open access
메뉴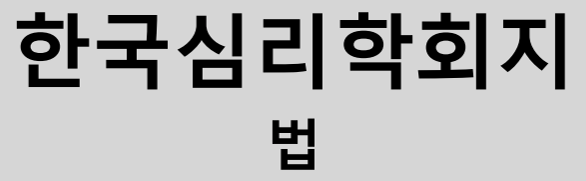
open access
메뉴본 연구는 범죄 피해자 110명을 대상으로 급성 스트레스가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정서조절곤란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범죄 유형에 따라 급성 스트레스, 우울․불안, 정서조절곤란 수준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범죄 피해 경험 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 2회 이하 경험자들보다 우울․불안이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범죄 피해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와 정서조절곤란, 사회적 지지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의 우울․불안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남성 피해자의 경우 급성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 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이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보였으나 여성 피해자는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남성, 여성 피해자 모두 사회적 지지는 급성 스트레스가 우울․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범죄 피해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 단계에서 피해자가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에 대해 성별에 따라 다른 치료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acute stress on depression and anxiety in 110 crime victims, and verified the moderating effects of emotion dysregulation and social support by gender.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level of acute stress, depression, anxiety, and emotion dysregulation depending on the type of crime. However, in case of victims who have experienced crimes more than three times, their depression and anxiety level was higher than those who experienced crimes less than twice. Second, acute stress, emotion dysregulation,, and social support due to crime damage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sex difference. However, women showed significantly higher levels of depression and anxiety than men. Third, in the case of male victims, emotion dysregulation showed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ute stress and depression/anxiety, but the female victims had no such effect. Fourth, social support for both male and female victims did not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acute stress and depression/anxiety.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negative emotions experienced by the crime victims during the acute stress stage due to crime damage require different therapeutic interventions depending on their gender. Finally, the significance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are discussed.
본 연구는 PAI의 내현화 및 외현화 척도로 구성된 2요인 모형이 한국 성인 교도소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유사한 모형 적합도를 나타내는지 검증하고자 했다. Ruiz 등(2008)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국 성인 교도소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PAI 척도들의 내부 구조를 탐색하였고, 이를 11가지 임상척도와 내현화 및 외현화의 중요한 징후로 나타나는 자살관념(SUI) 척도와 공격성(AGG) 척도를 포함한 총13가지 척도의 2요인 모형이 적합한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5개 지역의 개별 교도소에 수감중인 수형자들(N=788)을 대상으로 PAI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PAI 전체척도와 하위 척도의 문항 내 신뢰도(Cronbach’s α) 값은 전반적으로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13가지 척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내현화 요인에 속하는 하위 척도들 간의 높은 상관관계와 외현화 요인에 속하는 하위 척도들 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는 한국 성인 교도소 수형자들의 내현화 및 외현화 요인 구분이 Ruiz 등(2008)의 PAI 2요인 모형의 내현화 및 외현화 요인의 하위 구성척도와는 조금은 다르게 나타났다. 가장 주목 할 만 한 특징으로는 선행 연구에서 외현화 척도로 분류 되었던 망상(PAR) 척도와 약물문제(DRG) 척도가 본 연구에서는 내현화 척도로 분류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에서는 2요인 모형의적합도가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나 국내 교정 장면에서 활용 가능한 모형으로 볼 수 있겠다. 따라서본 연구에서는 서양과 다른 한국의 문화적 특성이 반영 된 성인 교도소 수형자들의 PAI 내현화 및 외현화 척도를 새롭게 탐색해보았고 이러한 2요인 모형에 근거해서 향후 수형자들의 관리 및 처우에 관한 효과적인 개입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validate whether a two-factor model which consist of the internalized and externalized measures of PAI represents similar model fitness in a study of Korean adult prisoners. Based on previous studies by Ruiz and others (2008), we explored the internal structure of PAI scales conducted on prisoners(N=788) in korean prisons, and found that there were 11 clinical scales, and 13 scales of suicide concepts (SUI) and aggressiveness (AGG) scales, which are important signs of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AI was conducted on the prisoners from individual prisons in five regions of Korea. As a result, the Cronbach's Alphas of the PAI full scale and subscale were generally superior. The correlations of the thirteen scales showed a high correlation between the subscales belonging to the internalizing factor and the subscales belonging to the externalizing factor. In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the distinction between the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factors of Korean adult prison prisoners was slightly different from the sub-constitutional scale of the PAI two-factor model of Ruiz and others (2008). Two notable features are the delusions (PAR) scale and the drug problem (DRG) scale, which were classified as externalizing scales in previous studies, classified as the internalizing scales in this study. In the results of the confirmation factor analysis, the conformity of the two factor model appears to be acceptable, and it appears to be the model that can be used in the domestic correction setting. Therefore, this study has explored the PAI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scales of adult prison prisoners who reflect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of Korea, which differ from those of the West, and discussed effective interventions based on these two-factor model in the management and treatment of prisoners.
데이트폭력은 최근 그 심각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으나, 여전히 관련 연구가 희소하고 대부분의 선행 연구가 실태조사에 그치는 한계가 있었다. 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범죄자 처벌 및 양형 기준, 관련 법제정 등 형사사법 제도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일은 해당 범죄가 실제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실태조사와는 별개로 의의를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데이트폭력에 관한 사람들의 인식, 즉 데이트폭력의 발생 빈도에 대한 인식 및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성별 및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데이트폭력에 관한 사람들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수도권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총 203명을 대상으로, 데이트폭력의 네 가지 하위유형(통제행동, 심리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각각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시한 후 데이트폭력의 심각성 및 발생빈도에 대한인식을 측정하였다. 더불어, 성별 및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가 데이트폭력에 관한 사람들의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데이트폭력이라는 사회문제를 매우심각한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남성 피해자의 성적 폭력에 대한 심각성 인식을 제외하고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데이트폭력 발생빈도 인식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일반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데이트폭력 상황이 현실에서 덜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심한 적대적 성차별주의 태도와 온정적 성차별주의 태도를 나타냈다. 더불어, 적대적 성차별주의의 하위요인인 경쟁적 성분화가 통제행동과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의 발생빈도 인식과관련이 있으며, 성별 또한 심리적 폭력과 성적 폭력의 발생빈도 인식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함의와 한계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Although the severity of dating violence increases, research on dating violence remains scarce and most studies on dating violence focus on reporting demographics of dating violence. Perception of crime influences offender punishment and sentencing, as well as law making, therefore investigating perception of crime provide practical implications.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perception of dating violence, including its severity and frequencies, and how gender and ambivalent sexism affects perception of dating violence. We gave a total of 203 participants scenarios regarding four types of dating violence(control behavior, emotional violence, physical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and evaluated perception of severity and frequencies of dating violence. We conducted independent samples t-test, correlational analyses, and regression analyses to examine how gender and ambivalent sexism affected perception of dating violence. As a result, respondents perceived dating violence as considerably severe, and the difference by gender was found only in the severity of sexual violence against male victims. Male respondents evaluated sexual violence against male victims less severe than female respondents. Perception of frequencies of dating violence differed by gender of respondents: Male respondents perceived dating violence less frequent than female respondents did. Males displayed higher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attitudes than females. Furthermore, competitive gender differentiation, a sub-factor of hostile sexism, affected perception of frequencies of control behavior, physical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and gender was highly related to perception of frequencies of emotional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Finally, we discussed practical ap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made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