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access
메뉴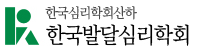
open access
메뉴본 연구는 아동기 외상경험이 대학생의 경계선 성격성향에 미치는 영향에서 초기애착과 성인애착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 233명(남 100명, 여 133명)을 대상으로 아동기 외상경험, 초기애착, 성인애착, 경계선 성격성향에 대한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 외상경험은 경계선 성격성향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둘째, 아동기 외상경험과 경계선 성격성향 사이의 관계에서 초기애착과 성인애착 각각의 단독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아동기 외상경험이 초기애착과 성인애착을 차례로 거쳐 경계선 성격성향을 예측하는 순차적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기 외상경험이 불안정한 초기애착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렇게 형성된 불안정한 초기애착이 이후 불안정한 성인애착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불안정한 성인애착이 결국 높은 수준의 경계선 성격성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경계선 성격장애의 대표적 위험요인인 아동기 외상경험이 경계선 성격성향으로 이어지는 기제를 애착을 중심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나아가 경계선 성격성향 대학생 집단에 개입할 때 애착 기반 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임상적 함의를 지닌다.
Although it is well established that childhood trauma presents a risk factor for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in later life, its specific mechanism has been relatively underexplored.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childhood trauma and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focusing on the mediating roles of early attachment and adult attachment. A total of 233 college students (100 men, 133 women) participated in the study and completed self-report questionnaires assessing childhood trauma, early attachment, adult attachment, and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Results indicated that early attachment and adult attachment sequential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trauma and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among college students. These findings support the role of attachment in the develop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and related problems.
수 감각은 수를 읽고 수가 나타내는 크기와 관계를 이해하는 것으로 수학 학습의 근간이 되는 능력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직선 추정 과제를 통하여 초등학교 1학년(n= 47)과 2학년(n= 34) 학생의 수 감각 정확도, 심적 표상, 문제풀이해결전략을 분석하였다. 1학년 학생은 0-100 수직선 추정 과제를, 2학년 학생은 0-100, 0-1000 수직선 추정 과제를 완성하였다. 연구 결과 2학년은 1학년보다 주어진 숫자가 나타내는 수의 크기를 수직선에 더 정확하게 표시하였다. 또한 2학년은 1학년보다 기준점(예: 중간지점)을 활용하는 전략을 수직선 추정 과제에 더 많이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1,2학년 모두 선형 모델이 로그형 모델보다 0-100, 0-1000사이의 숫자를 수직선 상에 표상한 결과의 패턴을 더 잘 설명하였다. 정리하면, 학년이 높을수록 수 감각 정확도와 사용하는 전략이 정교해지고 심적 표상의 선형성이 뚜렷해짐을 보여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확인된 높은 수 감각 정확도와 선형성은, 십진법 체계를 잘 나타내는 한국어 숫자표현의 이점을 반영한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겠다.
Number sense refers to the ability to read numbers and understand numerical magnitudes and their relations, and is a foundational skill for math learning. This study examined 1st (n=47) and 2nd (n=34) graders’ number sense acuity and their mental representation and problem-solving strategies using a numberline estimation (NLE) task. First graders completed the 0-100 NLE task and 2nd graders completed both the 0-100 and 0-1000 NLE tasks. Results showed that 2nd graders are more precise when representing numbers on the numberline than 1st graders. Additionally, 2nd graders applied more benchmark-based strategies (e.g., midpoint) in the NLE task than 1st graders. Finally, a linear model was found to be more suited for depicting the patterns of 1st and 2nd graders’ numerical estimates in the 0-100 and 0-1000 NLE tasks than a logarithmic one. Taken together, these findings suggest that as students grow older, their number sense and problem-solving strategies tend to be increasingly articulate and that the linearity of their mental representation becomes more obvious. Moreover, the high precision and linearity of numerical estimates in the current study can be interpreted as reflecting a positive influence of the transparency of the base-ten number structure in the Korean language.
본 연구는 각 학년별로 대략 200명의 유치원 아동과 초등학교 1, 2, 3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글 문식성(단어 읽기, 단어 읽기 유창성, 받아쓰기, 독해)과 인지 능력(음운인식, 명명속도, 좌우 방향 판단, 형태소, 철자 인식, 어휘력)을 검사하였다. 각 학년별로 읽기 부진 아동을 선정하고, 전체 아동과 읽기 부진 아동의 문식성 수행을 비교하였으며 또한 읽기 부진 아동이 주로 보이는 인지적 결손의 유형별 비율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 읽기 부진 아동은 각 학년별로 15-20% 사이에 해당하였다. 읽기 부진 아동의 문식성 검사의 평균은 전체 아동보다 1년 이상 낮게 지연(delay)되었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단어 읽기, 유창성, 받아쓰기, 음운변동 단어 읽기 수행의 지연은 더 커지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하기 직전 시기의 검사에서 민글자(받침 없는 글자)와 받친글자(받침 있는 글자)를 완전하게 읽지 못하는 미습득 아동의 비율은 전체 아동에서 각각 7%와 24%로 나타났으나, 읽기 부진 아동에서는 각각 48%와 95%로 나타나 두 집단 간의 큰 차이를 보였다. 2, 3학년 읽기 부진 아동의 30% 이상은 음운, 명명 속도, 철자, 형태소, 어휘력 결손을 보였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1학년에 민글자와 받친글자의 읽기 미습득 아동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지도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2, 3학년의 읽기 부진 아동이 보이는 인지적 결손 유형은 다양하므로, 개인의 인지적 결손 유형에 적절한 중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In this study, kindergarteners and first-to-third graders were assessed in Korean literacy (word reading, word reading fluency, spelling, and reading comprehension) and cognitive skills (phonological, orthographic, and morphological awareness, as well as naming speed, left-right reversal, and vocabulary). This study aimed to compare the literacy skills between poor readers and all children in each grade, as well as to determine the rate of cognitive deficits that appear in poor readers. We found that the average score of poor readers was more than a year below that of all children on all literacy tests. In particular, the proportion of children who could not read CV and CVC Gulja (written syllable) in the test immediately prior to entering elementary school was 48% and 95%, respectively, in the poor readers, whereas it was 7% and 24%, respectively, in all children, demonstrating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More than 30% of poor readers in the second and third grades had deficits in all types of cognitive skills except left-right reversal.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identify and intensively train children who have not mastered how to read CV and CVC Gulja in the early first grade.
본 연구는 행동억제 기질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거부민감성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를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실시되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386명을 대상으로 성인의 행동억제 기질, 거부민감성, 정서표현 양가성, 사회불안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의 행동억제 기질, 거부민감성, 정서표현 양가성, 사회불안 간에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둘째, 행동억제 기질은 사회불안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행동억제 기질은 거부민감성과 정서표현 양가성을 각각 매개하여 사회불안에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인의 행동억제 기질은 거부민감성과 정서표현 양가성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사회불안에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성인의 사회불안과 관련된 원인 파악 및 성인 기질을 포함한 개인의 내적 변인들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성인의 사회불안을 이해하기 위해 다요인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성인의 심리적인 특성을 다뤄주는 상담 전략을 통해 사회불안의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diation effects of rejection sensitivity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regarding the effects of behavioral inhibition temperament on social anxiety. To verify this, behavioral inhibition temperament, rejection sensitivity,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social anxiety were measured in 386 ad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behavioral inhibition temperament in adulthood, rejection sensitivity,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social anxiety. Second, behavioral inhibition temperament had a direct significant effect on social anxiety. Third, behavioral inhibition temperament had a significant indirect effect on social anxiety by mediating both rejection sensitivity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Finally, it was found that behavioral inhibition temperament had an indirect significant effect on social anxiety by sequentially mediating the rejection sensitivity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meaningful for understanding the causes of social anxiety in adults and the interaction of individual internal variables including adult temperament. Further, the findings suggest that a multifactorial perspective is needed to understand social anxiety in adults. The research findings also suggest that social anxiety can be alleviated through counseling strategies that deal with adult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의 화용언어능력과 자아존중감, 외현화 문제행동, 학교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를 단기종단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의 아동패널조사 제11차년도, 제12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총 1,148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IBM SPSS ver 25.0과 AMOS ver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상관분석 및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고,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해 부트스트래핑과 AMOS user-defined estimand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은 자아존중감, 학교적응과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현화 문제행동과는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은 자아존중감, 외현화 문제행동, 학교적응에 모두 유의한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동의 화용언어능력은 자아존중감과 외현화 문제행동 각각을 매개로 아동의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아동의 화용언어능력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외현화 문제행동의 이중매개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examined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pragmatic language, self-esteem,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 and school adaptation. Data on 1,148 children and their mothers from 11th and 12th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were us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5.0 and AMOS 23.0 with the application of Pearson’s correlation,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bootstrapping and the AMOS user-defined estimand function.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ly, children’s pragmatic languag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elf-esteem and school adaptation but negatively correlated with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 Secondly, children’s pragmatic language was found to exert an influence upon self-esteem,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 and school adjustment. Thirdly,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pragmatic language and school adjustment was mediated by their self-esteem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 Results are discussed in terms of the protective factor and risk factors for children’s school adjustment.
본 연구는 부모화 경험의 하위요인을 ‘부모화-불공평’과 ‘부모화-돌봄’으로 구분하여 각 하위요인이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자기불일치와 인지적 공감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 344명의 자료를 SPSS 22.0과 AMOS 22.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화 경험 두 하위요인은 각 하위요인 모두 가족형태와 출생순위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의 경우, 부모화-불공평은 대인관계능력, 인지적 공감과 부적 상관을 보인 반면 자기불일치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부모화-돌봄은 대인관계능력, 인지적 공감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자기불일치와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최종모형 매개분석 결과, 부모화 경험 두 하위요인이 자기불일치와 인지적 공감을 매개하여 대인관계능력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화 경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제공하는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그리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determine the differential effect of the parentification sub-factor (injustice, caretaking) on college student interpersonal ability (IA). Self-discrepancy (SD) and cognitive empathy (CE) were utilized as parameters to validat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Regarding demographic characteristics, both types of parentifiaction reveal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family type structure and birth order, respectively. Parentification-injustice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IA and CE but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SD. In contrast to injustice, Parentification-caretaking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IA and CE but not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SD.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the sub-factor of parentification (injustice, caretaking) had a differential effect on IA by mediating SD and CE. Based on these finding,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본 연구의 목적은 2011년부터 2021년 사이에 유아의 놀이성과 관련된 변인을 연구한 국내 학술지 논문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유아의 놀이성과 관련 변인의 효과크기를 분석하는 것이다. 총 52개의 연구논문에서 산출된 160개의 상관계수에 대해 평균 효과크기를 산출하였고, 유아 개인, 어머니, 아버지, 부모, 교사 영역에서 큰 효과크기를 갖는 변인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구의 특성과 영역에 따른 효과크기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하위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아의 놀이성과 관련 변인 간의 평균 효과크기는 중간 효과크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 개인 영역에서 효과크기가 가장 큰 변인은 유아의 행복감, 정서지능이었고, 어머니 영역에서 효과크기가 가장 큰 변인은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였다. 유아의 놀이성 평정자와 관련 변인의 평정자가 일치하는 경우의 효과크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세 배 이상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유아의 놀이성과 관련 변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유아 놀이성 관련 후속 연구에 제언하고, 유아의 놀이성을 증진하기 위해 부모와 교사가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ystematically search literature related to children’s playfulness published between 2011 and 2021 in Korea and classify the variables associated with it. The study calculated the average effect size and identified variables with the largest effect size in each domain using 52 studies with 160 correlation effect sizes. The study also conducted sub-group analyses to explore effect size differences according to study characteristics and domains. The average effect size between children’s playfulness and related variables was medium. The variables that had the largest effect size were the child’s happiness and emotional intelligence in the child individual domain and the mother’s acceptance of emotional expression in the maternal domain. When raters of playfulness and corresponding variables were matched, the effect size was three times larger than when they did not. The findings provide aggregated and helpful information regarding children’s playfulness with related variables. It suggests a direction for future study on children’s playfulness and provides information to teachers and parents when promoting children’s playfulness.
본 연구는 성장기 동안 경험한 부모의 정서적 불인정(emotional invalidation)과 표출 정서(expressed emotion)가 성인기 자녀의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248명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서적 불인정, 표출 정서, 정서조절곤란, 내면화 문제, 외현화 문제의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아버지의 정서적 불인정은 자녀의 내면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표출 정서와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 사이에서 정서조절곤란이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표출 정서가 자녀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정서조절곤란이 완전매개 하였다. 남성의 경우 부모의 정서적 불인정과 표출 정서가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로 이어지는 일부 직접 경로가 유의미하였는데, 여성의 경우 그 과정에서 정서조절곤란이 매개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는 성장기의 부모-자녀 간 정서적 상호작용이 성인기의 심리적 어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으며, 이러한 영향력이 부모와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작용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발달적·치료적 개입의 방향과 한계점,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This study explored the effects of parental emotional invalidation and expressed emotion experienced during childhood on the psychological health of young adults. Based on a sample of 248 college and graduate students, the relationships among emotional invalidation, expressed emotion, emotional dysregulation, internalizing problems, and externalizing problems were clarified us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results revealed that paternal emotional invalidation affected children’s internalizing problems, while emotional dysregulation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al expressed emotion and internalizing-externalizing problems. For male participants, some direct paths of parental emotional invalidation and expressed emotion leading to internalizing-externalizing problems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while, for female participants, emotional dysregulation mediated the path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suggestions for further studies are discussed.
본 연구는 아동학대의 발생 기제를 이해하기 위하여, 주 양육자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아동기 학대경험이 부정적 양육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적대적 귀인편향과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1-3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 396명의 자기보고식 설문자료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어머니의 아동기 학대경험은 부정적 양육행동을 직접적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아동기 학대경험과 부정적 양육행동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아동기 학대경험은 적대적 귀인편향과 정서조절곤란을 순차적으로 거쳐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예측하였다. 즉 어머니의 아동기 학대 경험은 적대적 귀인편향의 증가를 예측하고, 이어서 정서조절곤란에 영향을 주어 부정적 양육행동의 증가로 이어졌다. 본 연구 결과 확인된 부정적 양육행동의 발생 기제를 기반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In order to understand the psychological mechanisms influencing the occurrence of child abuse, this study focused on the mother’s negative parenting behavior. This study intende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hostile attribution bias and emotion dysregul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experience of childhood abuse and negative parenting behavior. Data of 396 mothers with children from grade 1 to 3 in elementary school were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s a result, mother’s childhood abuse directly predicted negative parenting behavior. In addition, emotion dysregulation showed significant mediating effects on the path between mother’s childhood abuse and negative parenting behavior. Furthermore, the double mediating effect was significant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childhood abuse and negative parenting behavior. In other words, mother’s childhood abuse predicted an increase in hostile attribution bias, which in turn contributed to a high level of emotion dysregulation, further leading to an increase in negative parenting behavior. Finally, effective prevention strategies along with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re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