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access
메뉴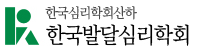
open access
메뉴이 연구는 남녀 대학생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화불안에서의 연령차와 성차를 확인하고 연령과 성별에 따른노화불안과 특성불안 및 노화불안과 5요인 성격특성의 관계를 규명하는 동시에 노화불안에 미치는 5요인 성격특성의 상대적 영향력도 함께 규명하였다. 연구 결과 대학생들은 노인들보다 더 큰 노인에 대한 공포를지니고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 큰 신체 외모에 대한 걱정을 지니며 상실의 공포에서는 노인들이 대학생들보다 그리고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크게 경험하였고, 여자 대학생들은 남자 대학생들보다 유의하게 더 큰상실의 공포를 경험하였지만 남녀 노인들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노화불안과 특성불안의 관계는 대학생들과노인들에서 서로 상이하였고 노화불안과 성격특성들은 비록 노화불안의 하위차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였지만, 양자 간에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학생들은 낮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높은정서적 불안정성을 지닐 때, 노인들은 높은 정서적 불안정과 낮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 및 높은 특성불안을지닐 때 노화불안이 커지는 경향을 나타내어 노화불안의 어떤 측면들은 성격특성의 영향을 받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변화에 저항적인 경향이 있음이 확인될 수 있었다.
This study examined differences in aging anxiety and in relationships between aging and, trait anxiety and 5-factor personality traits according to age and sex and relative effects of 5-factor personality traits on aging anxiety with college students and older adults. Results revealed college students had higher fear of old people than older adults, female had higher fear of physical appearance than male,and female older adults had highest fear of loss followed male older ones, female and male college students. College students and older adults indicated different patterns in relationships between aging and traits anxiety. Also 4 dimensions of aging anxiety were differentially related to personality traits in all participants. On the whole college students' aging anxiety tended to increase as having lower openness to experience and higher neuroticism, while older adults' aging anxiety to increase as having higher neuroticism, lower openness to experience and higher trait anxiety.
본 연구는 한국 노인의 삶의 의미 원천과 가족관계가 갖는 의미 정도를 알아보고 가족관계의 질과 자기초월가치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먼저 전체 한국 노인들은 삶의 의미 원천으로 배우자,자녀, 정신건강, 손자녀, 신체건강, 심리적 안녕감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성 노인들은 배우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여성 노인들은 자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차이를 보여주었다. 배우자관계에서도 여성노인은 배우자에게 존중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남성노인은 배우자의 배려를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를 중요한 의미원천으로생각하는 노인들 중 실제 가족관계의 질이 높은 사람은 실제 가족관계의 질이 낮은 사람에 비해 성공적 노화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노인의 자료를 회귀분석한 결과, 노인의 가족관계와 자기초월가치는남녀 모두에게서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임이 확인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 of family relations as a source of meaning of life and self-transcendence value on successful aging in the elders of Korea. The result was as follows:First, Korean elders considered that family relations as the most important domain from the 11domains suggested. Physical and mental health were also regarded as critical domains including psychological well-being. Second, the different results were reported between the group with high intimacy family relations and the group with relatively lower family relations in terms of successful aging. Lastly, this study analyzed the influential elements and factors in successful aging based on multiple regressions. This study concluded that family relations and self-transcendence value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successful aging.
본 연구는 연속적 자극의 절대적 크기를 부호화하는 아동 능력의 발달을 알아보고 이와 관련된 요인으로 실행기능의 역할을 검증하고자 설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절대적 크기를 부호화하는데 있어서 상대적 크기에대한 반응 편향을 극복하는 것이 핵심적인 발달과제임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4세, 6세, 8세 아동을대상으로 크기 부호화 과제(Duffy, Huttenlocher, & Levine, 2005)와 Flanker과제 (Munro, Chau, Gazarian, &Diamond, 2006)를 실시하여 연령별 아동의 수행과 그 관련성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가 다음과 같다. 우선 크기 부호화 과제에서 아동의 수행은 4세에서 8세에 이르기까지 발달했으며, 오류의 대부분이 상대적 관계에 대한 반응 편향으로 인한 것이며 이러한 반응 경향성이 8세경 벗어남을 확인하였다. 또한 크기 부호화 과제 수행은 실행기능을 측정하기 위한 Flanker과제와 모든 연령대에서 관련을 보였으며, 특히 4세 아동의 경우 상대적오반응률이 Flanker과제의 하위 조건 중 가장 어려운 세 번째 구획의 불일치 조건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음을검증하여 아동 초기 크기 부호화의 핵심적 발달 요인이 실행 기능과 관련됨을 시사 하였다.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ability to encode information about absolute size and its relation to executive functioning (EF). In particular, we explored whether the ability to inhibit relational information is critical in encoding size information. For this purpose, 4-, 6-,and 8-year-olds were given an absolute size task (Duffy, Huttenlocher, & Levine, 2005a)and a Flanker task. Our results showed that the ability to encode absolute size improves significantly between 4 and 8 years of age. The most prevalent type of error was relative error, which was significantly reduced when they reached age 8. There was also a significant correlation in all age groups between performance on the two tasks. Furthermore,we found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amount of relative error and performance in the third block of the Flanker task in 4-year-olds.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executive function is critical in encoding absolute size in early childhood.
본 연구는 만 7개월의 한국 영아들이 언어 정보를 이용하여 타인의 가리키기 행동의 목표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영아들은 실험 조건 또는 통제 조건에 참가하였다. 실험 조건에 참여한 영아들은 친숙화 시행에서 행위자가 “미도”라는 새로운 단어를 말하는 것을 들은 후에 두 개의 비친숙 물체 중 하나를 검지로 가리키는 장면을 보았다. 친숙화 시행이 끝나고 두 물체의 위치가 바뀐 검사 시행에서 영아들은 행위자가 친숙화 시행에서 가리켰던 동일한 물체를 가리킨 기존 목표 사건과 다른 물체를 가리키는 새 목표 사건을 보았다. 실험 조건에 참여한 영아들은 새 목표 사건을 기존 목표 사건보다 유의하게 오래 보았다. 통제 조건은 친숙화 시행에서 행위자가 “우와”라는 감탄사를 발화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험 조건과 절차가 동일했다. 통제 조건의 영아들의 기존 목표 사건과 새 목표 사건에 대한 응시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언어 정보가 주어질 경우 아직 스스로 목표 지향적 가리키기 행동을 하지못하는 만 7개월 영아들도 타인의 가리키기 행동의 목표를 이해함을 보여준다.
The present study examined whether Korean 7-month-old infants can understand the goal-directedness of others’ pointing gestures when linguistic information is provided. Korean 7-month-old infants were familiarized with an event in which an actor pointed to one of the two novel objects with her index finger after saying a novel label, “mido”(Experimental condition) or a Korean exclamatory expression “woowa” (Control condition). After the positions of the two objects were switched, the infants watched the actor pointing to the new-goal object (new-goal event) or the old-goal object (old-goal event) in the test trials. The infants in the experimental condition looked significantly longer at the new-goal event than the old-goal event. The infants in the control condition looked at the new-goal and the old-goal events about equally, indicating that other linguistic cues such as an exclamation of surprise do not facilitate infants’ understanding of goal-directedness of others’ pointing gestures. The results suggest that seven-month-old infants understand the goal-directedness of the actor’s pointing gesture when some linguistic cue is provided even though they cannot produce their own goal-directed pointing gestures yet.
본 연구에서는 읽기이해부진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읽기 전략들을 직접교수법과 읽기게임교수법을 활용하여 읽기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비교하였다. 교육내용은 사전 연구들에서 효과적으로 검증된 어휘 전략과 이해 전략으로 구성하였다. 직접교수법은 행동주의 원리를 적용하여 교사의 명시적 설명과 시범, 전체 수행과 피드백, 개별 수행과 피드백으로 진행하였다. 게임 교수법은 전략을 게임으로 변환 적용한프로그램으로 개발하였다. 초등학교 3-4학년의 읽기부진아동 12명을 직접교수집단과 읽기게임집단으로 나누어 15회기에 걸쳐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읽기이해능력에 대한 효과비교에서 직접교수법이 문장배열과제와 독해평가에서, 게임집단은 어휘선택과제와 읽기폭 문장진위과제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집단 모두 읽기이해검사의 일부하위요인에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읽기동기는 사전에 비해 두 집단 모두향상되었으나 집단 간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논의하였다.
This study compared the effectiveness of two reading comprehension programs, which consist of word strategies and comprehension strategies. The direct instruction program is developed based on behavioral principles, teacher's explicit explanations and demonstration,and students‘ practice. The reading game instruction program is developed transferring strategies into appropriate games. The subjects were twelve grade 3-4 students who have decoding skills and IQ 70 or above but are behind the class in reading comprehension by teachers' reports. The subjects were assigned into the direct instruction group and the reading group matching IQ, BASA scores, and BAAT scores. Both programs consist of 15sess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e reading game group outperformed the direct instruction group on vocabulary selection(BAAT) and true or false test(reading span), but the direct instruction group outperformed the game group on sentence arrangement(BAAT) and reading tasks developed by the authors. But both programs enhanced subjects' sentence comprehension but not passage comprehension. These results are discussed in terms of teaching materials which include a lot sentences but a few passages.
한국 아동의 의성어와 의태어 사용과 그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 3개의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1에서는CHILDES 코퍼스를 분석하여 한국어 모어 사용자인 아동과 양육자에서 의성의태어가 많이 사용됨을 확인하였다. 연구 2에서는 실험상황에서 아동과 양육자를 대상으로 청자의 연령에 따른 의성의태어 사용을 분석하였다. 아동은 청자에 따라 의성의태어 사용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양육자들은 아동에게 말할 때 의성의태어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였다. 또한, 아동과 양육자 모두 사물보다는 동작을 설명하는 상황에서 의성의태어를 많이 사용하였다. 연구 3에서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 양육자(다문화가정)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아동과 양육자 사이의 자유 대화에서 외국인 양육자의 의성의태어 사용은 한국인 양육자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으며, 이러한 패턴은 아동의 자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의성의태어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아동지향어의 특징이며 어휘획득 등 언어발달에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ree studies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 use of onomatopoeic and mimetic words and its functions in Korean children. In Study 1, conversations between a Korean child and her care-givers in CHILDES were analyzed. More onomatopoeic and mimetic words were found in their utterances than other languages such as English or Chinese. Onomatopoeic and mimetic words appear to belong to the basic layer of Korean motherese. In Study 2, an experimental situation was set in which children were asked to explain pictures depicting an object or motion for a puppet and a strange adult. The results showed that only mothers used more onomatopoeic and mimetic words to their children than to the adult. Both mothers and children used more onomatopoeic and mimetic words when the pictures depicted a motion rather than an object. Study 3 showed that immigrant mothers used less onomatopoeic and mimetic words than Korean mothers which in turn resulted in lower use of them in childre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frequent use of onomatopoeic language is a characteristic of Korean native CDS. The role of onomatopoeia in the acquisition and development of language was also discussed.
본 연구는 거짓말 유형(반사회, 선의, 유희)에 대한 이해, 이에 따른 도덕적 판단, 부정적, 긍정적 정서반응이 연령(만 5, 6, 7세, 성인)에 따라 어떻게 발달하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거짓말에 대한 이해는 모든연령에서 반사회적 거짓말에 대한 이해를 다른 유형의 거짓말보다 더 잘 이해했다. 그러나 선의나 유희적거짓말에 대한 이해는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 5, 6세는 선의와 유희적 거짓말의 이해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7세는 선의의 거짓말을 유희적 거짓말보다 더 잘 이해했다. 한편, 성인은 반사회와 선의의거짓말을 유희적 거짓말보다 더 잘 이해했다.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판단에서 5, 6세는 세 유형의 거짓말에대한 도덕적 판단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7세는 반사회와 유희적 거짓말을 선의의 거짓말보다 더잘못된 행동으로 판단했다. 성인은 반사회적 거짓말을 가장 잘못된 행동으로 판단했고, 그 다음 유희적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의 순으로 잘못된 행동으로 판단했다. 정서반응에서 5, 6, 7세는 모든 유형의 거짓말에서 부정적, 긍정적 정서반응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하지만 성인은 선의와 유희적 거짓말보다 반사회적 거짓말에서 미안하다는 부정적 정서반응을 더 많이 보였으며, 반사회적 거짓말보다 선의와 유희적 거짓말에서 기쁘다는 긍정적 정서반응을 더 많이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거짓말에 내재된 의도의 종류에 따라거짓말을 이해하고 판단하며, 더 나아가 정서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 달라짐을 시사한다.
This study examined children's understanding, moral judgment, and emotional reactions about three different types of lies(i.e. antisocial lies, white lies, and trick lies) in Korean children. Participants were eighty five-year-old, six-year-old and seven-year-old Korean children and adults(20 for each group). The results showed that children understood antisocial lies better than white lies and trick lies. But understanding of the inherent intention in lying stories, like the white lies or trick lies, required the understanding of cognitive epistemic state. There were differences of children's moral judgment for lies according to age and lie types. Younger children(five- and six-year-old) treated all types of lies as being bad. On the other hand, seven-year-old treated antisocial lies and trick lies as being bad, but white lies as being good, while adults treated antisocial lies as being bad, but white lies and trick lies as being good. The results also showed that children made a mistake in inferring negative emotions from white lies and trick lies and in inferring positive emotions from antisocial lies.
본 연구에서는 학령전기 아동의 증언판별 능력의 발달 정도 및 증거성표지들의 의미 이해 발달 정도와 출처에 따라 달라지는 정보확실성 이해 발달 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만 3-6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두 명의 화자가 제공한 정보 중 보다 확실한 정보를 고르는 과제(정보확실성 이해), 잘못된 증언을 무시하고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과제(증언판별 능력)와 증거성표지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있는 지를 측정하는 과제(증거성표지 의미 이해)를 제시하고, 세 과제 수행 정확도 간의 관계를 상관과 회귀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증언판별 능력은 3-4세 사이에 발달하는 정보확실성 이해 능력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거성표지 의미 이해 발달 정도도 정보확실성 차이 이해 발달에 간접적으로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보확실성 비교, 판단 능력에 이러한 인지, 언어 발달 요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The present study examined relationships between preschoolers’ abilities to judge trustworthiness in others’ testimony and information certainty, and also whether their understanding of evidential markers is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judging information certainty. Three to six-year-old Korean-learning children's ability to ignore an adult’s false testimony and to instead rely on their own experience was measured. Also, these children’s comprehension of evidential markers and abilities to determine more certain information when the two contrasting information was provided, marked by evidential markers or lexical items were obtained. Children’s abilities to trust other’s testimony appeared to uniquel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certainty judgment around the age of 3-4 years. In addition, children’s ability to comprehend evidential markers positively predicted 3-6-year-olds’ abilities to judge information certainty. These results suggest that both abilities to trust in testimony and acquisition of evidential markers play important roles in children’s development of judging information certainty.
상대방 말의 음성적 특성에서 정서를 파악하는 능력의 발달적 변화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말의내용(중립적/기쁜/무서운)과 음성적 특성(기쁜 목소리/무서워하는 목소리)을 다양하게 변화시킨 말 자극을 초등 2학년과 4학년 및 대학생에게 제시하여 말한 사람의 정서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정서를 유발하지 않는 중립적인 내용을 기쁜 또는 무서워하는 음성적 특성의 목소리로 말한 자극에 대해서는 모든 연령집단 아동이 음성적 특성에 따라 정서 판단하였다. 이에 반해 말의 내용이 기쁘거나 무서운 내용일 경우에는 연령과 말의 내용, 그리고 음성적 특성과 내용의 일치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기쁜 내용의 말자극에서는 음성적 특성이 말의 내용과 일치하던 일치하지 않던, 모든 연령집단이 음성적 특성에 따라판단하였다. 그러나 무서운 내용의 말 자극에서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2학년은 말의 내용과 음성적 특성이 일치할 때에 비해 일치하지 않을 때 말의 음성적 특성에 의해 정서를 판단한 정도가 더 낮았으나, 대학생은 반대로 일치하지 않을 때 더 높았다. 이는 말의 내용과 음성적 특성이 일치하지 않을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음성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서를 판단함을 보여준다.
This study examined the developmental change in reading the emotional states from the voice tone of speech. Seven- and 9-year-old children and adults judged whether the speaker was happy or fearful from cues conveyed by the content and affective vocal tone of speech. When the emotionally neutral contents were uttered with happy or fearful voice tone, all three groups relied on voice tone. In contrast, when the contents of utterances were about happy or fearful situations, the judgments differed according to the two factors; the content of speech, and the congruity of information conveyed by the content and affective vocal tone of speech. In case of happy utterances, all three groups relied on voice tone regardless of the congruity of information conveyed by the two cues. In contrast, group differences had been found in case of fearful utterances: Seven-year-olds relied on the voice tone less in the incongruent condition than in the congruent condition, but adults relied on the voice tone more in the incongruent condition. The present results demonstrate that as children get older, they rely more on the voice tone when the two cues convey incongruent information about the emotional states of spea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