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access
메뉴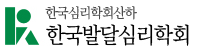
open access
메뉴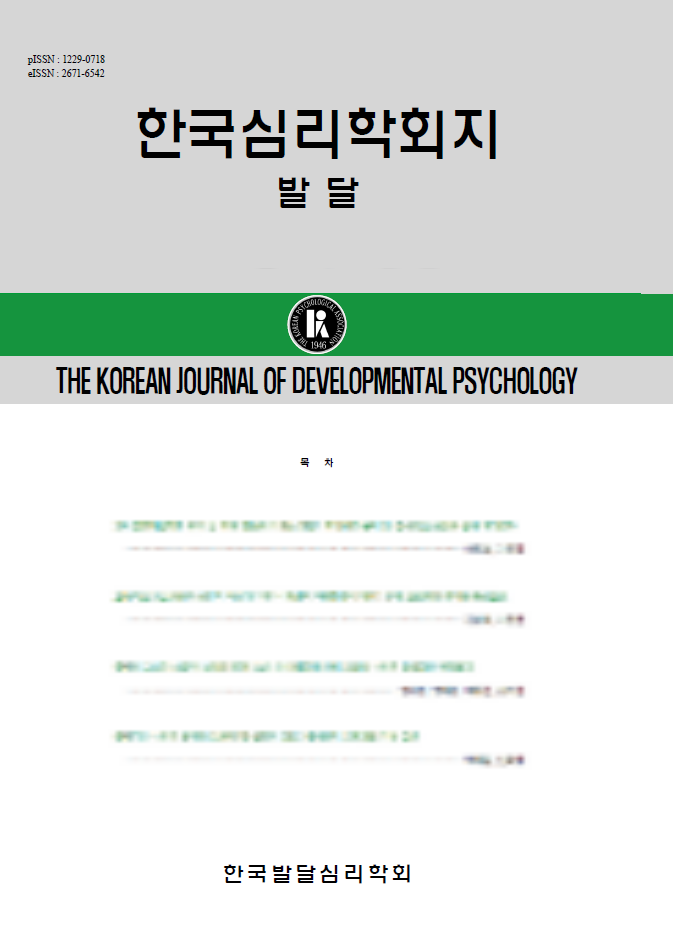 ISSN : 1229-0718
ISSN : 1229-0718
본 연구는 국내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아동의 자기조절과 심리사회적 적응(외현화 문제, 내재화 문제, 중독,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를 메타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2013년까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총 62개의 연구가 포함되었으며, Hunter와 Schmidt(2004)의 무선효과모형(random-effects model)을 적용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자기조절은 외현화 문제, 내재화 문제, 중독과는 부적 상관, 사회적 유능감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한편, 탐색적으로 진행한 조절변인 분석에서는 자기조절 하위유형, 측정방법, 그리고 아동의 성별과 연령대가 조절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들 변인에 따라 자기조절과 적응지표 간 관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금껏 국내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자기조절과 심리사회적 적응 간 관계에 대한 연구를 실증적으로 통합했다는 의의를 지니며,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자기조절의 증진을 효과적인 표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Meta-analyses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regulation and psychosocial adjustment (i.e., externalizing behavior, internalizing behavior, addiction, and social competence) in preschool and elementary school children using 62 studies published in Korean journals. Results revealed significant associations between children’s self-regulation and all indicators of psychosocial outcomes. Additionally, subtypes of self-regulation, child’s sex and age, and informants of rating emerged as moderator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regulation and psychosocial adjustment in exploratory analyses. This study represents an initial attempt to integrate previous studies on children’s self-regulation and psychosocial outcomes. Based on these findings, specifically targeting self-regulatory abilities were discussed as a way of promoting children’s adjustment across multiple domains.
중년 여성 158명을 대상으로 후회 영역, 후회 정서, 후회에 대한 대응 전략과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중년 여성이 가장 빈번하게 후회하는 삶의 영역은 ‘결혼 및 배우자 선택’, ‘교육 부족’, ‘자기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후회 관련 정서를 많이 느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회 대응 전략과 관련해서는 후회 반추를 많이 사용할수록 후회 관련 정서를 많이 느끼고 주관적 안녕감이 낮은 반면, 대안적 목표 추구 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회한 것에 대한 지각된 수정가능성이 후회 정서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수정가능성이 적다고 지각할수록 후회 관련 정서를 많이 느끼고 주관적 안녕감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잃어버린 기회 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분석 결과 지각된 수정가능성과 후회 대응 전략 중 후회 반추는 직접적으로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후회 관련 정서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회 대응 전략 중 대안적 목표 추구는 주관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s among perceived opportunity, coping strategies, regret-related emotions, and subjective well-being in 158 middle-aged women living in Busan, South Korea. Middle-aged women regret most frequently the areas of marriage, education, and self-development. The more regret-related emotions they felt, the less subjective well-being they had. Rumination as a coping strategy for regret was related to higher regret-related emotion and lower subjective well-being, while the use of engagement of new goals as a coping strategy was related to higher subjective well-being. The lower the perceived opportunity of modification experiences involving regret, the higher the regret-related emotions and the lower the happiness. Out of the two contrasting principles regarding regret-future opportunity principle and lost opportunity principle-this supported the lost opportunity principle. Finally, the path analysis result showed that perceived opportunity and rumination had effects on subjective well-being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Engagement of a new goal had a direct effect on subjective well-being.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구․경북 지역에 위치한 대학 4 곳의 37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도구로는 대학생활적응척도(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 성인 애착 유형검사인 친밀 관계 경험 척도(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Revised: ECR-R), 자아존중감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 대인관계능력 척도(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 ICQ)가 사용되었다. 선행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애착, 대학생활적응,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 간의 가능한 경로와 역할에 대한 가설적인 모형이 제시되었고, 이론적 모형들의 타당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들의 구조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는 AMO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검증 결과, 첫째, 애착은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은 대학생활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애착은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을 부분 매개하여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그리고 향후 연구 방향을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college students's adaptation to college, adult attachment,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Participants were 372 college students randomly selected from four college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IBM SPSS Amos 19.0. The results showed that 1) adult attachment affected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2)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ffected adaptation to college; and 3) adult attachment had an indirect effect on adaptation to college, which was mediated by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본 연구에서는 18개월 영아 어머니의 반응성 상호작용과 아동의 중심축 행동, 42개월 이후 지능 및 다중지능 발달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는 어머니와 아동 162쌍이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비디오 관찰과 어머니의 자기보고식 설문 작성에 의해 이루어졌다. 어머니의 반응성 상호작용과 아동의 중심축 행동은 비디오 관찰 방법으로 측정되었고, 아동의 지능 및 다중지능은 부모보고 질문지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어머니의 반응성 상호작용과 아동의 중심축 행동, 지능 및 다중지능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18개월 영아 어머니의 반응성 상호작용은 18개월 영아의 중심축 행동, 42개월 아동의 지능과 매우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48개월 아동의 다중지능 영역 중 논리수학, 언어, 대인관계, 개인이해 지능 등 일부 요인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구조 방정식 모형을 통해 변인들 간의 영향력 관계 검증 결과, 18개월 영아 어머니의 반응성 상호작용은 아동의 중심축행동과 42개월 이후 지능과 다중지능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발달에 있어 18개월 영아의 중심축 행동 발달이 42개월 이후 지능 및 다중지능에는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어머니의 반응성 상호작용 수준에 따른 아동 발달 변인의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의 반응성 상호작용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중심축 행동, 지능 및 다중지능 발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생애 초기 어머니의 반응적인 양육은 뇌발달의 중요한 환경변인이며 이후 지능발달에 중요한 영향임을 제안하였다.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a mother’s responsive interactions on toddlers’ pivotal behavior, their later intelligence, and multiple intelligence. There were 162 participants in the study which consisted of 18 month old toddlers and their mothers. Responsiveness and toddlers’ pivotal behavior was assessed by behavioral observation and a follow-up assessment of toddlers’ intelligence was conducted at 42 months of age. In addition, an assessment of toddlers’ multiple intelligence was conducted at 48 months of age. Results showed that maternal responsivenes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oddlers’ pivotal behavior, intelligence at 42 months, and multiple intelligence at 48 months of ag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conducted for examining relationships among across mother’s responsive interaction, toddlers’ pivotal behavior, intelligence, and multiple intelligence. The SEM analysis revealed that mother’s responsive interaction affected toddlers’ pivotal behavior and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oddlers’ later intelligence and multiple intelligence. In addition, toddlers’ with higher maternal responsiveness had a greater score in toddlers’ pivotal behavior, intelligence and multiple intelligence than toddlers with lower maternal responsivenes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maternal responsiveness affects toddlers’ intellectual ability development.
본 연구는 독재자 게임에서 자원 분배 행동이 자원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지 연구하였다. 즉 노력하여 얻은 자원에 비해 아무 노력 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원을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나누어 주는지 알아보았다. 또 독재자 게임에서의 자원 분배 행동이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되는지 연구하였다. 초등학교 2학년과 5학년 아동 88명이 연구에 참가하였다. 참가 아동은 자원을 아무 노력 없이 무상으로 받는 ‘무상 자원’ 조건과 게임에 이긴 상으로 받는 ‘노력 자원’ 조건에 무선 배정되었다.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은 Doescher(1985)의 척도를 사용하여 교사가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상 자원’ 조건에서의 분배 양이 ‘노력 자원’에서의 분배 양보다 컸으나, 그 차이는 유의한 수준에 근접하는데 그쳤다. 분배의 양은 연령과 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5학년 아동이 2학년 아동보다, 여아가 남아보다 더 많은 양을 나누어 주었다. 둘째, 독재자 게임에서 나누어 준 자원의 양과 교사가 평가한 아동의 친사회성 점수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독재자 게임에서 나타난 자원 분배 행동이 아동의 일상 생활의 친사회적 행동을 정확하게 대표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This study examined the different patterns of resource allocation behaviors based on the types of resources in the dictator game. Specifically, we tested whether children distributed more resources that were gained free of charge compared to those gained via effort. Additionally, we looked at whether the amount of distributed resources in the dictator game had correlations with the children’s prosocial behaviors in everyday life. A total of 88 Korean children in the 2nd and 5th grades participated. Children were randomly assigned to either the free-of-charge resource or the effort resource condition; in the free-of-charge resource condition, resources were given to the children without any effort, but in the effort resource condition, the children received resources as a reward for winning a card game. Children’s prosocial behaviors in everyday life were measured by teachers using the Modified Prosocial Behavior Questionnaire (Doscher, 1985). The results showed that, first, children distributed more resources in the free-of-charge resource condition compared to those in the effort resource condition with marginal significance. In addition, the amount of the distributed resources differed according to sex and age. That is, girls and 5th graders distributed more resources compared to boys and 2nd graders. Second, the Modified Prosocial Behavior Questionnaire scores were not correlated with the amount of resources distributed to other children in the dictator games. This suggests that the resource allocation in the dictator game may not reflect children’s everyday prosocial behaviors.
본 연구에서는 1-3세 영유아의 영상물 과몰입과 주요 발달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영유아 영상물 과몰입 척도를 구성하고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전국 5개 시도에 거주하는 1-3세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 795명을 대상으로 영유아 영상물 과몰입과 부모의 인터넷 사용, 영유아의 영상물 과몰입과 일반적, 정서사회적 발달과의 관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첫째, 영유아의 영상물 과몰입은 아버지 보다는 주로 어머니의 인터넷 사용과 관계가 있었다. 둘째, 영유아의 영상물 과몰입은 일반적 발달에 있어 주로 사회성 감소와 정서사회적 발달 저하와 관계가 있었다. 셋째, 영유아의 영상물 과몰입은 일반적 발달에 있어 개인-사회성, 의사소통, 대근육운동과 소근육운동 등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고, 정서사회적 발달에 있어 공격․반항성, 활동․충동성 등의 외재화 행동문제, 우울․퇴행과 일반불안 등의 내재화 행동문제 등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과제가 논의되었다.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infants’ (1-3 years) visual media overindulgence on their general, emotional and social development. An infants’ visual media overindulgence scale was created, and its content and construct validity proved sound. Participants comprised 795 mothers with infants across 5 provinces. There were three key findings. First, infant visual media overindulgenc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mothers’ Internet addiction, not fathers’ Internet addiction. Second, infant visual media overindulgenc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ocial development problems indicated in the Korean Ages and Stages Questionnaires. Third, visual media overindulgence negatively influenced personal-social, communication, and gross and fine motor skills in the Korean Ages and Stages Questionnaires, and aggression/defiance, activity/impulsivity (externalizing problem), depression/withdrawal, and general anxiety (internalizing problem). Limitations and future tasks were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