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access
메뉴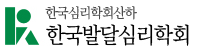
open access
메뉴본 연구에서는 가족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심리학적 연구들을 올바르게 자리매김하고 앞으로의 가족 연구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자, 문헌 연구를 통해 가족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 방법과 이들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변인들을 개략적으로 검토하였다.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이러한 기능과 관련해 심리학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첫째는 개인간의 상호 작용에 촛점을 두는 연구들이다. 이들 연구에서는 가족 관계 -부부, 부모자녀, 고부관계등- 에서 각 구성원 간의 상호 작용 유형을 밝히고 이에 영향을 주는 여러 변인들을 다루고 있다. 가족 치료는 가족 구성원들의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에 주목하는 임상적인 접근이다. 둘째는 발달적 접근법을 따르는 연구들로, 전생애적 발달심리학 개념에 기초해 가족을 그 구성원들의 발달과 함께 단계별로 변화해가는 하나의 유기체로 본다. 이들 연구에서는 가족의 발달주기와 각 발달 단계에서 요구되는 가족의 발달과업을 밝히고 있다. 한편 여러가지 심리학적인 개념들이 응용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가족의 효율적인 기능 수행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This study is to find proper orientation for family relationship through reviewing psychological approaches and the variables of the researches. The provision of psychological stability and emotional support are the essential function of family in contemporary society. There are two different research directions in that relation. First, the researchers emphasize individual interaction and show the types of interactions between family members. Clinical approach in family therapy about disfunctional family interaction. Second, other researchers attempt develpmental approach and show stages of developmental change of family member and refer to arganism as life-span concept. They also show the develpmental task which requires each stages. On the other hand, efficient family function programs are developed to give practical aid.
본 연구는 공격적인 사람과 비공격적인 사람이 공격적인 영화에 의해 사회정보처리과정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규명하고자 한 것이다. 국민학교 5학년 아동(N=17, 만 12세)과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N=113, 만 17세)을 대상으로, 피험자 각각의 공격성에 대한 교사의 평정점수와 피험자 자신의 평정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공격적인 집단과 비공격적인 집단의 피험자를 구분하였다. 공격영화조건에서는 약 9분 길이의 공격영화를, 중립영화조건에서는 같은 길이의 비공격적인 영화를 시청하게 하였다. 각조건의 영화를 시청한 후, 피험자가 어떤 방향으로도 반응할 수 있는 애매한 문제 상황을 그림과 글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사회정보처리과정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중립 영화에 비해 공격영화 조건에서, 그리고 비공격적인 집단보다 공격적인 집단에서 상대방이 공격적인 의도를 가진 것으로 판단하는 정도가 더 높았다. 또한 공격영화를 시청한 공격적인 청소년집단이 다른 세 집단에 비해 가장 많은 공격반응을 생성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공격영화가 공격적인 피험자집단, 그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의 공격스크립트(script)를 더 많이 활성화시킨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리고 아동집단에 비해 청소년 집단에서, 비공격적인 집단보다 공격적인 집단에서 공격행동은 효율적이며 긍정적인 결과를 지닌다고 평가하는 정도가 더 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의 시사점및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The major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basic mechanism of the aggression script by the aggressive films. The number of subjects are 117 fifth grade pupils and 113 high school juniors. The aggressive group and non-aggressive group are classified in terms of the two criteria ; self-rating scores and ratings by their teachers. An edited aggressive film of 9 minutes long was presented in the aggressive film condition, and landscape or tourism film was presented for the non-aggressive film conditions. Then three ambiguous situations were used as response stimuli and the subjects are arranged to judge the intention of the other party in the situation, and to produce the most available and effective alternatives. The experimental design is 2(film) × 2(age of the subjects) × 2(degree of aggressiveness) between subject design. In the judgment process, the first one of the two subprocess of the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more aggressive intention was evaluated in the aggressive group. And in the responding process, the second subprocess, the adolescents produced more aggressive response comparing with the children after exposing to the aggressive film. And also, comparing with the non-aggressive subjects, aggressive subjects evaluated the aggressive responses as more effective and positive. From these results, the following conclusion can be drawn. First of all, the aggressive film has stronger priming effect of the aggression script in the aggressive adolescents, but not in the fifth grade children. There fore, this study has an important meaning in the sense of providing empirical data to support the social-cognitive perspective of aggression. Connecting some methodological shortcomings, further research in the future is urgently needed.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관련 변인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간의시간경과 따른 관계를 규명하고 또한 양육행동의 두 차원인 통제와 애정이 아동의 자아존중에 상호작용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부산지역 국민학교, 3, 5학년 아동 219 명과 그들의 어머니 219 명 총 438 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자아존중감 점수와 어머니의 양육행동 점수를 1년 간격을 두고 2차에 걸쳐 측정하였다. 1차 측정 시 어머니의 관련 변인-연령, 자아존중감 및 교육수준-에 대해서도 대상 어머니들에게 응답케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아동의 자아존중감 1차 측정치를 통제한 가운데 경로분석 및 통제와 애정 각각의 변화 방향에 따른 2×2 공변량 분석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1) 어머니 관련변인 중 연령과 교육수준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며 이 중 연령은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 행동에 매개되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또한 양육행동 중에서는 통제만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며 아동의 자아 존중감에 대한 통제와 애정의 상호작용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으면 양육행동과 관계없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며,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 때 통제적 양육행동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결과로서 아동의 자아존중감도 높아짐을 시사한다.
This study examined the over-time relationship between the 3 mother related variables of age, self-esteem, and educational level, maternal affection and control and children's self-esteem. In addition, the interactional effect of maternal affection and control on children's self-esteem was studied. A total of 438 subjects-219 elementary school children and their mothers in Pusan area-completed the children's self-esteem scale and maternal parenting scale for two times at intervals of one year. Mother subjects also provided information on their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age, self-esteem and education level at the time of first data collection. Path analysis and 2(affection) ×2(control) ANCOVA(analysis of covariance) were applied for data analysis while controlling for scores on the time 1 children's self-esteem. Results indicated that (1) mother's age and educational level contributed to children's self-esteem and the impact of the mother's age on children's self-esteem is mediated through the effects of maternal control and (2) maternal control have positive effect on children's self-esteem and does not interact with affection on children's self-esteem.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mother's education level is positively related with the children's self-esteem. Younger mothers are more likely than older ones to exercise parental control, and as a consequence, their children are more likely to have higher self-esteem.
본 연구는 아동이 다른 사람의 개인적 정보에 기초해서 정서를 추론하는 과정과 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 즉, 한 상황에 대한 타인의 인지적 평가를 추론하고 이를 정서예측에 적용시킬 수 있는 아동의 능력과 추론과제로서 제시된 이야기의 개인적 정보 형태, 사건 유형의 영향을 알아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아동이 발달함에 따라 추론의 형태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이야기의 정보형태들과 사건유형들 간의 영향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아동의 연령이 많아 질수록 개인적 정서 추론 능력이 증가했으며, 개인적 정보의 유형 중 타인의 인지적 평가를 좀 더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이전의 정서적 반응'이 그리고 사건 유형 중 '부정적 개인정보/긍정적 사건'의 조건이 다른 조건들에 비해 아동의 개인화된 추론을 더 용이하게 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wo components of personalized inference, that is, process of inferring another person's mental appraisal about one situation and applying it to the other situation for making inference about emotional reaction. And another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ersonal information types and story conditions on children's personalized infernces. The subjects were 4-year-old(N=24), 6-year-old(N=24), second grade of primary school(N=24), and fifth grade of primary school(N=24) children. In each group, there were equal number of boys and girls. Subjects were told stories in which personal information and negative /positive types of events were varied, and they were asked to predict and explain hero(in)'s emotional reaction and :appraisal of target event. This experiment consisted of 4(age) by 3(story conditions : negative personal information /positive event, negative personal information /negative event, and positive personal information /negative event.) by 3(personal information types ; prior emotional reaction, prior behavior, and prior experience.) within subject design. The dependent measures were three response types ; personalized inference, situational inference, and transitional inference. These data were analyzed in terms of log - linear analysis and 2 - test. The results were shown as follows : First, the age-related differences in emotional inference types were significant, that is, personalized inferences increased with age while situational inferences decreased. Second, the differences in personal information type effects on personalized inferences were significant, that is, prior emotional reaction among personal information types was most influential in children's personalized inferences. Third, the differences in story condition effects on personalized inferences were significant, that is, 'negative personal information /positive event' condition was
본 연구에서는 회고적인 청년기의 정체감 발달상태에 따라 중년기 위기감 수준과 개방성향 수준의 차이를 분석해 봄으로써 발달통로에 따른 중년기 위기감 수준의 다양한 양상을 파악하고, 아울러 이러한 다양성을 매개한다고 가정되는 개방성향과 사회체계적인 요인의 역할을 유추해 보고자 했다. 응답자들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35세 ~ 60세(1391명)의 중년층이었다. 분석결과, 청년기에 정체감 유예나 혼미상태에 있었다고 회고한 사람들이 성취나 유실상태에 있었다고 회고한 사람들보다 위기감 수준이 더 높았다. 그러나 개방성향 수준은 유실이나 혼미상태보다 성취나 유예상태에 있었다고 회고한 사람들이 더 높았다. 즉 정체감 유예집단은 개방성향이 높은데도 위기감이 높고 유실 집단은 개방성이 낮은데도 위기감 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위기반응 양상은 중년기 위기 경험이 개방성향과 사회체계적인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받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었다.
In this study in order to seethe diversity of the mid-life crises along the line of developmental path, the level of mid-life crisis and the level of openness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retrospective identity status in adolescence. The respondents were 1391 mid-age adults(35-60, male ; 653, female ; 738). The results are as follows: Along the line of life-path, mid-life crises are more diverse. Those who had been in 'identity moratorium' or 'identity diffuse' in their adolescence experience more serious crisis compared with those who had been in the "identity achievement' or 'foreclosed'. In the openness dimension, however, the identity achievement or moratorium group has higher points than the foreclosed or diffused group. These results suggest that mid-life crisis is a function of openness and relationships in social systems.
재인기억 파라다임을 이용하여 제작된 생후 27주, 29주, 39주, 52주된 영아용 Fagan지능검사(Fagan Test of Infant Intelligence)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정상영아(73명)와 조산으로 인하여 신생아 중 환자실(NICU)에 입원하였던 영아(37명)의 수행을 비교하였다. 성별에 따른 수행상의 차이는 없어서(t(108)=.19, p<.890), 각 영아의 재인율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집단(2) X 연령(4) 2원 변량분석한 결과 집단의 주효과만이 유의하였다. 4-13주 일찍 태어난 NICU집단의 재인율은 54.59%(SD=7.92)로 정상영아의 재인율 59.59%(SD=7.26)보다 유의하게 낮았다(F(1, 102)=7.942, p<.006). 따라서 본 검사는 6개월부터 1세 사이의 정상영아와 미숙아집단을 변별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영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재인율이 증가하는 경향은 보이나 유의한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각 연령집단별 재인율은 27주 56.39% (SD=8.87), 29주 56.84%(SD=7.16), 39주 58.20%(SD=6.71), 그리고 52주는 62.14% (SD=7.18) 였다. FTII를 구성하는 10개의 재인기억과제에서 각 영아의 수행상의 표준편차는 영아의 재인율과 부적 상관을 지녔으며(r=-.43), 정상집단(M=20.53, SD=5.56)보다 NICU집단(M=22.97, SD=7.06)에서 더 컸다(t(108)=1.98, p<.05). 따라서 평균재인율외에 영아가 10개의 재인기억과제에서 보이는 수행의 변이 또한 두 집단을 구분하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27-, 29-, 39-, or 52-week-old normal (N=73) and premature infants (N=37) were compared to examine the utility of Fagan Test of Infant Intelligence(FTII). There was no sex difference on recognition memory (t(108)=.19, p<.890). Therefore, infants' performances were analyzed by group(2) X age (4) ANOVA. Only the group main effect was significant (F(1,102)=7.942, p<.006) . The recognition rate in NI CU group was 54.59% (SD=7.92) which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the normal group, 59.59% (SD=7.26). Even though it was not significant there was a trend that the recognition memory was increasing with age : 56.39% (SD=8.87), 56.84% (SD=7.16), 58. 20% (SD=6.71), 62.14% sss(SD=7.18) for 27-, 29-, 39-, and 52-week-olds repectively. The correlation between the recognition rate and the standard deviation in the IO recognition tasks was negative, r=-.43 and the standard deviation of the recognition rate in the NICU group (M=22.97, SD=7.06) was larger than that in the normal group (M=20.53, SD=5.56) (t(108)=1.98, p<.05). It was suggested that the variance in the performance on the FTII could be another index of infant's intelligence.
본 연구에서는 Down증 아동의 촉각 변별반응의 특징을 알아 보고자 두개의 실험을 했다. 실험 1에서는 자극 도형을 계열제시해서 Down증 아동의 촉각-촉각 변별반응이 일반 정신지체아와 정상아보다 열등한지 여부를 검토했다. 특수학교의 Down증 아동 22명,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일반 정신지체아 22명, 정상아 22명을 피험자로 선발했다. 일반 정신지체아의 생활 연령과 정신 연령은 Down증 아동의 생활 연령과 정신 연령에 대응하도록 선발했으며, 정상아의 정신 연령은 Down증 아동의 정신 연령에 대응시켜서 선발했다. 자극 도형과 선택 도형을 동일한 감각 양식(촉각-촉각 변별)으로 제시했다. 종속 변인은 촉각-촉각 변별 수행에서의 점수였으며, 통계검증으로는 변량분석을 했다. 분석결과, 촉각-촉각 변별반응은 3개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자극 도형의 계열제시 조건에서 Down증 아동의 촉각-촉각 변별반응은 일반 정신지체아와 정상아보다 열등하지 않았다. 실험 2에서는 실험 1에서와 동일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자극 도형을 동시에 제시해서 Down증 아동의 시각-촉각 변별반응과 촉각-시각 변별반응이 일반 정신지체아와 정상아에 비해서 열등한지 여부를 검토했다. 종속 변인은 시각-촉각 변별 수행에서의 점수와 촉각-시각 변별 수행에서의 점수였으며, 통계검증으로는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했다. 분석결과, 시각-촉각 변별반응과 촉각-시각 변별반응은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자극 도형을 동시에 제시했을 경우에 시각-촉각 변별반응과 촉각-시각 변별반응에서 정상아가 Down증 아동과 일반 정신지체아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Two experiments were conducted. Experiment 1 was designed to determine if Down's Syndrome children exhibit a deficit in tactual discrimination skills that is greater than might be accounted for MA alone. 22 Down's Syndrome children, 22 Non-Down's Syndrome retarded and 22 normal children were selected for the experiments. In a two forced-choice sequential paradigm, subjects were required to explore a standard, geometric shape tactually and then select a matching shape from a comparison pair of shapes(one similar to the standard and a distactor) which were presented tactually. The data was analyzed by ANOVA. The result was as follows. There was no difference among groups. Down's Syndrome children were not significantly inferior to both Non-Down's Syndrome retarded and normal children in tactual discrimination skills when the stimulus figures were presented sequentially. Experiment 2 was designed to determine if Down's Syndrome children exhibit. a deficit in visual-tactual discrimination skills and tactual-visual discrimination skills. In a two forced-choice simultaneous paradigm, the same subjects were tested under visual-tactual condition and under tactual-visual condition. 3(group) × 2(test) design was used. The data was analyzed by NOVA with repeated measures. The result was as follow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groups(p<.001). Normal children were significantly superior to both Down's Syndrome children and Non-Down's Syndrome retarded in visual-tactual discrimination skills and in tactual-visual discrimination skills when the stimulus figures were presented simultaneously.
본 연구는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문제의 하나인 자살행동이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어떤 변인과 관계를 맺고 있고 또한 상대적으로 중요한 변인이 무엇인가를 밝혀 보고자 하였다. 고등학교청소년 634명(남자 ; 305명, 여자 ; 329명)을 대상으로 자살생각경험과 그 심각성을 조사하고 그들의 정신건강 수준, 자아정체감, 학업성적, 학업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및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조사하여 집단간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일반적으로 자살생각경험집단은 낮은 정신건강 수준과 학업에 대해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이 심하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었다. 그러나 고등학생이라는 특수한 요인으로 인해 자아정체감, 부모의 양육태도등 몇가지 점에서 예상과 다른 결과를 얻었다. 또한 집단간의 차이를 보였던 여러 변인들 중에서 강박증과 사회적 적옹능력, 지각된 부모의 친애적 태도 및 GSI(General Severity Index)가 자살생각의 심각성 정도를 예언하는 가장 두드러진 변인이었다. 전반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고등학생청소년에서의 자살생각 경험이 공통적인 몇몇 변인에 의하며 그들 생활의 부적응 정도와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This study intended to investigate the associated variables of suicidal ideation among adolescents in Korea. A questionnaire on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was administered to 634 high school students (305 males, 329 females) from Seoul area. Their experience of suicidal ideation were measured and then only for the suicidal ideation experience group, Scale for Suicidal Ideation(Beck, Kovacs & Weissman, 1979) was tested. Also the survey contained items pertaining to mental health, identity, academic grade, stress on school achievement and perceived child-rearing patterns. ANOVA has shown that the suicidal ideation experience group was lower in mental health level and has higher stress on school achievement than the non-experience group. Also suicidal ideation experience group showed relatively low ego identity level and perceived that they receive a little love and care from their parents. According to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bsession, social adaptation ability, perceived parent's love, and GSI (General Severity Index) were reliable prominent variables that predicted the severity of suicidal ideation.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some common factors affected experience of suicidal ideation of Korean high school students, and experience of suicidal ideation might be associated with general maladjustment in their everyday life.
이 연구는 학령전 아동이 외양-실재 구분과제에서 범하는 두가지 오류 즉, 현상주의적 오류와 지적인 사실주의적 오류가 검사질문의 언어적 특성이나 외양-실재 구분과제의 구조적인 특성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이 시기 아동의 특정한 인지능력의 결여를 반영하는 보편적인 발달적 현상인지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실험 1에서는 동일한 질문의 반복적인 제시가 아동의 반응에 어떤 체계적인 영향도 미치지 않음을 보여 주므로써 외양-실재 구분과제에서 범하는 학령전 아동의 오류반응은 아동이 실험자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질문의 의도를 잘못 해석하여 생긴 것이 아님을 입증하였다. 실험 2에서는 외양-실재 구분과제에 내재된 변환경험의 유무가 학령전 아동이 범하는 두가지 오류현상과 관련이 있는지 알아 보았다. 그 결과 외양-실재 구분과제에 오류반응을 보이는 아동은 자극대상의 정체(identity)에 대한 질문에 지적인 사실주의적 오류반응을 보고하고, 자극의 색깔과 같은 속성(properties)을 묻는 질문에 대해 현상주의적 오류반응을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전 아동이 범하는 이와 같은 오류양상에 대해 이중부호화가설에 기초하여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bility of young children's appearance-reality distinction. When young children are asked questions about objects with misleading appearances, they make two kinds of errors ; phenomenism and intellectual realism. Such error pattern might reflect either a genuine, deep-seated inability to understand and think about the appearance-reality distinction or it might reflect only task insensitivity. So experiment 1 confirmed that children's performances didn't reflect a misinterpretation of the experimenter's intent in communication under repeated questioning. And experiment 2 examined that the presence or absence of a transformation could be related to the types of the appearance-reality error.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children's appearance-reality judgments were not associated with the transformation. Phenomenism errors predominated when children were asked about real and apparent properties, whereas intellectual realism errors predominated when children were asked about objects' real and apparent identities, The findings were discussed briefly in relation to the dual coding hypothe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