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access
메뉴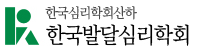
open access
메뉴본 연구에서는 부모 양육효능감 검사(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PSOC)와 배우자 양육협력 검사(Parenting Alliance Inventory; PAI)의 타당화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과 경기지역 소재 22개 어린이집에 소속된 만 1∼6세 사이 영유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 1051명이었다. 연구절차는 검사들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문항반응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최종 선정된 문항에 대해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PSOC가 총 15개 항목 2개 요인구조, PAI는 14개 항목 2개 요인구조가 한국에서는 적합한 모형으로 확인되었다. 각 검사의 신뢰도검증을 위해 내적합치도 계수와 검사-재검사 신뢰도 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양호한 수준이었다. 한편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효능감과 스트레스 검사 요인 간의 상관분석 결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내어 공인타당도를 입증하였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각 검사별 요인구조 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수준으로 구성타당도가 검증되었다. 이에 따라 본 검사들은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효능감과 배우자 양육협력 정도를 측정하기에 타당한 도구임을 입증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alidate the Korean version of the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cale (PSOC) and the Parenting Alliance Inventory (PAI). A total of 1051 parents with young children aged 1 to 6 years participate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onfirmed that the PSOC consists of 15 items and two factors, and that the PAI consists of 14 items and two factors. The each factor from the PSOC and PAI demonstrated clear convergent validity, proper internal consistency, and good test-retest reliability. Also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indicated good model fit for both measures supporting their good construct validities. Furthermore, there were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s between the Korean versions of PSOC, PAI and K-PSI, suggesting good concurrent validity. In conclusion, the Korean versions of PSOC and PAI appear to be useful tools for assessing parenting efficacy and cooperation among parents with young children.
본 연구는 4세 아동의 실행기능을 세 가지 하위유형인 억제적 통제, 인지적 유연성, 작업기억에 따라 측정하고, 2년 후 읽기 유창성 및 이해도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4세 아동 110명을 대상으로 단기종단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4세경 실행기능과 수용어휘를 측정하였고, 2년 후인 6세경 문장 읽기 유창성 및 이해도를 측정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4세의 억제적 통제, 인지적 유연성, 작업기억은 2년 후의 읽기 유창성 및 이해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또한 읽기 유창성 및 읽기 이해에 대한 만 4세 당시 실행기능 하위유형들의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만 4세의 언어능력을 통제하여도 실행기능 하위영역의 설명력이 관찰되었다. 즉 4세의 작업기억은 2년 후의 읽기 유창성을, 4세의 억제적 통제와 인지적 유연성은 2년 후의 읽기 이해를 예측할 수 있었다.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at 4 years old and reading fluency and comprehension at 6 years old.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skills at age 4 were examined by measuring three subcomponents: working memory, behavioral inhibition, and cognitive flexibility. A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was conducted with 110 four-year-old children.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and receptive vocabulary were measured at age 4, and their reading fluency and comprehension were then measured 2 years later. Results indicated that executive function, behavioral inhibition, and cognitive flexibility at age 4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reading fluency and comprehension at age 6. In addition, a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substantive impact of measured variables at age 4 on later reading fluency and comprehension. Results showed that the predictive value of executive function subtypes was evident, even after controlling for language ability at age 4.
아동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다. 아동은 종종 이러한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분까지 모방하는 과잉모방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영아 또한 조건이 적절히 제공된다면, 관찰 대상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합리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여 모방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관찰을 통해 만 3-5세 아동이 도구사용능력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관찰이 주어지는 조건에 따라 모방특성이 다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문제해결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된 아동은 제공되지 않은 아동보다 문제해결의 성공률이 높았다. 또, 불필요한 부분까지 관찰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과잉모방을 보이는 빈도가 높았다. 이와 더불어 전화를 받으면서 불필요한 행동을 보여준 집단은 같은 행동을 의도적으로 보여준 집단보다 불필요한 행동의 모방이 줄어들었고, 필요한 부분만 따라하는 선택적 모방이 증가하였다. 이는 아동이 타인의 의도를 고려하여 목적에 알맞게 합리적으로 모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Children are naïve scientists with the ability to imitate and learn new skills. Children learn about the world and become efficient problem solvers through observation. Even though children's capacity to be imitative problem solvers is evident, there seems to be a unique aspect that remains overlooked. When children observe an adult’s unfamiliar behavior, children seem to be inclined to produce irrelevant and superfluous actions, and this phenomenon (referred to as “overimitation”), increases with age. However, when given a cue regarding the situational context, young children are able to show selective imitation, or emulation, that results in the same goal without reproducing an identical action performed by the model. These varied understanding of children’s imitative strategies and social learning are crucial issues that should be further addressed. Hence, the present study examines whether 3 to 5-year-old children can learn to use new tools through observation, and whether children's imitational characteristics vary across different observational contexts. The study included 174 children aged 3 to 5. Results indicate that toddlers provided with a relevant solution to the problem showed higher rates of success than did those who were provided an irrelevant solution. Also, toddlers who observed solutions that were first irrelevant, and then relevant, demonstrated higher rates of overimitation. In addition, the present results substantiated the idea that 3 to 5-year-old children show different imitative responses according to the context. In the accidental context, where children observed irrelevant actions while the person was on the phone, toddlers demonstrated selective imitation; or emulation. The results suggest that toddlers have the ability to consider other’s intentions and show rational imitation accordingly. This study not only provides an analysis of children’s imitational characteristics as a social learner (i.e. by showing overimitation), but also shows that children are rational emulators when given a cue based on a situational context.
본 연구는 노년기에 증가 경향을 보이는 우울이 자전적 기억의 일화 요소 회상량에 어떤 차이를 불러오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노인우울검사(GDS) 점수에 따라 우울한 노인 20명(M=73.45세, SD=5.95)과 우울하지 않은 노인 20명(M=72.5세, SD=4.54)을 대상으로 자전적 기억을 이끌어내는 두 가지 담화 주제, 즉 일화적 주제인 ‘내 인생의 주요사건’ 및 절차적 주제인 ‘평소의 일과’를 제시하여 담화를 도출한 후 자전적 인터뷰(Autibiographical Interview: AI))의 채점방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울한 노인은 발생한 지 오래된 주요사건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하루일과에 대한 담화에서도 우울하지 않은 노인보다 일화요소의 회상량이 적었다. 그러한 현상은 사상, 시간, 장소, 지각, 사고 및 정서 등 일화 요소의 모든 세부 범주에서 나타났다. 그 반면, 우울한 노인은 일화주제 담화에서 비일화요소 중 의미와 반복 세부범주의 회상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정상적 노화에 따라 자전적 기억의 구체성이 감소한 노인이 우울로 인해 구체성 수준이 더욱 저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논의에서 본 연구의 의의와 함의, 제한점, 추후연구에 대해 기술하였다.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differences in episodic and non-episodic aspects of autobiographical memory between older adults with depression and those without it. 20 older adults with depression (M = 73.45, SD = 5.95) and 20 older adults without depression (M = 72.5, SD = 4.54) were asked to generate narratives based on two autobiographical themes: one was an episodic theme ‘an important event in your life’ and the other was a procedural theme ‘your daily routine’. Protocols were scored with Autobiographical Interview (AI) scoring manual, which is a reliable system for categorizing episodic and non-episodic information. Depressive older adults retrieved less informations in all episodic categories for both narratives, namely, event, time, place, perceptual, and thought/emotion categories, as compared to non-depressive older adults, while more informations in semantic and repetition categories of non-episodic type for episodic narrativ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deficits of autobiographical memory specificity may be a marker of depression in old age and memory specificity training can be effective in aiding recall of current common events as well as significant remote events
본 연구는 발달의 생태학적 관점과 누적된 위험(cumulative risk) 모형을 기반으로 빈곤 청소년이 일생 동안 경험한 양육자 변경 사건의 빈도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의 관계에서 부모 및 또래 관계 질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의 대상자로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빈곤 청소년 317명을 대상으로 양육자 변경 빈도, 행동문제, 부모 및 친구 관계의 질에 관한 설문을 실시했다. 먼저 양육자 변경 빈도와 내재화 문제의 관계에서 부모 및 친구 관계 질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양육자 변경 빈도와 내재화 문제의 관계에서는 부모와의 관계의 질에 관한 지각이 완전 매개했고 부모 관계와 친구 관계가 양육자 변경 빈도와 내재화 문제를 순차적으로 완전 매개했다. 양육자 변경 빈도와 외현화 문제의 관계에서는 양육자 변경 빈도가 외현화 문제를 직접적으로 설명했으며 부모와의 관계의 질에 관한 지각이 부분 매개했고 부모 관계와 친구 관계는 양육자 변경 빈도와 외현화 문제를 순차적으로 부분 매개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은 그들이 경험한 양육자 변경 빈도가 증가할수록 부모와의 관계를 더 부정적으로 지각했고, 부모 관계에 관한 부정적 지각은 친구 관계에 관한 부정적 지각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은 더 높은 수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의 의의와 함의를 논의에 포함했다.
The current study examined the association between caregiver separation frequency and behavioral problems among 317 impoverished adolescents. We also investigated how perceptions of relationship quality with parents and peers mediated based on ecological systems theory and the cumulative risk model. More frequent caregiver separation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higher levels of externalizing problems but was not associated with internalizing problems. However, parental separation and internalizing problems were fully mediated by relationship quality with parents and peers. The link between parental separation and externalizing problems was partially mediated by one’s relationship quality with parents and peers. In sum, when adolescents experienced frequent separation from parental figures, they were more likely to develop negative perceptions of their relationships with parents and peers. In turn, the negative perceptions of these significant relationships were associated with high levels of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본 연구에서는 4세 아동이 상황에 따라 거짓말 또는 참말을 한 화자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다르게 하고, 화자의 정서 역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는지 보고자 하였다. 아동들은 주인공이 규범을 위반한 상황(이를 닦지 않은 상황 등)이나 예의가 요구되는 상황(친구의 새 운동화가 멋있지 않다고 생각한 상황 등)에서 상대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참말을 하는 이야기를 들은 후 화자의 도덕성을 평가하고, 화자의 정서적 경험에 대하여 추론하였다. 실험 결과 아동들은 규범 위반 상황보다 예의 요구 상황에서 거짓말을 한 화자를 더 착하다고 평가하였다. 예의 요구 상황에서는 참말을 한 경우보다 거짓말을 한 경우를 더 착하다고 평가하였다. 정서 추론에서는 주인공 진술의 진위 여부만 유의미한 영향을 보여, 화자가 참말을 했을 때보다 거짓말을 했을 때 더 기분이 좋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5-6세와 달리 4세의 경우 도덕적 평가 능력이 성별로 다르게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4세 아동도 더 연령이 높은 아동이나 성인과 유사하게 상황적 요인에 따라 참말과 거짓말이 지니는 도덕적 가치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지만, 정서적 결과에 상황이 미치는 영향의 이해는 미숙함을 보였다.
The current study investigated whether 4-year-old Korean children consider situational factors when comprehending a protagonist’s lie- and truth-telling. Participants answered a series of questions after listening to stories in which the protagonist lied or told the truth during a transgression (e.g., not brushing his/her teeth) or a polite interaction (e.g., thinking his/her friend’s new shoes look awful). Children more positively evaluated lying during a politeness context than during a transgression context. Children also evaluated lying more positively than truth-telling during the politeness context. However, children attributed more positive emotions to protagonists who lied than to those who told the truth, regardless of context. In addition, there seemed to be gender differences in the development of moral evaluation and emotion inference at the age of 4.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preschoolers understand the influence of contextual factors when evaluating moral value of lying and truth telling but not when inferring a protagonist’s emotions after lying or truth telling.
본 연구에서는 만 4세 아동을 대상으로, 타인의 감정을 예측하고 고려하는 것이 분배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실험 1에서 아동은 사진 속의 원숭이와 자기 자신에게 스티커 10개를 분배하는 독재자 게임에 참여하였다. 실험 조건의 아동은 자신이 분배한 것을 보고 원숭이가 기분이 어떤지 그림을 그려서 줄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통제 조건의 아동은 이러한 설명이 없는 일반 독재자 게임을 하였다. 그 결과, 실험 조건의 아동이 통제 조건의 아동보다 더 많은 스티커를 원숭이 인형에게 나누어주어 감정에 대한 고려가 이타적인 분배를 증가시켰음을 보여주었다. 실험 2에서는 실제로 분배 상대방을 직면한 상황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원숭이 인형을 마주한 채 동일한 형식의 게임을 진행하였다. 두 조건 간 분배한 자원의 수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어 감정 메시지 자체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두 조건에서 분배한 자원의 수는 실험 1의 실험 조건과 유사하였고, 이는 아동이 분배 상대방을 실제로 마주하면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여 분배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아동의 친사회적 분배 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상황적 요인에 대한 함의점을 제공한다.
The current study investigated whether predicting others’ emotions affects 4-year-olds’ sharing behavior during dictator games. In Experiment 1, participants were asked to allocate 10 stickers between themselves and a monkey puppet shown in a photo. Children in the experimental condition, but not those in the control condition, were told that the monkey would draw a picture of how he felt about the amount of stickers he received. Children in the experimental condition allocated significantly more stickers to the recipient than did those in the control condition, suggesting that an understanding of others’ emotions promoted altruistic distribution. In Experiment 2, we examined whether the presence of the recipient in the setting would affect children’s distribution of resources. The procedure was identical to that of Experiment 1 except that participants were asked to give stickers to a monkey puppet in a face-to-face setting. In Experiment 2, children in both conditions donated stickers about equally between themselves and the monkey puppet, which resembled results of the experimental condition from Experiment 1. These results suggest that considering others’ emotions as well as an awareness of another’s presence promotes children’s fair distribution.
중년기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죽음 대처 유능감에 영향을 주는 인구학적 변인들과 성숙한 노화 요소들을 확인하고자 320명의 중년 남녀를 대상으로 변인들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죽음 태도와 관련된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지각된 건강은 죽음 공포와 죽음 회피 태도 둘 다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었으며, 성숙한 노화 요소의 사회적 책임감과 자녀와의 좋은 관계는 죽음에 대한 접근적 수용과 중립적 수용 둘 다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그리고 소득과 학력은 죽음에 대한 탈출적 수용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죽음 대처 유능감에 영향을 주는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은 성숙한 노화 요소 중 사회적 책임감이었으며 소득과 학력, 자녀와의 관계가 추가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인이었다. 끝으로 죽음 태도와 죽음 대처 유능감 간의 관계에서는 다섯 가지 죽음 태도 중 중립적 수용과 접근적 수용, 그리고 탈출적 수용이 죽음 대처 유능감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current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s between mature aging, death attitudes, and death competency among middle-aged adults. Results from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predicting death attitudes showed that perceived health was a significant predictor of both a fear of death and denial of death among middle-aged adults. Mature aging, especially social responsibility and good relationships with children, had a positive influence on both neutral and approach acceptance. Social responsibility, including generativity, was the most significant predictor of death competency, while income, education, and good relationships with children were also predictive. Furthermore, three subtypes of death acceptance, including neutral, approach, and escape acceptance, had a positive impact on death competency. These results suggest that mature aging might help individuals effectively cope with dea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