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access
메뉴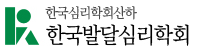
open access
메뉴3세~6세 아동,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연령, 성별과 의도적 통제에 따른 친사회적 거짓말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친사회적 거짓말은 그림을 사용한 이야기로 측정하였고, 의도적 통제는 Kochanska의 베터리와 유아기질척도(Children Behavior Questionnaire)를 사용한 부모용과 교사용 척도로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친사회적 거짓말은 연령에 따라 5세와 6세에 특히 많이 증가하였다. 성별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서 여아가 남아보다 친사회적 거짓말을 더 많이 하였으나 이런 경향은 부모보다 할머니와 같은 손위 사람이나 친구에게 더 두드러졌다. 아동용 베터리와 교사용 척도로 측정한 의도적 통제는 친사회적 거짓말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연령을 통제하였을 때 아동용 베터리, 부모용과 교사용 척도로 측정한 의도적 통제는 친사회적 거짓말을 예측하지 못했다. 그러나 의도적 통제를 구성하는 기질의 하위요인들이 친사회적 거짓말을 예측하는지를 살펴보았을 때, 부모용 척도의 강도 낮은 자극 선호와 지각 민감성이 친사회적 거짓말을 예측하여서 아동이 낮은 강도의 자극을 좋아하고, 변화에 민감하지 않을수록 친사회적 거짓말을 더 많이 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differences in prosocial lies by age, sex, and effortful control in eighty-six 3- to 6-year-old preschool children, their parents, and their teachers. Prosocial lies were evaluated using six stories. Children's effortful control was evaluated using three different measures: Kochanska's Battery for Assessing Effortful Control as well as both parents' and teachers' ratings on the Children Behavior Questionnaire. Age and sex differences were observed. Prosocial lies increased with age, particularly at age five and six. Girls tended to tell more prosocial lies than boys for events related to the elderly and friends. Children's effortful control, as measured by Kochanska's battery and teachers' ratings,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prosocial lies. However, after controlling for age in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three measures of effortful control did not predict children's prosocial lies. However, when the effects of the subscales of the three measures were examined, mothers' rating of low intensity pleasure and perceptual sensitivity significantly predicted children's prosocial lies even after controlling for age.
본 연구는 다양한 인종의 얼굴표정에 대한 정서인식이 인종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초등학생 5-6학년 257명과 대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알아보았다. 얼굴 정서인식 과제는 기쁨, 슬픔, 화, 공포의 네 가지 표정을 짓고 있는 한국인과 타인종인 동남아인, 백인, 흑인의 남, 여 사진 각각 한 장씩 총 32장의 얼굴표정 사진을 사용하였다. 얼굴 정서인식 과제에 사용한 한국인과 백인, 흑인의 표정사진은 박찬옥과 김혜리(2010)와 Baron-Cohen(2007)의 사진들 중 일부를 사용하였으며, 동남아인의 표정사진은 동남아 영화에서 정서가 잘 표현된 얼굴 장면을 발췌해서 사용하였다. 타인종의 얼굴표정보다 한국인의 얼굴표정에 대해 정서인식을 더 정확하게 하였으며, 타인종 중에서는 백인, 흑인의 얼굴표정보다 동남아인의 얼굴표정에 대해 더 정확하게 판단하였다. 초등학생과 대학생 모두 타인종의 표정자극보다 한국인의 표정자극에 대해 정서인식을 더 정확하게 하였으나, 초등학생과 대학생의 차이는 한국인의 표정자극보다 타인종의 표정자극에서 더 컸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인식능력의 발달적 변화는 동인종보다 타인종 표정자극에서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test the differences in the recognition of emotional facial expressions of various races. Participants were 257 Korean children in the fifth and sixth grades and 120 undergraduates. Emotional face recognition was measured using 32 pictures of facial expressions (happy, sad, angry, fear) of four different races (Korean, Southeast Asian, Caucasian, African American). There were cross-race differences in emotional face recognition. The facial expressions of Koreans were more accurately recognized than were those of other races, and among other races, the facial expressions of Southeast Asians were more accurately recognized than were those of Caucasian or African Americans. Though the facial expressions of Koreans were more accurately recognized than were those of other races for both age groups, differences were greater among undergraduates than among fifth- and sixth-grade children.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developmental change in emotional face recognition is greater for the facial expressions of other races than for those of Koreans.
본 연구는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초기 성인기 이성관계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초기부적응도식과 정서표현 양가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18세∼40세의 성인 남녀 중 미혼이며 현재 이성교제 중인 310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실시하였으며, 변수들 간의 전체적인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초기 성인기 이성관계 만족도 사이에서 초기부적응도식이 단순매개효과를 나타냈으며,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이 초기부적응도식과 정서표현 양가성을 순차적으로 거쳐 초기 성인기 이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중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으로 인해 이성관계에서 문제를 겪고 있는 성인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among childhood emotional maltreatment(EM), early adulthood romantic relationship satisfaction, early maladaptive schemas(EMS)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AE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elf-report data from 310 adults. The mediating effect of EMSs, as well as the dual-mediated effect of EMSs and AEE, was significant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EM and romantic relationship satisfaction. Based on these findings, effective intervention strategies were discussed for individuals who experienced EM as a child and are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romantic relationship. The importance of addressing EMSs was also emphasized.
본 연구에서는 5-6세 아동이 거짓말 및 참말에 대해 도덕적 평가를 내리고 화자의 정서를 추론할 때 상황적 요인을 고려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참가 아동은 주인공이 규범을 위반한 상황(친구의 크레파스를 몰래 가져간 상황 등)이나 예의가 요구되는 상황(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 등)에서 거짓말 혹은 참말을 하는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대답하였다. 도덕적 평가의 경우 아동들은 규범 위반 상황보다 예의 요구 상황에서 거짓말을 한 화자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아동의 부모들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정서 추론의 경우 아동들은 화자가 거짓말을 했을 때, 부모들은 화자가 참말을 했을 때 더 긍정적인 정서를 느낄 것이라 하였다. 또한 아동은 예의 요구 상황보다 규범 위반 상황에서 참말을 한 경우에 화자가 더 긍정적인 정서를 느낄 것이라고 하였으며, 부모의 경우 규범 위반 상황보다 예의 요구 상황에서 거짓말을 했을 때 더 긍정적인 정서를 느낄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5-6세 아동이 선의의 거짓말과 일반적인 거짓말의 차이를 이해하며, 도덕적 평가 역시 상황적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The current study investigated whether 5-6-year-old Korean children consider situational factors when comprehending a protagonist’s lie- and truth-telling. The participants answered a series of questions after listening to stories in which the protagonist lied or told the truth during a transgression (e.g., stealing a friend’s crayon) or a polite interaction (e.g., receiving a disappointing gift). Children more positively evaluated lying in the politeness contexts than in the transgression contexts. They also attributed more positive emotions to the protagonists who told the truth in the transgression contexts than those who told the truth in the politeness contexts.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preschoolers understand that the moral value and emotional consequences of lying and truth-telling can be affected by contextual factors.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조망수용, 틀린믿음, 억제통제의 발달과 이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3세와 4세 아동 92명에게 의사소통 조망수용 산출과제와 이해과제, 틀린믿음과제, 억제통제과제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동들은 의사소통 조망수용 산출과제보다 이해과제에서 상대방의 조망을 더 잘 수용하였다. 또한 아동들은 특혜기반 조건보다 공통기반 조건에서 상대방 조망을 고려하여 적절한 언어를 더 많이 산출하였고, 공통기반 조건보다 특혜기반 조건에서 상대방의 조망을 고려한 반응을 더 많이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들도 상대방의 조망에 민감한 것을 보여준다. 각 과제간의 관계에서 의사소통 조망수용 산출은 틀린믿음, 억제통제(낮밤과제), 수용어휘, 표현어휘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의사소통 조망수용 이해는 깃발과제로 측정한 억제통제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나아가 의사소통 조망수용에 대한 예측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의사소통 조망수용 산출을 예측해 주는 변인은 틀린믿음이었다. 그리고 의사소통 조망수용 이해를 예측해 주는 변인은 깃발과제로 측정한 억제통제였다. 이는 틀린믿음 이해가 높을수록 타인의 조망을 고려하여 보다 적절한 언어 사용하고, 간섭을 일으키는 자극을 억제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통제하는 억제통제능력이 뛰어날수록 의사소통상황에서 상대의 관점에서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남을 시사해준다.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children's development of communicative perspective-taking, false belief, inhibitory control, and further relations among these variables. Ninety-two 3- and 4-year-old children were tested. Children produced the appropriate adjectives in the common-ground condition more often than in the privileged-ground condition, and chose referential targets significantly more often in the privileged-ground condition than in the common-ground condition.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false belief understanding can predict performance in communicative perspective-taking production tasks, while inhibitory control predicts performance in communicative perspective-taking comprehension tasks. This implies that children are sensitive to the perspectives of others in communication, and further, that their communicative perspective-taking ability might be partially related to false belief understanding and inhibitory control.
본 연구는 학령기 한국 아동의 실행기능 발달과 수학적 능력 중 측정과 그래프 해석능력 간의 관계를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억제와 전환 기능을 중심으로 실행기능과 수학적 능력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서울 및 경기도 지역 만 8세에서 만 11세 사이 아동 195명을 대상으로 측정과 그래프 이해 과제 및 단순 구획과 복잡한 구획으로 나누어 구성된 Munro 등(2006)의 실행 과제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환에서는 9세와 10세 사이에 유의미한 수행 증가가 발견되었으나 억제에서는 유의미한 수행 증가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아동의 전환 기능은 측정과 그래프 이해 과제 수행 모두와 높은 관련성을 보였으나, 억제 기능은 두 수학 과제 모두에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전환 기능이 수학 능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기존의 이론을 지지하며, 만 8세에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른 억제 기능보다 그 이후까지 계속해서 발달하는 전환 기능이 한국 아동의 수학 능력을 예측하는 데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함을 시사한다.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age-related development in executive functions (EF), specifically, inhibition and shifting factors, and to explore their relationship with children’s understanding of two critical mathematical concepts: measurement and graph. Our sample included one hundred ninety-five 8- to 11-year-old children living in Seoul and Gyeongi-do, South Korea. Given the high performance of Korean students on EF tasks, we used Monro et al.’s (2006) task with easy and difficult phases to measure EF abilities. The major results of our study are as follows. First, shifting ability, but not inhibition ability, significantly improved between 9 and 10 years of age . Furthermore, shifting score was strongly related to both measurement and graph scores, but inhibition was unrelated to both. Our findings support the idea that shifting plays a critical role in learning mathematics.
본 연구는 한국형 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 3판 인지 척도의 예비연구본을 마련하고, 문항분석 및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여 국내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생후 16일 ~ 42개월 15일의 375명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예비연구를 실시하였다. 91개 문항의 내적 합치도가 양호하고 일차원성을 이루고 있어 문항반응이론 적용에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별 곤란도 분석 결과, 문항들은 쉬운 문항에서 어려운 문항으로 순차적으로 배열되어 있었다. 월령단계별 시작문항 및 기저선 문항들은 전반적으로 90%의 통과율을 넘어 적절하였으나 일부 시작문항들은 재배치가 요구되었다.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1주 간격의 재검사 신뢰도는 안정적이었으며, 평정자간 일치도 역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판 라이터 비언어검사(K-Lieter-R)와는 적절한 정적 상관을 보여 수렴타당도 역시 양호한 것으로 밝혀졌다. 요인구조를 탐색적으로 알아본 결과, 2요인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문항들이 두 요인 모두에서 높은 부하량을 보이고 있어서 이들 문항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문항 배치 및 실시 지침, 채점 기준 수정 등을 포함하는 K-Bayley-Ⅲ 표준화 연구본 마련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sought to validate the Korean version of the Bayley Scales of Infant and Toddler Development Third Edition (K-Bayley-III) for domestic application. Participants were 375 infants and toddlers from 16 days to 42 months and 15 days old from Seoul and its suburbs. The adequateness of item arrangement was determined by item difficulty analysis based on Item Response Theory. Item internal consistency was .986, and relevance of starting points for the 17 age stages were acceptable, with an average rate of 80%. Test-retest reliability and inter-coder reliability were both satisfactory. Convergent validity of the K-Bayley-III and the yielded a moderate correlation of .503 (p < .01).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stimated a two-factor structure on 91 items. Potential amendments to administration procedures and scoring criteria were discussed.
본 연구는 일련의 기억 항목들을 순서대로 하나씩 처리하는 계열적 수행의 세부 활동 중 어떤 활동에서 연령차가 나타나는지를 밝히고, 군집화와 억제를 중심으로 계열적 수행의 연령차를 탐구하였다(연구 1). 그리고 노인의 계열적 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출 단서의 효과를 탐구하였다(연구 2). 그 결과, 노인의 평균 반응시간이 청년보다 길게 나타났다. 그러나 청년과 노인 모두 8개짜리 계열을 3개의 군집으로 나누어 표상하였고 인출할 때에도 형성한 군집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 모두 군집 내 나머지 항목보다 군집 내 대표 항목에 대해 더 긴 반응시간을 보였다. 그리고 노인은 청년보다 과제 수행 정확률이 더 낮았고, 보속 오류를 더 많이 범하였다. 연구 2에서는 단서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노인들이 8개짜리 계열을 3개의 군집으로 나누어 표상하고 인출하였으며, 네 단서 집단 모두 군집 내 나머지 항목보다 군집 내 대표 항목에 대해 더 긴 반응시간을 보였다. 다른 단서 유형보다도 부분 세트 항목 일치 단서 조건의 평균 반응시간이 가장 빨랐으나, 오류율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계열적 수행 시, 계열의 표상과 관련된 연령차는 존재하지 않지만, 계열 내 요소들의 인출과 방해 자극에 대한 억제 활동에서는 연령차가 존재한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였고, 노년기 계열적 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분 세트 항목 단서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였다.
Sequential performance refers to performing tasks in a fixed order. Performing a certain task in an orderly manner requires multiple mental processes, such as representation and retrieval of sequential information as well as blocking certain information from impeding memory performance. Among other things, it seems that the chunking strategy and inhibitory mechanisms are the most important features for sequential performance. Therefore, two experiments were administered to delineate the nature of these two components using the sequential action control task(S-ACT). We also investigated differences in recall task performance across two age groups. Older adults showed a longer mean reaction time than did young adults in Experiment 1. Both age groups formed three chunks during sequence representation when retrieving a target stimulus. Furthermore, they both showed longer RTs for the lead item of a chunk compared to the other items within a chunk. Older adults made more lag –1 errors (conservative errors) than did the young group. We conducted Experiment 2 to examine the effects of retrieval cues for improving sequential performance. Regardless of the cue type, older participants showed a relatively consistent pattern of in their retrieval. All participants showed longer RTs for the lead item of a chunk compared to its remainder. There were no significant interactions between item role and cue types for the different age groups. For different types of retrieval cues, the part-set cue-congruent group performed faster than all other groups, but retrieval accuracy was comparable across all groups.
본 연구는 아동기에 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정서적 유대가 자기 존중감과 타인 신뢰를 통해 성인기의 애착 행동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경로를 애착이론에 근거하여 조사하였다. 미국 남서부의 대도시 지역권에 거주하는 대학생 401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신에 대한 존중감과 타인을 신뢰하는 성향은 각각 아동기에 경험한 모와의 정서적 유대와 성인기의 불안애착 행동 방식을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타인을 신뢰하는 성향만이 모와의 정서적 유대와 회피애착 행동 방식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적작동모델에 대한 Bowlby의 이론적 제안과 Bartholomew의 개념적 분류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아동기에 모와의 관계에서 애정과 돌봄, 정서적 지지를 많이 경험할수록 자신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타인의 의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신뢰하는 경향이 높음을 나타낸다. 또한, 이렇게 자기 존중감과 타인을 신뢰하는 경향이 모두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 거절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으로 타인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는 불안애착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낮음을 나타났다. 한편, 자기 존중감 보다는 타인에 대한 신뢰와 아동기 모와의 정서적 유대가 친밀한 관계를 회피하고 지나치게 자기의존적인 회피애착 행동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의 임상적, 교육적 의의와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 과제들과 함께 제시되었다.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pathways in which childhood emotional bonding with mothers predicts adulthood attachment through self-esteem and trust in others. Participants were 401 college students in the southwest United States. The results indicated that self-esteem and trust in others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bonding with mother and anxious attachment. In contrast, trust in others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emotional bonding and avoidant attachment. These findings confirm Bowlby’s proposition and Bartholomew’s conceptualization of working model, and suggest that those who received more affection from their mother were more likely to perceive themselves as valuable and to trust others. Furthermore, those who view themselves as valuable and trust others were less likely to show anxious attachment styles (i.e., overly dependent on others). Besides, trust in others and emotional bonding with mother were predictors of avoidant attachment (i.e., compulsively self-reliant). Limitations and future directions were discussed with regard to clinical and educational implications.
총칭 표현(예, 새는 날개가 있다)는 종류에 대한 보편적인 특징을 기술하여 범주에 대한 지식 습득을 돕는다. 선행연구들은 총칭표현의 이해와 사용이 만 4세부터 정교해진다고 제안하였는데 이러한 연구는 영어습득 아동에게 한정적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에서 활용되는 총칭 표현의 특징을 실험적으로 검토하고, 총칭표현에 대한 이해가 만 3세 아동에게서도 발달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실험 1에서는 우선 성인들이 보편적인 속성을 묘사하는 문장에서 보이는 형태론적 특징들을 검토하여 한국어 총칭 표현에는 주로 원형 단수 형태와 조사 ‘은/는’이 함께 나타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실험 2에서는 만 3세 아동에게 이러한 총칭 표현을 제시하고, 비총칭 표현에 비해 언급된 범주의 속성을 다른 대상에게 확장시키는지를 검토하였다. 실험 결과, 만 3세 아동은 총칭 표현의 대상이 다수인지 소수인지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보편적 속성을 추출하고 확장하였으며, 예외적인 경우(예, 새는 날지만 이 새는 못 난다와 같이)가 함께 제시되었을 때에도 발화된 표현에서 총칭성을 구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칭 표현의 이해와 활용이 만 3세부터 정교하게 발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Generic expressions (e.g., “Birds have wings”) describe different general properties and help children acquire knowledge of a given category. Although prior studies have suggested that generic inferences become more sophisticated around 4 years of age, no studies have tested younger age groups, and the findings have largely been limited to children in English-speaking communities. The present study examined Korean-speaking 3-year-olds’ abilities to make inferences based on generic expressions. First, we elicited and analyzed Korean-speaking adults’ utterances that described general properties of an animal category, and found that the most widely utilized generic noun phrases (NPs) of Korean were bare singulars, with the topic marker eun/nun accompanying these NPs. We then presented Korean 3-year-olds with generic expressions about properties of novel animals using these morpho-syntactic features, and observed the extent to which they were willing to extend the property to a novel instance of the given category. Specifically, we examined whether 3-year-olds can make generic inferences regardless of the strength of evidence (e.g., number of exemplars), or when an exception was introduced. We found that 3-year-olds can make generic inferences regardless of evidence strength, and distinguish genericity from nongenericity despite the presence of an except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sophisticated abilities to make generic inferences are present as early as 3 years old, and the development of inferential abilities is universal rather than language- or culture-specif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