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access
메뉴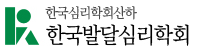
open access
메뉴본 연구는 가족과 이별한 북한이탈어머니의 모호한 상실감과 긍정양육행동간 관계를 살펴보고, 우울 및 양육스트레스의 순차매개효과를 확인해보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가족이 생존해있지만 만날 수 없는 모호한 상실 상황에 있고 현재 남한에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 는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북한이탈어머니 100명을 표집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면담 및 설문을 통해 모호한 상실상황 질문지, 경계모호성, 우울, 양육스트레스, 긍정양육행동(온정성/일관성)에 대해 보고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어머니의 모호한 상실감 수준은 양육행 동 일관성에 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 모호한 상실감 수준이 높을수록 양육행동 일관성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모호한 상실감과 양육행동 일관성의 부적 관계에서 우울의 단독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양육스트레스의 단독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지지되었 다. 셋째, 모호한 상실감과 양육행동 일관성의 부적 관계를 우울, 양육스트레스가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것이 지지되었고 이때 순차매개효과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양육행동 온정성에 대해서는 모호한 상실감, 우울, 양육스트레스의 직, 간접 경로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 및 한계점을 논의하였고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association between ambiguous loss (AL) and positive parenting behavior, considering depression and parenting stress as sequential mediators. Participants were 100 North Korean defector mothers who had left their families in North Korea and were now raising children in South Korea. Boundary ambiguity, depression symptoms, parenting stress, and positive parenting behaviors (warmth/consistency) were measured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s. Results indicated that AL was sequentially and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high levels of depression and parenting stress, which in turn predicted lower levels of the consistency factor for positive parenting behavior. The single indirect effect of AL on positive parenting (consistency) through parenting stress was also significant. However,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AL, depression, and parenting stress on positive parenting (warmth) were all not significant. Based on these result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통제적 과제참여와 지능에 대한 암묵적 신념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미국 동부와 남부에 소재한 7개의 중학교 3학년 학생 1,374명을 대상으로, 1학기와 2학기 총 2회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부모의 통제적 과제참여와 암묵적 신념 간의 상호적 방향성을 검증한 결과, 1학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통제적 과제참여가 높을수록 2학기에 노력으로 인지능력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믿는 고정믿음을 가졌다. 한편, 1학기 청소년의 지능에 대한 암묵적 신념은 2학기 부모의 통제적 과제참여를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는 부모의 일방적이고 통제적인 과제참여가 청소년 자녀의 지능의 가소성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기 자녀의 학업 지원에 있어 부모참여의 바람직한 방향과 중재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Contrary to common belief, parent support in homework does not always lead to positive results. Uninvited, parent-initiated, and controlled parent homework support deceases children’s academic motivation and achievement. In the current study, we examined whether perceived intrusive parent homework support predicted children’s beliefs about the malleability of intelligence, called theory of intelligence. We also examined the reverse relationship: whether children’s theory of intelligence predicted perceived parent intrusive homework support. In a year-long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we examined 1,374 middle school students. Results showed that students who perceived a higher level of intrusive parent homework support tended to believe that their intellectual ability was fixed (fixed mindset) six months later. However, perceived intrusive parent homework support did not predict theory of intelligence after the 6-month period. This finding adds to the understanding of the antecedent of theory of intelligence during adolescence, suggesting the need for a parent education program that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autonomy when supporting adolescents’ homework.
본 연구는 남자 중학생의 또래괴롭힘 피해경험과 전위된 공격성의 관계를 거부 민감 성과 남성 성역할 갈등이 매개하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관계를 비판단 성향이 조절 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남자 중학생 445명의 자기보고식 자료를 분석 에 활용하였다. 그 결과,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은 거부 민감성을 정적으로 예측하고, 이는 다시 전위된 공격성의 증가와 연합되었다. 또래괴롭힘 피해경험과 전위된 공격 성 간의 관계에서 거부 민감성과 남성 성역할 갈등의 이중매개효과도 유의하였다. 이 때, 비판단 성향은 또래괴롭힘 피해경험과 거부 민감성의 관계를 유의하게 조절 하였는데, 비판단 성향이 강할 경우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이 거부민감성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비판단 성향은 또래괴롭힘 피해경험과 전위된 공격성의 관계에서 거부 민감 성을 통한 간접효과와 거부 민감성 및 남성 성역할 갈등을 통한 간접효과를 조절하 여, 비판단 성향에 의한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 의와 남자 중학생의 또래괴롭힘 피해에 따른 부적응을 완화할 수 있는 개입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victimization from peer bullying and displaced aggression via rejection sensitivity and male gender role conflict. In addition, the moderation effects of a non-judgmental disposition were examined. Self-report data of 445 middle school boys were analyzed using SPSS 22.0 and Process macro. The results indicated significant double mediation effects of rejection sensitivity and male gender role conflict. Furthermore, a nonjudgmental disposition was found to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victimization and rejection sensitivity. Additionally, a non-judgmental disposition moderated the indirect effect between victimization and displaced aggression through rejection sensitivity, and also moderated the indirect effect through rejection sensitivity and male gender role conflict.. Study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were discussed, including those for intervention strategies for male middle-school victims.
본 연구는 학령전기 아동들이 자원을 가진 내집단과 외집단 구성원 중 누가 '가난한 사람'에게 자원을 나누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실험 1에서는 만 4세와 만 5세 아동에게 내집단과 외집단 구성원이 동일한 양의 자원(충분한 자원(2:2)조건, 불충분한 자원(1:1)조건)을 소유하였을 때, 누가 자원이 없는 개인에게 자원을 나누어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 결과, 만 4세는 충분한 자원 조건에서만, 만 5세는 두 조건 모두에서 내집단 구성원이 나눔 행동의 책임을 가진다고 추론하였다. 실험 2에서는 만 5세 아동들이 개인의 자원 공유 책임 판단에 자원의 양을 고려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내집단과 외집단 구성원이 상이한 양의 자원을 가졌을 때(내집단 충분조건(2:1), 외집단 충분조건(1:2))의 나눔 행동의 책임을 물어보았다. 그 결과, 아동들은 집단 소속과는 상관없이, 공정성 원리에 따라 더 많은 자원을 가진 구성원이 나누어주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타인의 도덕적 책임에 대한 추론 과정에서 학령전기 아동들이 개인의 집단 정보뿐 아니라 자원의 양과 같은 맥락특정적 정보를 함께 사용하는 인지적 추론을 해낸다는 것을 보여준다.
The present research investigated what do preschoolers think is morally responsible among ingroup and outgroup members regarding "the poor". In Experiment 1, an ingroup and an outgroup members possessed the same number of resources, while the poor possessed none. Across conditions, the number of resources was different (sufficient (2:2) and insufficient (1:1) condition). In a choice-task, 4-year-old children responded that ingroup members should share only in the sufficient condition, while 5-year-old children responded that ingroup members should share in both conditions. Experiment 2 presented 5-year-olds with another set of conditions (sufficient ingroup (2:1), sufficient outgroup (2:1) conditions) to investigate whether they would consider the number of resources when judging who should share them. As a result, regardless of group memberships, 5-year-old children responded that the individuals with more resources had the responsibility of sharing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fairness. These results suggest that preschool children are capable of sophisticated cognitive reasoning by using context-sensitive information when judging individuals' moral responsibility towards others.
본 연구는 성인 초기 실행기능이 정서조절과 정서인식 명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실행기능과 정서조절의 관계를 정서인식 명확성이 매개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과 경기도 지역 대학생 및 성인 101명을 대상으로 실행기능을 측정하는 Operation Span Task(Kane et al., 2001)를 실시하였고, 정서조절질문지(ERQ)와 특성상위기분척도(TMMS)를 사용하여 정서조절(재평가, 억제)과 정서인식 명확성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실행기능은 정서조절의 하위변인 재평가와 억제 그리고 정서인식 명확성 모두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나타냈다. 실행기능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했고, ‘억제’ 전략보다 ‘재평가’ 전략을 더 많이 사용했다. 또한, 정서인식 명확성은 실행기능과 재평가 관계를 매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년기 이후 성인 초기에도 실행기능을 포함한 인지적 유능성이 정서조절의 개인차를 설명하는 주요변인임을 제안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effects of executive function on emotional regulation and emotional clarity, and to explore whether emotional clarity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executive function and emotional regulation in early adulthood. For this purpose, an operation span task(OSPAN)(Kane et at., 2001) was applied to 101 participants in Seoul and Gyeonggi-do to measure execution function, and th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ERQ) and Trait Meta-Mood Scale(TMMS) were used to measure emotional regulation(reappraisal and suppression) and emotional clarity. Study results showed executive function had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both sub-variants of emotional regulation, ‘reappraisal and suppression’, and emotional clarity. The higher the level of executive function, the more clearly were emotions recognized, and the more ‘reappraisal’, rather than ‘suppression’, was used. In addition, emotional clarity was found to mediated executive function and reappraisal.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cognitive competence, including executive function, is a major variable explain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emotional regulation, even after adolescence and into early adulthood.
자율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력투구에 요구되는 성격 특성인 그릿(Grit)은 어떻게 길러지고 사회화되는가? 본 연구는 대학생의 그릿이 발달할 수 있는 사회화 경로에 주목하여, 대학생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성장적 실패마인드셋을 독립변수로, 부모의 학업기대(지지 및 압박)와 대학생의 학업적 실패내성을 매개변수로 설정한 이중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대학생 41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부모의 성장적 실패마인드셋은 대학생 자녀의 그릿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부모 지지기대와 자녀 실패내성 각각을 통한 단순매개 및 순차적 이중매개, 부모 압박기대와 자녀 실패내성을 통한 이중매개효과가 유의하였고, 압박기대를 통한 단순매개 효과만이 유의하지 않았다. 즉 부모가 실패를 건설적이고 성장적인 경험으로 여기는 경우, 자녀의 학업에 대한 지지기대가 높아지고 압박기대가 낮아지며, 이는 자녀의 실패내성을 견고하게 하여 그릿이 발달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본 연구는 부모의 실패마인드셋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밝힘과 동시에, 그릿이 발달하는 사회화 기제를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How is grit developed and socialized? This study aims to focus on the socialization of grit, investigating 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al academic expectation (support and pressure), and university students’ tolerance of academic failur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failure-is-enhancing” mindset and students’ grit. Data were collected from 412 university students and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PROCESS macro software. Results showed that the “failure-is-enhancing” mindset of parents had a positive effect on students’ grit development. It also demonstrated that the mediating and double mediating effects through parental academic support and students’ tolerance of failure were significant. Although the mediating effects through parental pressure were insignificant, the double mediating effects of parental pressure and failure tolerance were significant.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본 연구는 9~47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자폐스펙트럼장애 위험군을 선별하기 위한 교사 보고용 설문 검사도구인 걸음마기 아동 행동 발달 선별 척도-교사용 설문지(BeDevel-Q/T: Behavior Development Screening for Toddlers-Questionnaire/Teacher)의 타당성을 검정하였다. 217명(일반발달군 179명, ASD군 32명, 발달지연군 6명)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총 1,936명, 이 중 일반발달군 1,833명, ASD군 62명, 발달지연군 41명)에서 예비 문항, M-CHAT, BITSEA의 자폐증 선별에 민감한 문항, K-DST의 사회성 영역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9~11개월, 12~23개월, 24~35개월, 36~47개월로 구분되며, 월령별로 7~27개 문항으로 구성되고, 3개 하위요인이 도출되었다. BeDevel-Q/T와 M-CHAT, BITSEA의 자폐증 선별에 민감한 문항, K-DST의 사회성 영역과의 상관분석 및 일반발달 집단, ASD 집단, 발달지연 집단간 차이 분석을 활용하여 BeDevel- Q/T의 타당도를 검정하였고, 본 척도는 받아들일 만한 수준의 타당도를 보였다. BeDevel-Q/T는 민감도(50.0~85.0%), 특이도(59.6~84.8%), 문항 내적 일치도(Cronbach's α=.72~.76), 검사-재검사 신뢰도(R=.79~.94)에서도 높은 수준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BeDevel-Q/T가 한국의 보육 및 교육환경에서 영유아기 ASD를 조기 선별하는 간편선별 도구로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validified the Behavior Development Screening for Toddlers-Questionnaire/Teachers (BeDevel-Q/T), an autism spectrum disorder (ASD) screening instrument. This assessment serves the purpose of teacher reports for early screening of ASD on infants aged 9-47 months. Pilot tests were conducted on a total of 217 people(N=179 typical development, N=32 ASD, n=6+DD). A total of 1,936 participants were tested N = 1,833 typical development, N = 62 ASD, N = 41 developmentally delayed). The results showed a line between age ranges of 9-11 months, 12-23 months, 24-35 months and 36-47 months. Each age ranges consisted of 7-27 questionnaires and 3 subfactors. BeDevel-Q/T validity was tested by the general developmental criterion of BeDevel-Q/T, M-CHAT, Autism items from BITSEA and sociability items from K-DST. M-CHAT, Autism items from BITSEA and sociability items from K-DST were also employed and correlation analysis was performed and general differentiation factors between ASD, developmental delayed, and normal groups were also considered. Results showed a reasonable level of acceptability. BeDevel-Q/T showed high sensitivity (50.0-85.0%), specificity (59.60-84.8%), high internal consistency (Cronbach's α=0.72-76) as well as high test-retest reliability (r=0.79-94). Our results suggest that BeDevel-Q/T might work as a useful short form screener for early identification of ASD in primary care settings.
공동주의는 언어와 사회성 발달을 예측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그러나 공동주의 측정법들은 객관성과 생태타당도를 동시에 확보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법을 결합한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하여,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유아와 어머니의 공동주의 시도하기를 체계적으로 측정해보았다. 이를 위해 30분간의 준구조화된 놀이 상황에 초기 사회적 의사소통 척도가 적용되도록 하였고, 녹화된 전수 자료를 코딩하여 대표성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측정된 시도하기와 유아/어머니 요인과의 관계도 탐색하였다. 전반적으로, 어머니는 유아보다 시도하기 비율이 높았고, 여아의 어머니들이 남아보다 눈 마주치며 가리키기를 더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공감 정확도가 높을수록 유아의 시도하기 수준도 높았다. 반면 개인적 고통을 더 느끼는 어머니일수록 자녀의 시도하기 수준이 낮았다. 또한, 가리키기를 많이 하는 어머니일수록 자녀에게 비언어적으로 단어 의미를 더 잘 전달하였다. 종단적 검증이 남아있으나 유아의 시도하기에서의 개인차는 어휘발달과 상관이 있었고, 어머니의 시도하기도 영아기 이해어휘와 관련을 보였다. 본 연구는 공동주의의 새로운 측정법과 함께 어머니와-자녀의 상호작용에서 공동주의 시도하기와 관련된 다양한 촉진 요인들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Joint attention between infants and mothers is known to be a predictive factor for individual differences in language and social development of the child. Approaches to measuring joint attention, however, had limitations in securing both objective and naturally valid measures. The present study combined prior methods to obtain naturally valid and systematically comparable joint attention measures in both toddlers and their mothers. We presented semi-structured play setting that can utilize Early Social Communicative Scale and coded entire 30-minute mother-child interactions for initiation of joint attention (IJA) behaviors. Overall, mothers showed more IJA than their toddlers. Mothers with girls tended to use pointing with gaze alternation than mothers with boys. Furthermore, maternal education and empathic accuracy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ir toddlers’ IJA. However, mothers’ personal distress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toddlers’ IJA. Also, the more the mothers used pointing to initiate, the better they appeared to convey word meanings non-verbally. An association was found between Toddlers’ IJA and their comprehension/production vocabulary and mothers’ IJA was positively linked to their 14-17-month-olds’ word comprehension. These findings suggest possible factors that can facilitate IJA in mother-child interactions.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과 이후 초기 성인기의 우울증상 예방을 궁극적 목표로, 학교 밖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지지와 또래지지, 사회적 낙인감이 이후 초기 성인기의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사회적 낙인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학업중단청소년패널 1차~5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776명(남아 444명)의 청소년을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후 경로모형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학업중단 초기 부모지지와 또래지지는 학업중단 2년 후 경험하는 사회적 낙인감에 직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성인 초기 우울증상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학업중단 초기 부모지지와 또래지지는 성인 초기 우울증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학업중단 2년 후 경험한 사회적 낙인감을 매개로 하여 성인 초기 우울증상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업중단 이후 학교 밖 청소년의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examined the extent to which parental and peer support influenced youth's depressive symptoms during emerging adulthood directly and indirectly through perceived social stigma, using the longitudinal survey on school dropout youth conduct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The present study included 776 adolescents (boys n = 444). The results indicated that parental and peer support in the beginning of school dropout (age 17) negatively affected the youth's perceived social stigma 2 years later (age 19). Their perceived social stigma was significantly and positively associated with depressive symptoms in emerging adulthood (3-4 years after school dropout, age 21). Second, depressive symptoms were not directly influenced by parental and peer support during the early years of school dropout but were significantly reduced through reduced social stigma. Results from the present study are expected to inform efforts for developing preventive intervention programs to support healthy adjustment among school dropouts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