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access
메뉴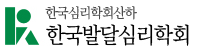
open access
메뉴이 연구는 남녀 노인들(66-80세)을 대상으로 노년기 고독을 연구하고 성격변인들과의 관계를 규명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성인용 고독척도(SELSA)를 사용하여 사회적, 낭만적, 가족고독의 비율을 확인하고 성별과 연령에 따라 세 가지 고독에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세 가지 고독과 외향성, 정서적 불안정성 및 자기존중감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낭만적 고독의 경험비율이 가장 높고 가족고독의 경험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세 가지 고독의 경험비율은 연령과 함께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또한 여성노인들은 남성노인들보다 더 큰 낭만적 고독을 그리고 76-80세의 남성노인들은 여성노인들보다 더 큰 가족고독을 경험하였고, 76-80세의 남녀 노인들은 연령이 적은 두 집단보다 더 큰 사회적, 낭만적, 가족고독을 경험하였다. 71-75세 남성노인들을 제외하고 사회적 고독과 가족고독은 외향성과 자기존중감이 낮을수록, 정서적 불안정성은 높을수록 더 컸으며 낭만적 고독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나타났으나 연령집단에 따라 약간의 변이를 나타내었다. 중다회귀분석 결과 외향성과 정서적 불안정성도 세 가지 고독에 영향을 주지만, 자기존중감은 세 가지 고독 모두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었다.
With the proportion of social, romantic and family loneliness, this study examined if there’s differences in three types of loneliness according to sex and age, what relationship was there between loneliness and persoanlity variables, that is exteroversion, neurotocism and self-esteem. As results, old adults had the highest proportion in romantic loneliness and the lowest proportion in family loneliness and the experience of loneliness was increased with age. Women experienced more romantic loneliness than men and the men of 76-80 age group experienced more family loneliness than women. Old adults of 76-80 age group experienced more social, romantic and family loneliness than the other two age groups. Except men of 71-75 age group, social and family lonelines negatively correlated with exteraversion and self-exteem and positively with neuroticism. Although similar correlation pattern was found in romantic loneliness, some variation appeared according to age group. It was confirmed three personality variables influenced three types of loneliness.
본 연구는 여중생들의 우정집단 내 우정관계 질투와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의도귀인과 또래동조성이 매개하는지 알아보았다. 울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3개의 중학교 여학생학급에 속한 1학년 여학생 547명을 대상으로 우정관계 질투 척도, 의도귀인 척도, 또래동조성 척도, 또래갈등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여중생들을 대상으로 우정관계 질투, 의도귀인, 또래동조성,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의도귀인과 또래동조성이 우정관계 질투와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매개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매개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우정관계 질투는 의도귀인, 또래동조성, 관계적 공격성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도적 귀인은 또래동조성, 관계적 공격성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래동조성은 관계적 공격성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정관계 질투가 의도적 귀인을 매개하여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우정관계 질투가 또래동조성을 매개하여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이 논의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ive the effects of friendship jealousy on intent attribution, peer conformity, and relational aggression. A sample of 547 students from 3 girls’ middle schools in Ulsan was participated in the survey. For this study, a relation friendship jealousy scale, a intent attribution scale, a peer conformity scale, and a peer conflict scale were conducted. For statistical analyses,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ere employ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ing: First, friendship jealousy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intent attribution, peer conformity, overt aggression, relational aggression, and total in aggression. And intent attribution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peer conformity, overt aggression, relational aggression, and total in aggression. Peer conformity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overt aggression, relational aggression and total in aggression. Secondly, intent attribution as well as peer conformit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friendship jealousy and relational aggression. Additionally, friendship jealousy exerts a direct effect on relational aggression.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과 노인을 대상으로 지혜의 정도가 어떻게 다른지, 그에 따라 다양한 삶의 딜레마 상황에서 주인공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어떤 판단을 하는지, 아울러 개방성과 자기초월이 지혜와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를 살핌으로써 지혜의 기능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노인은 대학생에 비해 지혜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는데 특히 절제와 균형 요인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노인은 대학생에 비해 자기초월점수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험에 대한 개방성에서는 두 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삶의 딜레마 상황에서 노인들은 대학생에 비해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상황 속 인물들에게 있는 정도를 더 낮게 평가하였고 그 인물들이 느끼는 부정적 정서도 적게 보고하였다. 각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해결방안에 대한 판단에서도 노인집단과 대학생집단은 차이가 있었다. 노인과 대학생 모두 지혜는 자기초월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개방성은 노인의 지혜와만 정적 상관을 보였다. 노인의 경우에는 연령과 지혜 간에 상관이 없었으나 대학생의 경우에는 연령이 높을수록 지혜점수가 더 높아 노인과 대학생간에 차이를 보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wisdom of old people and college students an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 of wisdom, openness to experience, and self-transcendence. Seventy-four college students and fifty-six old people were measured their level of wisdom on Korean Wisdom Scale(Kim, 2008). It was found that old people got higher scores than college students on four areas of the Korean Wisdom Scale, especially in ‘self-control and balance’ factor. Also old people showed higher scores in self-transcendence than college students. Comparing the judgments on four hypothetical life dilemma situations, old people judged the protagonists less responsible for the dilemma than college students. Old people gave more weights on concerns for other people as best solutions whereas college students more on protagonist-oriented solutions. Wisdom was related positively both to self-transcendence and to openness to experience in old people, but wisdom was related positively only to self-transcendence in college students. Limitations of this study, its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were discussed.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 유아 행동평가척도 교사용(C-TRF)을 표준화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1,371명(남아 679명, 여아 692명)의 18개월~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미국판 원 검사의 요인구조를 한국에서도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검사-재검사 신뢰도 값(.57~.82)이나 각 하위척도들의 내적 합치도 수준(Cronbach’s α = .52~.96)은 일부 척도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판 C-TRF의 하위척도들은 상호 요인 간, 특히 내재화 및 외현화의 상위 요인별로 높은 상관을 보였다. 문제행동총점을 비롯한 대부분의 척도에서 임상집단(n = 33)과 비임상집단(n = 1,209) 간에 중간 이상의 효과크기 수준 평균차이를 보였으며, 한국판 C-TRF 총점이 임상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어머니가 실시한 한국판 CBCL 1.5-5의 하위척도 점수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나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뒷받침하였다. 성별, 연령대 별 척도 점수 비교 결과, 36개월 전후 남녀 네 집단으로 규준을 제시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판 C-TRF의 임상 및 연구 장면에서의 활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tandardize the Korean version of Caregiver-Teacher Report Form (C-TRF). 1,371 preschoolers (679 boys and 692 girls) age from 1.5-5 were selected as the normative sample.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howed that the original C-TRF’s factor structure can be appropriately applied to the Korean version of C-TRF. The reliability was tested via internal consistency (.52~.96) and test-retest reliability (.57~.82). The mean differences and Cohen’s effect sizes of the subscales between clinical and normative sample revealed the scale’s discriminant validity. Differences of mean subscale scores for different age and sex groups showed that 4 independent norms for sex (male vs female) and 2 age groups (18~35month vs 36~72month) would be reasonable for the scale.
본 연구에서는 가르치기를 이해할 때 의도의 역할을 살펴보고, 가르치기 이해, 틀린 믿음 이해, 어휘력과 학업 준비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3세 아동들은 성공적인 가르치기, 실패한 가르치기, 성공적인 모방, 실패한 모방의 4 조건에서 모두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였고, 5세 아동들은 가르치기 과제에서는 의도를 추론하였지만 모방과제에서는 의도를 추론하지 않았다. 3세와 5세 아동들의 반응은 모두 결과가 성공적이었는지 실패였는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가르치기 과제와 더불어 틀린 믿음 과제를 실시하였고, 수용 어휘력과 표현 어휘력을 측정하였다. 이 아동들을 담당한 교사들에게 학업 준비도를 평정하게 하였다. 가르치기, 틀린 믿음, 어휘력이 학업 준비도를 예측해 주는 모형이 5세의 경우에는 유의했지만, 3세의 경우에는 유의하지 않았다. 특히 학업 준비도-언어 인지 기술의 경우에는 표현 어휘력의 예측이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5세가 되면 가르치기에서 의도의 역할을 인지하고, 또한 표현 어휘력이 높으면 학업에 대한 준비가 더 잘 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This study examined the role of intention in 3-and 5-year-olds’ understanding of teaching, using 4 different stories(successful teaching, failed teaching, successful imitation, failed imitation). The finding indicated that 5-year-olds considered teaching as an intentional activity only in the teaching tasks regardless of successful results. It suggested that the children’s responses could not be interpreted in terms of the functional definition of teaching. This study also examined which variables such as teaching, false belief, and vocabulary could predict children’s school readiness.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suggested that 5-year-olds’ expressive vocabularies uniquely predicted their school readiness-language and cognitive skills.
본 연구는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 애착 안정성, 거부 민감성 및 자기개념 명확성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자하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관계를 애착 안정성과 거부 민감성이 매개한다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서울 및 근교에 소재한 5개 대학의 남녀 대학생 409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주요 변인들에 대한 성차 분석 결과 거부 민감성에서만 유의미한 성차가 발견되어 여성이 남성에 비해 거부 민감성이 높게 나타났다. 연구 모형 검증 결과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의 하위차원인 돌봄과 과보호 중 과보호가 자기개념 명확성에 직접 경로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시에 지각된 모의 양육 행동의 하위 차원인 돌봄과 과보호 모두는 모에 대한 애착 안정성과 거부 민감성을 매개로 하여 자기 개념 명확성을 설명하는 간접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모형에서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다집단 분석 결과, 본 연구 모형이 남녀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his study examined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Perceived mother’s parenting behaviors, Attachment security, Rejection sensitivity and Self-concept Clarity. Based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this study suppose that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mother’s parenting behaviors and Self-concept Clarity is mediated by attachment security and rejection sensitivity. For this research, the self-report data of 409 College student in Seoul and suburbs of Seoul were analyzed. After examining hypothetical model, subordinate levels of perceived mother’s parenting behaviors, overprotection, has a direct effect on Self-concept clarity. At the same time, Relationship between subordinate levels of perceived mother’s parenting behaviors, care and overprotection, and Self-concept clarity was mediated by attachment security to the mother and rejection sensitivity. However, care was not significant as a direct path to predicting Self-Concept Clarity. Lastly, the study model was shown to be suitable both to male and female and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Path Coefficient.
본 연구는 한국 14개월 영아들이 타인의 행동을 모방할 때, 행동이 이루어지는 상황적인 제약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모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합리적 모방 수행의 개인 차이가 어떤 기질적 요소로 설명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Gergely, Bekkering과 Király(2002)의 머리로 등 켜는 과제를 사용하여 한국 영아들의 합리적인 모방 수행을 측정하였다. 영아들은 시연자가 손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손 가용 조건) 혹은 손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손 불가용 조건)에서 머리로 등을 켜는 새로운 행동을 본 후에 시연자의 행동을 모방할 기회를 가졌다. 손 가용 조건의 영아들은 손 불가용 조건의 영아들보다 머리로 등을 켜는 재연 반응을 더 많이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14개월 영아들도 타인의 상황적 제약을 고려하여 행동 목표를 추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손 가용 조건에서 머리 반응이 실험 상황에서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가는 기질의 부정적 정서와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 얼마나 빨리 나타나는가는 기질의 주의 지속성 요소와 정적 상관이 있었다. 이는 합리적 모방 수행의 개인차가 부정적 정서와 주의 지속성 기질로 설명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The current study investigated the development of rational imitation in 14-month-old Korean infants using Gergely et al. (2002)’s procedure. We also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infants’ rational imitation and their temperament. The infants watched an actor use her head to illuminate a light box while her hands were free (Hands-free condition) or while her hands were occupied by a blanket (Hands-occupied condition). The infants in the hands-free condition were more likely to imitate the actor’s head action than the infants in the hands-occupied condition. In the hands-free condition, the frequency of head reenactment negatively correlated with infants’ negative emotionality and the latency of head reenactments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duration of orienting in infant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14-month-old Korean infants can infer the goals of others’ actions by considering situational constraints and that individual differences in rational imitation can be related to differences in infants’ temperament.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기질과 청각기억능력,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양과 상호작용의 유형, 가정의 사회경제적 특성들이 24개월 표현어휘의 발달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320명의 24개월 영아와 그의 어머니들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결과, 영아의 청각기억능력 중 듣고 따라하기 능력, 18개월 때 영아의 표현어휘, 기질 중 적응성, 어머니의 발화수, 월 소득과 도서구입비가 24개월 영아의 표현어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함께 24개월 표현어휘의 55%를 설명하였다. 이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해 보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영아의 ‘듣고 따라하기’ 능력이었고, 그 다음이 18개월 표현어휘, 월 소득, 적응성, 어머니의 발화수, 도서구입비의 순으로 영향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와 함께 영아를 대상으로 한 언어 프로그램의 개발 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ve contribution of infant, mother, and family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n expressive vocabulary acquisition of 24-month-olds. A sample of 320 infants and their mothers were recruited for this study. Results indicated that infants’ auditory memory(specifically, listening and repetition ability), the amount of expressive vocabulary at 18 months, adaptability, mothers’ linguistic inputs, monthly family income, and the amount of monthly book expense,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expressive vocabulary at 24 months of infant age in that order and together explained 55% of the variance of infants’ expressive vocabulary. The implications on development of language program for young children were discussed.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의 부정적 기질 특성이 초기 학교적응과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 간 관계를 조절하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초등학교 1, 2학년 아동의 어머니와 아동의 각 담임교사 204쌍들이다.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어머니 보고로 측정했으며, 학교적응은 아동의 각 담임교사의 보고를 통해 측정하였다. 어머니 보고와 교사 보고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학업 수행적응에서 아동의 부정적 기질 특성과 긍정적 양육태도가 상호작용효과를 보인 반면, 학교생활적응, 또래적응 및 교사적응에서는 상호작용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학교적응의 4개의 하위영역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학교생활적응, 학업수행적응, 또래적응 그리고 교사적응 영역에서 매우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이 초등 1, 2학년 아동의 학교적응 전반적인 영역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과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학교적응을 더 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부정적인 반응성이 높은 까다로운 기질 특성의 아동들이 그러하지 않은 아동들보다 어머니로부터 긍정적인 양육을 받았을 때 학업을 더 잘 수행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제안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role of children’s negative temperament characteristic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arly school adjustment and mothers’ parenting attitudes. The participants were 124 pairs of mothers and classroom teachers of children. Children’s temperaments and mothers’ parenting attitudes were measured using mothers’ reports and school adjustment was measured via reports of each child’s school teachers. Correlation and hierarchial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based on the reports by the parents and teachers, The findings showed that in terms of academic performance adjustment specifically, there was an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children’s negative temperament characteristics and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On the other hand, there were no indications of interaction effects within the domains of school life adjustment, peer adjustment, and teacher adjustment. Additionally, girls displayed a higher level of school adjustment and its four subcategories compared to boys. Also, the mothers‘ positive parenting attitude significantly predicted school life adjustment, academic performance adjustment, peer adjustment, and teacher adjustment. The results from the current study demonstrated that mothers’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positively affected children’s overall school adjustment and that girls appeared to be better adjusted in the first and second grades of elementary school than boys. Most importantly, children with high negative reactivity are able to perform better academically than the children with low negativity reactivity when they receive positive parenting from their moth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