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access
메뉴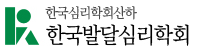
open access
메뉴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1권 2호에 게재된 송윤지와 김소연의 논문(시간 정보 처리 기능이 아동의 문법 발달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을 대상으로)에 오류가 있기에 다음과 같이 바로 잡습니다. 156쪽 표 3의 TWM 정확도 행의 수치들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또래 상호 작용이 공격 및 이타적 행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의 성과 교사와의 관계가 어떠한 조절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미국 중부지역 초등학교 5-6학년, 48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사 보고를 통해 청소년의 공격 및 이타적 행동을, 또래 보고를 통해 청소년의 친구 관계 네트워크를, 자기 보고를 통해 청소년의 교사와의 관계를, 학기 초와 학기 말에 걸쳐 측정하였다. 종단적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청소년은 이타적 행동과 공격 행동의 정도가 비슷한 또래를 친구로 선택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친구의 이타적 행동과 공격 행동을 적극적으로 사회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친구 선택 및 친구 사회화 과정에 청소년의 성과 교사와의 관계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이타적 행동이 낮고 공격성이 높은 또래를 친구로 선호하고, 학기가 진행됨에 따라 친구의 공격성을 적극적으로 사회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청소년일수록 공격성이 낮고 이타적 행동이 높은 또래를 친구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공격 행동과 이타적 행동 발달을 살펴보는데 있어 청소년의 개인 및 사회적 변인이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The current study examined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and aggressive behaviors in youth as related to the selection and influence of friends, and the potential moderating role of gender and relationship with their teacher in these processes. Participants were fifth and sixth graders from 48 classrooms and were followed from the start to the end of the semester in the Mid-West of the U.S. Across the school year, there was a tendency for youth to select peers who were similar to themselves as friends and to be influenced by their friends in regard to both aggressive and prosocial behaviors. However, friend selection and influence processes were moderated by youth’s gender and relationship with their teacher. Boys were more attracted to aggressive peers and less attracted to prosocial peers as friends, and were more influenced than girls by their friends' aggressive behavior over time. Further, when youth had a more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ir teacher, they were more likely to select peers who were highly prosocial and less aggressive as friends. Overall, results indicate that youth’s gender and relationship with their teacher play an important role in friendship dynamics and social behavior development.
본 연구는 청소년의 또래 상호 작용이 공격 및 이타적 행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의 성과 교사와의 관계가 어떠한 조절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미국 중부지역 초등학교 5-6학년, 48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사 보고를 통해 청소년의 공격 및 이타적 행동을, 또래 보고를 통해 청소년의 친구 관계 네트워크를, 자기 보고를 통해 청소년의 교사와의 관계를, 학기 초와 학기 말에 걸쳐 측정하였다. 종단적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청소년은 이타적 행동과 공격 행동의 정도가 비슷한 또래를 친구로 선택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친구의 이타적 행동과 공격 행동을 적극적으로 사회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친구 선택 및 친구 사회화 과정에 청소년의 성과 교사와의 관계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이타적 행동이 낮고 공격성이 높은 또래를 친구로 선호하고, 학기가 진행됨에 따라 친구의 공격성을 적극적으로 사회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청소년일수록 공격성이 낮고 이타적 행동이 높은 또래를 친구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공격행동과 이타적 행동 발달을 살펴보는데 있어 청소년의 개인 및 사회적 변인이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The current study examined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and aggressive behaviors in youth as related to the selection and influence of friends, and the potential moderating role of gender and relationship with their teacher in these processes. Participants were fifth and sixth graders from 48 classrooms and were followed from the start to the end of the semester in the Mid-West of the U.S. Across the school year, there was a tendency for youth to select peers who were similar to themselves as friends and to be influenced by their friends in regard to both aggressive and prosocial behaviors. However, friend selection and influence processes were moderated by youth's gender and relationship with their teacher. Boys were more attracted to aggressive peers and less attracted to prosocial peers as friends, and were more influenced than girls by their friends' aggressive behavior over time. Further, when youth had a more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ir teacher, they were more likely to select peers who were highly prosocial and less aggressive as friends. Overall, results indicate that youth's gender and relationship with their teacher play an important role in friendship dynamics and social behavior development.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들의 학습무동기의 영역 별 관련변인들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광주, 전남 소재 중학교 2학년 3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부모의 비지지적 양육태도, 교사의 통제적 수업태도, 학습사가 자율성, 유능감을 매개하여 학습무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모델을 설정하고 경로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경로계수의 상대적 효과는 대응별 모수비교를 통해 분석하였고 매개효과는 부트스트래핑 기법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학습무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각 하위영역 즉 능력부족, 가치부족, 흥미부족, 노력부족으로 구별하여 분석하였다. 총효과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능력부족에는 학습사, 유능감, 부모 방임의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부족에는 교사의 통제적 태도, 부모 방임, 유능감과 자율성의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흥미부족에는 교사의 통제적 태도, 부모의 과잉통제와 유능감의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노력부족에는 학습사, 부모 방임, 유능감, 자율성과 교사의 통제적 태도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전체적으로 유능감, 자율성, 학습사는 학습무동기에 부적 영향을 미친 반면에 부모의 방임, 과잉통제, 교사의 통제적 태도는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율성과 유능감을 매개로 학습무동기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부모의 방임과 학습사에서만 유의하였는데, 이 또한 학습무동기 하위영역 별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학습무동기의 다차원적 모델을 확인하고 활용가능성을 탐색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predict students’ learning amotivation with the following predictors: parental attitudes, teachers’ attitudes, and previous academic achievement. Learning amotivation had four dimensions: task characteristics, lack of task value, absence of belief in personal abilities, and absence of belief in personal effort. The data analysis incorporated the students’ perceived competence and perceived autonomy as mediating variables. To ascertain the associations within and between the variables, path analysis was applied to questionnaire data on 331 middle school students. The results found complex interrelationships: Previous academic achievement, perceived competence, and parental neglect predicted absence of belief in personal abilities; teachers’ attitudes, parental neglect, and perceived competence predicted lack of task value. Teachers’ attitudes, parental over-control, and perceived competence significantly influenced task characteristics. Previous academic achievement, parental neglect, perceived competence, perceived autonomy, and teachers’ attitudes predicted absence of belief in personal effort. Perceived competence and perceived autonomy differently mediated the effects of parental neglect and previous academic achievement on learning amotivation depending on its dimensions. In sum, the results confirmed that learning amotivation is a multidimensional construct.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우울 만성도가 어머니의 온정적, 통제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때, 자료분석에 아동의 내적 요인인 부정적 정서성을 포함하여 아동의 기질이 아동의 적응과 어머니 요인에 미치는 효과를 통제하였다. 육아정책연구소(KICCE)의 한국아동패널연구(PSKC) 1차년도(아동 0세)에서 8차년도(아동 7세) 조사에 참여한 어머니와 아동(N=2150, 여아 50%)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어머니의 우울(아동 연령 0-5세, K6), 양육행동(6세, 양육행동 척도), 아동의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7세, CBCL)는 모두 어머니가 보고하였다. 매개모형을 검증한 결과, 어머니의 우울 만성도와 아동의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행동의 관계를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의하게 매개하였다. 즉, 어머니의 우울이 오래 지속될수록 온정적 양육행동이 낮아졌고, 이는 아동의 높은 외현화 및 내재화 증상에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이론적, 실용적 함의와 제한점 및 미래 방향을 논의하였다.
This study investigated maternal warmth and controlling behavior as mediators of the relationship of chronic maternal depression to child behavioral problems. The model included a measure of child negative emotionality to control for its effects on child adjustment and maternal factors. Using data from th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KICC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PSKC), 2,150 mothers and their children(50% female) were analyzed. Mothers self-rated their extents of depression (child age zero to five years), positive parenting (age six years), and child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s (age seven years). The results found that mother’s chronic depression predicted their children’s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behaviroal problems, which was mediated by maternal warmth, but not by controlling behavior. That is, longer-lasting depressive symptoms predicted child’s behavior in the transition to school age through less warm parenting. The findings elucidated a developmental pathway to child maladaptation during the early school ages which suggests a promising target for early prevention.
본 연구는 사회적 거절 경험이 새로운 타인과의 연결성 회복 의향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애착 안정성 점화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 거절로 인한 고통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18-25세 여대생 9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2(애착 안정성 점화 유/무) × 2(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높음/낮음) 피험자 간 설계로, 실험 전에 온라인 설문을 통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구분하였다. 실험 참여자 모두에게 사회적 거절 유발 절차를 실시하였고, 이후 애착 안정성 점화 글쓰기 과제를 통해 애착 안정감을 조작하였다. 마지막으로 추후 협동과제에 대한 참여 선호도로 새로운 타인과의 연결성 회복 의향을 측정하였다. 분산분석 결과, 새로운 타인과의 연결성 회복 의향에 대한 애착 안정성 점화의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애착 안정성 점화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수준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 애착 안정성 점화 글쓰기를 수행한 집단은 통제 글쓰기를 수행한 집단에 비해 새로운 타인과의 연결성 회복 의향을 더 많이 보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주요 발견의 시사점과 사회적 거절을 경험한 개인들이 새로운 유대관계를 구축해나가는 데 있어 필요한 개입 방안을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ecurity priming and fear of negative evaluation on the process of social rejection leading to the desire to reconnect. A sample of 90 female university students aged 18 to 25 years participated in the experiment. The analysis used a 2 (security priming writing/control) × 2 (fear of negative evaluation: high/low) ANOVA test. Before the experiment, the subjects were tested by an online survey that categorized them as the low or high fear of negative evaluation. The social rejection procedure and security priming writing task were used to manipulate social rejection and felt-security, respectively. The desire to reconnect was measured by a scored task in which the subjects selected their extents of preference for future collaborative tasks. The results found a significant main effect of security priming writing and a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between security priming and the extent of fear of negative evaluation on the desire to reconnect. Based on these results, the paper discusses the effectiveness of security priming for establishing new social ties after social rejection.
많은 시간관련 단어가 공간정보 개념을 차용하는 것에서 보듯이, 일상생활에서 시간과 공간정보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연구들은 시간에 대한 내적표상이 공간정보에 기반하고 있다는 행동 및 신경학적 증거들을 보여준다. 그러나 내적 시간표상의 구체적인 형태에 대해서는 아직도 활발히 논쟁 중이며, 그 발달 양상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더욱 부족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수평선으로 제시된 구체적인 시간선(time line)을 사용하여 6~8세, 9~11세, 그리고 성인의 시간정보 처리의 특징을 비교하였다. 특히, 수평선위에 경험한 시간을 직접적으로 맵핑하게 한 후, 로그-선형 융합 모형(Cicchini et al., 2014)에 기반하여 시-공간정보 연합의 형태가 선형적/비선형적인지를 검증하였다. 전체 연령집단에 걸쳐 로그형태로 축약된 시간표상이 관찰되었으나, 시간관련 단어 습득의 시기와 동일한 8~9세 사이에 연령관련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6~8세 아동의 경우, 성인집단은 물론 9~11세 아동집단보다 현저히 로그형태로 왜곡된 시간지각을 보이는 반면, 성인집단과 9~11세 아동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내적인 시간정보 표상이 동물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로그적으로 축약된 형태의 공간표상에 의존하고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Time and space are intimately related in real life, as can be seen from the nearly universal use of spatial concepts in time words across cultures. However, whether the form of spatiotemporal representations relies on the linear or on the logarithmic scale is still under debate. In addition, there is a lack of research investigating the development of spatiotemporal representations. Here, we examined the form of spatiotemporal representations across 6-8-year-olds, 9-11-year-olds, and adults using a novel timeline estimation paradigm. We asked participants to view a three-minute-long video clip and mark the temporal distance of a specific scene of the video on a horizontal timeline. We found non-linearity between their estimates and stimulus temporal distances, which decreased as the participants’ ages increased. Six-to-eight-year-old children showed the greatest non-linearity compared to other age groups,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magnitude of non-linearity in estimation between 9-11-year-olds and adults. These results imply that humans might have a logarithmically compressed spatial representation of time across age groups.
본 연구는 성 유형화된 놀이에서 일어나는 또래배제에 대한 유아들의 도덕 판단(허용성 판단, 성 고정관념적 선택, 심각성 판단)과 정당화를 알아보고, 유아의 성과 마음이론 그리고 또래배제가 일어나는 맥락의 복잡성에 따라 그러한 판단과 정당화가 달라지는지 알아보았다. 서울 및 경기 지역 소재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5-6세 유아 106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 분석을 위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유아들은 다면적 맥락보다는 단순한 맥락에서의 또래배제를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여아보다는 남아가 성 고정관념적 선택을 더 많이 하였다. 그러나 허용성 판단에서는 변인들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남아보다는 여아, 마음이론 수준이 낮은 유아보다는 높은 유아, 그리고 다면적 맥락에서보다는 단순 맥락에서 도덕적 정당화 사용 횟수가 높았다. 그러나 사회-관습적 정당화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만 5-6세 유아들도 사회적 사건에 대한 도덕 판단을 할 때 상황적 요소를 고려할 수 있고, 또래배제에 대한 유아의 도덕 판단 및 정당화에 유아의 성별, 마음이론과 같은 특성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혔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hildren’s moral judgments and justifications about peer exclusion in gender-typed play, and to examine whether they differed by gender, Theory of Mind (ToM), and with respect to context and types of play. A sample of 106 children (five to six years old)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results found that children assessed peer exclusion more negatively in baseline context than in multifaceted context, and boys were more likely than girls to choose playmates that fit gender stereotypes. Analyses of justifications found that girls and children with high ToM used moral justifications more often than their counterparts. Moral justifications were more often used in baseline context.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field of moral development in that children as young as five to six years old considered situational factors to make moral judgments. Furthermore, children's gender and ToM influenced their moral judgments and justifications.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를 역기능적 신념과 불안통제감이 매개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성인진입기에 해당하는 만 18세에서 25세 대학생 456명(남: 207명, 여: 249명)의 설문자료를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신념의 단순매개효과가 나타났으나, 불안통제감의 단순매개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아울러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에서 역기능적 신념과 불안통제감을 순차적으로 거쳐 사회불안에 미치는 이중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 사회불안에 여전히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이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고, 역기능적 신념과 불안통제감이라는 인지적 요인들이 이러한 관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지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대학생 개인에 대한 개입 뿐 아니라, 자녀의 심리사회적 건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과보호적 양육을 고려한 개입의 중요성을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est the dual mediating effects of dysfunctional beliefs and anxiety control on the relationship of maternal overprotection to social anxiety. The data comprised survey results on 456 undergraduate students aged 18 to 25 years old. The result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SEM) analysis indicated that only dysfunctional beliefs mediated the relationship of maternal overprotection to social anxiety. The dual mediating effects of dysfunctional beliefs and anxiety control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the relationship of maternal overprotection to social anxiety. Based on this finding, the paper discusses factors asscoiated with worsening social anxiety and effective intervention strategies for undergraduate students.
이 연구는 초기 청소년기 또래거부의 사회화 과정(또래선택과 또래영향)을 살펴보고,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또래거부의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 경기 지역 초등학교 총 43학급 1,131명의 5-6학년 학생(여학생 48%)을 대상으로, 1학기와 2학기 총 2회에 걸쳐 또래지명방식으로 청소년의 또래거부와 친구네트워크를 측정하였다. 종단 사회연결망 분석(RSiena) 결과, 초기 청소년기 학생들은 또래거부 수준이 비슷한 또래를 친구로 선택하고, 청소년의 또래거부 수준은 친구의 또래거부 수준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과 교사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또래거부의 수준이 낮아지는 반면, 학생과 교사의 부정적인 관계는 또래거부의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친구네트워크가 또래거부의 사회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초기 청소년기 학생의 또래거부의 영향요인으로서 교사-학생 관계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In the current study, we examined early adolescents’ friendship selection and social influence with regard to peer rejection and the role of teacher-student relationship among fifth and sixth graders. Participants (N=1131, 48% girls at wave 1 and 2) were followed from spring to fall within one academic year. With longitudinal social network analysis (RSiena), we found that early adolescents tended to select friends with similar levels of peer rejection in the classroom, and their friends influenced one another in their own peer rejection over time. Further, relationship with the teacher had a significant effect on youth’s own level of peer rejection. When youth had a supportive relationship with the teacher, they were less likely to be rejected by their peers. When youth had conflicts with the teacher, they were more likely to be rejected by their peers. The results suggest that peer processes of selection and influence play a role in the development of early adolescents’ peer rejection, and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the teacher-student relationship in youth’s peer dynamics of rejection.
인간의 상호작용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현상 중 하나는 내집단을 외집단보다 선호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내집단 선호 현상에 대한 발달적 근원은 무엇일까? 여러 관점 중에서도 최근 대두되고 있는 진화적 관점에서는 인간의 내집단 선호는 생애 초기 나타나는 몇 가지 추상적인 사회 도덕적 원리 중 내집단 원리를 반영한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내집단 선호의 발달 기제에 대한 기존 관점을 요약하고 이 중 진화적 관점을 지지하는 영아의 내집단 원리의 민감성을 밝힌 최근 주요 연구를 개관하였다. 마지막으로 추후 연구 방향을 제안하였다.
One pervasive facet of human interactions is the tendency to favor ingroups over outgroups. What are the developmental origins of ingroup favoritism? Among several accounts proposed to answer this question, an evolutionary perspective holds that ingroup favoritism reflects in part an abstract and early-emerging sociomoral expectation of ingroup support. This paper reviews the key findings supporting this view and suggests future dire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