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access
메뉴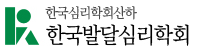
open access
메뉴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냉담-무정서 특질(Callous-unemotional trait, CU)과 탈억제 기질이 이후 아동의 품행문제를 예측하는 데 있어 부부갈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대상은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연구(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의 2차, 5차 및 8차년도에 응답한 174가구였다. 부모가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하여 아동의 CU특질(아동 연령 4세), 탈억제 기질(14개월), 품행문제(7세), 부부갈등(14개월, 4세)에 대해 응답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품행문제에 대한 CU특질과 부부갈등의 주효과가 유의하였으며, CU특질과 부부갈등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CU특질 수준이 높을수록 품행문제 수준이 높으며, 이러한 관계는 부부갈등 수준이 높을 때에만 나타났다. 한편 품행문제에 대한 탈억제의 주효과 및 부부갈등과의 상호작용 효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는 품행문제의 발달경로를 이해하고 개입하는 데에 개인 내, 외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중요성을 시사한다.
The present study examines marital conflict as a moderator of relationships between early early child callous-unemotional (CU) traits, disinhibition temperaments, and conduct problems at the transition-to-school-age. Data from waves 2, 5, and 8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of th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ICCE) were analyzed. Parents provided ratings of a child’s CU at four years of age, disinhibition at 14 months, marital conflict at 14 months and four years, and child conduct problems at seven years. The result of hierarchical regression showed that CU and marital conflict had significant main effects on future conduct problems. In addition, interaction effects between CU and marital conflict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such that the associations between CU and conduct problems were larger for children whose parents reported high levels of marital conflict. On the other hand, main effects of disinhibition and interaction effect between disinhibition and marital conflict on conduct problems were not significant. Results are discussed with respect to both individual and contextual factors in developmental pathways to conduct problems.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갈등지각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경로에서 거부․제재 양육지각, 아동의 반추 및 사회불안과 어떤 직․간접적인 연계성을 보이는 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 아동 290명과 아동의 담임교사들이다. 부모갈등 및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 반추적 반응과 사회불안은 아동 보고로 측정하였고, 학교적응은 아동의 각 담임교사들의 보고로 측정하였다. 변인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갈등 지각은 반추적 반응 및 사회불안과 매우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학교적응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거부․제재 양육지각은 갈등지각, 반추, 그리고 사회불안 매우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그리고 학교적응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각 변인들이 학교적응에 주는 직․간접적 연계성을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으로 검증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갈등지각은 거부․제재 양육지각, 반추적 반응, 그리고 사회불안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거부․제재 양육지각은 학교적응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주었다. 반추는 사회불안에 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사회불안은 학교적응에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갈등은 거부․제재 양육, 반추적 사고 및 사회불안을 매개로 하여 학교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으며, 거부․제재 양육은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반추적 반응은 사회불안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이 제안되었다.
The present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children's perception of parental conflict and parenting style, their rumination, social anxiety and school adjustment. A total of 280 children (4th year) and 10 homeroom teachers participated. Each child completed questionnaires on perception of parental conflict, perception of parenting style, rumination, and social anxiety. Children's school adjustment was measured by their homeroom teachers' reports. The results showed that perception of parental conflict was highly correlated with rumination and social anxiety, and negatively correlated with school adjustment. In addition, parenting style high in rejection and control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perception of parental conflict. Rumination has a positive correlation with social anxiety an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school adjustment. The results of path analysis revealed that children's perception of parental conflict influenced their school adjustment and was mediated by parenting style high in rejection and control, rumination and social anxiety. In addition, our results showed that parenting style high in rejection and control directly influenced school adjustment, and children's rumination influenced school adjustment, mediated by their social anxiety.
정보 제공자가 이전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는지의 여부는 그 사람이 주는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가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했거나, 또래 보다 더 정확하다는 정황이 분명하지 않을 때, 그리고 교사가 일반 성인과 비교될 때 유아들의 선택적 신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교사가 이전에 부정확하고 또래 유아가 정확했던 조건에서 만 4, 5세 유아들은 장난감에 대해서는 또래 유아가 주는 정보를 더 신뢰하였으나, 물건에 대해서는 또래 유아를 선뜻 더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건에서 만 3세 유아들은 사물의 종류에 상관없이 우연 수준으로 또래 유아를 신뢰하는 경향을 보였다. 흥미롭게도, 교사가 부정확했고 또래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알 수 없거나, 또래 유아가 정확했고 교사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모호한 상황들에서 모든 연령의 유아들은 사물의 종류와 상관없이 선뜻 또래 유아를 더 신뢰하지 않았다. 4, 5세 유아들이 일반 성인보다 교사를 더 신뢰할 수 있다는 결과와 함께, 사회 규범이나 연장자, 교사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중요시하는 문화가 유아들의 교사에 대한 신뢰에 줄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 논의한다.
An informant's previous accuracy is an important aspect to judge credibility of his information. The current study examined whether young children trust a teacher or a peer when the teacher was inaccurate or when it is uncertain if the teacher is more accurate than the peer. Four- and five-year-olds trusted the peer's labeling of a toy, but not labeling of an object when the teacher was previously inaccurate and the peer was accurate. In this situation, three-year-olds' trust in the peer was at chance level no matter whether the labeling was about toys or usual objects. Interestingly, when the teacher was inaccurate and the peer's accuracy was uncertain, and when the peer was accurate and the teacher's accuracy was uncertain, children in all age groups did not readily trust the peer's labeling regardless of the kind of objects. Alongside the result that four- and five-year-olds might trust a teacher more than a usual adult, cultural emphasis on harmony with social norms, the elderly, and teachers and its possible influence on young children's trust in teachers will be discussed.
이 연구는 국내 비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함께 나타나기 쉬운 신체, 심리 증상인 우울-통증-피로 증상 클러스터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를 설명하는 관계변인으로 가족관계의 질 그리고 개인변인으로 외로움의 역할을 검증하고자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성인기 초기 257명의 비임상 일반인 집단을 대상으로 부모자녀관계 질, 형제관계 질, 외로움, 우울, 통증, 피로증상에 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비임상 일반인 집단에서도 증상 클러스터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관 분석과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구조방정식을 통해 부모자녀관계 및 형제관계와 증상 클러스터와의 부적관계에서 외로움이 매개효과를 갖는지 검증하였다. 그 결과 비임상 일반인 집단에서도 우울, 통증, 피로 증상 클러스터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로움이 부모자녀관계 질과 증상 클러스터의 부적 관계를 부분매개하고, 형제관계 질과 증상 클러스터와의 부적 관계를 완전매개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신적, 신체적 임상 질환을 나타내지 않는 개인도 하나의 심리, 신체 증상을 경험할 때 다른 공존 증상을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 클러스터를 경험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 연구는 증상 클러스터에 대한 통합적인 개입을 제안하고, 이를 설명하는 관계변인으로 부모자녀관계 질 형제관계 질을 확인하고, 개인변인인 외로움의 심리적 역할에 대해 밝힌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ascertain the depression-pain-fatigue symptom cluster in a nonclinical sample in Korea and investigates how family relationships and loneliness might explain the symptom cluster. We recruited 257 young adults, and surveyed the quality of parental and sibling relationships, loneliness and depression, pain and fatigue symptoms. In order to ascertain the symptom cluster among the nonclinical sample, we performed correlational tests and principle component analyses. We also tested loneliness as a mediator between parental and sibling relationships and the symptom cluster. The results confirmed the existence of the symptom cluster in this sample. Furthermore, loneliness fully mediated the link between parental relationship and the symptom cluster, and partially mediated the link between sibling relationship and the symptom cluster. These results suggest that nonclinical samples also experience the symptom cluster and require more comprehensive intervention to treat psychological and physical symptoms. Implications for considering both parental and sibling relationships and loneliness to explain symptom clusters were found.
이 연구는 국내 비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함께 나타나기 쉬운 신체, 심리 증상인 우울-통증-피로 증상 클러스터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를 설명하는 관계변인으로 가족관계의 질 그리고 개인변인으로 외로움의 역할을 검증하고자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성인기 초기 257명의 비임상 일반인 집단을 대상으로 부모자녀관계 질, 형제관계 질, 외로움, 우울, 통증, 피로증상에 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비임상 일반인 집단에서도 증상 클러스터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관 분석과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구조방정식을 통해 부모자녀관계 및 형제관계와 증상 클러스터와의 부적관계에서 외로움이 매개효과를 갖는지 검증하였다. 그 결과 비임상 일반인 집단에서도 우울, 통증, 피로 증상 클러스터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로움이 부모자녀관계 질과 증상 클러스터의 부적 관계를 부분매개하고, 형제관계 질과 증상 클러스터와의 부적 관계를 완전매개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신적, 신체적 임상 질환을 나타내지 않는 개인도 하나의 심리, 신체 증상을 경험할 때 다른 공존 증상을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 클러스터를 경험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 연구는 증상 클러스터에 대한 통합적인 개입을 제안하고, 이를 설명하는 관계변인으로 부모자녀관계 질 형제관계 질을 확인하고, 개인변인인 외로움의 심리적 역할에 대해 밝힌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ascertain the depression-pain-fatigue symptom cluster in a nonclinical sample in Korea and investigates how family relationships and loneliness might explain the symptom cluster. We recruited 257 young adults, and surveyed the quality of parental and sibling relationships, loneliness and depression, pain and fatigue symptoms. In order to ascertain the symptom cluster among the nonclinical sample, we performed correlational tests and principle component analyses. We also tested loneliness as a mediator between parental and sibling relationships and the symptom cluster. The results confirmed the existence of the symptom cluster in this sample. Furthermore, loneliness fully mediated the link between parental relationship and the symptom cluster, and partially mediated the link between sibling relationship and the symptom cluster. These results suggest that nonclinical samples also experience the symptom cluster and require more comprehensive intervention to treat psychological and physical symptoms. Implications for considering both parental and sibling relationships and loneliness to explain symptom clusters were found.
틀린 믿음 과제로 측정하는 마음이론의 기본적 능력은 대체로 문화 보편적으로 4-5세경에 발달한다고 보고되었고, 이러한 결과는 한국에서도 유사하게 보고되어왔다. 이에 비해 보다 고차원적인 마음이론 능력의 발달 양상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상위 마음이론 능력을 검토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이차순위 마음이론과 해석적 마음이론의 발달을 한국의 만 6세 아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 두 능력이 정보의 출처에 따른 확실성을 판단하는 증거성 추론 능력과도 관련성을 보이는지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이차순위 틀린 믿음 과제에 대해서는 우연 수준보다 낮은 수행을 보여, 이 시기 한국 아동들이 이차순위 마음이론 이해에는 어려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석적 마음이론 과제의 경우 이에 대한 이해 및 판단은 가능하지만, 자신의 판단에 대한 이유를 적절히 설명하는 것에는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해석적 마음이론 능력이 완전한 수준은 아니지만, 일부 발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이차순위 마음이론, 해석적 마음이론과 증거성 추론 능력 간의 상관 분석 결과, 증거성 추론 능력이 이차순위 마음이론 능력, 해석적 마음이론 능력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한국 만 6세 아동들의 경우 이차순위 마음이론 발달에 앞서 해석적 마음이론 능력이 일부 발달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위 마음이론 능력의 발달이 증거성 추론 능력 발달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도 보인다.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development of second-order theory of mind and interpretive theory of mind in Korean 6-year-olds and also examined whether these two abilities are related to evidential reasoning abilities. The results showed that, overall, Korean 6-year-olds performed lower than chance level on the second-order false-belief task, suggesting it is still developing at this age. In the interpretive theory of mind task, performance was relatively good, although children still had difficulty explicitly explaining their reasons behind their choices.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second-order theory of mind scores showed a positive association with the differences in evidential reasoning abilities. Individual differences in interpretive theory of mind abilities also showed a positive associa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skills that require representing and computing diverse and complex mental states develop in parallel, or perhaps the second-order theory of mind and interpretive theory of mind abilities might underlie the development of the abilities to reason about the certainty of information obtained and reported from different sources.
사회정서적 선택 이론은 노인의 인지 과정의 긍정성 효과가 정서 조절을 위한 목표 지향적 인지 처리에서 나타나는 것이라 제안한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정서적 선택 이론의 관점에서 노인의 정서 정보에 대한 선택적 주의와 기억 인출의 긍정성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목표 지향적 인지 처리는 주의 통제를 필요로 하므로, 대학생 집단(19-26세; 75명)과 노인 집단(65-84세; 120명)을 대상으로 정보 처리의 주의 과정에서 정보 유형(정서, 비정서)에 따른 선택적 주의와 정보의 정서가(긍정, 부정)에 따른 주의 편향을 검증하였다. 기억 인출에서는 정보 정서가에 따른 재인 편향에서의 연령차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노인은 주의 과정에서 비정서 단어보다 정서 단어에 대해 선택적 주의를 더 잘 기울였으나, 긍정 정서 단어에 대한 주의 편향을 보이지 않았다. 기억 인출에서, 노인은 부정 정서 단어에 비해 긍정 정서 단어를 더 많이 재인하여 긍정성 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 결과는 노인의 인지 과정의 긍정성 효과가 노년의 적응적인 정서 조절 과정에 기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 maintains that an age-related positivity effect in cognitive processes such as attention and memory may reflect efforts at emotion regulation in older adults. Based on this, the study examines age differences in selective attention to emotional information and positivity effect in memory retrieval. Compared to the younger age group (aged 19-26 years), older adults (aged 65-84 years) showed relatively high levels of selective attention to emotional words than non-emotional ones, though not showing positive bias, and also recognized the positively valenced words more than the negatively valenced on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an age-related positivity effect in cognitive processes may reflect the process of emotion regulation that contributes to positive affective experiences and sense of well-being in older adults.
이 연구는 초기 성인기 여성을 대상으로 외로움과 통제감, 폭식행동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외로움, 통제감 그리고 폭식행동은 연구기간인 2년 동안 안정적으로 지속되며 서로를 양방향으로 예측할 것이라 가정하였다. 이때 외로움의 증가는 통제감의 감소를 통해 폭식행동의 증가를 예측할 것이라 가정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해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대학에서 18-31세 초기 성인기 여성 570명을 대상으로 6개월을 주기로 2년 동안 4회 설문을 실시하고,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을 통해 종단적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외로움, 통제감, 폭식행동은 2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외로움과 폭식행동은 서로 예측하지 않았으며, 외로움과 통제감은 서로 부적으로 예측하였고 통제감은 폭식행동을 예측하였으나 폭식행동은 통제감을 예측하지 않는 일방향적 관계가 검증되었다. 외로움이 통제감을 매개로 폭식행동을 예측하는 종단적 매개효과는 검증되었으나 폭식행동이 통제감을 매개로 외로움을 예측하는 종단적 매개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이 연구의 결과가 갖는 학문적 의의와 상담 장면에서의 함의를 논의에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a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loneliness, sense of control, and binge eating symptoms. We hypothesize that loneliness, sense of control, and binge eating symptoms would remain stable and reciprocally related over two years. We expected that decrease in sense of control would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increase in loneliness and binge eating symptoms. We employed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with 570 young adult Korean women aged 18-31 who completed surveys four times over two years. We found that loneliness, sense of control, and binge eating symptoms were stable over time. We also found that loneliness and sense of control negatively predicted each other, and sense of control negatively predicted binge eating over time. Although the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loneliness and binge eating was not significant, this relationship was mediated by sense of control over time. Theoretical and clinical implications of the study and limitations were discussed.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피해자 정의민감성, 적대적 귀인편향,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를 확인하고, 이 변인들의 관계가 의도적 통제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중학생 1-3학년 420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고,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과 의도적 통제 수준(상·하위 30%)에 따른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전체 집단에서 적대적 귀인편향은 피해자 정의민감성과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를 부분매개하였다. 한편, 의도적 통제 수준이 낮은 경우 적대적 귀인편향은 반응적 공격성을 예측하지 않았으며, 적대적 귀인편향의 매개효과는 의도적 통제 수준이 높을 때에만 유의하였다. 의도적 통제가 강한 것은 피해자 정의민감성과 적대적 귀인편향, 피해자 정의민감성과 반응적 공격성 간의 정적 관계를 유의하게 약화시켰다. 본 연구는 반응적 공격성을 설명할 때 피해자 정의민감성이라는 변인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하였으며, 피해자 정의민감성으로 인한 적대적 귀인편향과 반응적 공격성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 통제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among victim justice sensitivity (VJS), hostile attribution bias (HAB) and reactive aggression (RA) of middle-school students. Specifically, we investigated how the relationships of these variables varied according to the level of effortful control (EC). Self-reported data of 420 middle -school students were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Results indicated that HAB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VJS and RA in the total sample. Multigroup analysis was also conducted based on the level of EC (top/bottom 30%). Results indicated that HAB did not predict RA at low EC, while the mediation effect of HAB was only significant at high EC. A stronger EC significantly weakened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VJS and HAB, and between VJS and RA. This study supported the importance of considering VJS in explaining RA and demonstrated the need to enhance EC to reduce HAB and RA resulting from VJS.
본 연구는 중년 성인이 지각한 대학생 자녀의 의미의 양면성을 확인하고, 자녀의 의미가 부모-자녀관계의 질을 매개로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 1에서 210명 대상으로 예비 연구에서 선정한 문항과 자녀 가치 척도 문항을 추가해 설문조사 후 탐색적 요인 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1의 결과, 자녀 의미는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의 상위 2요인으로, 긍정적 의미는 사랑의 대상, 돌봄의 대상, 밀착의 대상의 하위 3개 요인으로, 부정적 의미는 부담의 대상과 제약의 대상의 하위 2개 요인으로 나타났다. 연구 2에서 216명을 대상으로 자녀의 의미가 행복에 미치는 과정에서 부모 자녀 관계의 질의 매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 2의 결과, 어머니들이 아버지에 비해 자녀의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 모두 높았다. 그리고 자녀의 긍정적 의미는 긍정적 관계의 질을 높이고 이를 통해 행복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나타났다. 반면 자녀의 부정적 의미는 직접적으로 행복을 낮추면서도, 긍정적 관계의 질을 낮추고 부정적 관계의 질을 높이는 과정을 매개로도 행복을 낮추어 자녀 의미의 양면성이 행복에 각기 다른 과정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ffect of ambivalence of meaning of children on quality of relationships and happiness in middle aged parent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ere examined by study 1 in 210 participants to identify contents and structure of meanings of children. The results showed that positive meanings of children were included of 3 subfactors as ‘love’, ‘supporting’ and ‘attached’, And negative meanings of children were constructed by 2 subfactors, ‘burdened’ and ‘restrictive’. And study 2 was to identify the impact of positive and negative meanings on quality of relationship and happiness in 216 parents. The result showed that mothers reported more higher positive and negative meanings than fathers. Also positive meanings enhanced their care, respect and consideration on their children and it also improved happiness of the parents. However, negative meanings were linked to increased positive quality of relationships and reduced conflict with children, while also enhancing happiness.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성인 남녀의 삶의 의미추구가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생성감, 의미발견, 영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이 경로에서 나타나는 남녀 성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대구 경북의 40세에서 65세 중년기 남녀 성인 391명(여자 256명, 남자 156명)을 대상으로 삶의 의미, 생성감, 주관적 안녕, 영성의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구조모형을 통하여 각 변인간의 관계를 검증한 뒤 중년기 남성과 여성 집단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중년기 남녀 집단의 의미발견은 의미추구와 주관적 안녕의 관계를 완전매개하였다. 중년기의 생성감과 영성은 의미추구가 주관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의미발견과 함께 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즉 중년기 성인이 의미추구를 할 때 생성감, 의미발견, 영성을 거쳐 주관적 안녕감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이러한 매개효과 모형에서 남성과 여성은 집단간 차이를 나타내었다. 남성의 경우 영성은 의미발견과 주관적 안녕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하였으며 영성이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강력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중년기 삶의 의미가 주관적 안녕에 이르는 경로와 함께 남녀 성차를 밝히는 데 기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요 시사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점을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gender differences and the mediating effect of generativity, meaning presence and spirituality between search for meaning in life and subjective well-being. A total of 391 middle-aged adults(156 males and 235 females) participated in the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used to test the relationship between each factors and to analyze the difference between males and females. As the result of this research, we found the fully-mediated effect of the presence of meaning in the relationship of the search for meaning and subjective well-being. Generativity mediated the effect of search for meaning on meaning presence, while meaning presence mediated both the relationship between search for meaning and spiritualit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tivity and subjective well-being. The effect of spirituality on subjective well-being for male participants was stronger than that of female participants. Limitations of the current study and implications for future study were discussed.
본 연구는 어머니와 교사의 정서표현성이 유치원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정서조절의 매개 효과를 알아보았다. Y시 소재한 M유치원 만 3-5세 신입생 유아 110명(남아 60명, 여아 50명)과 그들의 어머니 및 교사가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입학 전 설명회에 참석한 어머니들을 표집하였다. 어머니들은 학기 시작 전에 자기 보고식 정서표현성을 실시하였으며 유아의 부적 정서성과 정서조절 능력을 평정하였다. 교사의 정서표현성은 동료 교사의 평정으로 측정하였으며 약 한 학기 후에 교사가 유아의 유치원 적응을 평정하였다. 연구결과, 유아의 부적 정서성과 정서조절간의 관계가 유의하였으며 기질인 부적 정서성은 어머니의 부적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정서조절간의 관계를 매개하였다. 한편 교사의 정서표현성은 유아의 유치원 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나 유아의 정서 변인과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 결과는 정서사회화 모델을 기반으로 논의되었으며 취학 초기 적응에 영향을 주는 교사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of mothers’ and teachers’ emotional expressiveness on school adjustment of preschool children. In addition, the mediation effects of children’s negative emotionality and emotion regulation were examined. Data were collected from 110 children(60 boys and 50 girls) between 3 and 5 years old, and their mothers and kindergarten teachers. Mothers reported their own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rated children’s emotional temperament and regulation ability at time 1. Teachers’ emotion expressiveness and children’s school adjustment were evaluated by other teachers at time 2. Results showed that children’s negative emotionality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ir emotion regulation ability, and particularly, children’s negative emotionalit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negative expressiveness and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However, teachers’ emotional expressiveness accounted for children’s school adjustment, but not emotion regulation. Findings are discussed in terms of socialization of emotion and the role of teachers in the kindergarten classro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