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access
메뉴
open access
메뉴 ISSN : 1229-0696
ISSN : 1229-06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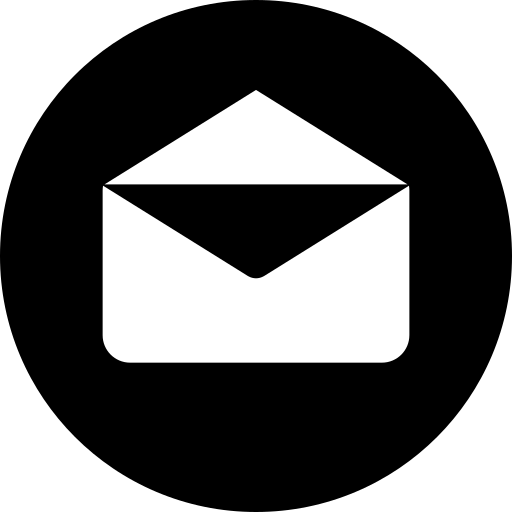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낯설고 새로운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반적인 자기 능력에 일반화된 신념인 일반화된 자기효능감을 가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관련하여 다음의 세 가지 큰 흐름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개념을 특수적 자기효능감 및 포부수준, 노력-수행기대, 자존감과 같은 유관 개념들과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둘째로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측정과 관련한 여러 이슈를 검토하였다. 특히,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초기 연구부터 최근의 연구까지 망라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비롯한 측정과 문항 구성 등과 같은 관련 이슈들을 비교하여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작금과 같이 급속한 기술과 환경의 변화 속도로 다기능 및 연결기능이 요구되는 시기에,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상황에서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신념으로서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지닌 인적자원관리 측면의 시사점을 선발/배치와 교육/훈련을 중심으로 제안하였다. 더욱이 조직을 둘러싼 환경의 불안정성과 변화 속도는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선발과 교육 등과 같은 인적자원관리 분야에서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효용성은 매우 높을 것이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이론적 및 경험적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다.
We have accumulated varied past experiences of success in a variety of domains, which can develop as "a general sense of positive expectations" that we have in unfamiliar and ambiguous domains. This study investigates general self-efficacy; its concept, measurement issues, and its implications for human resources management(HRM). First, the distinction and relationship among specific self-efficacy(SSE), general self-efficacy(GSE), and other related variables such as effort-performance expectancy, self-esteem, and level of aspiration are examined. GSE is a motivational trait-like variable, which functions regardless of domains as a belief and expectation of one's own capability. Second, the measurement issues of GSE are discussed. Many studies have regarded GSE as a construct with three factors, which are the level of activities, degree of efforts, and persistence. However, this conceptualization is an ad hoc interpretation of SE, and thus the content validity, and reliability of GSE. Lastly,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general self-efficacy for human resources management are suggested. If GSE is well measured, GSE measures are to be used as an effective predictor of selection/placement. In addition, GSE is to be a target variable of improvement and evaluation in education/training programs, especially in problem-based learning programs demanding overall coping competencies rather than job-specific competencies. The practical use of GSE as a generalized competency should be expanded further and more empirical studies need to be conducted in various HRM fiel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