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 KOREAN
- P-ISSN1229-067X
- E-ISSN2734-1127
- KC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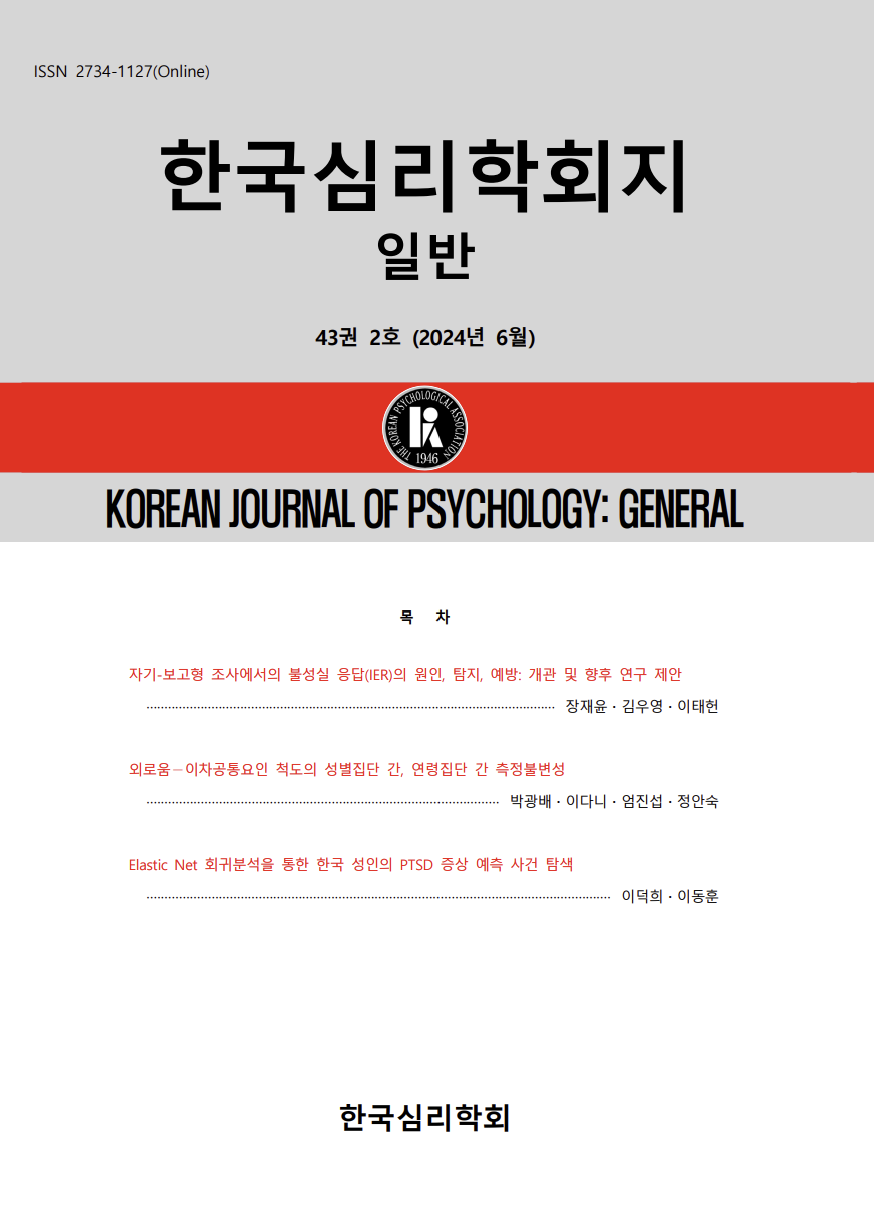 ISSN : 1229-067X
ISSN : 1229-067X
Article Contents
- 2024 (Vol.43)
- 2023 (Vol.42)
- 2022 (Vol.41)
- 2021 (Vol.40)
- 2020 (Vol.39)
- 2019 (Vol.38)
- 2018 (Vol.37)
- 2017 (Vol.36)
- 2016 (Vol.35)
- 2015 (Vol.34)
- 2014 (Vol.33)
- 2013 (Vol.32)
- 2012 (Vol.31)
- 2011 (Vol.30)
- 2010 (Vol.29)
- 2009 (Vol.28)
- 2008 (Vol.27)
- 2007 (Vol.26)
- 2006 (Vol.25)
- 2005 (Vol.24)
- 2004 (Vol.23)
- 2003 (Vol.22)
- 2002 (Vol.21)
- 2001 (Vol.20)
- 2000 (Vol.19)
- 1999 (Vol.18)
- 1998 (Vol.17)
- 1997 (Vol.16)
- 1996 (Vol.15)
- 1995 (Vol.14)
- 1994 (Vol.13)
- 1993 (Vol.12)
- 1992 (Vol.11)
- 1991 (Vol.10)
- 1990 (Vol.9)
- 1989 (Vol.8)
- 1988 (Vol.7)
- 1987 (Vol.6)
- 1986 (Vol.5)
- 1985 (Vol.5)
- 1984 (Vol.4)
- 1983 (Vol.4)
- 1982 (Vol.3)
- 1981 (Vol.3)
- 1980 (Vol.3)
- 1979 (Vol.2)
- 1976 (Vol.2)
- 1974 (Vol.2)
- 1971 (Vol.1)
- 1970 (Vol.1)
- 1969 (Vol.1)
- 1968 (Vol.1)
A Systematic Review of Studies about Complicated Grief in South Korea from 2010 to 2020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review the literature on Complicated Grief(CG) in South Korea for 10 years from 2010 and summarized the significant results. 33 papers out of 188 studies were selected through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As a result, the majority of the studies conducted after 2015, and most were classified as quantitative studies. When looking 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19 studies considered the elapsed period after bereavement, 28 studies identified the subject of bereavement. Inventory of Complicated Grief(ICG) and Prolonged Grief Disorder-13(PG-13) were most popular measures for CG but the use of validated measurement were limited. Factors related to CG were included attachment type, intrusive rumination,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Protected factors affecting the coping process of bereavement were future-oriented coping style, coping flexibility, and meaning-making process. Additionally, we summarise the results of the study on traumatic loss and the studies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psychological intervention program on the recovery of CG. Lastly, we discussed the limitations of the literatures and the potential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is the first study to systematically examine studies conducted on CG in South Korea.
- keywords
- 복합 비애, 연구동향, 체계적 문헌 고찰, Complicated Grief, Studies in South Korea, Systematic Review
- Downloaded
- Viewed
- 0KCI Citations
- 0WOS Cita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