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 KOREAN
- P-ISSN1229-067X
- E-ISSN2734-1127
- KC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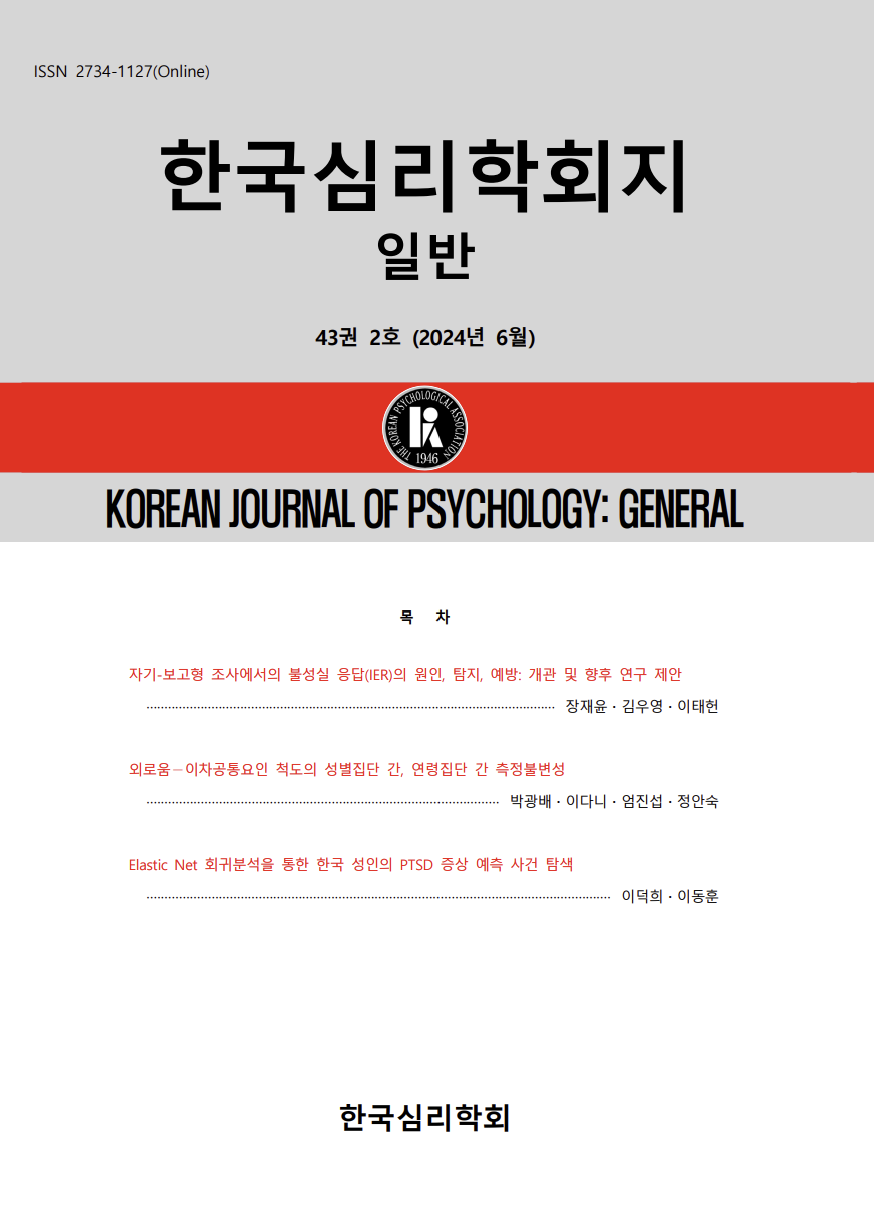 ISSN : 1229-067X
ISSN : 1229-067X
Article Contents
- 2024 (Vol.43)
- 2023 (Vol.42)
- 2022 (Vol.41)
- 2021 (Vol.40)
- 2020 (Vol.39)
- 2019 (Vol.38)
- 2018 (Vol.37)
- 2017 (Vol.36)
- 2016 (Vol.35)
- 2015 (Vol.34)
- 2014 (Vol.33)
- 2013 (Vol.32)
- 2012 (Vol.31)
- 2011 (Vol.30)
- 2010 (Vol.29)
- 2009 (Vol.28)
- 2008 (Vol.27)
- 2007 (Vol.26)
- 2006 (Vol.25)
- 2005 (Vol.24)
- 2004 (Vol.23)
- 2003 (Vol.22)
- 2002 (Vol.21)
- 2001 (Vol.20)
- 2000 (Vol.19)
- 1999 (Vol.18)
- 1998 (Vol.17)
- 1997 (Vol.16)
- 1996 (Vol.15)
- 1995 (Vol.14)
- 1994 (Vol.13)
- 1993 (Vol.12)
- 1992 (Vol.11)
- 1991 (Vol.10)
- 1990 (Vol.9)
- 1989 (Vol.8)
- 1988 (Vol.7)
- 1987 (Vol.6)
- 1986 (Vol.5)
- 1985 (Vol.5)
- 1984 (Vol.4)
- 1983 (Vol.4)
- 1982 (Vol.3)
- 1981 (Vol.3)
- 1980 (Vol.3)
- 1979 (Vol.2)
- 1976 (Vol.2)
- 1974 (Vol.2)
- 1971 (Vol.1)
- 1970 (Vol.1)
- 1969 (Vol.1)
- 1968 (Vol.1)
Do generational gap and intergenerational conflict reduce quality of life? With specific focus on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Abstract
The focus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ollowing questions: Do generational gap and intergenerational conflict reduce quality of life and what role does self-efficacy play? This study examines the influence of the perception of generation gap and intergenerational conflict on quality of life among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and the mediating role of self-efficacy. A total of 3,114 respondents, consisting of 1,038 adolescents and their father (n=1,038) and mother (n=1,038) completed a questionnaire that included the perception of generation gap, intergenerational conflict, and quality of life developed by the present researchers and self-efficacy (Bandura, 1995). Hierarchical analysis indicate that inclusion of self-efficacy significantly increases the percentage of variance explained for quality of life, far and above the influence of the perception of generational gap and intergenerational conflict. LISREL analysis indicate that the perception of generational gap had a direct and positive influence on intergenerational conflict, which had a direct and negative influence on quality of life. The perception of generational gap had a direct and negative influence on self-efficacy, which in turn had a direct and negative influence on intergenerational conflict and a direct and positive influence on quality of life. Those respondents with less intergenerational conflict and with higher self-efficacy had higher quality of life. However, self-efficacy had a more powerful effect on quality of life than intergenerational conflict. The effect size of self-efficacy on quality of life was significantly greater than the influence of the perception of generational gap and intergenerational conflict on quality of life. The effect size of self-efficacy on quality of life was 3 to 9 times greater than that the perception of generational gap and intergenerational conflict on quality of life. A similar pattern of results were obtained for adolescent, father and mothers samples. In summary, the perception of generational gap increases intergenerational conflict, which in turn reduces quality of life. However, self-efficacy reduces intergenerational conflict and significantly increases quality of life.
- keywords
- 자기효능감, 삶의 질, 세대갈등, 세대차 지각, Self-efficacy, quality of life, perception of generation gap, intergenerational conflict
Reference
김명언, 김의철, 박영신 (2000). 청소년과 성인간의 세대 차이와 유사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1), 181-204.
김성천, 탁진국 (2010). 역할과부하 및 일-가정 갈등과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 시간 통제감을 매개변인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1), 35-49.
김의철, 박영신 (2006). 한국 사회에서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인들에 대한 탐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5), 특집호, 1-28.
김의철, 박영신, 김명언, 이건우, 유호식 (2000). 청소년, 성인, 노인 세대의 차이와 생활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1), 119-145.
김의철, 박영신, 김의연, Tsuda, A. & Horiuchi, S. (2010). 스트레스와 우울에 대한 사회적 지원, 어려움극복 효능감, 스트레스 관리행동의 영향: 초, 중, 대학생 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6(2), 특집호, 197-219.
김의철, 홍천수, 이정권, 박영신 (2005).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분석: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원 및 질병관리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2), 143-181.
김정란, 이은희 (2007). 중년 여성의 불안정 애착이 본인의 우울수준 및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역기능적 태도와 부부갈등의 매개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297-319.
남순현 (2004). 가족 내 세대갈등과 통합.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2), 1-15.
민은정, 홍창희, 이민영 (2001). 아버지의 문제성 음주가 청소년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갈등과 가족 기능을 매개변인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1), 121- 132.
박아청 (2002). 정체감 교섭과정에 대한 교육심리학적 이해. 교육심리연구, 16(2), 5-21.
박영균, 박영신, 김의철 (2006). 청소년과 부모세대간 문화갈등 요인분석 및 문화소통 증진 방안. 한국여성개발원․한국청소년개발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6-02-05.
박영신, 김의철 (2001). 서장: 자기효능감과 행동특성. 박영신, 김의철 역.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 교육 건강 운동 조직에서의 성취. 서울: 교육과학사. Bandura, A. (1997). Self- 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and Company.
박영신, 김의철 (2004). 한국인의 부모자녀관계: 자기개념과 가족역할 인식의 토착심리 탐구. 서울: 교육과학사.
박영신, 김의철 (2006). 한국 사회와 개인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 탐구: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와 낮추는 요소에 대한 세대별 지각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1), 161-195.
박영신, 김의철 (2008).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 자녀에 대한 신뢰 및 자기효능감이 성인의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4), 71-101.
박영신, 김의철 (2009a). 한국 청소년의 행복: 심리적, 관계적, 경제적 자원과 학업성취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3), 399-429.
박영신, 김의철 (2009b). 한국 성인 남녀가 행복에 이르는 길: 직업 성취, 자녀 성공, 정서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3), 467-495.
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민병기 (1999). 초등학생의 생활만족도 형성요인에 대한 구조적 관계 분석: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5(1), 57-76.
박영신, 김의철, 민병기 (2002). 부모의 사회적 지원,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 변화에 대한 종단자료 분석과 생활만족도 형성에 대한 구조적 관계 분석. 교육심리연구, 16(2), 63-92.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이상미, 권혁호, 양계민 (2000). 초 중 고등학생의 생활만족도 차이와 형성 및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1), 94-118.
박영신, Tsuda, A., 김의철, 한기혜, 김의연, Horiuchi, S. (2009). 한국과 일본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우울에 대한 분석: 부모의 사회적 지원, 어려움극복효능감, 스트레스 관리행동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1), 1-28.
박혜련, 박민선, 이뻐라, 정선아 (2009). 교도관의 정서적 소진과 직무만족, 역할갈등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연구: 수용자에 대한 교도관의 태도 차이에 따른 변인간 관계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2(2), 319-343.
양돈규, 성옥련 (1998). 부모갈등과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우울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 1998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375-393.
유연지, 조현주, 권정혜 (2008). 부부의 원가족 특성과 고부, 옹서 갈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4), 433-451.
윤운성 (1999). 부모의 기대가 자녀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교육심리연구, 13(4), 247-268.
이선희, 김문식, 박수경 (2008). 가족친화적 경영이 조직몰입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직장-가정 갈등의 매개효과 가설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1(3), 383-410.
이정미, 이양희 (2007).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간의 갈등, 어머니의 양육행동, 사회적 지지 및 안녕감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0(4), 33-58.
임수진, 최승미, 채규만 (2008). 부부갈등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처효율성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 (1), 169-183.
장재윤 (2004). 직무 특성과 직장-가정 간 갈등이 조직에 대한 애착 및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효과: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7(1), 107-127.
장재윤, 김혜숙 (2003). 직장-가정간 갈등이 삶의 만족 및 직무 태도에 미치는 효과에 있어서의 성차: 우리나라 관리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1), 23-42.
정태연, 최상진, 김효창 (2002). 아동과 어른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표상: 성격적, 관계적 및 과업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2), 51-76.
한혜영, 현명호 (2006). 성인애착과 결혼만족: 부부 조망수용과 갈등해결 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4), 935- 952.
허창구, 신강현, 양수현 (2010). 직장-가정 갈등이 직무탈진 및 가정만족에 미치는 영향: 성차에 따른 다집단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1), 103-128.
Bandura, A. (1991). Self-efficacy mechanism in physiological activation and health-promoting behavior. In J. Madden, IV (Ed.). Neurobiology of learning, emotion and affect, (pp.229-270). New York: Raven.
Bandura, A. (1995). Manual for the construction of self-efficacy scales. Unpublished manuscript, Dept. of Psychology, Stanford University, USA.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and Company.
Bandura, A. (2006a). Adolescent development from an agentic perspective. In F. Pajares & T. Urdan (Eds.), Self-efficacy beliefs of adolescents, 1-43. Greenwich, CT: Information Age Publishing.
Bandura, A. (2006b). Guide for creating self-efficacy scales. In F. Pajares & T. Urdan (Eds.), Self-efficacy beliefs of adolescents, 307-337. Greenwich, CT: Information Age Publishing.
Chang, W. G., Park, Y. S., & Kim, U. (2008). The influence of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self-efficacy on quality of life among university students and their parents. Paper presented at the XXIX International Congress of Psychology, p. 308. July 20-25, International Congress Centrum Berlin, Germany.
Kim, U. (1999). After the crisis in social psychology: Development of the transactional model of science.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 1-19.
Kim, U., & Park, Y. S. (2006a). Factors influencing academic achievement in relational cultures: The role of self, relational and collective efficacy. In F. Pajares & T. Urdan (Eds.), Self-efficacy beliefs of adolescents, 267-285. Greenwich, CT: Information Age Publishing.
Kim, U., & Park, Y. S. (2006b).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of academic achievement in Korea: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parents and cul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41(4), 287-292.
Lee, S. M., Kim, U., & Park, Y. S. (2006). Longitudin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among social support, relational efficacy, life-satisfaction and trust: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of Korean adolescents. Paper presented at the convention of the Society for the Psychological Study of Social Issues. p. 20. June 23-25, California, USA.
Park, Y. S. (2008). Parent-child relationship, academic achievement and quality of life: The role of self-regulation, social support, and efficacy beliefs in Korea. Invited keynote address at the XXIX International Congress of Psychology, p.168. July 20-25, International Congress Centrum Berlin, Germany.
Park, Y. S., & Kim, U. (2004). Paths to academic achievement, delinquency and life-satisfaction: Longitudinal analysis of influences of psychological, relational and cultural factors. Invited keynote address at the 17th International Congress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Cross-Cultural Psychology. p.11-12. August 2-6. Shaanxi Normal University, Xi'an, China.
Tinker, S. P., & Moore, K. A. (2003). Teachers' work hours, work-family conflict and health: The mediating effects of perceived control and organizational support.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8(3), 663-678.
Wiedenfeld, S. A., O'Leary, A., Bandura, A., Brown, S., Levine, S., & Raska, K. (1990). Impact of perceived self-efficacy in coping with stressors on components of the immune syst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1082-1094.
Zimmerman, B. J., & Cleary, T. J. (2006). Adolescets' development of personal agency: The role of self-efficacy beliefs and self-regulatory skill. In F. Pajares & T. Urdan (Eds.), Self-efficacy beliefs of adolescents, 45-69. Greenwich, CT: Information Age Publishing.
- Downloaded
- Viewed
- 0KCI Citations
- 0WOS Cita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