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 KOREAN
- P-ISSN1229-067X
- E-ISSN2734-1127
- KC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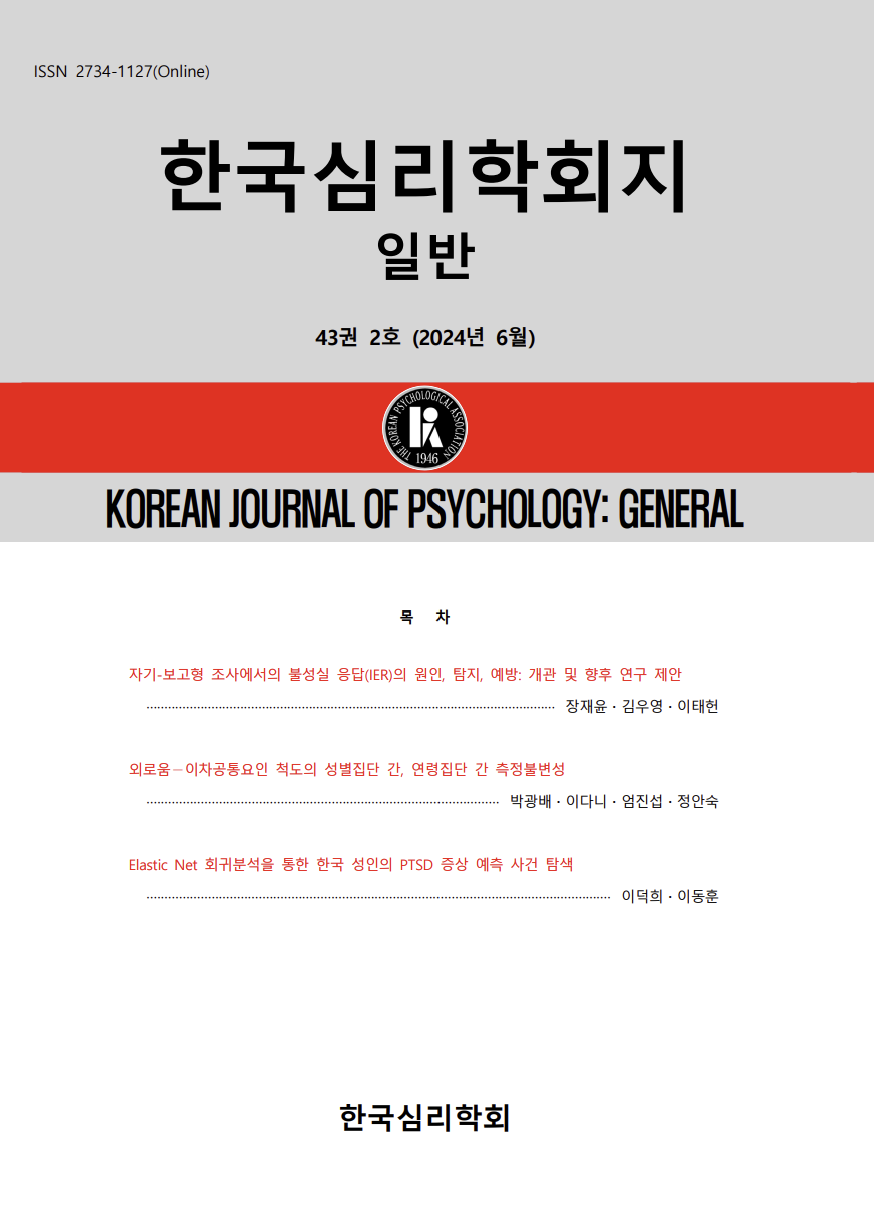 ISSN : 1229-067X
ISSN : 1229-067X
Article Contents
- 2024 (Vol.43)
- 2023 (Vol.42)
- 2022 (Vol.41)
- 2021 (Vol.40)
- 2020 (Vol.39)
- 2019 (Vol.38)
- 2018 (Vol.37)
- 2017 (Vol.36)
- 2016 (Vol.35)
- 2015 (Vol.34)
- 2014 (Vol.33)
- 2013 (Vol.32)
- 2012 (Vol.31)
- 2011 (Vol.30)
- 2010 (Vol.29)
- 2009 (Vol.28)
- 2008 (Vol.27)
- 2007 (Vol.26)
- 2006 (Vol.25)
- 2005 (Vol.24)
- 2004 (Vol.23)
- 2003 (Vol.22)
- 2002 (Vol.21)
- 2001 (Vol.20)
- 2000 (Vol.19)
- 1999 (Vol.18)
- 1998 (Vol.17)
- 1997 (Vol.16)
- 1996 (Vol.15)
- 1995 (Vol.14)
- 1994 (Vol.13)
- 1993 (Vol.12)
- 1992 (Vol.11)
- 1991 (Vol.10)
- 1990 (Vol.9)
- 1989 (Vol.8)
- 1988 (Vol.7)
- 1987 (Vol.6)
- 1986 (Vol.5)
- 1985 (Vol.5)
- 1984 (Vol.4)
- 1983 (Vol.4)
- 1982 (Vol.3)
- 1981 (Vol.3)
- 1980 (Vol.3)
- 1979 (Vol.2)
- 1976 (Vol.2)
- 1974 (Vol.2)
- 1971 (Vol.1)
- 1970 (Vol.1)
- 1969 (Vol.1)
- 1968 (Vol.1)
Comparative Study of Self and Other(in-group/out-group) Evaluation of Creativity among Latent Classes of Self-Construal in Korea: Using Implicit Theories of Creativ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tendency of creativity evaluation on self and others (Koreans/foreigners) based on latent classes by self-construal. Implicit theory was used as the criterion of self-evaluation and evaluation on others(Koreans/foreigner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824 Koreans ranging from teens to 50s. First, in order to confirm if self-construal factors suggested by Singelis et al.(1995) appear in identical constructs among Korean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Vertical and horizontal-collectivism were turned out to be one factor of collectivism, vertical-individualism was interpreted as competitive individualism, and horizontal-individualism was divided into individualism emphasizing uniqueness and independent individualism. Second, the result of analysis on latent classes using four factors of adjusted self-construals provided 4 groups, which were low-competitive collectivism group(27.7%), low-uniqueness group(28.9%), low-competitive/high-uniqueness(29.9%) and self-conviction (high-competitive/high-uniqueness/high-independent) group(13.6%). Lastly, the self-conviction group tends to evaluate his/her creativity as higher than, or similar to, that of other people.
- keywords
- 창의성 평가, 문화적 성향(문화적 자아관), 암묵적 이론, 잠재집단분석, 자기 및 타인평가, creativity, cultural orientation(self-construal), implicit theories of creativity, latent class analysis, self-other evaluation
Reference
곽금주 (2008). 20대 심리학: 미래의 나를 완성해주는 20대를 위한 인생강의. 서울: 랜덤하우스 코리아.
김기범 (1996). 대인관계 속에서 도덕성과 내집단-외집단 구별: 문화비교 분석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논문.
김대환 (1993). 한국인의 자기발견. 서울: 김영사.
김도원 (2012. 10. 21). “창조․공정․혁신. 경제 정책 차이점은?”. YTN. http://www.ytn.co.kr/ _ln/0101_201210210602249492에서 검색.
김성환 (2011). 창의적인 인물에 대한 지역과 세대별 인식차이 비교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신성 (2007. 7. 16). 美 평론가 “한국 영화 위기는 창의성 부족 탓”. 세계일보. http://www. segye.com/content/html/2007/07/15/20070715000094.html에서 검색.
김양희 (2013). 한국 여대생의 문화적 성향 잠재집단과 진로관련 변인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 논문.
김재은 (1987). 한국문화연구원 한국문화 총서 12: 한국인의 의식과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김정호 (2013). 창조도시의 도시경쟁력 메카니즘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26(1), 219-240.
김 준, 길종구 (2004). 창의력 계발과 창조적 경영. 삼영사.
김태훈 (2013. 6. 10) 과학고 → 명문대 → 대기업…이공계 인재 획일화된 진로 벗어나자.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news /app/newsview.php?aid=2013061005601에서 검색.
류승아 (2009). 정신장애인의 경쟁고용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 한국과 미국의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4), 1-25.
류승아 (2010). 자아존중감 및 문화적 성향과의 관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2), 169-183.
류충호 (2004). 한국사회의 내집단 비하연상에 대한 문화심리학적 접근.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문용린, 최인수 (2010). 창의․인성교육의 총론.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심포지움, 10, 21-29.
문윤희, 한기순 (2010). 창조적 성취자를 키운 동서양 양육자의 특성 비교, 영재교육연구, 20(2), 395-426.
박건현 (2013. 4. 4). 남의 기술 따라 말고 남의 성공 좇지 마라 그게 창의, 창조경제.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404002013에서 검색.
박우규 (2008. 9. 13). 출산율 높일 수 없다면 이민을 받아들이세요.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9/12/2008091200663.html에서 검색.
박현경, 이영희 (2004). 집단상담 참가자의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 상담자 역할기대 및 치료적 요인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치료, 16(4), 571-596.
배소라 (2012. 10. 30). “자치구 행정우수사례 발표대회”. 시민일보. http://www.siminilbo.co.kr/main/list.html?bmain=view&num=310653에서 검색.
배영찬 (2010. 10. 13). 엄마 품에 큰 ‘수재’들, 영원히 노벨상 못 받는다.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0/13/2010101301964.html 에서 검색.
변미리 (2008). 서울의 창의시정 모델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8-PR-04.
성은현, 류형선, 하주현, 이정규, 한순미, 한윤영 (2007). 한국 대학생이 생각하는 한국과 미국의 암묵적 창의성에 대한 비교 연구. 영재교육연구, 17(2), 365-391.
송치웅, 장성일 (2010). 창의성 지수(Creativie index)측정을 통한 창의 역량 국제비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책연구 2010-16-2.
안미현 (2006. 12. 16). 한국 창의성 부족… 혁신 제품 없어.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61216019016에서 검색
오현숙, 민병배 (2008). 독일과 한국 청소년의 기질 및 성격 특성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397-407.
윤샘이나 (2012. 6. 15). 한국 교육도 K팝처럼 붐 일으킬 수 있어.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615029037에서 검색.
전경원 (2006). 동서양의 하모니를 위한 창의학. 학문사.
조선일보 (2013. 3. 22). 한국 휴대폰 꺼내든 사전트 “보라, 자유경쟁이 낳은 창의적 산물을”.
조슈아 코프만 (2008. 3. 12). 한국인 창의성 너무 부족. 대전일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9&aid=0000138738에서 검색.
최상진 (1993). 한국인의 특성: 심리학적 탐색: 한국인의 심정 심리학: 정과 한에 대한 현상학적 한 이해. 한국심리학회 대외심포지움, 1993(3), 3-21.
최인수 (2011). 창의성의 발견. 쌤앤파커스.
최인수, 윤지윤 (2013). 한국, 중국, 일본의 창의성에 대한 대학생의 암묵적 지식 비교 연구: 창의적인 인물의 직업군과 지각된 창의적 성향을 중심으로. 창의력교육연구, 13(2), 159-183.
최인수, 이건희, 표정민 (2013). 창의적 인물의 특성과 직업군에 대한 한국, 중국, 일본인의 암묵적 지식 비교. 영재교육연구, 23(4), 615-632.
최인수, 전요한, 표정민 (2013). 창의적․비창의적 성향에 관한 한국, 중국, 일본인의 암묵적 이론연구-ACL-CPS를 사용하여-. 아시아교육연구, 14(3), 319-344.
최인수, 표정민 (2014). 한국인의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 척도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8(1), 27-47.
코리아 데일리 (2009. 5. 12). “기본 부족하고 창의력 부족”… 한국 다녀온 미국 교사가 본 한국 교육.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7&branch=NEWS&source=&category=education&art_id=1476872에서 검색.
한국경제 (2011. 11. 8). 에릭 슈미트 “한국인은 창의성을 타고 났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11087 051t에서 검색.
한국경제매거진 (2013. 5). 키스라인하드 DDB 월드와이드 회장 “창의적 발상을 이끌어내는 법”. http://magazine.hankyung.com/money/apps/news?popup=0&nid=02&c1=2003&nkey=2013052100096071502&mode=sub_view에서 검색.
한국행동과학연구소 (2014). 엉뚱한 생각. 학지사
한규석, 신수진 (1999). 한국인의 선호가치 변화-수직적 집단주의에서 수평적 개인주의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293-310.
한기순, 유경훈 (2013). ‘피로사회’ 속 창의성과 행복에 관한 담론. 창의력교육연구, 3(1), 55-68.
한덕웅 (2002). 집단행동이론. 서울: 시그마프레스.
한 민, 이누미야, 김소혜, 장웨이 (2009). 새로운 문화-자기관 이론의 국가 간 비교연구: 한국, 중국, 일본 대학생들의 자기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1), 49-66.
홍일식 (1996). 한국인에게 무엇이 있는가. 서울: 정신세계사.
YTN (2013. 10. 13). 외국 학자들이 본 ‘한류’. 한국 창조성의 근원은?. http://www.ytn.co.kr/_ln/0101_201310131003279884에서 검색.
Breen, B. (2004). The 6 myths of creativity. Fast Company, 89, 75.
Burnside, R. M., Amabile, T. M., & Gryskiewicz, S. S. (1988). Assessing organizational climates for creativity and innovation: Methodological review of large company audits. New directions in creative and innovative management: Bridging theory and practice, 169-185.
Cahoon, N. (1996). History of the Western mind.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Colvin, C. R., Block, J., & Funder, D. C. (1995). Overly positive self-evaluation and personality: Negative implications for mental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1152-1162.
Davis, G. A. (1999). Creativity is forever. Kendal/ Hunt Publishing Company.
Egri, C. P., Khilji, S. E., Ralston, D. A., Palmer, I., Girson, I., Milton, L., ..., & Mockaitis, A. (2012). Do Anglo countries still form a values cluster? Evidence of the complexity of value change. Journal of World Business, 47(2), 267-276.
Ekvall, G. (1996). Organizational climate for creativity and innovation. European Journal of work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5(1), 105- 123.
Farh, J. L., Dobbins, G. H., & Cheng, B. S. (1991). Cultural relativity in action: a comparison of self ratings made by Chinese and US workers. Personnel Psychology, 44(1).
Gómez, C., Kirkman, B. L., & Shapiro, D. L. (2000). The impact of collectivism and in-group/out-group membership on the evaluation generosity of team member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3(6), 1097-1106.
Hamamura, T. (2012). Are cultures becoming individualistic? A cross-temporal comparison of individualism-collectivism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6(1), 3-24.
Harris, M. M., & Schaubroeck, J. (1988). A meta‐analysis of self‐supervisor, self‐peer, and peer‐supervisor ratings. Personnel Psychology, 41(1), 43-62.
Heine, S. J., & Hamamura, T. (2007). In search of East Asian self-enhancemen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1(1), 4-27.
Heine, S. J., Lehman, D. R., Markus, H. R., & Kitayama, S. (1999). Is there a universal need for positive self-regard?. Psychological review, 106(4), 766.
Hofstede, G. H. (2001). Culture's consequences: Comparing Values, behavior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cross nations.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Inglehart, R. (1998). Modernization and Post 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Kelly, G. A. (1955). The psychology of personal constructs. New York: Norton.
Kitayama, S., Markus, H. R., Matsumoto, H., & Norasakkunkit, V. (1997). Individual and collective processes in the construction of the self: self-enhance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self-criticism in Jap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6), 1245.
Leung, K., Bond, M. H., De Carrasquel, S. R., Munoz, C., Hernandez, M., Murakami, F., & Yamaguchi, S. (2002). Social axioms: The search for universal dimensions of general beliefs about how the world function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98, 224-253.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McLachlan, G. J., & Basford, K. E. (1988). Mixture Models: inference and Application to clustering. Marcel Dekker, New York.
Meijer, Z. Y., & Semin, G. R. (1998). When the self-serving bias does not serve the self: Attributions of success and failure in cultural perspective. Free University Amsterdam.
Miller, D. T., & Ross, M. (1975). Self-serving biases in the attribution of causality: Fact or fiction?. Psychological bulletin, 82(2), 213.
Morris, M. W., & Peng, K. (1994). Culture and cause: American and Chinese attributions for social and physical ev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6), 949.
Muthen, L. K., & Muthen, B. O. (1998). Statistical analysis with latent variables. Mplus User’s guide, 1998-2012.
Neisser, U. (1979). The concept of intelligence. Intelligence, 3(3), 217-227.
Ng, A. K. (2003). A cultural model of creative and conforming behavior. Creativity Research Journal, 15(2-3), 223-233.
Ralston, D. A., Egri, C. P., Casado, T., Fu, P., & Wangenheim, F. (2009). The impact of life stage and societal culture on subordinate influence ethics: a study of Brazil, China, Germany, and the US. Journal of International Management, 15(4), 374-386.
Rogers, C. R. (1959). A Theory of Therapy, Persona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s Developed in the Client-centered Framework.
Romo, M., & Alfonso, V. (2003). Implicit theories of Spanish painters. Creativity Research Journal, 15, 409-415.
Ross, S. B. (1977). On the mode of action of central stimulatory agents. Acta Pharmacologica et Toxicologica, 41(4), 392-396.
Rudowicz, E., & Hui, A. (1997). The creative personality: Hong Kong perspective.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12(1), 139-157.
Singelis, T. M., Triandis, H. C., Bhawuk, D. P., & Gelfand, M. J. (1995). Horizontal and vertical dimension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 theoretical and measurement refinement. Cross-cultural research, 29(3), 240-275.
Steel, P., & Taras, V. (2010). Culture an a consequence: A Multi-level multivariate meta-analysis of effects of individual and country characteristics on work-related cultural values, Journal of International Management, 16, 211-233.
Stemberg, R. J. (1983). Components of human intelligence. Cognition, 15, 1-48.
Sternberg, R. J. (1985). Implicit Theories of intelligence, creativity, and wisdom.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49(3). 607-627.
Stemberg, R. J., Conway, B. E., Ketron, J. L., & Bernstein, M. (1981). People's conceptions of intellig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37-55.
Taijfel, H., & Turner, J. C. (1979).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In W. Austin & S. Worchel(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pp. 33-47). Monterey, Ca: Brooks-cole.
Takata, T. (1999). Development process of independent and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in Japanese culture: Cross-cultural and cross-sectional analyses. Japanes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47(4), 480-489.
Thornton, G. C. (1980). Psychometric properties of self-appraisals of job performance. Personal Psychology, 33, 263-271.
Triandis, H. C. (1989).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ing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3), 506.
Triandis, H. C. (1994). Culture and social behavior. McGraw-Hill Book Company.
Triandis, H. C. (1995). Individualism & collectivism. West view Press.
Triandis, H. C., McCusker, C., & Hui, C. H. (1990). Multimethod probe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5), 1006.
Tung, R. L., & Verbeke, A. (2010). Beyond Hofstede and GLOBE: Improving the quality of cross-cultural research.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41, 1259, 1274.
Yue, X. D., & Rudowicz, E. (2002). Perception of the most creative Chinese by undergraduates in Beijing, Guangzhou, Hong Kong, and Taipei. The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36(2), 88-104.
Yue, X. D. (2003). Meritorious evaluation bias: how chinese undergraduates perceive and evaluate chines and foreign creators.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37(3). 151-177.
Yue, X. D. (2011)., Bender, M., & Cheung, C. K.(2011). Who are the best-known national nad foreign creators? A comparative study among undergraduates in China and Germany.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45, 23-27.
- Downloaded
- Viewed
- 0KCI Citations
- 0WOS Cita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