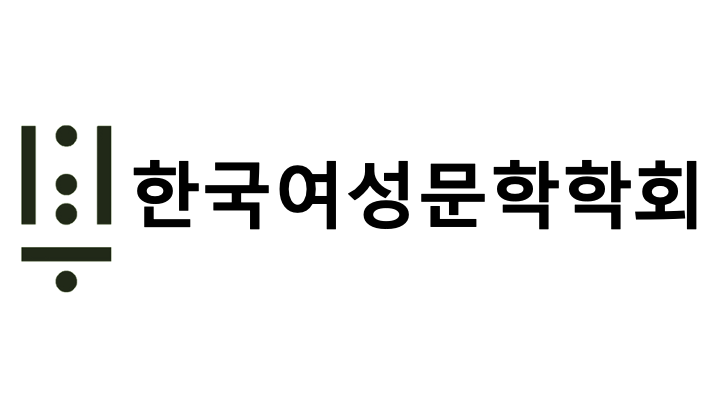- ENGLISH
- P-ISSN1229-4632
- E-ISSN2733-5925
- KCI
63호
초록
Abstract
본고에서는 서영해의 설화집을 중심으로 하여 1900년대 초 서구 언어로 번역된고전서사들과의 비교를 수행하고자 한다. 후자를 원전에 대한 외국어 화자–도착어에 대한 원어민 화자의 관점, 그리고 원전에 대한 원어민 화자–도착어에 대한외국어 화자의 관점으로 분류한다면, 알렌, 게일 등 대부분 서양 기독교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번역이 전자에 해당하고 서영해의 번역이 후자에 속한다. 서영해의 번역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의 이유 때문이다. 여행기나 박물관적 관점에 속하지 않으며 제국주의나 식민주의를 배제하고자 하는 관점의‘번역’이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면 쉽게 발견되는 연구 대상은 아니기때문이다. 특히 서구어 번역자들의 탐색 대상인 한국문학 혹은 넓게는 한국을 일종의 영토화된 대상이라 해석할 때, 재현되는 여성의 형상에 주목하는 것은 보다유의미한 작업이 된다. 고전 번역의 여성 형상을 기명의 여성들과, 그리고 무기명의 여성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면 서영해는 후자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여성의 형상을 구현하고 그것을 그가 지향하던 다음 공동체의 가능성으로 기술하려 한다.
초록
동아시아에서 『부인론』이라는 제목으로 널리 알려진 아우구스트 베벨의 저서『여성과 사회주의』는 1879년 처음 나온 뒤로 수십 년 간 거듭 개정판이 발간되고 수십 개 언어로 번역된 사회주의의 고전이다. 한국에서는 1920년대 중반에공산주의자 배성룡과 아나키스트 신종석에 의해 각각 원저의 2부(현재의 여성) 와 1부(과거의 여성)가 차례로 발췌 번역된 이래, 1990년 최초의 완역본이 나오기까지 총 아홉 번의 번역 시도가 있었다. 이들은 번역의 저본이 되는 일역본 및중역본 그리고 영역본과 상호 텍스트적 관계를 갖는 한편, 완역의 형태를 갖지는못했으나 검열의 시대를 통과하며 수행된 그 나름의 번역 실천을 보여준다. 한편1920년대 초에서 30년대 초까지 이 책의 직접적인 영향 하에 쓰인 여러 파생 텍스트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예외 없이 남성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쓰인 이 글들은 일부일처제와 매음(매매혼) 문제에 특히 편중된 주제의식을 드러냈다. 무엇보다 이들은 여성 혐오와 시혜적인 입장을 노출하기도 하는 등 조선 여성이 처한 구조적 문제 및 자본주의 하의 젠더 모순에 육박하지는 못했다. 이 책이 당대의 여성 독자들 및 여성 지식인들에게 해방의 교과서처럼 거론되었음에도 실제로 진지한 접근이나 해방 담론이 충분히 펼쳐지지 못했던 것은 조선 여성이 처한열악한 상황을 되비쳐주고 있다. 일본의 선구적 여성 사회주의자로 동아시아에서 『부인론』을 처음 완역한 야마카와 기쿠에가 조선 여성에게 내민 연대의 손길조차도 일본 무산계급 운동에 조선여성이 포섭되는 방식으로만 승리(해방)가 가능하다는 역설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 년 전에 이루어진 불완전한 번역 실천과 연대의 시도들은 현재까지도 물음을 그치지 않아야 하는 문제들을 환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bstract
The book Woman and Socialism by August Bebel, known in East Asia as On Women (Buin-ron), is a socialist classic first published in 1879. In Korea, abridged translations of its second and first parts appeared in the mid-1920s, with nine translation attempts made before the first complete Korean edition in 1990. These translations, connected with Japanese, Chinese, and English editions, symbolized a meaningful effort amidst ideological censorship. Between the 1920s and 1930s, derivative texts influenced by the book were written by male socialists, focusing on issues like monogamy and sex labor but neglecting structural gender problems under capitalism. These writings often revealed misogyny or paternalism, limiting their engagement with women’s liberation. Although regarded as a “textbook of liberation” by women intellectuals, the book failed to inspire broader discussions on emancipation, reflecting the harsh realities faced by Korean women. Japanese socialist Yamakawa Kikue, the first to fully translate Woman and Socialism in East Asia, extended solidarity to Korean women, albeit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ir liberation required alignment with Japan’s proletarian movement. Despite these limitations, the incomplete translation practices and solidarity efforts from a century ago hold significance as they continue to evoke unresolved questions about gender and women’s liberation.
초록
본고는 일본군 ‘위안부’ 증언의 혼종적 성격을 드러내고, 혼종적인 언어가 다시신·구제국의 언어로 번역되는 양상을 분석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태평양전쟁 종전 후 공고화된 ‘국경(border)’을 경계로 인식되어 왔지만, 위안소라는전시성폭력 시스템은 ‘전선(front line)’을 따라 확대되었다. 전선은 기존의 공권력이 구획한 것과는 다른 영역을 만들어 냈고, 특히 언어적 차원에서는 다민족· 다국적 주체에 의한 혼합적·혼종적 어문역을 형성했다. 따라서 전쟁에 대한 피해자의 증언은 국민국가의 공식언어로 균질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진상 규명이 우선적 과제였던 증언 연구 초기에는 피해자 증언에 내재하고 있는 이질적이고 혼종적 언어가 상당 부분 소거되었으나, 2000년대 이후 피해자의 구술 언어를 반영하려는 시도에 따라 증언의 혼종성이 텍스트에 기입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영어, 일본어로 번역되면서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었다. 본고는 증언자가 발화하는이질적인 언어와 증언자가 스스로 해석하는 의미 사이의 간극을 가시화하고, 이간극이야말로 폭력적인 언어 조건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은 피해자들의행위성(agency)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았다. 또, 혼종적인 언어가 영어와 일본어로 번역되면서 새로운 문법 체계 속에 귀속되거나 혹은 그것으로부터 이탈하는양상을 분석하였다. 증언의 번역 양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세계사적 지평으로 이동하면서 보편성을 획득하는 대가로 고유성이나 특수성을 어떻게 왜곡· 상실하게 되는지 비판적으로 살피게 한다.
Abstract
This paper reveals the hybrid aspect of the ‘Comfort Women’ testimony and zanalyzes how it is translated back into the language of the New and Old Empire. The ‘Comfort Women’ issue has been recognized as a boundary called the ‘border’ that was solidified after the end of the Pacific War, but the wartime sexual violence system called ‘comfort station’ has expanded along the ‘front line’. The front line created an area different from that of the existing public power, and especially at the linguistic level, it formed a hybrid language by multinational subjects. Therefore, the victim’s testimony about the war does not appear homogeneously in the official language of the nation-state. In the early days of the study, when ‘finding the truth’ was a priority, the heterogeneous and hybrid language inherent in victim testimony was largely eliminated. However, since the 2000s, the hybridity of testimony has begun to appear in the text by dictating the victim’s spoken language. And it became more visible in earnest in the process of being translated into English and Japanese. This paper visualizes the gap between the heterogeneous language spoken by the testator and the meaning of the testator’s self-interpretation, and sees that this gap reveals violent language conditions and the agency of victims who survived such situations. In addition, as hybrid languages were translated into English and Japanese, it was analyzed that they belonged to or deviated from the new national grammar system. The translation aspect of the testimony critically examines what uniqueness or specificity of the ‘Comfort Women’ issue erases in exchange for acquiring universality as it moves to the global historical horizon.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김혜순의 시와 그 영역본을 나란히 분석함으로써 그의 시가 그리는여성성과 번역과의 상관성을 탐구하는 논문이다. 한국문학이 활발히 번역되고있으며, 한국의 작가 한강이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현재까지도 번역과 젠더의 연관성에 대한 논의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하되 김혜순 시에 담긴 여성성에 대한 연구가 주로1980~1990년대에 발간된 시집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까지 보완하기 위해, 가장 최근에 발간된 시집이자 ‘죽음의 3부작’으로 불리는 『죽음의 자서전』, 『날개 환상통』, 『지구가 죽으면 달은 누굴 돌지?』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이중 번역본이 있는 『죽음의 자서전』과 『날개 환상통』의 영역본, Autobiography of Death와 Phantom Pain Wings를 함께 분석하였다. 원시와 번역본과의 비교를 통해, 영어로 번역될 때 시적 정황과 발화 주체가명료해짐으로써 젠더 폭력의 양상이 구체화되지만, 김혜순이 의도하는 혼종적인존재들이 실천하는 ‘–하기’의 수행은 희미해지는 경향이 생겨난다는 점을 확인할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김혜순이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여성성을 향한 다층적인 시선을 점검하고 그가 구축한 여성성의 실체를 확인해 보았다. 세 권의 시집에서 김혜순은 가족주의와 가부장제를 분자화하여 이를 여성성으로 수용해 내는독창적인 상상력을 선보인다. 그는 입자의 형태에 머물며 타자와 섞이는 관계적존재를 지향하는 창의적인 여성성을 고안하여 여성시를 확장해 낸다. 영역을 거치며 분자화의 의미가 불분명해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러한 섞임의 작업이 비인간 존재에게까지 확장된다는 점이 강조된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김혜순의 시가 번역되는 과정에서 여성성의 중층적인 의미가 발견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여성시’를 둘러싼 논의를 확장해 나갈 단초를 마련할 수있었다.
초록
Abstract
이 글은 로맨스 판타지 웹툰 「언니, 이번 생엔 내가 왕비야」와 영어 번역본 「I’m the Queen in This Life」를 중심으로, 번역 과정에서 젠더 재현이 변화하며 생성된 문화적 의미를 분석한다. 캐런 버라드의 행위적 실재론을 활용하여, 웹툰 번역이 다양한 번역 행위자들이 얽혀 의미를 생성하는 수행적 행위임을 논의하였다. 로맨스 판타지는 낭만적 사랑과 여성 주체성을 그리는 장르로,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여성혐오적 재현을 문제화하는 새로운 서사적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글은 서구 중세 배경의 로맨스 판타지 웹툰이 글로벌 독자층과 만나는 과정에서발생하는 문화적 맥락의 재구성을 살펴본다. 번역 과정에서 여성혐오적 표현이완화되는 방식은 원텍스트의 직접적 어조를 약화시키는 한편, 그림텍스트와 상호작용하면서 추가된 영어권 문학의 상호텍트스적 개입은 새로운 의미를 생성한다. 「I’m the Queen in This Life」의 번역은 더 나은 삶을 희망하는 여성들의보편적 정동이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서 변주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글로벌문화 시장의 우연한 효과이면서도, 번역 행위에 개입하는 다양한 힘들의 상호작용이 새로운 의미 생성의 가능성을 보여준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전우치전〉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의 재현 양상을 살펴보고 작품에 반영된 여성의 현실과 여성 인식을 추적하고자 했다. 〈전우치전〉에서는 사회적 보호막이 없는 여성의 성은 누군가의 욕망 충족을위해 침탈 가능한 것으로 다루며, 유흥 공간의 여성을 남성들의 모임에서 자리의위용을 과시하는 전시물이자 흥을 돋우는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등장시킨다. 사족 여성의 경우 이들의 정조를 지켜야 할 사회적 윤리로 두기보다 배우자 남성의약점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 인식은 주로 전우치를 통해 드러나는데, 그는 학문적 정통성이나 공적 지위를 가지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에 이름을 알린 비주류다. 그리고 역모에 이름이 오른 데다가 힘을 통제받아야 할 존재로 인식되었기 때문에그의 가계 형성과 계승은 불가능했다. 이처럼 가족중심적 시각에서 자유로울 수없었던 전우치가 혼인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그가 모친을 제외한 모든 여성을타자화하고 도구화하는 배경이 된다. 따라서 그가 문제시하는 여성의 행실은 간통보다는 투기에 있었다. 남성의 성을 통제하는 욕망이 통제를 벗어난 여성의 성보다 더 교정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전우치와 그의 세상인 〈전우치전〉은 철저히 남성의 시선으로 여성 인물을조명했다. 그리고 기존 권력을 조롱하는 과정에 여성 역시 조롱의 도구이자 대상으로 쉽게 활용되었다. 타자화된 여성의 몸, 도구화된 여성의 섹슈얼리티, 약점이된 여성의 정조는 전우치가 세상을 휘저으며 화려한 재주를 선보이기 위한 재료가 되었다. 그리고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폭력적 인식은 권위와 질서의 전복과통쾌한 복수 과정에서 저열한 웃음의 자양분이 되고 있다.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공창폐지운동이 작가의 정치적 이념을 중심으로 이분법적으로 평가되어 왔던 선행연구의 흐름에서 벗어나, 김말봉의 『별들의 고향』에서 공창폐지 과정이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온전히 회수되지 못한 채 분열되는 지점들을 논한다. 공창폐지는 해방기 주요한 건국의제였지만, 이념 및 윤리뿐만 아니라 경제적 맥락과 궤를 같이하는 사안이었다. 김말봉은 여러 수필을 통해 공창폐지를 지지하는 한편, 공창폐지운동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남한의 남성 중심적 정치계를 비판하며, 공창폐지운동이 여성들의 문제로 주변화되었다는 사실을 폭로한다. 소설 속에서 주의와 주의자, 신앙과 신도의 모습이 지속적으로 분리되는데,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는 인물들의 입을 통해 이상적인 것으로 이야기되지만 실제 특정 정치적 주의를 자신과 동일시하는 주의자들의 이념과 실천이 지속적으로 분열된다. 본 연구는 김말봉의 『별들의 고향』을 통해 해방기는 좌익과 우익의 이분법적 대립을 넘어 좌익과 우익이 모두 내적으로 분열되어 있는혼란스러운 시기였으며, 이러한 맥락 속에서 공창폐지운동은 여성문제와 경제담론, 정치 담론이 교차되는 복잡한 이해관계의 장이었음을 확인하였다.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 개인 여성의 내면을 따라가는 여성 서사로서 최정희의 『끝없는 낭만』이 지닌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해방기 양공주 소설’이라고 알려진 이 작품은 ‘국제결혼’이냐 ‘양공주’냐의 문제를 안고 고민하는 한 여성 개인의 비극을 그려내고 있다. 최정희가 1952년 당시 양부인들과 이웃하여 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하였다고 밝힌 이 소설은 그들의 일상적 어려움을 내면에 초점을 맞춰 조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 내면의 감정을 입각점으로 삼고 세 가지 측면에서 최정희가 파악한 양공주 문제에 재접근하고자 하였다. 주인공 이차래는 아버지와 약혼자 배곤을 비롯한 타자의 시선을 아프게 의식하며 수치심을 강요받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사회 규범에 부합하지 못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난 욕망은 도리어 욕망의 주체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원인이된다. 수치심은 우울증, 불안장애, 중독, 자살 등 문제와도 연결되며 양공주 문제에서 파생되는 문제와 별개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차래를 중심으로 서술되는이 서사에서 주변 인물로 인텔리 여학생 한상매와 양공주 정순자가 등장하여 이차래의 내면에서 불화하는 두 가지 정체성을 더 돋보이게 비춰주고 있다. 특히이차래의 최후를 함께 해준 사람은 혈연이나 결혼으로 맺어진 사람이 아니라 양공주 정순자라는 사실은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마지막으로 이차래를 더욱불행하게 만든 상황은 혼혈아의 어머니라는 사실이었다. 혼혈아 아들의 이질적외모와 남편의 부재라는 문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이차래는 아이를 영아원으로보내는 방법, 즉 해외입양을 보내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차래가 눈으로뒤덮인 거리를 정처 없이 헤매는 신체적 증상은 불안을 극대화하여 보여주며 그녀의 죽음은 이미 서사 곳곳에 배치된 여러 단서를 통해 예고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가족으로의 ‘귀환’이 아니라 가족으로부터의 완전한 ‘탈출’로이 서사는 완결된다.
초록
Abstract
펄 벅의 소설은 1950년대에 집중적으로 번역되면서 대중적인 인기를 누렸다. 펄벅은 아시아 여성의 인종 간 결혼과 혼혈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였다. 한국 문제를 처음 다룬 소설에서 펄 벅은 동서양의 이분법적 대립을 통해 가부장적 가족주의를 역설했다. 펄 벅은 한국의 역사와 아메라시안 입양을 주제로 삼은소설에서 순혈주의와 가부장적 시각을 되풀이했다. 한국을 바라보는 펄 벅의 태도는 전후 미국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반면에 아시아 여성과 혼혈을 역사적 시선으로 포착한 소설에서 펄 벅은 여성의 독립적인 내면과 심리를 섬세하게 묘사했다. 일본인 여성의 사랑과 결혼, 인도의 선교사 일가, 중국의 유대인 사회를 재현한 소설에서 펄 벅은 자기 삶과 운명을 주체적으로 개척하는 여성을 그렸다. 인종 편견과 사회적 차별에 맞서는 여성과 혼혈에 관한 도전적인 문제의식을 통해 펄 벅은 평등하고 민주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서사적 전망을 보여주었다. 1950년대 한국 독자들은 휴머니즘이나 모성애가 아니라 여성의목소리를 통해 새로운 시대의 사랑과 가치관을 제시한 펄 벅의 문학적 실천에 공명했다.
초록
문화적 시간은 선조적으로 흐르지 않는다. 문화의 역사는 지층처럼 겹겹이 쌓여있다. 과거의 지층에서 아직 실현되지 않은 역사적 가능성을 소환하여 미래의 운명과 연결하는 것이 비평의 작업 중 하나라면, 2015년 이후 한국사회에 재부상한 페미니즘과 그 이행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1990년대 여성문학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1990년대는 여성문학사의 전환점이 되는 연대이기 때문이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1991년 소비에트 체제의 몰락과 함께1980년대 변혁운동이 퇴조하면서 거대 이념에 대한 환멸과 냉소가 1990년대의 지배적 감정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여성들에게 이 시기는 성적 각성이일어난 시기이기도 하다. 대서사의 붕괴는 거대하게 부풀어 오른 남성주체의 김이 빠지는 광경을 목격하도록 만들었지만, 그 그늘 아래에 억눌려 있던 소주체들의 각성과 반란, 자기발견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환멸과 각성이 교차하는 역사적변곡점에서 1990년대 여성문학은 한국문학의 주변부에 게토화되어 있지 않고중심부로 진입한다. 본 논문은 1990년대 여성문학의 세 시간성 혹은 전선을 ① 1980년대 민족민중문학에 대한 여성주의적 애도를 통한 주변화된 여성존재의복원 (잔존 형태) ② 성적 주체로서 ‘나’의 발견 (지배 형태) ③ 탈젠더화된 포스트개인의 등장과 마이너리티 퀴어 감성의 표출(부상 형태)이라고 보면서, 이 세전선의 중층결합을 통해 1990년대 여성문학의 지향도를 그리고 있다.
Abstract
Cultural time does not flow lineally. Cultural history is layered like strata. If one of the tasks of criticism is to summon unrealized historical possibilities from the strata of the past and connect them with the fate of the future, we need to go back to women’s literature of the 1990s. Women’s literature in the 1990s was a turning point in the history of Korean women’s literature. With the fall of the Berlin Wall in 1989 and the collapse of the Soviet system in 1991, the progressive movement of the 1980s was in decline, and disillusionment and cynicism toward grand narrative became the dominant structure of feeling at that time. However, for women this period was also a time of sexual awakening. The collapse of the grand narrative allowed women to witness the spectacle of the hugely inflated male subject losing its steam, and led them to the awakening, rebellion, and self-discovery. At a historical turning point where disillusionment and awakening intersected, women’s literature in the 1990s was not ghettoized in the periphery of Korean literature, but enters its center. This paper views the three temporalities or fronts of women’s literature in the 1990s as ① the restoration of marginalized women through feminist mourning for the national and popular literature of the 1980s (residual front), ② the discovery of ‘I’ as a gendered subject and experiment of feminine writing (dominant front), ③ the emergence of de-gendered post-individuals and expression of minority queer sensibilities (emergent front), and provides a overall mapping of women’s literature in the 1990s through the overdetermination of these three fronts.
초록
Abstract
이 글은 영화 「살인의 추억」(2003)과 드라마 「괴물」(2021)의 연쇄살인 서사를저개발의 지리적 상상력을 드러낸 텍스트로 읽고자 했다. 실제 연쇄살인사건에기반한 영화 「살인의 추억」(2003)이 만들어진 이래 연쇄살인은 한국 대중문화텍스트의 매력적인 제재가 되어왔다. 살인의 추억 과 괴물 은 연쇄살인을 하층계급 남성성 위축을 여성혐오 폭력으로 상쇄하는 페미사이드이자 저개발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범죄로 재현하여, 21세기 이래 한국 사회에서 지속된 신도시 개발, 재개발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위계화된 지리적 상상력을 제공한다. 두 텍스트는 연쇄살인 사건의 지리적 배경을 시골 마을이나, 수도권 주변부의 낙후한 지역으로 설정하는 데서 머물지 않고, 아파트단지 개발 이슈를 이야기속에 삽입하고 그곳을 섬뜩한 반자연과 저개발의 공간으로 공들여 보여준다. 이는 시골이나 도시의 주변부 지역을 잠재적 범죄의 공간으로 암시함으로써, 아파트단지로 체현된 중산층의 이성애 규범성과 공간화된 안전 감각을 고조시키고아파트단지 개발이라는 한국사회의 보편화된 욕망을 자연화한다. 이 글은 이러한 대중문화텍스트에 의해 매개된 미디어적인 현실이기도 한 한국사회의 끊임없는 아파트단지개발이 다양한 지역과 공간, 환경에 대한 상상력을 고갈시키는 문화적 착취의 근본 배경임을 비판하고자 하였다.
초록
Abstract
본고는 김멜라의 초기 단편집 『적어도 두 번』과 『제 꿈 꾸세요』에 나타난 퀴어한시간에 대한 윤리적·정치적 상상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때 ‘퀴어’는 이성애 규범을 비롯하여 각종 주류적 ‘정상성’을 구성하는 기율을 해체하고 탈주하는 실천이자 관계성이라고 할 수 있다. 시간을 과거–현재–미래로 분절하고 보편 인간 주체를 가정하는 고전 물리학의 선형적(straight) 시간이 어떤 방식으로 이성애 규범과 착종되면서 퀴어를 ‘존재하지 않는 것non-being’ 또는 ‘삶이 아닌 것nonlife’ 으로 규정하는지, 그리고 퀴어 관계가 자아내는 퀴어한 시간이 선형적 시간을 탈주하고 무화하는지를 살펴본다. 김멜라는 이성애 규범에 의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타자들의 형상을 그린다. 그들은 경계 위에 선 존재로 상실의 슬픔에 잠들지 못하는 이들이다. 이성애규범은 주류의 시간적 논리를 통해 타자들의 몸과 삶을 규범화하고 생성한다. 김멜라는 이 선형적(straight) 시간으로부터 탈주하는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해 최근 한국문학에서 출몰하는 유령적 존재들과는 다른 형태의 유령을 등장시킨다. 그들은 물질성을 띤 유령으로, 죽음 이후의 시간을 살아가며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의 연결을 형성한다. 반복적인 애도의 실패는 이들에 대한 기억을 반복적으로회상하도록 하는 효과를 지닌다. 관계적 존재론에 기반했을 때, 기억은 나에게 남은 타자의 흔적이자 타자들이 ‘나’를 통과해간 무수한 흔적이다. 따라서 기억–회상은 과거를 현재화하고 죽은 자의 흔적을 나와 함께 살아가도록 만든다. 결국산 자는 죽은 자의 흔적을 통해 내 안의 타자와 관계맺음으로써 삶과 죽음의 중첩을 이루어낸다. 그것은 죽음이라는 무한한 잠재성을 삶 속에 품은, 죽음과 함께살아가기로 선택한 삶으로 그 앞에 열린 것은 삶/죽음의 경계를 무화시키는 삶– 죽음의 ‘사이’, 근대적 시간이 해체되고 뒤섞이는 잠재적 창조의 시간이다. 이는유한성에서 무한성으로 넘어가는, 우리가 대문자 지구와의 얽힘을 감각할 수 있는 잠재성을 품은 ‘사건’으로, 차후 김멜라의 작품 세계가 포스트휴먼 존재론으로 나아갈 단초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