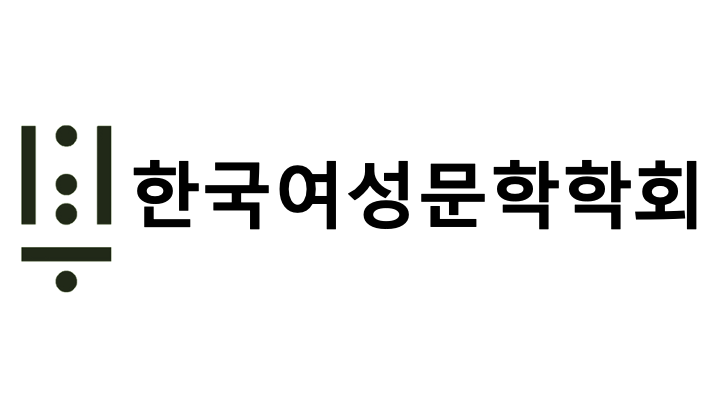- ENGLISH
- P-ISSN1229-4632
- E-ISSN2733-5925
- KCI
5호
초록
Abstract
페미니즘의 발전은 육체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960년대에 페미니스트들은 성차(gender)가 유발하는 각종 차별과 성폭력, 매매춘, 포르노, 성 상품화 등에 대한 관심을 본격적으로 갖기 시작했다. 이들은 여성성을 규정해온 것은 바로 여성들의 몸의 특성, 혹은 여성의 몸과 관련된 역할들이고 이것이 여성에 억압적인 규범을 구성해왔다고 주장하면서 그동안 폄하되어왔던 여성육체 및 남성과 다른 여성육체에서 파생되는 재생산, 여성성, 모성 등에 대한 문제를 다시 고려하기 시작했다. 몸에 대한 페미니즘의 관심은 문학 텍스트에서 크게 두 가지의 방향으로 전개된다. 하나는 여성이 욕망의 주체임을 선언하는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여성의 몸이 이제 타자 중심적인 ‘보살핌의 윤리’에 의해 세계의 중심이자 세계의 전부로 확장되는 경우이다. 작가들의 이러한 낙관주의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의 견고화는 여성의 육체를 상품화함으로써 미를 위한 무한 경쟁에 밀어 넣는다. 여성성의 특성으로 언급되는 허여성의 의미도 현실이라는 마법의 통로를 지나면 여성의 현 위치를 고착시키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게 된다. 몸 담론은 새로운 의미를 산출할 수 있는 전복의 지점이지만 스스로 왜곡될 수 있는 지점일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만 한다.
초록
몸을 마음보다 열등하게 간주했던 근대의 시각ㆍ논리ㆍ이성ㆍ계몽 중심주의에 대한 탈근대적 저항으로 몸의 복원을 강조할 때에도 여성의 몸은 몸 자체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으로 이상화되거나 동물적인 본능을 배설하는 곳으로 폄하됨으로써 양극화된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여성들의 몸은 훼손된다. 여성들은 없던 다리가 생김으로써 성적인 대상이 된다. 그럴 때 잃어버리는 것은 자신을 찾거나 알릴 수 있는 목소리이다. 또 여성들은 자신의 오른쪽 유방을 잘라냄으로써 모성성을 약화시키고 인간성을 강화시킨다. 이런 순응의 극단에 인어공주가 있고, 저항의 극단에 아마조네스가 있다. 인어공주는 다리의 ‘첨가’ 지체가 순응이 되는 몸을, 아마조네스는 유방의 ‘훼손’ 자체가 저항이 되는 여성의 몸을 보여준다. 그리고 인어공주의 다리와 아마조네스의 유방 사이에는 탯줄이 잘린 흉터나 상처에 다름 아닌 오이디푸스의 ‘배꼽’이 있게 된다. 여성(어머니)의 몸과의 분리를 통해 생긴 ‘배꼽’을 가지고 있기에 남성들의 몸 또한 온전치 못하다. 이것이 바로 여성 작가가 바라본 여성의 몸(오정희, 「중국인 거리」), 여성작가가 바라본 남성의 몸(전경린, 「남자의 기원」), 남성작가가 바라본 여성의 몸(이윤기, 「진홍글씨」)을 통해 내릴 수 있는 몸의 정치학이다.
Abstract
Even when the restoration of body is emphasized under the banner of resistance to the modern logocentrism which have regarded the body as inferior to mind, female body is not treated in itself. From one extreme point of view, it is idealized as the solution to all the problems and from the other, it is depreciated as the cathartic place of the instincts like animal. Therefore, female body is often hurt. Women become sexual objective-being by having legs newly. Just then, they are to lose their voice through which they can find and tell themselves. On the other hand, women weaken maternity and strengthen humanity by removing their right breasts. So we can say that princess mermaid shows the obedient extreme and Amazons, the resistant extreme. Princess mermaid has the body which symbolizes an obedience with the "attachment" of legs, and Amazons, the body which represents an resistance with the "hurt" of breast. In addition, between legs and breast exists the oedipal omphalos, the trace of bruise derived from the umbilical cord. Man's body are also incomplete because he has the navel which is brought to forth by the separation from mother's body. It is the politics of body which is inferred from the female body seen by female writer(「Chinese street」 by Oh Jeong-Hee), from the male body stated by female writer(「the origin of man」 by Jeon Kyeong-Rin), and from the female body gazed by male writer(「scarlet letter」 by Lee Yun-Gee).
초록
Abstract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문학사를 다시 쓰는 일이 더 이상 새롭지만은 않은 이 시점에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희곡사나 연극사를 접하기란 여전히 흔치 않은 일이다. 이는 이 장르 자체의 상대적 열세 때문이기도 하고, 다른 장르에 비해 연출과 무대화 과정을 통한 실제 작업을 수반해야 하는 특성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여성의 목소리를 내기 힘든 상황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미약하나마 일제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는 여성희곡사의 맥락을 잡아낼 수는 있다. 나혜석, 박화성, 장덕조 등 일제시대 여성 작가의 희곡에서는 식민지의 억압과 가부장제의 억압에 시달리는 여성의 현실이 드러난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여성희곡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된 시기는 1950년대 이후 60-70년대에 일정한 여성희곡 작가군이 형성되면서이다. 그 중에서도 박현숙과 김자림이 특히 눈길을 끈다. 박현숙 희곡에서는 여성의 모성성과 도덕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연계되는가 하면, 김자림 희곡에서는 억제된 성으로부터 탈출하며 주위 환경에 도전하려는 여성상이 등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더욱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여성연극이 등장하는 것은 여성주의에 대한 이론적 관심이 고조되던 80년대 이후의 일이다. 그런데 이 시기 여성연극은 외국 원작의 번역극이나 번안극, 타 장르의 각색극, 운동성이 강한 단체의 공동창작물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막상 텍스트로서의 희곡 창작 중심으로 여성극작가의 존재를 강조하기란 여전히 쉽지 않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실질적으로 한국연극에 나타난 여성육체 이미지의 문제는, 우선 여성을 소재로 다룬 남성 희곡작가나 남성 연출가의 작업을 통해 다가가야 할 문제로 파악된다. 이현화 희곡 「카덴자」는, 희곡 자체의 상황도 여성 연기자의 육체를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는 데 다 실제 공연에 있어선 그 효과가 더욱 증폭되어 나타나는 두드러진 예로서, 이 문제에 접근해가는 하나의 중요한 대표 사례가 되어줄 수 있다. 「카덴자」는 우선 표면적으로 세조와 사육신의 소재를 다룬 역사물과 같은 첫인상을 풍기나, 사실 그 상황 속에 예정된 ‘임의의 여관객’을 끌어들여 고문을 가하는 과정만으로 채워진 작품이다.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육체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쉬운 위협적이고 압도적인 배경과 분위기 위에 구축되어 있다. 그 안에서 여성 육체는 고문의 점층적 효과를 통해 유린당하는 이미지로 드러난다. 특히 가상의 고문에서 실제 고문으로 진전되어 가는 중에, 실질적인 육체의 고통 못지 않게 성희롱적 모멸감을 불러일으키는 데 적절한 가해 행위들이 자주 드러난다. 궁극적으로 이 작품의 특성은 의미의 애매성과 감각의 확실성으로 귀결된다. 주인공 여성이 정치적 폭력에 의한 또 하나의 무고한 희생자로 제시되었는지, 당대 현실에 무심한 일반 관객을 질타하기 위한 대표적 방관자의 예로 선택되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하지만 해석상의 다의성은 접어두고, 이 공연이 여성의 육체를 활용하여 강력한 고통의 감각을 전달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만일 이러한 여성 육체의 이미지가 많은(특히 남성) 관객들에게 작품의 의미와는 무관한 쾌락의 시선을 허용한다면, 이는 신중히 재고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 작품 외에도 최근 적지 않은 수준급 공연에서 연기자의 노출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기에, 이 문제의식은 계속 유효할 것이다.
초록
Abstract
1990년대 후반 한국영화는 ‘신르네상스’ 시기라 불릴 정도로 영화 산업적인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이 시기에 한국영화는 40%의 극장 점유율과 제작 편수의 증가를 기록했다. 다양한 영화들이 이 시기에 제작된 가운데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서사와 새로운 장르가 등장했다. 이 글은 신르네상스 시기라 불리우는 90년대 후반 한국영화를 성별/성을 중심으로 지도를 그려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영화는 함축적인 사건, 즉 징후적 텍스트로 위치해 있다. 그리하여 이 글은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 당대에 남성 중심의 이성애 구조를 해체하는 새로운 욕망의 경제와 주체성의 관계를 영화가 어떻게 징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신르네상스 시기 한국영화는 성별/성의 재현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변화를 일으켰다. 하나는 기존에 이성애 중심의 여성 섹슈얼리티가 아닌 레즈비언 섹슈얼리티가 등장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외상으로서의 한국역사가 본격적으로 등장, 이 역사와 여/남 주체성의 관계에 대한 탐구가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영화에서 레즈비언 섹슈얼리티가 등장한 영화는 <노랑머리>, <텔 미 썸딩> 그리고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이다. 이 중에서 <노랑머리>와 <텔 미 썸딩>은 싸이코 킬러로서 레즈비언이 등장한다. 이 두 편의 영화들은 레즈비언이 등장하기 위한 재현의 조건을 제시한다. 그것은 범죄자로서의 레즈비언, 공범 관계의 두 여성, 여성의 욕망과 범죄의 비례 관계, 실패한 이성애 여성의 선택으로서의 레즈비언 섹슈얼리티, 어머니의 부재가 낳은 비정상적인 섹슈얼리티로서의 레즈비언 섹슈얼리티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는 규범적인 정상성보다 우월한 일탈적인 비정상성을 상징한다. 그리하여 영화는 법과 언어의 질서에 균열을 내는 감각과 비언어의 소유자이자 저항적 주체로서 10대 레즈비언을 등장시킨다. 식민지 시기와 한국전쟁 그리고 80년대 광주의거를 거친 한국역사의 남성 주체성이 맺는 관계가 본격적으로 고찰된 시기 또한 신르네상스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아름다운 시절>과 <박하사탕>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편의 영화는 다른 방식으로 역사와 남성 주체성을 접합시키는 데 <아름다운 시절>은 아버지에 순응하는 아들을 통해서 민족의 역사를 긍정하는 애국주의적 방식으로, <박하사탕>은 자살을 통해서 민족의 역사라는 자아-이상을 거부하는 자학적인 아들을 통해서 역사를 알레고리화한다. 한편 신르네상스 시가의 대표적인 영화인 <쉬리>는 분단 문제와 여성의 관계를 멜로와 액션의 혼합인 블록 버스터 장르 속에서 빚어낸 영황이다. 이 영화는 분단에 처한 한국의 상황을 강등적이고 복합적인 여성 정체성으로 알레고리화해서 역사와 여성의 보다 복합적인 관계를 펼쳐보인다. 이 영화는 분단의 희생자로서의 민족 알레고리고서의 여성과 액션 영화의 총을 든 여성이라는 도상을 결합, 능동적이면서 변화하는 여성 이미지와 정태적이면서도 고착된 분단 상황이 모순적으로 결합된 토착적이면서도 절충적인 블록 버스터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90년대 말 ‘신르네상스’ 시기 한국영화는 정형화된 성적 재현들을 탈피하면서 레즈비언 섹슈얼리티의 재현 가능성을 질문, 새로운 욕망의 경제를 펼쳐보였고 역사 및 민족 이데올로기와 여/남의 주체성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심문, 역사에 대한 거듭 쓰기를 시도해서 전례 없는 변화의 사회적 의미를 만들어 낸 것이다.
초록
Abstract
영화 <코르셋>은 여성이 언술 주체로서 등장하고 육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영화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주인공 공선주가 남성의 욕망의 대상인 조형된 육체라는 사회적 억압에 의해 구속당하던 차원에서 벗어나 점차 자신의 육체를 진지하게 보게 되고 진정한 주체로 변화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첫째, 여성이 언술 주체가 된 영화, 이것이 <코르셋>에서 우선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여성은 오랫동안 주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영화를 진행시키지 못했고 오직 주체인 남성의 시선에 의해 끌려 다녔으나 선주는 <코르셋>의 진정한 주인공으로서 영화를 이끌어간다. 둘째, 일하는 여자와 성공의 의미를 여성의 관점에서 파악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성공의 의미가 성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사회에서 여자의 남성적 의미의 성공은 전통적인 여성적 성공보다 무의미하다. 그것은 남성의 영역이며 온전하고도 정당한 여성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주인공은 전문직 여성으로서 변화된 위상을 보여주며 여성에게도 일을 통한 성공의 욕망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셋째, <코르셋>은 여성의 육체에 대한 시각의 변화를 담고 있다. 여성은 자신의 육체의 주체가 되지 못한 적이 많았고 영화의 표현에서는 더욱 그러했다. <코르셋>은 여성 육체에 관한 진지한 탐색의 과정을 보여주고 본질적인 사고에 도달함으로써 육체를 통한 여성의 정체성 형성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결론적으로 <코르셋>은 명확한 여성중심적 관점을 드러냄으로써 페미니즘 영화의 한 모델이 된다.
초록
Abstract
1920, 30년대 신지식인의 등장은 역사적 당위성을 획득하고 있었다. 봉건체제의 중심계층은 나라를 빼앗기게 한 담당계층으로 더 이상의 지도력을 발휘 할 수 없었고 자본주의의 중심계층이 떠오르지 않은 시점에서 이광수, 최남선, 등, 또 여성으로는 김명순, 나혜석, 김일엽 등의 신지식인의 사회적 역할은 중차대한 것이었다. 그들은 정치적 꿈을 실현할 수 없는 한계 속에서, 근대화의 꿈을 펼치게 된다. 그들은 주로 글쓰기를 통하여 유교전통의 모순을 비판하고, 새로운 근대의 틀을 마련하려는 욕망을 보여준다. 그 중 하나가 전통결혼 제도를 비판하고 자유연애를 주창하게 된다. 이광수와 모윤숙을 통해서 드러나는 자유연애론은 아직 근대 계몽주의에 기초를 둔 이분법적 가치체계에 의해서 정신과 영혼, 지배와 피지배, 남성과 여성 등 모든 것을 지배와 억압 관계 속에서 바라보는 인식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반면 나혜석을 비롯한 신여성들의 의식은 육체와 영혼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통합되어 개성으로 외화되는 인식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나혜석의 글쓰기에서 나타나는 자유연애론은 인간은 살아있는 생명체임을 부르짖는 몸의 정치학이다. 즉 감각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기이다. 감각적 글쓰기는 고백적 글쓰기로 나타난다. 고백적 글쓰기는 폐쇄된 사회에서 소통체계를 찾을 수 없을 때 드러나는 최종의 선택방법이다. 나혜석은 고백적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새로운 삶의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고, 개성적 주체로서의 인간임을 확인하려고 했다. 나혜석은 남성들은 허위의식을 가차없이 내던지고 철저히 자신의 ‘날몸’으로 각인되는 흔적에 의해 포착하려고 했다. 사회는 폐쇄된 남성중심사회였고, 나혜석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초록
Abstract
이 글은 금홍이란 인물을 중심으로 이상 소설의 복잡한 서사 전략 속에서 여성이라는 타자가 “나”와 어떻게 만나는지, 그리고 그 만남에 의해 “나”의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그와 동시에 여성이라는 타자는 어떤 모습을 갖게 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 글은 “나”의 타자들이 한결같이 ‘요부’(妖婦, femme fatale)의 이미지를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금홍은 배천온천의 기생이었는데 이상과 만났을 때 그녀는 당시 온천 지역에 널리 퍼져 있던 매음부였던 것 같다. 이후 금홍은 이상을 따라 경성에 오게 되는데 여기서 그녀는 당시로서는 첨단을 걸었던 “모던걸”로 변신한다. 이러한 그녀에 대해 이상의 친구들은 한편으로는 매혹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강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다. 즉 그들은 경성의 모던걸 금홍을 요부로서 대하고 있었던 셈이다. 경성에서 이상은 금홍과 2년 6개월 정도 동거생활을 한다. 이상은 그녀와 헤어지고 난 후 「지주회시」, 「날개」, 「봉별기」 등의 작품을 썼는데 이 작품에서 “나”의 “안해”는 “나”를 흡혈하는 “거미”이자 살인자의 모습을 갖는다. 「지주회시」에서 이상은 금홍을 “거미”에 비유하는데 이는 팜므 파탈의 대표적인 이미지인 뱀파이어의 모습과 흡사하다. 또 「날개」에서는 속임의 서사원리를 사용해서 그녀를 철저하게 타자화하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요부의 모습으로 그려놓고 있다. 그는 금홍의 정조없음을 비판하지만 그것은 육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마음의 문제였다. 즉 그녀가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안해”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희생당했다고 그리고 있다. 서양의 경우 요부의 이미지는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던 신여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상이 살던 시대에도 여권을 주장하는 신여성이 대두했지만 식민지 조선의 신여성은 그다지 강력하지 못했다. 그녀들은 이념적으로는 새로운 사상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들의 사상을 실현시킬 뚜렷한 경제적 위치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신 그녀들은 여성의 성적 매력을 팔아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신여성의 모습이 당시 남자들에게 줄 수 있는 두려움이란 봉건적인 가족제도를 훼손하거나 남자의 순정을 훼손하는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이상이 금홍이란 여인이 요부의 이미지로 그리면서 절대애정을 소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초록
Abstract
박완서 소설은 삶의 ‘이면’으로서 ‘내면’적 자아를 부각시키려는 성격화 방식을 보여준다. 이는 전쟁과 분단, 전체주의적인 근대화의 경험을 통해 은폐되고 ‘억압’된 역사적 사실들을 복원하려는 작가의 방법론에서 연유한 것이다. ‘기억’과 ‘복원’의 방법론은 바로 역사적 과정에서 억압된 사실들을 ‘내면’적 자아의 형상으로 복원하려는 작가 나름의 정치적 의도가 전제된 서술방식으로서 ‘이면지향적 사유’와 연관된다. 특히 박완서 소설에서 정치적 의도를 읽어내고, 그것을 통해 문학사적 의미를 부여하려는 것은 ‘기억’하고 ‘복원’하려는 역사적 경험이나 ‘사실’은 단순한 증언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은폐하고 억압하도록 하는 현실의 이해관계까지도 비판하는 현실비판의식과 내면화된 이데올로기의 허위성을 비판하려는 자기성찰이 이 기억의 방법론을 역사적으로 의미있게 한다. 『나목』의 이경과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의 수지는 전쟁이라는 극적 상황을 통해 허구적 ‘가족 관념’에 의해 부정된 자기 삶의 진상(眞相)을 발견한다. 그러나 그 ‘관념’은 자기 삶의 근거이기도 하여 자기를 발견함과 동시에 은폐할 수밖에 없는 역설적 상황에 놓임으로써 극심한 내명갈등을 겪는다. 이 내면갈등을 내색하지 못하고 내면에만 담아두어야 하는 인물의 이중적 상황은 인물의 삶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역설적으로 강조한다. 이런 이중적 인물의 성격화방식은 서술의 <역설성>이라 할 수 있다. 자기를 발견함과 동시에 자기를 은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인물의 내면갈등은 자기를 소외된 자, 즉 타자로 인식하는 자기인식으로서 고아의식이 된다.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나 규범의식에 의해 자기가 소외되었다고 여기는 고아의식은 60ㆍ70년대의 전체주의적 ‘근대화’ 과정에서 내면화되었던 획일적인 자아를 부정하고 억압된 자아를 복원하는 자아의 서사라 할 수 있다.
초록
Abstract
‘나무’는 원형적으로 끊임없이 허여하는 수동적인 몸을 상징하는 동시에, 무한한 생멸과 순환을 거듭하는 생명력을 지닌 세계수로 신성시되어 왔다. 그런데 여성주의 자장 안에서 읽어보는 나무에 관한 상상력은 매우 다르다. 여성의 몸 안에 나무가 형해되어 있거나 육화되어 있는 여성시에서, 나무는 오히려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도 길들여지지 않으려는 의지적인 몸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김혜순, 나희덕, 황인숙, 세 시인의 시를 중심으로 길들여지지 않는 나무들로 일관된 여성시의 궤적을 살펴보았다. 김혜순은 ‘나무’를 통해 사유하는 대표적인 시인이다. 그는 남성중심의 신화적 세계관 위에서 신성시되어 온 나무를 뒤집는 전복적인 나무로 여성의 몸을 표현한다. 여성의 몸을 싱싱한 나무와 더불은 ‘환한 대걸레’로 표현해 나무의 생장과 여성의 일상적 노동을 축제의 장으로 만들며, 이런 온전한 나무의 몸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적 세계관의 흔적을 적극 거부할 뿐 아니라, 흰 나무와 ‘희디흰 편지지’의 육체성을 통해 여성적 글쓰기의 욕망까지 체현한다. 나희덕의 시에서 나무는 생태적 친연성과 대지적 모성성을 넘어서 자기 내면의 타자들을 비유한다. 자기 안에 내재한 길들여진 자아에 길항하는 자존적 자아, 여러 겹의 욕망을 지닌 채지병같은 몸살을 앓는 섬세한 자아들이 모두 나무로 표현된다. 시인은 이런 나무들로 가득한 ‘잡목숲’의 눈부심을 마침내 자기 내면에서 발견하고, 자신의 ‘밝은 피’에 뿌리내린 나무들과 한 몸으로 즐겁게 몸을 떨며 자기 안의 타자성을 적극 끌어안는다. 황인숙의 나무는 마법에서 풀려나 밤바람 속을 내달리는, 그리고 그것이 즐거워 ‘진저리’치는 나무들이다. 시인은 욕망이 무거운 만큼 오히려 가볍게 날아오르길 희구하면서, 살아있음을 생생하게 느끼는 순간 나무들과 함께 광기의 바람 속으로 유쾌하게 뛰어든다. 싱싱하고 건장한 나무를 ‘훨씬’ 껴안아 그 심장 박동대로 온몸을 젖혀 흔드는 이 시인에게 있어 숨가쁜 질주는 곧 ‘나무의 몸을 통해 나온 욕망’들이다. 이같이 세 시인은 환한 광기의 나무, 밝은 피에 뿌리내린 나무, 질주하는 유쾌한 나무 등을 통해 여성의 몸과 욕망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스 신화에도 자신의 의지대로 나무로 몸바꾼 여성들의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듯, 길들여지기를 거부하면서 나무가 되는 여성들의 이야기는 여성시에 있어서 의미있는 주제라 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나무가 되길 서슴치 않은 여성들의 몸에 흐르는 수액은 그 무엇에도 길들여지지 않는, ‘늑대와 함께 달리는 여인들’의 젖줄과도 같다.
초록
신경숙 소설들의 특징을 '공동체적 관계의 회복 혹은 집의 재건과 따스함의 분위기'로 요약할 수 있다면, 은희경 소설들의 특징은, '삶의 이면에 대한 가차없는 시선과 냉소적 태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전자가 '따스한 관계'의 가능성을 역설하는 반면 후자는 그러한 관계의 실현 불가능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일견 서로 상반된 것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신경숙과 은희경을 소설은 삶의 단자화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 시대에 '과연 타인과의 만남은 가능한가?' '그러한 경험은 지속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의 소설은 '지속성을 체험하려는 열망'을 드러내고 있다. 그들은 그러한 열망을 작품 속에서 실현시키기 위한 매개로 구체적인 감각, 특히 몸의 감각을 사용한다. 그 까닭은 그들이 구체적인 몸의 감각을 통해서만 지속성을 경험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따뜻한 피가 흐르는 몸의 만남, 그리고 그 만남의 기억만이 우리를 살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시간의 침식 작용에 저항할 수 있게 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문제는 몸과 몸의 만남, 온기의 전달 가능성, 섹스라는 구체적 감각을 통해 지속성을 체험하려는 그들의 열망이, 그 구체성에 머물러 있지 않고 보편적인 만남의 가능성으로 초월한다는 데 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현실의 시름을 잠시 잊게 하는 '환상의 공간'을 불러들이게 된다. 신경숙의 소설에서 환상의 구성물이 인간 존재가 지닌 온기 즉 체온이라면, 은희경의 소설에서는 낭만을 걷어낸 사랑 즉 섹스이다. 지속성을 체험하려는 열망으로 인해 환상을 불러들이는 이러한 태도는 생에 대한 지극히 낭만적 태도이다. 그런데 몸의 기억만으로 만남의 지속성을 체험하고 유지하려는 태도는 삶에 대한 소극적 방어일 수 있다. 또한 두 작품 속에서 그 열망은 그 자체로서 생산적인 힘이 되지 못하고 결핍 혹은 상실의 형태로만 유지되고 있으며, 충족이 끝없이 지연되는 방식에 의해서만 그 열망이 증폭되고 있다. 물론 이것이 90년대 현실 속에서 실현 가능했던 지속성 체험의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정치 혹은 현실에 대한 정면 승부를 회피하고, 그 투쟁을 문학 내부로 끌어들일 때, 그러한 문학은 오히려 현실 정치를 내면화함으로써, 현실 자체를 승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한 문학은 궁극적으로 현실 보수화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신경숙과 은희경 소설에 드러나 있는 지속성을 체험하려는 열망은 현실과 정밀하게 만나지 못할 때, 현실을 바라보는 그들의 낭만적 태도로 인해 헛된 꿈이거나 망상이 되기 쉽다.
Abstract
Generally, Critics say that the perspective of 'the meeting with unrelated people' could be actualized in Shin Kyung-Sooks novels but it could not be in Un Hee-Kyungs those. At a glance, it seems that there is a opposed view of the world between Shin Kyung-Sooks and Un Hee-Kyungs novels. But both of them have the similar understanding of the 1990s reality and are based on 'romantic view point of the reality'. They have a same question such as 'how to meet with unrelated people' and 'how to retain such experience' in the world in which our life extremely has been fragmented. In other word, Shin and Un have expressed the desire of 'the meeting with unrelated people' and 'endurance of the experience'. They use the special techniques, which are 'making the fantastic space' and 'using the perception of body', in order to realize their desire in their novels. The component of the fantastic space means the temperature of the body in Shin's novels and does sex in Un's those. The reason why they use these techniques is that they comprehend the reality through the romantic viewpoint. These techniques are the solution that two of these novelist finally have accepted to meet reality. However, if novelists never concerned about politics or reality but only literature, it will cause to accept the problem of reality itself. The literature written by novelist such like that helps to conserve the problem of reality. Sometimes, the desire and romantic viewpoint of the reality, expressed by Shin and Un, may become illusion.
초록
Abstract
본고는 조선 후기라는 중세 질서의 해체 시기 속에서 ‘열(烈)’이라는 여성 윤리가 절대화하고 있음을 열녀전(烈女傳)의 여성 재현 양상을 통해 살펴보고, 그 속에서 여성의 몸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고찰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먼저 2장에서는 조선 후기의 열녀전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서술 단락을 순차적으로 따라가며 열녀전에 입전된 여성 인물의 생애를 살펴보았다. 열녀전 여성 인물의 행위 유형은 대체로 고정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열행 이전 부분의 서술 단락에서는 열녀전의 여성 인물이 열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열녀가 될 만한 강하고 의지적인 성품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었다. 열행을 실천하는 부분의 서술 단락은 열녀전의 여성 인물이 열녀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하는 부분으로, 남편을 희생적으로 간호하는 모습과 남편을 따라 죽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다. 3장에서는 열녀전에 나타난 여성의 몸에 대한 문제를 다루어 보았다. 열 윤리는 고도의 정신적 가치이지만, 그 가치가 실현되는 것은 여성 몸의 경험과 실천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 신체가 남편의 간병을 위해 사용되는 국면에서 여성의 몸은 순종하는 몸으로 형상화되고 있으며, 여성의 신체적 감각과 고통이 無化되어 서술되는 양상에서 여성의 몸은 자신의 감각과 고통을 말하지 않는 침묵하는 몸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사후 여성 인물은 자신의 용모를 훼손하고 음식을 먹지 않는 拒食 행위를 통해 신체에 죄의식을 각인하고 있었으며, 여성 노동의 양상과 노동의 소외를 통해 여성이 노동하는 몸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조선 후기 열녀전이 남성 작가들이 전형적으로 여성을 재현하는 문학 장르였으며, 그 속에서 열녀의 입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은 조선 후기의 가부장 이념이었음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렇게 창작된 열녀전의 사회적 재생산의 효과는 여성들에게 죽음을 암묵적으로 권장하여 내면화하게 만들었으며, 죽음에 대한 강박증을 갖게 하였음을 실제 여성의 유서를 통해 증명하였다. 5장에서는 조선 후기 열녀전이 가지는 여성 문학적 의의를 살펴보았다. 조선 후기 열녀전은 강한 남성 중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텍스트이다. 그러나 그러한 텍스트 자체의 성격으로 인하여 오히려 고전 여성 문학의 영역을 재범주화하고, 고전 문학에 있어서 여성주의적인 문학연구의 시각을 재정의할 수 있게 해주는 조직적 중심으로서의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
초록
Abstract
우리시의 경우, 90년대 들어 비로소 ‘여성적 글쓰기’가 부상하게 되었다. 확실히 90년대 여성 시인들은 과거에 비해 여성의 정체성 혹은 여성의 언어에 대한 탐색과 물음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여성주의 시의 정체성과 방향을 점검해보고자 하는 기획 아래 1) 여성 시인들의 텍스트 속에 그려지는 여성적 언술의 특징은 무엇인가? 2) 그러한 언술로 발화하는 여성 시인들의 텍스트는 어떠한 현실 인식과 시인의 내면을 재현하며 어떠한 가치나 이상을 계시하는가? 라는 물음을 중심으로, 90년대 여성사를 대표하는 언술 전략들을 갈래화해 보았다. 그 결과, 사회ㆍ자연ㆍ신화와 같은 외부적 현실 속에서 여성의 정체성을 찾아내려는 통합 지향의 언술 전략(아이러니컬한 풍자, 자연친화적 서정, 알레고리적 서사)과, 욕망ㆍ무의식ㆍ공포 등으로 가득찬 여성의 내면 안에서 여성의 정체성을 구현해내려는 내적 분열의 언술 전략 (독백과 대화의 말건넴, 비약과 지연의 환상, 가학과 피학의 그로테스크)으로 그 양상들을 정리할 수 있었다. 여성시의 언술 전략을 탐색해가려는 이러한 과정은, 여성의 경험을 여성의 눈으로 복권시키면서, 여성들의 목소리와 정체성을 확인하는 작업이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가치를 제한하고 격하시키는 남근중심적 사고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여성 자신들의 분노를 창조력의 근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본고에서 살펴본 다양한 언술들은 남근중심적인 상징계에 해체적인 비판을 가함과 동시에 여성적 글쓰기의 발견을 위해 다양한 언술 전략을 고안해낸 90년대 여성 시인들의 노력의 소산물이다. 그리고 여성적 글쓰기의 이 같은 약진이야말로 우리 시단에서 ‘여성’이 시적 인식의 전망과 모색의 주체로 자리잡아 가는 일련의 확인들일 게다.
초록
이 연구는 1990년대 한국 문학에서 진행된 문학 논쟁들을 통해 새로운 주체성을 위한 기획들이 등장하고 사라지는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여성적 주체성을 위한 기획의 의미를 현재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십 년 간 차이의 이름으로 등장한 새로운 주체성의 기획들은 근대성의 패러다임을 비판적으로 재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여성적 주체성을 위한 기획들 역시 여성작가들의 대거 등장이라는 표면적 요인뿐 아니라 이러한 새로운 주체성을 위한 기획들의 한 흐름 속에서 살펴보아야만 그 의미를 정당하게 살펴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민족 문학론 비판과 신세대론, 동아시아 담론등 새로운 주체성을 위한 기획들의 흐름을 살펴보고 그 연장선에서 여성적 주체성의 서사들의 변화와 새로운 시도들을 고찰하였다. 이 과정에서 근대적인 자기 동일성의 서사와는 다른 방식의 차이의 서사들이 구축되는 면모를 통해 새로운 차이의 서사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서로의 서사라는 새로운 차이의 윤리학을 구성할 수 있는 서사의 형식을 제기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emerging the new subjectivity in 1990's Korean literature. Rise and fall of new subjectivity in 1990's is a barometer of the success and failure of deconstructing modern subjectivity. Debate about 'New generation', 'The East asian', 'politics of difference' is the symptom of project of new subjectivity. So called women writer's novels which becomes the main stream in Korean literature, are the productions of this new project. Thus this study aim for historical approach about this project of new subjectivity. And this study elaborates new change of the narrative of feminine subjectivity. In this acting, I explore the narrative of difference which is different from modern narrative of self-identity. This reveals the possibility of new narrative. The new narrative of difference is also the ethics of differece. In conclusion, this study reached that new subjectivity in 1990's Korean literature was emerging from new feminine subjectivity and the narrative of difference.
초록
Abstract
법적ㆍ제도적ㆍ관습적ㆍ문화적으로 명백한 가부장제 사회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의 결혼한 여자로서 나에게 맡겨진 다중적 역할 부담을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정도로는 수행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함으로써 이 자본주의 가부장제의 단순한 방조자일 뿐 아니라 그 존속에 기여하는 나를 페미니스트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러나 가부장제의 존속에 기여하는 나의 옆에 살을 맞대고 가부장제의 일상적 억압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해방을 꿈꾸는 ‘나’들이 살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 지점에서 나는 질문을 수정하여 내가 어떤 페미니스트인지 묻는다. 20여 년 전의, 동등한 기회와 제도적 평등에 대한 나의 열망은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지향에 맞아떨어진다. 대학생이 되었을 때 나를 사로잡은 논리는 물론 마르크시즘이었다. 이어진 결혼은, 나의 개인적 체험으로 보아도 그렇고 거의 모든 여성들의 경험담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 여성이 가부장제의 실체를 정면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가장 분명한 계기이다. 결혼 제도의 그러한 본질적 속성과 직면한 까닭에 더욱 또렷이 인지하게 된 것은, 그 동안 의식적ㆍ무의식적으로 지워 버리려 나의 여성성이었다. 나는 여자 친구들과의 교류와 임신, 출산을 통하여 나에게 아로새겨진 모든 차이들 중의 한 중요한 차이로서 성차를 인식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문화주의 페미니즘이 급진적 페미니즘과 반페미니즘의 경계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아슬아슬한 느낌은 종내 사라지지 않는다. 만약 내가 찬양하는 여성성이 나 자신을 부자유하게 얽어매어 놓는 질곡일 때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단일한 의미의 “여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포스트페미니즘의 주장은 이 지점에서 빛을 발한다. 그렇다면 페미니즘 역시 하나가 아닐 것이다. 한국 사회 자체가 이미 전근대, 근대, 탈근대의 양상들이 뒤섞인 복잡다단한 혼종(混種) 사회일진대 한국 사회의 여성 정체성을 고정되어 있고 단일한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무한한 다양성과 단조로운 유사성’의 한가운데에서 혼란스러워 한다. 나는 여성 혐오적 근대의 가혹한 시간을 살아온 전 세대 여성들의 저력에서 탈출구를 찾는다. 남자들이 거대담론에 몰두해 있는 동안 생활 터전을 지키며 생명 유지의 노동을 감당해온 우리 나라 민중여성들의 생활력은 진정 끈질기고도 줄기찬 것이었다. 그 여성들의 자기 희생적 생활력이 가부장제적 가정과 가문을 위한 헌신으로 귀결되었다는 것을 비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날의 세련된 딸들이 이 어머니들과 단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대책 없는 전복과 단절, 무시와 경멸보다는 “비판적인 협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가족, 가문의 보존을 위해 사용되어온 우리 어머니들의 힘이 딸들을 거쳐 세계를 향하여 해방될 수 있으려면. 이러한 완만한 그러나 중단 없는 비판적 협상을 통하여 페미니즘‘들’은 제휴해야 할 것이다. 21세기 기술과학의 시대에 이러한 제휴는 이제 전통적 ‘인간’의 범주를 넘어 설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