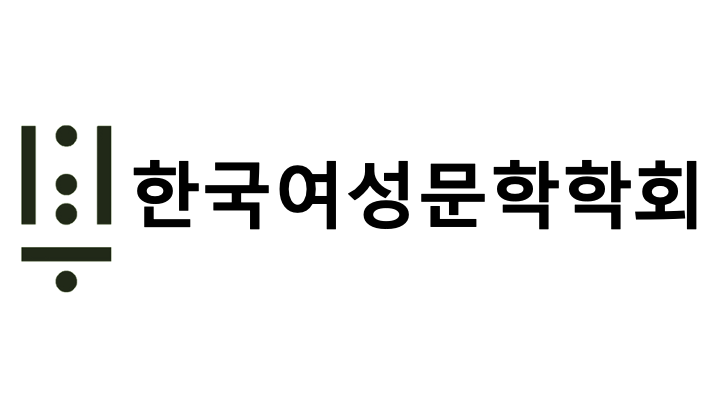- ENGLISH
- P-ISSN1229-4632
- E-ISSN2733-5925
- KCI
46호
초록
Since debuting with “A Legitimate Spy(정당한 스파이),” published in Samcheolli(삼천리) in 1931, Choe Jeong-hui continued to lead her 50-year career until “Hwatu Story(화투기)” in 1980. Compared to Kang Gyeong-ae and Ji Ha-ryeon, the second wave of female writers who were forced to terminate their literary activities due to certain circumstances and trend of the times, Choe Jeong-hui’s career survived through Korea’s tumultuous history, ranging from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o Liberation, the Korean War, the April Revolution, the May 16 coup, and the Vietnam War, the first military dispatch by the Korean army. Her relentless pursuit of career, quite rare for a female writer, was characterized by extremely bipolar critique toward her body of work, as either the “most feminine among female writers” or being the “most unfeminine.” This paper seeks to focus on Choe Jeong-hui’s literary world pre and post-liberation Korea, in consideration of her transfigurations and deviations. During this turbulent era of wartime mobilization of the Japanese imperialist power, Liberation, and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collaboration” with the Japanese emerged as a major issue of the day. While no writer who was active during the colonial period was free from such accusation, the aspects of their stigmatization, and the subsequent excuse, repentance, and reflection were unique to each of them. This paper aims to discuss the issue of collaboration as the element that penetrates pre and post-Liberation period, linking it to the early fellow traveler tendencies and the transition to “femininity,” represented by the “Maek Trilogy(맥 삼부작).” The two wars in pre and post-Liberation Korea effectively launched the motherhood discourse, which provided the source of cooperation and alignment. Choe responded to the nationalization and demands of the motherhood discourse by femininity, playing a part in nationalized motherhood. Parts 2 and 3 of this article will delineate how the transition of Choe’s femininity cannot be discussed separately from the wartime motherhood discourse. For this purpose, this paper posits “maternal alliance” as the point of analysis. Alliance is a concept often applied to the nature of relations between states, which forms a temporary and fluid space of strategic partnership and cooperation involving mutual interests. Despite the unequal and asymmetric power relations, maternal alliance comprised a part of the wartime mobilization regime as “the weapon of the weak” that negotiated comparative advantage. The accusation of collaboration signified interrogation and punishment of her involvement in the wartime mobilization. While this post factum accusation was waged around the motherhood discourse, regarded as the natural manifestation of femininity, the gender dynamics of femininity itself remains unresolved. This paper attempts to critically examine the dilemma and the paradox of femininity and motherhood, which may have functioned as the latent “ancient future.”
Abstract
최정희는 1931년 『삼천리』에 「정당한 스파이」로 등단한 이래 1980년 「화투기」까지 거의 50년에 걸쳐 작품 활동을 해왔다. 제2기 여성작가군을 형성했던 강경애, 지하련 등의 여성 작가들이 어떤 식으로든 시대적 상황과 흐름에 밀려 문학 활동을 접어야 했던 것과 비교하면, 그녀는 식민지, 해방, 한국전쟁, 4·19, 5·16, 나아가 한국군 최초의 파병이었던 베트남전쟁까지 굴곡진 역사를 함께 넘어온 인물이었다. 여성 작가로서는 상당히 드문 이러한 지치지 않은 작품 활동은 가장 ‘여류다운 여류’에서 남성을 떠올리게 하는 ‘여성답지 않은’ 작가의 대명사로 양 극단의 평가를 점하게 했다. 이 글은 최정희의 작품 세계가 지닌 변모와 굴절을 감안하면서, 해방 전/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 시기는 일제의 전시 동원과 해방 및 한국전쟁의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첨예한 시대적 화두로 ‘부역’이 문제시되었던 때이다. 부역은 이 시기 작품 활동을 했던 작가들이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던 문제였지만, 부역의 오명과 이에 따른 변명과 참회 및 반성의 양태는 각기 달랐다. 이 글은 최정희의 해방 전/후를 관통하는 요소로 부역의 문제를 초창기 동반자적 경향에서 ‘맥 삼부작’으로 대변되는 ‘여류다움’의 방향 전환과 결부시켜 논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해방 전/후 두 차례의 전시(戰時) 국면은 협력과 동조의 자원이 된 모성 담론을 그야말로 활성화시켰다. 최정희는 모성 담론의 국가적 전환과 요구를 여류다움으로 대응하며, 국가모성의 일익을 담당했다. 이 글은 최정희의 여류다움으로의 방향 전환이 전시 국면의 모성 담론과 별개로 논해질 수 없음을 2장과 3장에서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모성 동맹’을 분석의 입각점으로 삼는다. 동맹은 흔히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 설정을 의미하는 친소(親疎)의 집단 개념이지만, 상호간 이해가 교차하는 전략적 제휴와 협력의 일시적이고 유동적인 장을 형성한다. 비록 한쪽의 일방적인 힘의 경사가 있다 해도, 유·불리를 따지는 약자의 무기(weapons of the weak)로써 ‘모성 동맹’은 전시 동원 체제의 일부를 이루었다는 것이 이 글의 기본 논점이다. 친일 부역 혐의는 모성 동맹의 전시 동원과 연루된 사후적인 심문과 단죄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적에게 협력했다는 사후적인 부역 혐의가 여류다움의 자연스런 발로로 간주된 모성 담론을 선회하고 있다면, 여류다움의 젠더 역학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이 글은 어쩌면 ‘오래된 미래’로 잠복해 있을지도 모르는 여류다움과 모성성의 딜레마와 역설을 숙고하는 비판적 성찰의 한걸음을 내딛고자 했다.
초록
Abstract
이 글은 한무숙의 소설 『역사는 흐른다』를 중심으로 내셔널리즘의 성격과 젠더의식을 살펴보았다. 이 소설에서 작가는 해방 이후 새로운 국가 건설이라는 아젠더를 실현할 수 있는 내셔널리즘을 구축하려고 했다. 이 시기 아젠더는 좌우익의 이념 극복, 식민지와 전통사회의 잔재 청산, 경제 활성화라는 당면과제의 해결이 핵심 쟁점이었다. 『역사는 흐른다』는 이 문제를 3.1절 기념식을 통해 재현하면서 내셔널리즘의 이상을 제시한다. 친일/국민의 구별은 식민지 잔재 청산과 좌우익의 이념 극복의 문제와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유연하면서도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그래서 적극적인 친일 협력자마저 국민으로 수용하는 남한 정부나 수동적 협력자마저 국민에서 배제하는 38선 이북의 정권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유지한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역사는 흐른다』는 탈이념적 민족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내셔널리즘의 사회원리를 모색하는데, 이를 전통적 사회에서 소환하지는 않는다. 민족의 역사는 신분과 성별에 의해 세밀하게 위계화된 전통적 제도와 규범에 의해 유지되고 있으나, 그 제도와 규범은 사회의 질서와 민족 공동체를 규합하는 힘이 아니라 분열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발전 이데올로기와 근대적 합리주의에 의해 구축된 능력주의 사회에서 새로운 국가를 지탱할 수 있는 내셔널리즘의 사회원리를 모색하게 된다. 능력만 갖추었다면 신분이나 성별과 관계없이 사회적 성공도 하고 정치적 주체로도 활동할 수 있는 사회를 소망한 것이다. 그런데『역사는 흐른다』는 능력주의 사회로의 지나친 편향성을 노정하며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현모양처를 근대적 여성상이라는 환상을 구현한다. 또한 여성의 주체성을 주장하면서도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내셔널리즘의 경계 밖으로 추방하는 한계 역시 노출한다.
초록
박화성 작품 중에서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작품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국가주의적 계몽성을 드러내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언제나 균열적으로 침묵했던 전쟁의 이야기를 작가의 말년 작품에서 다시 끄집어낸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작품들도 1977년 작품집 『휴화산』(창작과 비평사)에 실렸던 단편들과 그 이후의 작품들, 자전적소설 『눈보라의 운하』(『여원』 연재, 1963)로 전쟁 이야기를 다시 쓰고 있는 자전적 작품들이다. 칠순이 넘은 노년의 작가가 다시 전쟁의 기억을 끄집어내고 말년의 작품에서도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쓰기가 시도되고 있다. 최정희, 박완서의 전쟁 체험 다시쓰기와도 비교되는 이러한 증언과 기억의 서사가 박화성의 경우는 늘 침묵과 멈춤으로 기억의 한 부분으로 되돌아오는 특징을 보인다. 박완서의 작품이 오빠의 죽음에 대한 다시쓰기를 통해 조금씩 진실에 가까워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면, 박화성의 경우는 늘 그 자리에 다시 멈추어 선다. 『눈보라의 운하』에서는 좌익에 관련된 듯한 아들이 어느 날 동료들과 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짧은 기술로 침묵시키고 있다. 말년의 작품인 「미로」에서는 서울에 두고 피난길을 떠났던 딸의 이야기를, 「마지막 편지」에는 행방불명된 아들의 이야기를 다시 쓰고 있다. 특히 「마지막 편지」는 작가의 생애에서도 거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작품으로 보인다. 이 소설은 34년 동안 입에 담지 못 했던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초혼가와도 같은 작품이다. 그러나 그 역시도 완장 찬 사나이들과 함께 나간 아들의 이야기는 모호하게 끝나고 만다. 세대의 차이나 정치적 상황의 차이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직접 사상검증의 대상으로 살아왔던 작가이기에 자신에 대한 이념적 알리바이나 자식의 죽음에 대한 알리바이를 서사화하기는 더욱 쉽지 않았을 것이다. 자신의 전쟁체험에 대한 윤리적 판단의 불가능함을 반영하는 특징이 감정에 대한 서사적 침묵으로 드러나는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여성들의 자전적 소설들은 고립된 여성의 경험에 대한 소통의 글쓰기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어서 무엇인가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다른 여성들과 공감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선택되는 경우가 많다. 소설과 수필의 경계를 허물고 소설인지 수필인지 혼성장르적 특징을 보이는 이유도 이러한 서사적 추동 자체가 남성작가와는 다른 경향성 때문이었다. 전쟁 경험에 대한 증언도 파편화된 주체를 사회적 보편적 자아로 통합하는 남성지식인의 서사적 증언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그 때문에 여성작가들의 전쟁 증언은 원체험의 장면으로 되돌아가 다시쓰기를 시도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원초적 사건은 단지 그것 자체로 의미를 지니는 것(역사적 진리)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이야기됨으로써 그 의미가 재해석되고 통합(서사적 진리)된다는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도 여성 경험의 다시쓰기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Multiple of South Korean female author Pak Hwasŏng's works deal with the subject of war and national enlightenment. In particular, hitherto silenced and fragmented stories of war appear in works produced during the latter part of her life. This essay will discuss the later works of Pak Hwasŏng which constitute a rewriting of war memories. Most notably, I evaluate the short stories contained in the collection Hyuhwasan and her later autobiographical works, such as Nunbora ŭi unha. Indeed, in Pak Hwasŏng's later works she once again summons recollections of war in an attempt to fashion a new narrative of wartime memories. The testimony and memories laid bare in Pak Hwasŏng's works differ from the war writing of authors Ch'oe Chŏnghŭi and Pak Wansŏ. In Pak Hwasŏng's writings, the narrative returns to a single aspect of a memory through silence and a suspension of time. Pak Wansŏ's works, however, reveal a process of working closer towards truth through a rewriting of the death of the author's brother. Pak Hwasŏng's works are arrested in a single moment in time. The novel Nunbora ŭi unha relates the story of her leftist son who one day goes out with his comrades and doesn’t return. The narration is concise and restrained and is surprisingly devoid of emotion. In contrast, the short stories “Miro” and “Majimak p'yŏnji” deal more concretely with stories of war. “Miro” relates the story of her daughter who has left Seoul as a refugee. “Majimak p'yŏnji” rewrites the story of her missing son. This story “Majimak p'yŏnji” summarizes the last years of the author’s life. The work begins with the words, “Son! My son! Chaeyŏng! My Chaeyŏng!” The story begins with a song memorializing her son, a name she could not speak for 34 years. Yet, the story of her son and the other armband clad young men he left with is dealt with ambiguously. It could likely be an effect of generational differences and the political situation, but for an author who had lived under constant state scrutiny concerning her political convictions, the explaining away of her political beliefs or the death of her son through narrative would not have been easy. Autobiographical novels by women often act as works communicating the commonality of the isolated experiences of women and are often considered as attempts to speak of one's own experiences in an effort to empathize with other women. These works are particular in that they destabilize the boundary between novel and essay, setting them apart from the works of male writers. The testimonies of war also differ from the narrative testimonies of male writers which integrate the fragmented subject into a socially universal self. Following from this, the war testimonies of female writers return to primal memories as an attempt to rewrite historical memory. The rewriting of female experiences also needs to be evaluated from the perspective of psychoanalysis to determine how these narratives reinterpret events not as historical truths in themselves, but as reconstructions of the past through narrative which serve to reevaluate and consolidate their meanings.
초록
Abstract
이 글은 1960년대 여성-문학-교양의 연계 지점에서 ‘펄 벅’은 어떻게 의미화 되었는지, 그리고 ‘펄 벅’의 위치와 의미화는 전후 여성 교양의 형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펄 벅의 작품세계에 대한 비평을 재독해함으로써 학적인 인증 과정을 거친 펄 벅의 문학이 당시 여성-문학-교양 범주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960년 펄 벅 방한을 즈음하여 『여원』에 수록된 수행기, 작가들의 인상담, 작가론, 연설문 등을 재구성한 결과 펄 벅이 이상적인 여성성과 모성성을 세계시민의 요건으로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제국여성의 위치에서 저개발국가의 여성을 교양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펄 벅의 문학론과 펄 벅의 문학세계에 대한 비평들은 ‘대중성(대중소설)’과 아시아라는 ‘지역성(지방색)’을 펄 벅 소설의 고유성으로 정의함으로써 여성-문학-교양의 형성에 기여했다. 결론적으로 펄 벅은 동아시아적 여성상과 ‘아시아(적 가치)’를 재정위(re-positioning)함으로써 여성 독자들의 문학/문화 교양 형성의 다른 축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소설과 여성 관련 담론을 종합해 봤을 때, 펄 벅은 서양/동양, 아프레걸/현대화된 현모양처, 낭만적 사랑이나 섹슈얼리티의 추구/어머니 노릇의 획득과 같은 대립항에서 후자에 더 가치를 둠으로써 1960년대 전후 한국 여성들의 문학-교양의 형성에 참조가 되었던 것이다.
초록
Abstract
전혜린은 반복적인 일상이나 몰개성적인 삶을 견디지 못하는 민감한 감수성을 지닌 예외적 개인으로 이해되어왔다. ‘실존’과 ‘자기’를 추구하는 그의 목소리는 관념성을 부각하는 것이자 타인과 사회에 대한 무관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현실과 불화하는 그의 의식세계는 ‘참된 자기’로 살아가기 어렵게 하는 억압적 현실과의 긴장과 경합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전혜린이 추구했다고 여겨지는 관념적 가치들이 어떠한 맥락에서 생산되었고, 현실 문제와 어떠한 관련성을 띠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혜린의 ‘자기’를 추구하려는 실천적 행위는, 그 과정에서 장애가 되는 당대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관념 속에 굳어진 젠더 규범을 거부하면서 구체화되었다.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여성성을 내면화해야 하는 분위기 속에서, 전혜린은 한 개인이 여성성과 남성성에 속하는 면면들을 넘나들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이분법적 젠더체계의 견고함에 균열을 일으켰다. 이때, 본질화된 젠더를 횡단하는 힘은 ‘자기’가 인식되는 찰나의 순간을 외면하지 않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사회적으로 여성의 자기 상실을 유도하는 고착화된 성역할 논리 속에서, 전혜린은 여성이라면 공통적으로 느끼게 되는 이 부조리함을 응시하는 것만이 인습과 타인의 시선을 따르지 않는 ‘자기’의 삶을 살게 하는 계기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샤르트르, 보부아르 등의 실존주의 철학과 루이제 린저의 『생의 한가운데』 등 그가 읽었던 책에서 나타나는 사유들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인다. 또한 독서를 통해 만난 단일한 정체성으로 규정되지 않는 복수의 여성‘들’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번역을 비롯한 산문에 담아냄으로써 공론장의 젠더 규범과 화합하지 않는 사유를 보여주었다. 이는 전혜린이 자신의 현실과 투쟁하고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글쓰기 실천의 동력과 방법을 그가 읽은 책과의 영향 속에서 키워나갔음을 알게 한다. 이처럼 전혜린은 읽고 쓰는 행위를 통해 젠더 규범을 동요하게 하는 문화적 실천을 수행했다. 규범화된 여성성과 남성성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개인을 강조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당대 이분화된 젠더구조를 무너뜨리는 수행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전혜린 문학에서 발견되는 평범함과 속물성을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를 구체적 현실을 도외시하거나 현실 밖으로 탈주하고자 했다고 단언하는 것은 일면적인 해석이라 하겠다.
초록
Abstract
1960년대 한국사회는 건강하고 명랑한 나라를 만들려는 사회정화운동이 활발했다. 박정희 체제는 군사주의적 남성성을 기반으로 국가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건강하고 명랑한 코미디 영화를 국책 선전용으로 사용하였다. 1960년대 남성성과 여성성의 경계를 넘나들며 젠더 규범을 희화화하는 여장남자 코미디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 영화가 이성애규범성을 강화하고 청년 남성이 성공하는 플롯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여자 되기를 거쳐 여성 젠더를 수행하면서 기성세대 남성들을 비판하고 남성다움의 의미를 변화시킨다. 그러나 “우리라도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영화의 결론은 이들 영화가 비판적으로 참조하고 있는 것이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체현한 ‘사장족’이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들 여장남자 코미디가 가진 다양한 층위를 독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1960년대 여장남자 코미디 영화는 이성애 커플이라는 안전장치를 통해 사회 질서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이는 젠더 수행의 실험이 다시금 규범성을 강화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들 영화는 여자나 남자라는 명사로 기술될 수 없으며 정체성의 지속적인 변형, 젠더화된 정체성을 의문시하게 만드는 사이공간을 입증한다. 공적이며 산업적인 남성성과 사적이며 양육하는 여성성의 공사 영역의 분리를 해체하는 여장남자 코미디는 건강하고 명랑한 외피에도 불구하고 여러 균열점을 만들어낸다. 여장남자와 남자 커플이 연출하는 커플씬은 이성애규범성을 퀴어하게 만들며 이성애와 동성애의 경계를 모호하게 한다. 「남자는 절개 여자는 뱃장」처럼 남성동성사회를 성애화하는 영화들은 코미디 영화의 의미망의 ‘잉여’로 존재하기도 한다. 이는 젠더퀴어의 존재를 사건화된 목록을 통해 계보화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음화를 통해 읽어내야 하는 초남성적 사회의 거울인 것이다.
초록
Abstract
한국현대사에서 1980년대는 자유와 평등에 대한 열망과 민주화 의식이 비약적으로 성장한 시기였으며 어느 정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지배이데올로기인 가부장제와 운동권 내에서도 만연했던 남성중심성은 혁명의 깃발 아래서도 공고하게 유지되었다. 또한 80년대 지성의 흐름을 주도했던 저항담론들조차 계급 갈등을 우선시하고 젠더의 문제는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했다. 본고에서는 젠더정치학의 관점에서 후일담 소설을 논한다. 시위현장과 토론장과 산업현장과 감옥에서 분명 존재했던 여성인물들이 남성작가의 후일담 소설에서 삭제되거나 왜곡되어 묘사되었음은 이미 선행연구들에서 논의된 바 있으며, 본고에서는 후일담 소설의 보다 다양한 젠더 지평을 분석한다. 80년대에서 조금 거리를 둔 시점인 2000년에 발표된 황석영의 장편 『오래된 정원』의 사유의 시발점은 80년 5월 광주였으나 이 소설은 20세기 전반에 걸친 남성중심 근대성의 폭력성을 반성하고 21세기의 가치를 ‘자연’으로 상정된 ‘여성성’에서 찾으려 한다. ‘남성성’을 부정하고 ‘여성성’을 지향하는 이 소설은 사실상 전통적인 젠더 이분법에 고착되어 있다는 한계를 가지며 실제로 80년대에 분투했던 다양한 여성들을 하나의 이미지로 환원해버린다. 그 하나의 이미지는 남성판타지의 일종인 엘렉트라 콤플렉스에 지나치게 경도된 여성이며, 독재 권력의 폭력에 저항했으나 그 자신도 ‘남성’이라는 기득권을 놓지 않았던 이율배반적인 남성인물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포용하는 여성상의 이미지이다. 모성에 대한 집착 역시 ‘모성’ 또한 이데올로기임을 간과하고 있다. 한편 후일담 소설 연구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작가인 공지영의 소설들에서 후일담의 서사구조는 변주되어 반복된다. 80년대는 혁명에 대한 낭만적 낙관과 인간에 대한 예의와 동료에 대한 신뢰가 가득했던 시기였고 그 시대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공지영 텍스트의 서술태도이다. 또한 시대가 바뀌면서 많은 남성들이 비겁함과 안일함과 자조와 타협하거나 일부 남성들이 제도권 정치권력에 편입했을 때 끝까지 현장에서 이름 없는 시민 활동가로 자리를 지킨 여성들을 증언한다. 노동현장에서 빈곤과 질병과 싸우며 마지막까지 신념을 굽히지 않고 동지들에게 헌신했던 여성인물을 형상화 한 공지영의 서사는 계급과 젠더 문제를 다 담으려 했다. 이는 공지영이, 계급과 이념에만 집중했던 황석영과 달라지는 지점이다. 남성들의 역사에서 삭제되거나 왜곡된 여성의 목소리를 복원했다는 의의를 가지지만, ‘감성’을 ‘여성적인 것’으로 상정하고 ‘여성적’인 ‘감상성’이 혁명과 가까운 것으로 묘사하는 공지영의 텍스트 역시 젠더 이분법에서 자유롭지 않다. 비겁하고 나약하며 때로 폭력적인 남성인물들을 연민하고 포용하는 여성인물들의 인물형상화가 변주되어 반복되는 것도 그러하다. 다른 한편, 80년 5월 광주를 묘사한 중편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1988)를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한 최윤의 텍스트는 다른 후일담 서사와는 확연하게 다른 서술기법으로 그 시대를 형상화 한다. 시적이고 암시적인 서술방식과 분열증적 인물화는 그 시대의 폭력을 더 비극적으로 느끼게 하는 수사적 효과를 가지며 국가의 폭력과 개인의 폭력, ‘남성성’과 폭력에 대한 중층적인 사유까지 나아간다. 전형적인 후일담 서사구조를 가지는 「회색 눈사람」(1992)은 차갑게 승화된 지적인 서술태도도 돋보이지만, 삭제된 여성들의 이야기를, 자기연민이나 감상성을 제거한 채 복원했다는 의미에 더해서 여성들의 우정과 사랑 그리고 연대감을 혁명과 연결시키는 현대성과 진보성을 보인다. 무엇보다 후일담 소설의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젠더 지평을 펼쳤다는 의의가 있다.
초록
황석영의 『심청』은 작가가 고전 <심청전>의 재창조라는 관점에서 내놓은 작품이다. 이 작품은 고전 <심청전>과 출발점으로서의 시대적 배경을 같이 하고 있지만 작품 내 공간을 조선에서 아시아 지중해라는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 『심청』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이러한 공간 영역 확장의 의미를 읽어내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미시사의 관점에서 심청이 만들어내는 인적 이동의 기능적 의미를 규명하고 전통서사가 이러한 변화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재창조되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다. 이 시기 아시아 지중해는 조공무역에서 조약무역으로 이동하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직면해 있었으며, 동인도회사를 중심으로 역사적 격변을 만나는 난징, 싱가포르와 일본의 제국주의 침탈에 맞서는 지룽, 류큐, 조선으로 나눌 수 있다.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대응력에 따라 각 지역이 맞아야 하는 미래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새로운 시대가 제시하는 패러다임은 고전 <심청전>의 ‘효’의 이데올로기를 개인적 구원의 서사에서 미래를 향한 구원의 약속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심청』은 심청 개인의 구원의 이야기이면서 열다섯에 떠나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 ‘효’의 공간, 조선에 대한 구원의 서사가 된다.
Abstract
Literature is based on the contemporary discourse. Although the origin of the ‘filial piety’ ideology has a long history of convergence until the Three Kingdoms period, it is in the late Joseon period that it is enjoyed by many people of the contemporary and it became a narrative literary genre. In particular, <Simchungjeon> is a work that can discuss the value as a discourse in relation to its long life force in that it has a strong expanding power that continues until the modern era. Hwang Seok-young's <Simchung> is a re-creation of the classic <Simchungjeon>, and it is a work to be discussed in relation to the process of the change of the discourse of ‘filial piety’ ideology in that the background space is extended to Asia Mediterranean rather than Joseon. As for the background, the aspect of the discourse that changes due to the change of the spatial background of <Simchungjeon> are similar to that of Hwang Seok-young's <Simchung> and its starting point should be discussed in relation to the spatial background. Despite the fact that studies on the existing <Simchung> have been studied with emphasis on the relation with the traditional narrative, the necessity of such research is raised in that the difference of the spatial background can not be linked with the inner narrative and discourse. The 'Asian Mediterranean' paradigm seeks not to view one space centered on the nation, but to focus on the functional flow in that space. This work, in which the central character of 'Simchung' is the center of human movement in the space, is therefore the most effective way to understand this space from the perspective of microsociology. The 'Odyssey of prostitution' view, which is revealed on the surface of the work by the author, can reveal the surface of the narrative, but it cannot read the process of changing the paradigm in connection with space. At the time when the paradigm of the period changes from tribute trade to treaty trade, each space makes different choices according to the historical and cultural backgrounds of each region, and the lives and thoughts of the central characters who she had met in such spaces changed Simchung. Although the 'filial piety paradigm' of the classic <Simchungjeon> seems to disappear at the beginning of the work, the filial piety paradigm did not disappear but change. <Simchung> should be read as a narrative of salvation of 'filial piety' paradigm beyond the narrative of salvation to 'filial daughter', and as a salvation narrative of the Asian Mediterranean space called Joseon that created such a paradigm. In Foucault's <L‘Hermeneutique du sujet>, self-consideration and care for oneself is refused to be the object of the other, and declares that man should exist only for themselves, self-object. However, 'self-consideration' is no longer a matter of finding truth in the subject. The important thing is that armed with truth which is not in subject. In other words, the quasi-subject that Foucault speaks not only resists being the object of power, but also the object of reason for rational subject. It is also a subject to resist. It is not a modern subject, a subject who recognizes oneself, but a subject who makes oneself through the truth that was not found in the subject. After leaving the road as a ‘filial daughter’, Chung, who came back after a long, long journey, was able to come back with the truth of the time and space in which it created the ‘filial piety’ at the same time as the subject who survived on her own. We can find out the truth in a lonely way of Simchung why so ‘filial piety’ ideology should be strong, and why is it that Joseon had to walk into the history of the humiliation of colonialism.
초록
이 논문은 하종오 시에 나타난 탈북자의 이미지를 살펴보았다. 하종오는 탈북자를 전 지구적 자본주의, 아시아 경제 구도 안의 노동자로 인식한다. 또 배제와 차별로 탈북자를 대하는 자본주의 한국 사회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포착한다. 탈북자 중에서도 사회적, 성적 약자인 탈북여성에 더해진 고통과 트라우마에 대해 하종오는 공감과 연민의 시선을 보낸다. 외국인 노동자나 탈북자와 같은 소외된 이에 집중하는 이러한 하종오 시의 행보는 매우 소중하고 의미있다. 그러나 분단, 농민, 노동, 자본 등 한국사회의 현안에 예민하고 꾸준하게 대응해온 하종오의 시는 분단생태계 안에서 탈북자를 바라보는 한계를 보여준다. 분단생태계란 남과 북의 경제적 차이에서 시작된 위계적 인식이 남북 주민에게 적용되어 편견과 고정관념을 형성하고 강화되어 가는 갇힌 시스템이다. 하종오의 시에서 분단생태계는 탈북자와 탈북여성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탈북자는 굶주림이 일상인 나라에서 온 가난한 노동자, 노동시장의 위계에서 맨 아래에 위치한 하층 노동자, 가족도 없고 물려줄 유산도 없는 ‘다른 신분’의 사람으로 형상화되고 탈북여성은 주로 성적으로 침해받고 고통당한 사람들,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피해자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우리 사회에 분단생태계가 엄존하기에 그 현실을 충실히 반영하는 하종오의 시에서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으나 문제는 깊이있는 성찰이나 비판적 감각없이 피상적으로 시화(詩化)된 탈북자 형상이 분단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침해당한 여성성으로만 상상되는 탈북여성은 분단생태계 안에서도 젠더생태계라는 한 겹 더해진 프레임 안에 갇혀 있었다. 하종오의 시에서 탈북자, 탈북여성들은 동질적인 집단으로 획일화되고 고정된 이미지로 형상화되는 한계를 보이는데 이는 우리 사회의 편견과 편협한 인식에 대한 시인의 비판적 성찰과 고민의 부재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how the poet Jong-oh Ha describes North Korean defectors in his work. In the era of global capitalism and of the cut-throat Asian economic structure, Ha paints the image of North Korean defectors as Koreans who cannot live as such. He depicts North Korean defectors as laborers who have an even worse reputation than foreign workers, and as women with a shameful past. In his poetry, they are treated poorly in the Asian labor market, but even after coming to South Korea, they remain unable to achieve great social or economic improvement in their lives. Ha also claims that Koreans tend to avoid hiring North Koreans even more than they do Korean-Chinese, and display prejudice against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implying that they might be damaged, both physically and mentally, from forced marriage and human trafficking. As a result, in Ha’s poetry, North Korean defectors are not fully recognized as Koreans, whether in the labor market or in everyday life. The image of them as a homogenous group separate from other Koreans is repeatedly employed in his work. This kind of perspective fundamentally arises from the stereotypes and closed-mindedness prevalent in Korean society. North Korean defectors are people with whom communication is vital both for furthering the goal of the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and for enabling reconciliation afterwards. Therefore, for Korean society and literature to maintain such prejudice against North Korean defectors seems problematic. Before engaging in thorough discussion about Korean unification, the general Korean view of them and the role of literature in reflecting and disseminating such a view should be reconside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