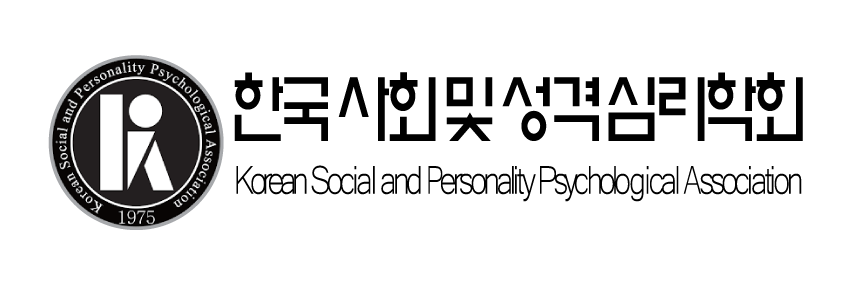ISSN : 1229-0653
ISSN : 1229-0653
권호 목록
- 2025 (39권)
- 2024 (38권)
- 2023 (37권)
- 2022 (36권)
- 2021 (35권)
- 2020 (34권)
- 2019 (33권)
- 2018 (32권)
- 2017 (31권)
- 2016 (30권)
- 2015 (29권)
- 2014 (28권)
- 2013 (27권)
- 2012 (26권)
- 2011 (25권)
- 2010 (24권)
- 2009 (23권)
- 2008 (22권)
- 2007 (21권)
- 2006 (20권)
- 2005 (19권)
- 2004 (18권)
- 2003 (17권)
- 2002 (16권)
- 2001 (15권)
- 2000 (14권)
- 1999 (13권)
- 1998 (12권)
- 1997 (11권)
- 1996 (10권)
- 1995 (9권)
- 1994 (8권)
- 1993 (7권)
- 1992 (6권)
- 1991 (6권)
- 1990 (5권)
- 1989 (4권)
- 1988 (4권)
- 1987 (3권)
- 1986 (3권)
- 1985 (2권)
- 1984 (2권)
- 1983 (1권)
- 1982 (1권)
36권 1호
초록
본 연구는 McAdams가 제안한 성격 3수준 이론을 바탕으로 서사정체성이 심리적 웰빙에 대해 가지는 추가적인 설명력, 즉 증분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6개월 종단연구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93명이었다. 참여자들은 1차시에 성격 5요인(성격 1수준; 기질적 특성), 회복탄력성과 낙관성(성격 2수준; 특징적 적응), 심리적 웰빙(준거 변인) 척도에 응답하였다. 6개월 후 2차시에 참여자들은 앞서와 같은 척도에 응답하고, 추가로 어떻게 지금의 자신이 되었는지에 대해 기술하는 서사문(성격 3수준; 서사정체성)을 작성하였다. 연구 결과, 서사정체성은 1차시에 측정된 성격 1수준과 2수준 변인을 통제하고도, 2차시에 측정된 심리적 웰빙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또, 2차시에 측정된 성격 1수준과 2수준 변인을 통제한 후에도 서사정체성은 2차시에 측정된 심리적 웰빙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이는 서사정체성이 심리적 웰빙에 대해 증분타당도를 가진다는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격 세 수준을 모두 살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공고히 함과 더불어 서사정체성의 연구 가치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present study aimed to test the incremental validity of narrative identity in predicting psychological well-being based on McAdams’s three-level model of personality. We analyzed the data from 93 participants who consistently participated in a six-month longitudinal study. At Time 1, participants completed measures of Big-Five personality (level 1 personality; dispositional traits), resilience and optimism (level 2 personality; characteristic adaptation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criterion variable). Six months later (Time 2), the participants rated the same measures as the ones used at Time 1 and additionally wrote a story explaining how they had become the person they were (level 3 personality; narrative identity). The results showed that narrative identity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psychological well-being assessed at Time 2, controlling for Level 1 and Level 2 variables assessed at Time 1. Furthermore, the positive link between narrative ident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remained significant after controlling for Level 1 and Level 2 variables assessed at Time 2. These findings suggest that narrative identity has an incremental validity in predicting psychological well-being, which supports our hypothesis. The present study demonstrates the importance of examining all three levels of personality to fully understand a person and attests the value of narrative identity in personality research.
초록
본 연구는 면담 기반의 사이코패시 성격 종합평가 도구(CAPP-IRS)를 국내에 타당화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CAPP-IRS 신뢰도와 타당도를 조사하기 위해 전국 교정시설 수용중인 재소자 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담이 동시에 이뤄졌다. 그 결과 양호한 수준의 CAPP-IRS 평가자간 신뢰도(ICC)를 보였으며 검사-재검사(test-retest) 수준도 두 시도 간 높은 관련성을 보여 신뢰성이 양호했다. 준거 척도의 수렴도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면담 기반의 한국판 PCL-R과 자기보고식 한국판 PPI-R간 상관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두 준거 척도 간 수용할 만한 연관성을 보여 내용 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본 도구를 활용하여 치료 효과성, 일반인, 여성에 대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임상장면에서 치료자가 사이코패시의 변화 정도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이코패시의 평가, 진단, 치료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줄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Comprehensive Assessment of Psychopathic Personality-Institutional Rating Scale(CAPP-IRS) in Korea. Eighty nine inmates at correctional prisons across provinces participated in the study. We compared the CAPP-IRS’ psychometric properties to those of the Psychopathy Checklist-Revised(PCL-R) and Psychopathic Personality Inventory-Revised(PPI-R). As a result, the CAPP-IRS showed good to excellent interrater reliability and good test-restest reliability. The CAPP-IRS also showed overall good associations with interview-based PCL-R and self-reporting based PPI-R, which means good concurrent validity. Our findings suggest that the CAP-IRS approved clinical utility for the assessment, diagnosis, and intervention in Korea.
초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의 대유행과 함께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었다. 서구권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코로나 확산 방지의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마스크 착용에 대한 태도를 탐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실제적 함의가 있다. 또한, 코로나 이후 마스크 착용에 대한 사람들의 외현적 태도가 긍정적이라는 것이 일부 확인되었지만 암묵적 태도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에 대한 외현적, 암묵적 태도를 함께 측정하여 비교 분석하는 것은 학문적으로도 흥미로운 주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에 대해 가지고 있는 외현적 태도를 자기보고 설문지로, 암묵적 태도를 암묵적 연합 검사(IAT)로 측정하였다. 또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외현적/암묵적 태도와 심리적 요인들 및 인구통계학적 변인들과의 관계도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참가자들은 외현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 모두에서 마스크 착용을 안전하다고 지각했으며, 두 태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확인되었다. 반면, 마스크가 아닌 방식으로 얼굴의 일부를 가리고 제시한 얼굴은 위협으로 지각하는 암묵적 태도를 보였다. 흥미롭게도 질병을 피하려는 동기가 마스크 착용에 대한 외현적 및 암묵적 태도와 모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로 인한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사회적 규범을 일부 내재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질병을 피하려는 동기에 따라서 그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Due to the wide spread of COVID-19, wearing masks has become essential in daily lives. Despite increasing rates of vaccination in many Western countries, mask wearing is still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efficient ways of preventing COVID-19. Thus, the investigation of attitudes towards mask wearing could entail numerous implications. Furthermore, although some studies have confirmed people's positive explicit attitudes toward mask wearing after COVID-19, there is still a lack of research investigating their implicit attitudes towards it. Thus, it is academically intriguing to examine and compare the two specific attitudes towards mask wearing. To fulfil this objective, we explored and compared explicit as well as implicit attitudes, measured by IAT (Implicit Association Test), toward mask wearing and lastly examined several psychological factors that could influence the two attitudes. The results revealed that participants explicitly and implicitly perceived mask wearing as safe and that the two attitudes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Unlike the attitudes towards mask wearing, however, participants still associated faces covered by a rectangular, black object with threat. Interestingly, we found the motive of disease avoidance to be positively related to both explicit and implicit attitudes towards mask wearing. The results implicate that people have indeed internalized social norms of encouraging mask wearing in the face of threatening COVID-19 situations, and the levels of internalization could vary depending on the degree to which they are motivated to avoid diseases.
초록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위험-보상 정보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린 타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대상이 위험-보상 수준이 높은 의사결정을 내린 것이 대상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낮게 지각하는 편향을 가져오고, 이 편향이 최종적으로 대상이 느끼는 정서적 신체적 고통에 대한 과소 추정으로 이어지는지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고려하여 지각된 사회경제적 지위를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였으며, 탐색적인 목적으로 대상 성별과 위험감수 성향을 각각 조절변인과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참가자들은 위험-보상 수준이 더 높은(vs. 낮은) 의사결정을 내린 대상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더 낮게(vs. 높게) 지각하였으며 대상이 경험하는 신체적 고통에 대해 더 낮게(vs. 높게) 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고통에 대한 추정에서는 위험-보상 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가설에서 예측한 바와 다르게 위험-보상 수준이 고통 추정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경제적 지위 지각과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위험과 보상 정보가 의사결정 주체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관찰자가 의사결정자를 지각할 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Abstract
Focusing on how people perceive a person who makes a decision based on risk-reward levels, this study tested whether choosing a high risk-reward option leads to perceiving the decision-maker as of lower socioeconomic status, and whether this perception leads to underestimating the target’s emotional and physical pain. Therefore, we set the perceived socioeconomic status as a mediator. For the exploratory purposes, we set the target’s gender as a moderator and the target’s risk-taking tendency as a mediator. We found that participants perceived the socioeconomic status of the target who made the high (vs. low) risk-reward decision, as lower (vs. higher) and estimated the target’s physical pain as lower (vs. higher).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estimation of emotional pain depending on the risk-reward level. In addition, contrary to our predictions the effect of risk-reward level on pain estimation was found to be independent of socioeconomic status percep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just as the risk-reward information can influence the choice of decision maker, it could also influence the observer’s perception of the decision mak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