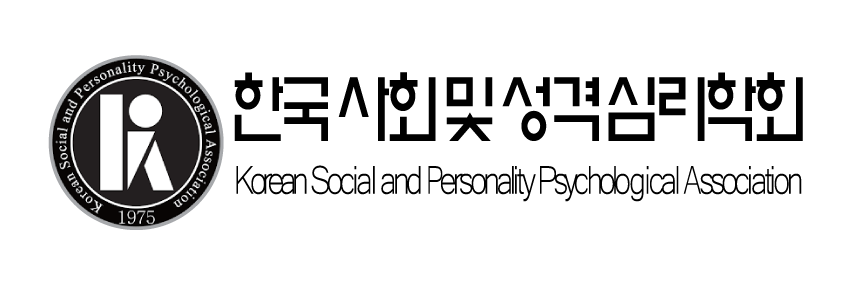ISSN : 1229-0653
ISSN : 1229-0653
권호 목록
- 2025 (39권)
- 2024 (38권)
- 2023 (37권)
- 2022 (36권)
- 2021 (35권)
- 2020 (34권)
- 2019 (33권)
- 2018 (32권)
- 2017 (31권)
- 2016 (30권)
- 2015 (29권)
- 2014 (28권)
- 2013 (27권)
- 2012 (26권)
- 2011 (25권)
- 2010 (24권)
- 2009 (23권)
- 2008 (22권)
- 2007 (21권)
- 2006 (20권)
- 2005 (19권)
- 2004 (18권)
- 2003 (17권)
- 2002 (16권)
- 2001 (15권)
- 2000 (14권)
- 1999 (13권)
- 1998 (12권)
- 1997 (11권)
- 1996 (10권)
- 1995 (9권)
- 1994 (8권)
- 1993 (7권)
- 1992 (6권)
- 1991 (6권)
- 1990 (5권)
- 1989 (4권)
- 1988 (4권)
- 1987 (3권)
- 1986 (3권)
- 1985 (2권)
- 1984 (2권)
- 1983 (1권)
- 1982 (1권)
2권 2호
초록
三元關係의 狀況들에 관한 理論的 分析이 세 가지 側面들에 대해서 이루어졌으며, 그에 관련된 몇 가지 命題들이 제시되었다: (1) 三元關係의 狀況들은 심리적으로 P/O關係의 正負와 態度一致如否의 두 가지 要因들로 知覺되며, 狀況들에 대한 認知的 및 感情的 反應들의 力學들간에 差異가 있다는 命題가 제안되었다. 認知的 力學은 두 心理的 要因들의 合致의 方向으로 이루어지며, 感情的 力學은 두 개의 心理的 要因들과 이것들 간의 相互作用 效果가 加算的으로 작용된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2) 三元關係의 狀況들에 관한 理論化는 전적으로 P의 知覺된 關係들을 중심으로 分析되어져야만 된다고 주장되었고, P/X와 O/X關係들의 知覺들은 態度一致如否의 知覺들에 직결되어 있으며, 態度一致如否 知覺을 決定짓는 것은 X가 共有可能한 것인지 共有不可能한 것인지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命題가 제시되었다. (3) 對人關係의 理解를 위해서는 多數의 對象들과 他人들이 포함된 三元關係의 狀況들을 전제할 필요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P/O와 P/X關係들의 强度들은 포함된 正的 및 負的 對象들과 他人들의 數와 比率 및 重要性에 의해서 決定되며, 對象들의 重要性은 대인관계의 넓이와 깊이 次元들 모두를 포함한다는 命題들이 제시되었다. P/X關係들은 正的 P/O關係보다도 負的 P/O關係가 포함되어 있을 때에 더 不安定할 것이라는 것이 지적되었다.
Abstract
Theoretical analyses were performed on the following three aspects of the triadic social situations : (1) The propositions that triadic situations will be perceived in terms of positivity and agreement factors and the dynamics of cognitive and affective responses to the triadic situations will be different were proposed. It was indicated that cognitive dynamics will be in the direction of the harmony of two psychological factors and affective dynamics will be summation of two factors and their interaction. (2) It was argued that cognitive theory of triadic situations should absolutely be predicated upon the P's perceptions of the relations and that P/X and O/X relations directly related to the perceptions of attitude similarity-dissimilarity. The proposition that important determinant of attitude similarity-dissimilarity perceptions will be coobtainable-co-unobtainable nature of the X was proposed. (3) The necessity of inclusions of multi-objects and multi-persons in the triadic situations for understanding of the interpersonal relations was indicated. The propositions that the strength of the P/O relations will be determined by the number and proportion of the agreements and that strength of the P/X relation will be determined by the positivity of the P/O relation and number of the agreements were proposed. It was emphasized that the importance of the object will determine the interpersonal processes and this cocept of importance include both breadth and depth dimensions of the interpersonal relations. It was also argued that the P/X relations will be unstable in the situations of negative other person.
초록
본 논문에서는 고정관념적 신념의 변화에 관련된 요인이나 인지과정을 찾기 위해 인지적으로 접근한 최근의 실험 연구들을 개관하였다. 고정관념적 신념의 수정에 깔려있는 인지과정을 직접적으로 구명한 연구는 단 하나(Weber & Clocker, 1983)였다. 본 개관의 결과, 피험자들의 자기-제시 동기가 피험자로 하여금 고정관념 -검증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데 병용(동등 기회) 책략을 사용하도록 만듦을 알았다. 집단의 구성원들을 개성화시키면, 우리의 고정관념적 신념이 우리가 그 구성원들에 의해 인상을 형성하거나 판단하는데 영향을 덜 미치게 할 수 있음도 알았다. 그리고, Weber와 Crocker(1983)는 고정관념적 신념의 수정에 깔려 친는 인지과정을 이해하는데에 Bookkeeping 모델(예, Rothbart,1981)과 Subtyping 모델(예, Taylor, 1981)이 적용될 수 있음을 밝혔다. 추후 고정관념적 신념의 변화 과정 산에 있는 時繼들(sequences)이 더 구명되어야 한다. 가능한 時繼들 중의 하나로 "상반되는 증거(또는 다른 관련 요인들)→외집단 동질성의 지각의 변화→고정관념적 신념의 변화"의 時繼를 제안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some recent experimental researches which explored the factors or processes underlying the change of stereotypic belief from a cognitive perspective were reviewed. There was only one research(Weber & Crocker, 1983) which directly investigated the cognitive processes underlying the revision of stereotypic beliefs. As a result of this review, it was found that subjects' self-presentational concerns could solicit the equal opportunity strategy for gathering-evidence in stereotype-testing activities. Individuation of group members could reduce the influence of stereotype on our impression and judgment about individual group members. And Weber & Crocker(1983) explored the possibility that Bookkeeping model(e.g., Rothbart, 1981) and Subtyping model (e.g., Taylor, 1981) were to be applicable to the understanding of cognitive processes underlying the revision of stereotypic beliefs. It was suggested that sequences in the, processes of change of stereotypic beliefs be further explored. Such a sequence as "disconfirmatory evidences (or other relevant factors)-change in the perception of outgroup-homogeneity-change of stereotypic beliefs" was proposed as one of probable sequences.
초록
도덕성 귀인발달의 실험적 연구를 목표로 한 기본적 가설설정을 위한 고찰로서, Piaget, Kohlberg이론과 Heider, Kelley이론을 중심으로 한 여러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양대측면의 개념통합을 시도하였다. 구체적 방법에서는 인과스키마 고찰을 필수로하여 아동의 도덕성 판단에 대한 귀인적 분석을 하였고, 귀인발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도덕성ㆍ이타성 목록과 실험적 자극 (스토리) 제작과 질문 방법을 모색하였다.
Abstract
The paper is intended to review the traditional cognitive model of morality development from attributional perspective. The piagetian and/or Kohlberg's model has placed its principal focus on describing schematic change in moral judg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developmental stages. However, the model has relatively neglected the dynamic aspect of the moral judgement processes on micro-analytic level. Any moral judgement involves interpretational processes of the object behavior to be judged. It also can be assumed that the interpretation of behavior in moral judgement situation inevitably presupposes attributional processes. It is further reasoned that morality schema would develop in parallel with attributional development. This line of reasoning was substantiated in the paper by analyzing the traditional cognitive model from attributional perspective and further by conceptually relating kohlberg's model to developmental dimension of attribution theory. Finally, an experimental instruments for measuring attributional schema in relation to moral judgement situations were introduced.
초록
한국인의 가치, 태도, 및 신념의 시대적 변천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177개 문항으로 된 질문지를 두 세대, 즉 20대와 50대 성인, 각 300명에게 실시하였다. 이 보고서는 45개의 가치에 관한 문항의 결과만을 다루었다. 표집은 성(2)x세대(2)x학력/거주지(3)의 直交設計하에 각 칸에 50명씩의 임의표집 방법으로 얻었다. 연구결과는 (1) 현재(1979당시)의 가치의 위치와 (2) 이 자료에서 판정된 시대적 변천의 유무 및 방향을 알아보는 방향으로 분석하였다. 20개의 가치는 세대차가 없었으나 다른 25개의 가치에서는 27대와 50대간의 세대차가 있어 가치의 세대간 갈등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14개의 가치는 지난 30여년간 가치변동이 없었다는 시사를 얻고 다른 15개에서는 이 기간에 가치의 변동(상승 또는 쇠퇴)이 있었다는 시사를 얻었다. 이 연구는 同時的資料(橫斷的 연구에서 얻은 자료)에서 世代間의 차이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時代間變動을 알아내는 방법의 첫 적용이다.
Abstract
A 177-item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600 Korean married adults, 300 in their twenties and 300 in their fifties or older, in a study designed to assess changes occurring in values, attitudes, and beliefs among Koreans over the span of past 30 years. The present report presents only the results from the 45 items that dealt more directly with values. An incidental sample of 50 were interviewed at their residence for each of the cells formed by a Sex (2) x Generation (2) x Education/Urban-Rural Residence (3) orthogonal design. Data were analyzed for (1) the current status of values as of 1979 and (2) evidence for epochal changes and the directions of such changes in the values studied. Of the items analyzed, 20 did not show any generational differences, but the remaining 25 did show generational differences between the adults in their twenties and those in their fifties or older. Significant inter-generation differences as well as significant main effects of the education-residence variable and interaction effects between the generation and education residence variables, indicated that 15 of the values covered underwent changes sometime in the past 30 years and that 14 other values did not go through any significant changes in the same span of time. The present study represent a first application of a methodology which permits determination of possible epochal changes in values, attitudes, and beliefs as well as their generational differences from synchronic (cross-sectional) as contrasted with diachronic data.
초록
우정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14개월에 걸친 종단적 연구를 수행했다. 대학 입학후 처음 사귄 동성 친구들 가운데 세 조사 시점에서 동일한 인물을 가장 좋아하는 친구로 선정했던 71명이 연구의 대상이었다. 이들이 친구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고한 대인행동, 자기노출 및 친구에 대한 대인매력의 변화를 성별 및 시점을 고려하여 분석했다. 분석결과를 보면, 친교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친구가 교류한 전체 행동의 다양성, 긍정적 행동수, 부정적 행동수, 최고 자기노출 수준 및 노출의 바람직한 수준이 증가되었다. 변화의 크기는 친교 후기보다 초기에 더 컸다. 대인매력 평정총점에서 세 시점간에 변화가 없었으나 대인관계의 밀접성 수준별로는 차이가 있었다. 한편, 대인행동 측정치들과 자기노출 측정치들을 함께 예언요인으로 사용하여 다음 시점에서의 대인매력을 효과적으로 중다예언할 수 있음을 알았다. 또한, 대인행동, 자기노출과 아울러 대인매력 측정치를 중다예언 요인으로 첨가하면, 다음 시점에서의 대인매력을 더 효과적으로 예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는 사회적 침투이론을 지지하는 자료로서 해석되었다.
Abstract
A longitudinal study was performed within a framework of social penetration theory to understand the processes of same sex friendship formation and development. 71 junior college students who had successfully developed into intimate friendship completed questionnaires three times an newly developing friendship during 14 months after admission to the college. Questionnaires were consisted of self-reports of dyadic behaviors, self-disclosure exchanged in dyad relationship, and rating of attractiveness of the best friend. Results revealed that both diversity of interpersonal behaviors and intimacy level of self-disclosure were increased as the relationship progressed.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in attractiveness of the friend. It was also found that dyadic behaviors and intimacy levels of self-disclosure were good multiple predictors of attractiveness of the friend 7 months later. The results were interpreted as a supporting data for social penetration theory.
초록
이 연구는 필자(趙,1982a)가 제시한 대인평가차원의 이원모형을 대인기억분야의 연구방법을 원용한 세개의 실험으로 검증한 것이다. 실험 I에서는 103명의 피험자에게 53개의 성격특성형용사를 제시하고 정보의존상황에서의 중요도와 효과의존상황에서의 중요도를 각각 평정하게 하여, 지적 특성형용사와 정적 특성 형용사를 찾아내었다. 실험 II에서는 정보의존상황과 효과의존상황이라는 도식에서 두가지 특성으로 구성된 대상인물에 대해 인상판단을 하게 했을 때, 전자의 경우에는 지적 특성,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는 정적특성의 기억량이 그 반대의 것보다 높음이 발견되었다. 실험 III에서는 호오차원과 화친차원이라는 인상판단도식으로 인상판단을 하게 하면, 각각 지적 특성과 정적 특성의 기억량이 그 반대의 것보다 높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정보의존상황에서의 호오차원인상은 지적 특성을 중심으로, 그리고 효과의존상황에서의 화친차원인상은 정적 특성을 중심으로 형성된다는 필자 의 이원모형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논의되었다.
Abstract
Three experiments were performed to test the hypothesis that the intellectual traits and the affective traits would have differential effects in forming impression of other person as a function of the type of dependency on him/her and the impression-dimension. In Experiment I, 103 students evaluated 53 personality-trait-adjectives in terms of their value to be considered as important in forming impression of other person in information-dependent-situation and in effect-dependent-situation respectively. From this experiment, 23 intellectual traits, whose importance values in information-dependent-situation were higher than those in effect-dependent-situation, and 18 affective traits, whose importance values in two situations were vice versa from those of intellectual traits, were identified. In Experiment II, a stimulus person, consisted of 24 traits (12 intellectual traits and 12 affective traits), was presented with the schema to farm impression of him/her in information-dependent-situation or in effect-dependent-situation respectively. The main dependent variables were the amount of free recall, the recognition confidence and the SCR score (Bousfield & Bousfield, 1966) of each trait groups. From this experiment, the followings were found; (1) in forming impression of other with the information-dependent-situation schema, the intellectual traits were recalled more, recognized more confidently and their SCR scores were higher than the affective traits, and (2) in forming impression of him/her with the effect-dependent-situation schema, the affective traits were higher than the intellectual traits in all of the 3 dependent measures. In Experiment III, the same stimulus person of Experiment II was presented with the schema to form impression according to the good-bad dimension and the lake-dislike dimension respectively. As predicted, the intellectual traits were recalled more and their SCR scores were higher than the effective traits in the good-bad impression condition, and the amount of recall of the affective traits and their SCR scores in the like-dislike condition were higher than those of the intellectual traits. These results supported fully the hypothesis of this study. From these results, the following conclusion can be elicited: the author's (Cho, 1982a) dual-aspect model of person evaluation is justified in the study of person memory as well as in the study of impression formation (Cho, 1982a, b, 1983, 1984).
초록
Fishbein 모델은 合理的 思考양식에 의존하는 認知的 태도 모델이라는 점에서 문화에 따라 타당성에 차이를 가져오리라는 예측을 가능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델의 타당성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문화권에서는 연구된 사례가 희소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멕시코, 이란, 한국, 피지, 인도의 5개 문화권에서의 성인남자 표집을 대상으로 4가지 종류의 避妊法의 사용에 대한 태도조사에 Fishbein 모델을 사용하여 그 타당성을 검사하였다. 결과는 Fishbein 모델의 二個 구성 성분(태도성분 및 규범성분)이 行動意思의 예언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요소임이 모든 문화권 및 태도대상에 걸쳐서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 이 모델에 Triandis의 개인규범 성분을 첨가한 결과는 문화권에 따라 일관성 있는 改善을 보이지 않았으며 社會人口學的인 변인들은 일반적으로 微微한 정도의 관여만을 나타내었다. 이 연구결과는 Fishbein 모델이 상이한 문화권에서 타당성을 가짐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아가서 認知樣式의 類似性 및 이에 근거한 認知모델의 상이한 문화권에서의 적용 등에 대한 긍정적인 示唆를 던져준다.
Abstract
초록
본 연구에서는 비경제적 보상을 내적 보상과 외적 보상으로 구분하여 이들 각각이 경제적 보상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역할 수행법으로 실시된 두개의 실험에서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검증하였다. 내적보상은 과소불형평 보수에서의 불만을 경감시키나 과다불형평 보수분배에서의 불만은 경감시키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비경제적 외적보상은 개인이 외적동기화된 조건에서 과다불형평 보수분배의 불만을 경감시키나 과소불형평에서의 불만은 경감시키지 않을 것이다. 또한 부수적으로 불형평의 크기에 따른 효과와 균등분배와 차등분배의 효과를 검토하기 의하여 분배조건 조작에 자신과 타인의 투입비와 성과비 모두를 변화시켰다. 자료의 분석 결과 설정된 모든 가설들이 지지되어, 본 연구에서 가정한 과다, 과소불형평의 특성과 비경제적인 내적, 외적보상 각각의 특성, 그리고 이들간의 관계들이 지지되었다. 또한 부수적인 분석결과에서 특기할 만한 것으로 불형평의 크기가 같을지라도 균등분배조건이 차등분배조건보다 보수만족이 높았다. 상기 결과들의 의의와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을 논함으로써 형평이론의 정교화와 추후 연구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Abstract
In this study, categorizing noneconomic rewards to internal and external, the effects of internal and external noneconomic rewards on the satisfaction with inequitable pay allocation were examined. Following four hyphothesis were tested; i) Internal rewards will reduce dissatisfaction with disadvantageous inequity pay allocation, ii) Internal rewards will not reduce dissatisfaction with advantageous inequity pay allocation, iii) External rewards will reduce dissatisfaction with advantageous inequity pay allocation, and, iv) External rewards will not reduce dissatisfaction with disadvantageous inequity pay allocation Additionally, it was examined the effects of equality and strength of inequity on the satisfaction with pay allocation in the context of equity, by manipulating both ratio of input and outcome of self and other. Supporting all hyphothesis, the results showed the predicted two way interactions of equity condition with internal and external noneconomic rewards in the two experiments respectively, and partial analysis of data showed that the satisfaction with equal allocation is greater than that with unequal allocation. The implications of the results were discussed in the context of equity theory and interpersonal relation, and some further researches were recommen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