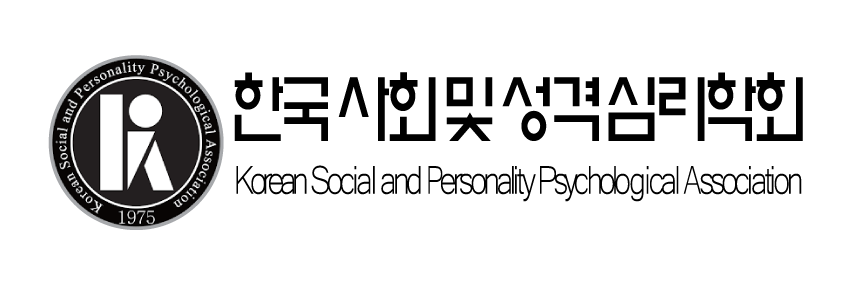6권 1호
초록
본 논문은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 행위자의 책임판단과 처벌판단을 다룬 기존 연구들을 3가지 유목으로 분류했다. 기존의 책임판단연구들의 문제점, 특히 종속변인(책임)외 다의미성을 지적하였고 그 개선책으로 잘못판단, 책임판단 처벌크기 결정은 서로 다른 판단들이고 이것들은 3단계에 걸쳐 이루어 진다고 제안했다. 또한 처벌판단에 관한 가상적인 3단계 모형으로부터 도출된 가설과 추론들을 근거와 함께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처벌판단을 다루는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과 각 가설 및 추론들의 검증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Abstract
The present paper is purposed to categorize and summarize researches related to the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and the assignment of punishment for an accident, and to propose a hypohetical model of punishment assignment. Since Heider(1958) suggested that the attribution of personal responsibility varies with the relative contribution of environmental factors to the outcome, many researchers have tried to identify the variables contributing to the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and the assignment of punishment. But there are the possibility that the meaning of the dependent variable(eg, responsibility) used in these researches-were varied to the research contexts. Thus I tried to clarify the concept of responsibility by dividing it into fault, responsibility, and punishment. And these three concepts are connected in a model. I mention the important psychological mechanisms in each judgments and several hypotheses driven from the model.
초록
본 연구에서는 신앙의 태도에 따라 종교의 정향(목적적, 수단적, 추구적)을 구분해 보았고, 종교의 정향에 따라 사회적 현상의 부적 결과에 대한 귀인의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았다. 개신교 및 가톨릭신자, 신학대학생 등 모두 153명을 대상으로 종교정향 척도와 사회적 현상의 부적 결과에 대한 귀인의 정도를 응답하게 하여 점수화하였다. 종교척도들에 대한 요인분석을 한 결과 전제한 세 가지 정향으로 신앙의 태도를 구분지을수 있지만 각각은 독립적인 성향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연령, 종교 경력. 종교종류의 측면에서는 귀인의 정도 차이가 없었고, 종교의 정향 중 수단적(외적) 정향과 추구적(상호작용적) 정향 간에서 귀인의 정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기대했던 수단적 정향과 목적적(외적) 정향에서는 차의 의미가 뚜렷하지 않았다.
Abstract
This study was intended to differentiate the religious orientation according to religious attitude, and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of attribution of negative results in social phenomena according to religious orientation. Subjects (Protestants, Catholics, and Protestant college students) were asked to respond to religious orientation scales and attributional scales of negative results in social phenomena. In order to use five scales to measure the three orientations to religion, as a means, end, and quest, factor analysis was employed. It is possible to differentiate three religious orientations, but each component can not be said to exist independently. The significant distinction could not be made in attribution judgements in terms of age, religious history, and the different religions background. The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between means orientation and quest orientation for attribution judgements. But the significance of difference was not found between means orientation and end orientation.
초록
본 연구는 특질들간의 유사성을 측정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 즉 질문지를 통한 특질추론방법과 실험을 통한 특질분류방법에 따라 특질들간의 지각된 인지적 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다. 연구 사용된 특질은 30개로서 피험자 459명에게 특정집단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형용사를 적게 한 다음 이 자유반응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특질들이었다. 특질들간의 유사성은 피험자 786명(남 420명, 여 384명)에게는 특질 30개 각각을 쌍으로 제시하여 측정하였고(특질추론과제), 피험자 32명(남 22명, 여 10명)에게는 실험실에서 특질분류방법을 통해 측정하였다. 유사성 자료 각각이 어떠한 하위유형으로 묶여지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 결과 두 가지 유사성 측정치간에는 차이가 있었다 피험자들이 특질의 공발생에 대한 판단을 할 때 특질추론 과제에서는 기억에 근거한 특질들간의 개념적 유사성에 의존하여 판단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질분류 과제에서는 온라인 평정을 함으로써 실제 행동의 공발생을 더 많이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erceived relationships among traits measured by the two method, trait inference method and trait sorting method were contrasted. 30 trait adjectives were used in this study, which were the most frequent trait in the free-response descriptions when we asked students to describe target person. For 786 subjects(M : 420, F : 384), they were asked to judge each of the 435 pairs of 30 trait adjectives according to the trait co-occurrences. For 32 subjects(M : 22, F : 10), they were asked to sort trait adjectives into boxes, each box representing a different person. The two similarity data were used as input for clustering analysis. Differences between the two method measuring the similarity of traits was found in the resulting structures.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When subjects were asked to judge for traits co-occurrences in traits inference task, their judgment was based on conceptual or semantic similarity. In trait sorting task, subject's judgment was reflected more the relationship actually observed in behavior.
초록
본 연구는 최소집단 상황에서 집단간 차별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수행되었다. 많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무선적으로나 혹은 아주 사소한 기준에 의해서 집단으로 구분하면 피험자들은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경쟁적으로 행동하며 내집단을 선호하는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Tajfel의 사회정체감 가설에 의하면 집단간 차별을 하는 것은 피험자들이 자신을 자신이 속한 집단과 동일시하고 외집단과 비교하여 내집단이 더 우수하다는 결정을 함으로써 자신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려 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한다. 본 연구의 가설은 집단구분을 하면 사람들은 집단간 차별을 하는가와 집단구분과 집단간 차별은 자아존중감에 어떤 영향을 주며, 다양한 집단간 분배 유형은 자아존중감에서 다른가이다. 연구의 결과 사람들은 집단 구분을 하면 집단간 차별을 하며 집단구분은 자아존중감을 낮추며 집단간 차별은 손상된 자아존중감을 회복시킨다. 그러나 집단간 차별 뿐만 아니라 공평한 분배도 자아존중감을 회복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것은 자신과 남을 스스로 비교할 수 있다는 통제감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Abstract
This experiment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rgroup discrimination and self-esteem in the minimal group situation. It has been demonstrated repeatedly that when subjects were merely categorized into groups and asked to distribute some values to others in the groups, they discriminated competitively in favor of their own group and strived for their own group's profit even though the criterion for the categorization was very trivial or random. Tajfel in the Social Identity Theory contends that the intergroup discrimination is a strategy for achieving self-esteem via social competition. When categorized, the subjects identify themselves with their own group, compare the ingroup with the outgroup and attempt to establish relative superior status of the ingroup to the outgroup. Thus the present study was designed to test hypotheses whether the categorization into groups makes subjects discriminate in fovor of their own group, whether the categorization or the discrimination affects self-esteem, and whether various types of distributions, (either discriminatory or fair and either voluntary or forced) also affect self-esteem. The results of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when categorized, subjects discriminated in intergroup distributions, and that categorization deteriorated self-esteem and discrimination increased the deteriorated self-esteem. In addition, all types of distributions, discriminatory as well as fair and voluntary as well as forced, increased self-esteem compared to the categorization without distribu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social comparison and evaluation performed by oneself provides one internal locus of control and high self-esteem.
초록
본 연구는 착각적 상관연구들에서 나타나는 피험자의 집단간 평가와 집단지각의 결정 원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실험 1에서는 집단에 대한 차별적 평가의 원인이 기존의 가정처럼 소수집단만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즉 집단에 대한 평가는 비율에 근거한 판단보다 다수집단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고수집단은 더 부정적으로 평가한 상대비교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이러한 상대비교를 토대로 한 판단의 경향은 상대적 정보량, 즉 A선호정보량(A바람직+B비바람직)과 S선호정보량(B바람직+A비바람직) 간의 차이가 커질수록 증가함이 밝혀졌다. 실험 2에서는 부호화 단계에서 독특성이 공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정의 오류가 발생하고 집단에 대한 차별적 평가도 유지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착각적 상관연구에서 나타난 추정오류가 부호화 단계에서 일어나는 소수집단과 회귀성 정보간의 독특성의 공발생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Abstract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determinants of the subjects' evaluation and perception of groups in illusory correlation paradigms. The study conducted two experiments. The experiment 1 showed that the cause of the subjects' differential evaluations of groups was not resulted from the subjects' negative evaluations of the minority group only as was assumed in the previous studies. It was found that the subjects' evaluations of groups were based on a relative comparison in which the majority group is evaluated more positively and the minority group more negatively. Because there was no difference in subjects' group evaluation when they evaluated the group based on a ratio of the desirable and undesirable stimulus behaviors. Also, it was found that this subjects' judgmental tendency of relative comparison increased as the differences in the amount of relative behavioural indices between the two groups increased. The experiment 2 showed that the subjects' frequency estimation errors in the previous studies were not caused by the distintive co-occurrence of the minority group and the infrequent behaviours of the group at the subjects' encoding of the informations. Even under conditions where the ditinctiveness did not co-occur at the encoding stage, estimation error occured and the subjects' differential evaluation of the group was maintained.
초록
人性論을 중심으로 했던 앞선 글(조긍호, 1990)에 이어 맹자의 교육과 도덕실천론을 중심으로 그 심리학적 항의를 고찰하였다. 맹자의 교육론은 인간의 이상적 可能態를 상정하고, 누구나 이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능동적·주체적으로 이를 지향하는 노력의 과정을 강조한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그의 교육론으로부터는 성격 및 발달심리학과 관련된 연구 문제인 이상적 인간형의 특징과 그 도달 단계의 문제와 학습 및 교육심리학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들이 도출되었다. 한편 맹자의 도덕실천론은 인간의 존재 의의를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전제하에 推己及人과 興民同之를 통해 사람들과 함께 선을 이루는 與人爲善을 지향하는 과정을 강조한다는 데 그 요점이 있다. 이러한 그의 도덕실천론으로부터는 사회심리학과 관련된 연구 문제인 사회 관계와 타인 이해 과정의 문제들 도출되었는데, 이러한 연구 문제들은 교환 이론을 배경으로 하는 현대 사회심리학과 인간의 사회적 존재 특성을 강조하는 맹자의 입장으로부터 이끌어지는 사회 관계 파악의 眺望이 본질적으로 상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추론되는 것들이었다.
Abstract
Continued from the previous paper (Cho, 1990) regarding Mencius' theory of human nature and its psychological implications, this article aims to extract some psychological lessons from Menicus' view on education and that on moral practice. Presupposing the possible ideal state of human being, Menicus thought that anyone can reach to this state if he/she realizes that one has inborn beginnings of four virtues(i.e., the feeling of commiseration, the feeling of shame and dislike, the feeling of modesty and complaisance, and the feeling of approving and disapproving) and strives actively and subjectively for a full flourish of these beginnings into four ultimate virtues(i.e., benevolence, rightousness, propriety, and wisdom) in everyday relationships with others. Mencius taught that one can come to the realization of his/her inborn beginnings of four virtues through education and learning and that he/she can strive for a full flourish of those beginnings into ultimate virtues through moral practice in relations with others. From these Mencius' points, two psychological research issues can be derived. One is the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ssible ideal state of human being and on the steps as well as methods for reaching it. Another is the study on the perspective for understanding human social relations, distinguished from that of the social exchange paradigm in the modern social psychology, and on some related social activities(i.e. the performance of role and harmony in social relations).
초록
Maslow(1970)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체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이론적 틀을 제시한다. 그러나 Maslow의 인간기본 욕구 이론에는 인간의 기본욕구들이 환경적인 맥락(environmental context)에서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려가 담겨있지 않다. 본 연구는 Maslow의 기본욕구들이 환경적인 맥락에서 재조명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또한 구체적으로 주거환경(housing environment) 내에서의 Maslow의 욕구들이 주거환경의 평가지표인 주거만족(residents housing satisfaction)과 갖는 인과적 관련도를 중점적으로 토의한다. 한국의 6개 대단위 공동주택단지가 본 연구의 대상지로 선정되었고, 표본추출시 건물유형과 건물배치유형을 고려한 다단계표집방법 (multistage sampling)이 사용되었다. 설문면답 방법 (modified structured interview form)에 의해 646명의 처리가능한 응답이 수거되었다. 인과모형검증의 첫 단계로서 다수의 설문 문항을 원래 관심있는 소수의 변수로 정선, 추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요인분석 (factor analysis)이 사용되었다. 요인분석으로부터 정선된 변수를 이용해서 본 연구의 가설 모형이 정립되고, 그 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경로분석(path analysis)이 사용되었다. 검증결과를 요약해 볼 때, 1) Maslow의 6개 욕구 변수들 모두가 거주자의 주거만족과 유의한 관련도를 보임으로서, Maslow의 욕구이론이 환경적인 맥락에서도 응용될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으나, 2) 욕구들간의 상호체제는 Maslow가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독자적인 위계 (independent hierarchy)가 아니라 인과적인 종속위계(causally dependent hierarchy)로 구성되어 있음과, 3) 또한 Maslow의 기본 욕구들에 추가될 수 있는 욕구로서 주거 밀착욕구 (residential attachment)의 중요성을 본 연구의 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Abstract
Maslow's theory(1970)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substantial structure of human basic needs. One of the question raised in his theory is, however, whether the theory can be applied to the environmental context. In this study, Maslow's theory is both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investigated in the context of the housing environment. This study specially seek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dents' housing satisfaction and the human needs defined by Maslow. A modified structured interview form was used as the procedure of data gathering in six large-scale multi-family housing developments. Factor analysis was utilized to develop appropriate conceptual indices. Based upon the indices, the hypothesized model of this study was developed, and tested by path analysis. The results of model testing; showed several interesting findings ; 1) all six issues originated from Maslow's theory were strongly related to residents' housing satisfaction, suggesting a high possibility to apply the theory to the environmental context, 2) the needs i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however, would not be organized into the independent hierarchy, as suggested by Maslow, but the causally dependent hierarchy, 3) and residential attachment is found to be a possible need to be added to Maslow's basic needs i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초록
본 연구는 집단의 편파 감소에 미치는 협동의 효과를 집단 경계의 현출성을 조작한 집단 범주화 유형과, 과제수행 결과의 성과유형 사이에서 검증해 보려는 것이다. 연구의 결과, 협동적 과제에서의 편파감소의 효과는 집단 경계의 현출성 약화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과, 협동의 효과 결정에 과제 수행의 성과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 집단의 상위 범주화와 하위 범주화를 비교해 볼 때 상위 범주화에서는 성공과 실패에 따른 내·외집단 평가에 차이가 작았던 반면, 하위 범주화에는 그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의 연구가 집단간 유인을 증가시킬 수 있는 조건들을 확인하는데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experimentally the effects of the social categorization and outcome information on reducing intergroup bias in the cooperative task performance. In the first phase of the present study, members of the two groups either wore similar uniforms or different uniforms to distinguish the groups. In the second phase of the study, the two groups were combined and worked cooperatively on the tasks. And the outcome of the cooperative endeavor was manipulated so half the groups succeed and half failed. The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1) The one-group members (superordinate group) showed lower intergroup bias than the separate-two group members (subordinate group). (2) Success at the task increased the elimination of former group identies during intergroup cooperation. (3) The one-groups in the success feedback condition have lower degrees of bias than the separate-two groups in the failure feedback condition.
초록
사회심리학이 다루는 현상 및 이론들이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권의 특수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문화권의 현상을 설명하는데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잘못이다. 본고는 교환현상, 정서표현, 사회적 동기의 발현, 자기 제시현상, 사회비교, 귀인의 편향, 인지일관성 동기의 제 현상이 어떻게 문화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관련연구와 추론을 통해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한국인의 사회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고려해야 할 점을 제언하였다.
Abstract
To understand the social psychology of Korean people, researchers should examine cultural limitations of those psychological theories developed in the Euro-American culture. To substantiate this issue, 1 reviewed empirical evidences and arguments questioning the universality of psychological theories in seven domains ; social exchange, emotional experience, social motives (N-Achievement, N-Affiliation, & N-Power), self-presentation, social comparison, attributional biases, and cognitive consistency. This review concluded that it is critical to delineate cultural representations of indigenous phenomena and to conduct social psychological investigation of them. Finally, few suggestions were made concerning the future research in the area.
초록
본 연구에서는 대인지각에 있어서 Lewicki(1983)가 제안한 자기상 편파(Self-image bias) 효과에 개인차 변인으로서 우울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실험은 먼저 피험자에게 BDI척도를 실시하여 각 개인의 우울 수준에 관한 정보를 얻었고 뒤이어 14명의 자극 대상인물을 17개의 특성 차원에 대해 평가하게 하였다. 그러고 이 평가에 근거하여 각 개인마다 특정 특성차원의 긍정성과 중심성을 측정하여 이들간의 관계의 모양과 상관을 알아보았다. 여기서 자기자신의 긍정성은 평가지에 있는 '자기자신'항목의 평가에 근거해서 측정되었고 특성차원의 중심성은 한 특성 차원과 나머지 16개의 각 특성간에 r²을 합산함으로서 한 특성차원이 나머지 특성차원을 설명해 주는 변량의 크기로 측정되었다. 실험결과는 우울집단에 속하는가 개인들은 특성차원의 중심성과 긍정성간에는 부적상관을, 비우울 집단에서는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Lewicki가 제안한 자아상 편파 효과가 사람들의 우울 여부에 따라 정반대로 나타남을 의미한다. 그러고 우울한 사람들이 자신의 부정적인 특성차원이 타인을 지각할 때도 중요한 특성차원으로 보는 현상은 Lewicki가 제안한 인지적 설명모형에 의해 설명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Lewicki가 자아상편파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제안한 인지적 설명모형을 더욱 확증시킨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depression on Lewicki's self-im age bias in person perception. Beck Depression scale(BDI) was administered to college students, and depressed and non-depressed groups were sorted. And subjects were asked to rate frankly fourteen target-persons on according to seventeen trait-dimensions. Having established the subject's self-ratings representing positivity of his or her location on each dimension and each dimension's centrality measure, I determined self-ratings-centrality relation separately for each subject.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there was a positive corelation between positivity of self ratings and centrality in non-depression group and a negative corelation in depression group.
초록
대인관계들과 타인의 특성들의 추정과 추정의 확신도 판단에 관한 네 개의 가설이 검증되었다. 태도일치여부 정보에서 P/O관계의 추정, P/O나 O/P관계에서 태도일치여부의 추정, P/O나 O/P관계에서 타인의 특성 추정, 타인의 한 특성에서 다른 특성의 추정 및 P/O나 O/P관계에서 O/P나 P/O관계의 추정의 다섯개 상황들에서 추정의 방향과 주관적 확신도에 관한 측정치들이 얻어졌다. 가설 1(추정의 동일한 방향과 극화)은 예측방향과 극화(또는 정도)를 취급하고 있는데, 다섯 개의 모든 상황들에서 지지 받았다. 가설 2(긍정성-확신성과 부정성-불확신성)도 다섯개의 모든 상황들에서 지지 받았다. 가설 3(호오관계의 극화-확신성증가)은 네 개의 상황에서 지지받았고 마지막의 상황에서 지지받지 못했다. 가설 4(확신성에서 긍정성-극화차이 있음과 부정성-극화차이 없음)는 세 개의 상황에서 지지받았고 두 개의 상황에서 지지받지 못했으며, 이러한 결과는 연구방법 (즉, 특성선택)의 측면에서 논의되었다. P/O관계에서 O/P관계의 추정은 0/P관계에서 P/O관계의 추정보다도 추정의 호오도가 더 상호적이고, 더 확신도가 높았으며, 정·부관계간의 확신도 차이가 더 적었다.
Abstract
Four hypotheses which related to the inferences about interpersonal relations and subjective certainty of inferences were tested. The measures of direction of inferences and subjective certainty were obtained from five situations. These situations included inferences of P/O relations from the information of attitudinal agree-disagree, inferences of attitudinal agree-disagree from P/O or O/P relations, inferences of other person's traits from P/O or O/P inferences of other trait from other person's inferences of other trait from other persons's a specific traits, and inferences of O/P or P/O relations from P/O or O/P relations. Hypothesis 1, same direction and polarization of infercence) which dealt with direction and polarization of inference were supported from five all situations. Hypothesis 2(positivity-certainty and negativity-uncertainty) were supported from five all situations. Hypothesis 3(polarization of relations-increment of certainty were supported from four situations and was not supported from last situation. Hypothesis 4(greater difference in certainty in the positive degrees and no difference in certainty in the negative degrees) was supported from three situations and was not supported from two situations. The last results were discussed in terms of research method (that is, selection of traits). Inferences of O/P relations from P/O relations were more reciprocated, higher in certainty and smaller in certainty differences between positive and negative relations than inferences of P/O relations from O/P re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