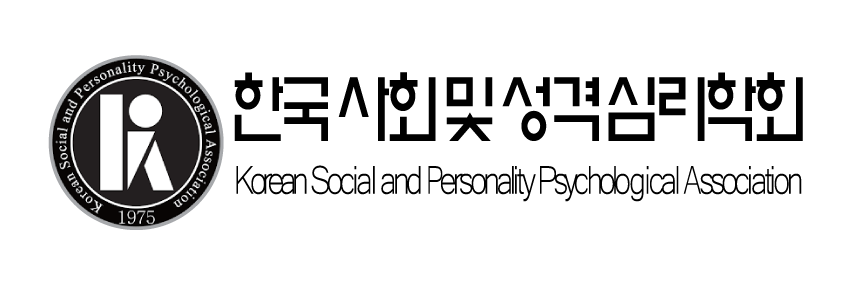ISSN : 1229-0653
ISSN : 1229-0653
권호 목록
- 2025 (39권)
- 2024 (38권)
- 2023 (37권)
- 2022 (36권)
- 2021 (35권)
- 2020 (34권)
- 2019 (33권)
- 2018 (32권)
- 2017 (31권)
- 2016 (30권)
- 2015 (29권)
- 2014 (28권)
- 2013 (27권)
- 2012 (26권)
- 2011 (25권)
- 2010 (24권)
- 2009 (23권)
- 2008 (22권)
- 2007 (21권)
- 2006 (20권)
- 2005 (19권)
- 2004 (18권)
- 2003 (17권)
- 2002 (16권)
- 2001 (15권)
- 2000 (14권)
- 1999 (13권)
- 1998 (12권)
- 1997 (11권)
- 1996 (10권)
- 1995 (9권)
- 1994 (8권)
- 1993 (7권)
- 1992 (6권)
- 1991 (6권)
- 1990 (5권)
- 1989 (4권)
- 1988 (4권)
- 1987 (3권)
- 1986 (3권)
- 1985 (2권)
- 1984 (2권)
- 1983 (1권)
- 1982 (1권)
33권 3호
초록
기존 연구에 의하면 다양한 경험은 창의성을 증가시키거나 집단 간 편향을 감소시키는 것 같은 긍정적인 결과와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런 효과는 주로 해외 거주 경험 같이 외국과 인종 측면에 국한된 다양한 경험의 영향을 검증하였기 때문에, 외국 문화에 대한 경험이 필수 요소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외 문화 측면과 관련 없이도 성장하면서 겪은 다양한 경험 자체의 속성이 외집단(본 연구에서는 동남아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지 알아보고, 이 효과가 인지적 유연성을 통해 매개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두 개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1의 결과, 실험을 통해 전공이 다른 학생과 상호작용 하는 상황을 점화하면 동남아인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가 증가하였다. 연구 2에서는 참가자들이 성장 과정에서 경험한 다양성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때 다양한 경험이 해외 문화 경험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다양성 경험을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다양한 경험의 빈도는 동남아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정적 관계를 보였으며, 이 관계는 인지적 유연성을 통해 매개되었다. 또한 이 관계는 해외 문화 경험 및 동남아인을 접촉해본 경험을 통제했을 때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기존에 확인되었던 다양한 경험의 긍정적 효과는 해외 문화 경험과 독립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논의에서는 연구결과가 갖는 함의와 제한점을 검토하였다.
Abstract
Previous research demonstrated that multicultural experiences can generate beneficial outcomes such as reduced intergroup biases. However, those effects of diverse experiences were largely limited to diverse experiences involving foreign cultures such as living abroad. We proposed that diverse experiences would still be associated with positive attitudes toward outgroup even when the nature of the experiences is not related to foreign cultures. We also suggested that the relation between diverse experiences and positive attitudes would be mediated by cognitive flexibility. Result of study 1 revealed that participants who were asked to think about interactions with classmates with other majors than their own showed more favorable attitudes toward a negatively stereotyped group in Korea (i.e., Southeast Asians) than those who were asked to think about interactions with classmates with the same major. In study 2, we showed that broadly defined diverse experiences were associated with positive attitudes toward Southeast Asians. Moreover, this association was mediated by cognitive flexibility. Finally, these relations persisted even when controlling for foreign-related variables, such as living abroad and experience to contact outgroup member. Taken together, the results suggest that those with diverse experiences may become cognitively flexible and overcome intergroup biases regardless of how much they have experiences relating to foreign cultures.
초록
본 연구는 행복의 변동 여부와 변동 양상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이 행복의 평균적 변화에만 주목하여 행복을 고정된 특질 혹은 유동적 상태로 이분하여 보았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행복 변동 양상에서의 개인차 가능성을 고려하여, 행복의 변동이 개인에 따라 상이한 형태로 나타나는지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3년에 걸쳐 수집된 대학생 종단 자료(N = 219)를 활용하여 행복 변화에 대한 잠재계층성장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행복 변화 유형에 따라 하위-증가형, 유지형, 그리고 감소형의 세 하위 집단이 확인되었다. 추가 로지스틱 분석 결과, 일부 인구 통계학 변인과 성격 특질 변인들이 행복 변화 유형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들의 시사점 및 한계점에 대해 논하였다.
Abstract
The current research aimed to explore whether and how happiness varied. While previous studies mainly focused on either the stability of happiness or the variability of happiness, we took into account the possibility that there might be differences in the patterns of variability in happiness and investigated whether happiness varied in different patterns among different people. To this end, we conducted a series of latent class growth modeling analyses with longitudinal data collected from undergraduates for three years (N = 219).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three different subgroups in terms of patterns of happiness change: increasing vs. stable vs. decreasing. Subsequently, the results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indicated that a few demographic variables (i.e., age and major) and Big Five traits (i.e., extroversion, emotional stability, and conscientiousness) could predict the patterns of happiness change. We discussed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current research.
초록
본 연구에서는 장기목표와 관련된 그릿의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릿이 ‘장기목표’에 대한 끈기와 열정으로 정의됨에도 불구하고, 그릿과 장기목표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래에 대해 가깝거나 멀게 지각하는 주관적인 시간지각이 현재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미래시간조망 이론을 적용하여 그릿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더 먼 장기목표를 추구하면서도 이를 심리적으로 더 가깝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 때, 그릿과 유사한 개념으로 알려진 성실성이 장기목표 설정 및 지각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함께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대학생 120명에게 본인의 장기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시점의 나이와 목표까지 남은 시간의 길이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그릿은 성실성의 영향력을 통제했을 때도 유의하게 장기목표까지의 객관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를 예측하였지만, 성실성은 장기목표에 대한 시간지각을 모두 예측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그릿이 장기적인 목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성실성과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으며, 장기목표를 꾸준히 달성해나가는 것으로 알려진 그릿의 특성을 시간지각 측면에서 확인하였다는 함의를 갖는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 of grit related to long-term goal. Despite grit is defined as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a long-term goal, little is known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grit and long-term goal. Therefore, based on the theory of future time perspective, which explains the subjective temporal perception that perceives close to or far from reaching future goals could motivate the present behavior, we aimed to identify gritty people would objectively pursue further distant goals from the present, and feel more psychologically closer to the long-term goals. We also investigated how conscientiousness, which is considered a similar concept as grit, differs from grit in long-term goal setting and perception. 120 university students were asked to draw a line to a point when they would achieve their long-term goal in their life span and write down the age of that point in their life. The result showed that grit was a still significant indicator of objective distance and psychological distance to the long-term goals even when conscientiousness was controlled. However, conscientiousness was not associated with all of the time perception to the long-term goals. These findings support the result of the literatures, which argues that grit is a distinct concept from conscientiousness in pursuing long-term goals, and have the implication that we verified the characteristics of grit known to achieve long-term goals in terms of time perce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