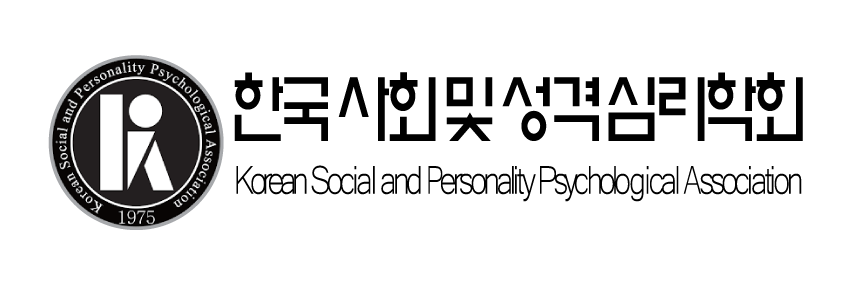ISSN : 1229-0653
ISSN : 1229-0653
권호 목록
- 2025 (39권)
- 2024 (38권)
- 2023 (37권)
- 2022 (36권)
- 2021 (35권)
- 2020 (34권)
- 2019 (33권)
- 2018 (32권)
- 2017 (31권)
- 2016 (30권)
- 2015 (29권)
- 2014 (28권)
- 2013 (27권)
- 2012 (26권)
- 2011 (25권)
- 2010 (24권)
- 2009 (23권)
- 2008 (22권)
- 2007 (21권)
- 2006 (20권)
- 2005 (19권)
- 2004 (18권)
- 2003 (17권)
- 2002 (16권)
- 2001 (15권)
- 2000 (14권)
- 1999 (13권)
- 1998 (12권)
- 1997 (11권)
- 1996 (10권)
- 1995 (9권)
- 1994 (8권)
- 1993 (7권)
- 1992 (6권)
- 1991 (6권)
- 1990 (5권)
- 1989 (4권)
- 1988 (4권)
- 1987 (3권)
- 1986 (3권)
- 1985 (2권)
- 1984 (2권)
- 1983 (1권)
- 1982 (1권)
10권 1호
초록
본 논문에서는 책임판단에 관한 Heider의 이론적 뿌리와 그 후의 경험적 연구 결과들을 독립변인 범주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인과추론과 책임판단의 혼동, 책임의 다의미성, 및 여러 의미의 책임판단에 사용되는 기준들로 구분하여 책임판단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특히 '책임'의 의미가 상황 맥락에 따라 도의적 책임, 인과적 책임, 및 사후적 책임으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Heider가 처음부터 이를 구분하지 않았고 기존의 경험적 연구들도 구분없이 사용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들이 상충되었음을 지적하였다. 만약 책임을 위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면 상충된 결과들의 대부분이 재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각 유형의 책임크기를 결정하는 기준들은 서로 다르지만, 이것들은 일종의 Guttman 척도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책임판단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때 연구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안하였다.
Abstract
Heider's theoretical framework and other researchers' empirical findings about responsibility judgment(RJ) were reviewed critically in the present paper. In spite of the meanings of responsibility(e.g. moral responsibility, causality, and liability so on) are varied with contexts which it was used, most of researchers including Heider didn't specify them in their works. As a result, their findings are in conflict now. If we classify responsibility into moral responsibility, causality, and liability, most of conflicts in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researches of RJ would be resolved. Although several criteria which determine each type of responsibility are different from one another, it seems that they consist of a Guttman-type scale to measure the target's overall responsibility. Finally, some suggestions to be considered for further researches of RJ are mentioned.
초록
지역사회의 연구는 사회심리학의 주제 및 방법론의 다양화 추세에서 부상될 수 있는 주제이다. 본고는 지역사회 연구의 필요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체화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심리학적 탐구의 성격을 모색하였다. 아울러 이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의 방법론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심리학적 접근들이 지역사회의 연구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추가적인 방법론적 접근으로써 사회표상론적 접근(Moscovici, 1984)의 이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Abstract
Current trends in the field of social psychology reflect diversity in its themes and methods for research. Community can become an important topic for psychological research. The present paper examines the needs for community research from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and characterizes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of community. It reviews major research fields to show how each field may contribute to community research by social psychologists. To compensate for the shortcomings of traditional methods in social psychology for community research, the social representational approach(Moscovici, 1984) can be usefully employed and, thus, discussed in greater details.
초록
집단 행동에 관한 집단간 이론들 가운데 다른 이론들과 비교 논의가 가능한 이론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각 이론의 발전 가능성과 대안 이론들의 상대적 타당성을 검토함으로써 여러 이론들이 다양한 형태의 통합을 모색할 수 있는 방향도 모색하였다. 이 잡지의 지난 호에 실린 집단내 과정 이론들로는 집단에 적용된 추동이론, 사회비교이론, 자기제시이론, 자기주의이론이 포함되었다. 이 논문에서 집단간 과정 이론들로는 상대적 박탈이론들, 사회적 정체성이론 및 자기범주화이론, 그리고 집단간 관계를 다루는 귀인이론적 접근을 다루었다. 이 이론들 이외에 형평이론, 사회적 충격이론, 소수영향이론, 절차정의이론 등이 여러 이론들과의 관계에서 논의되었다. 전체 논의에서는 여러 집단 이론들의 위상을 정해줄 수 있는 이해의 틀이 모색되었으며, 한국 문화에서 서구의 집단 이론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데 따르는 몇 가지 문제점들도 검토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ritically review the major middle range theories in intergroup relations from 1980's. The intergroup theories included in this article are relative deprivation theories, social identity theory, self-categorization theory and attribution approaches to intergroup relations. In addition, equity theory, social impact theory, interdependence theory of social influence, minority influence theory and procedural justice theory among others are partly discussed in relation to the relevant theories. In order to obtain a comprehensive framework that systematize the intragroup and intergroup theories, a two-dimensional classification scheme is presented according to the nature of group relationships(intragroup, intergroup) and levels of analysis(individual, interpersonal and intergroup). It is emphasized that group researchers in Korea ought to take the relationship orientations of the Korean people into account in studying group behaviors and intergroup relations.
초록
본 연구는 역태도 역할놀이가 태도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태도의 구조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가정은 역태도 역할놀이가 태도대상에 대한 새로운 인지를 생성하며, 이렇게 생성된 인지가 기존에 갖고 있던 인지에 누적됨으로써 태도구조가 양극구조에서 이원구조로 변화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역할놀이를 통하여 개인의 태도구조가 이원화되면 태도대상을 평가적 의미차원에서 인식하지 않고 서술적 의미차원에서 인식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을 검증하기 위하여 피험자들을 두개의 실험조건인 인지생성과 인지차단조건에 할당한 후 역태도 역할처치를 가하였다. 인지생성조건에서는 역태도 역할을 맡게 한 후 태도대상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인지차단조건에서는 그 기회를 차단하였다. 그 결과 역태도 역할놀이의 효과가 인지생성조건에서만 나타났다. 인지생성조건에서는 예언대로 개인의 태도가 역태도 방향으로 바뀌었으며 또한 태도의 구조도 양극구조에서 이원구조로 바뀌면서 태도대상에 대한 인식차원이 평가적 의미차원에서 서술적 의미차원으로 변화되었다.
Abstract
The present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a hypothesis that people will integrate their counterattitudinal beliefs in terms of the descriptive values of an attitude object when they experience the arguments which are against their attitudinal evaluations. A pretest was performed to test the participants' attitude towards capital punishment, rated on the evaluative dimensions (e.g., agreedisagree) or the descriptive dimensions (e.g., human right, social order). Participants were then forced to took a role of counterattitudinal role playing in which they were instructed to write their opinions supporting their counterattitude(the cognitive generation condition) or to write their opinions regarding about an issue irrelevant to the attitude object(the cognition blocking condition). After the role playing, a posttest was performed to test the final attitude toward capital punishment. The changed-magnitude between the two tests was measured on the evaluative and descriptive dimensions. As confirming the prediction, the results of the correlational analyses indicated that (1)in the cognition blocking condition, the positive attitud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value of social order, but negatively with the value of human right, and (2)in the cognitive generation condition, the positive attitud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value of social order, but not correlated with the value of human right. For the negative attitude, the same trends observed above were obtained. Obviously, after the role playing, participants combined opposing attitudinal beliefs on the evaluative dimension into an attitude by integrating them in terms of descriptive values.
초록
집단극화에 관한 설명 중 집단구성원의 태도 결정 과정에 관한 두 이론의 상이한 주장을 2개의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였다. 사회비교이론은 사회적 가치와 내집단규범의 절충에 의해서, 자기범주화이론은 내집단규범에의 동조에 의해서 태도가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이를 개인의 태도, 이상(理想) 및 내집단규범 추정치를 비교함으로써 검증할 수 있다고 보고, 사회적 가치의 명료성 수준에 따라서 세 측정치간의 차이가 달라서 각 이론이 잘 적용되는 조건이 다를 것으로 추론하였다. 즉, 가치 명료 조건에서는 사회비교이론의 주장대로 개인 태도는 내집단보다 더 바람직하고 이상보다는 덜 바람직할 것이며, 가치 불명료 조건에서는 자기범주화이론의 주장대로 세 측정치간에 차이가 없을 것으로 가설화하였다. 모험-보수 차원의 태도를 측정한 실험 1에서는 가치 명료 조건에서만 가설이 지지되었으며, 일반적인 사회적 요망도를 조작한 실험 2에서는 두 조건에서 모두 가설이 지지되었다. 그리고 실험 2의 두 조건에서 유의한 극화 효과를 얻음으로써 태도의 결정 과정은 달라도 결과는 동일함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wo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test the controversy on the process of group member's attitude formation between two theories about group polarization. Social comparison theory suggests that group member's attitude is compromised between social value and ingroup norm, on the other hand self-categorization theory proposes that it is determined by conformity to ingroup norm. This problem was likely to be solved by comparisons among personal attitude, ideal and estimated ingroup norm, and these comparisons were expected to have different results according to the level of value clearness. Specifically, it was hypothesized that personal attitude would be more desirable than ingroup norm but less desirable than ideal in value-clean condition, and three measures would be no difference in value-unclean condition. The results of experiment 1 which measured attitude on risky-conservative dimension supported the hypothesis only in value-clean condition. But the results of experiment 2 which manipulated general social desirability supported all hypotheses of both condition and showed significant polarization effect in both condition. These results imply that social comparision theory and self-categorization theory have their own condition more suitably applicable.
초록
본 연구에서는 13가지 자기제시 책략을 사용하는 경향을 측정하는 자기제시 책략척도(Lee, Quigley, Nesler, & Tedeschi, 1995)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그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는 (1)자기제시 책략척도가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가지고 있고, (2)자기제시 책략이 이원구조(방어적 책략과 자기주장적 책략)를 가지며, (3)남자는 여자보다 자기주장적 책략을 더 자주 사용하였음을 보였다. 논의에서는 개인차 변인으로서 자기제시 경향이 자기본위적 편향을 조정하는 역할과 비교문화의 관점에서 개인주의-집합주의의 문화적 속성이 자기제시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본 척도의 예언 타당도를 검증하는 연구과제로 제안하였다.
Abstract
A Self-Presentation Tactics Scale developed by Lee et al.(1995),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proclivity for using 13 self-presentation tactics, was translated into Korean. Two studies were carried out to examin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translated version of the scale. Evidence for discriminant and construct validity is presented. The results indicate that (a)the translated version is highly reliable and valid as the original English version, (b)self-presentation tactics consist of two components: defensive and assertive tactics, and (c)males are more likely than females to use assertive self-presentation tactics. The potential utility of the Self-Presentation Tactics Scale for future research on both the impacts of cultural factors such as individualism-collectivism on self-presentation behavior and the moderating role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self-serving attributional bias is discussed.
초록
본 연구는 걸음걸이 특징이 성격특질을 평가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기위하여 3가지 실험을 실시하였는데, McArthur와 Baron(1983)이 제시한 생태학적 사회지각 이론을 근거로 연구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실험 1, 2, 그리고 3은 그동안 국내에서 검증되지 않았던 '걸음걸이가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밝히고자 한 것이다. 본 연구의 가설은 걸음걸이 특징과 인상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젊은 걸음걸이를 가진 사람을 나이든 걸음걸이를 가진 사람에 비해서 더욱 힘있고 행복하게 지각할 것이며,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젊은 걸음걸이를 가진 사람보다 나이든 걸음걸이를 가진 사람을 더욱 지배적으로 지각할 것이라는 것이다. 실험 1, 2, 3은 미국에서의 걸음걸이 인상을 조사했던 Montepare와 Zebrowiu-McArthur(1988)의 연구에 후속되는 것으로 한국에서의 걸음걸이 인상을 조사하여 이전 결과와 비교하는 비교문화 연구를 실시하는 것이다. 걸음걸이 자극물은 Johansson(1973)이 신체 움직임에서 사용한 광점 기법을 이용하여 사람의 걸음걸이를 어둠속에 움직이는 광점으로 표시하였다. 실험 1의 자극인물은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의 16명이었고, 피험자 48명이 참가하였다. 결과에서 걸음걸이 인상의 전반적인 문화적 보편성과 '지배성'인상의 문화적 특수성이 모두 나타났다. 실험 2의 자극인물은 19세에서 32세 사이의 성인 32명이었고, 피험자 72명이 참가하였다. 결과에서 걸음걸이 인상의 문화적 보편성이 나타났다. 실험 3의 자극인물은 실험 2와 동일했으며 자극제시시 화면상의 밝기를 조절하여 자극인물의 전신모습이 나타나도록 하였다. 피험자는 40명이 참가하였다. 결과에서 걸음걸이 인상은 자극인물의 성이나 연령이 고려될 경우에도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실험 1, 2, 3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한국에서의 걸음걸이 지각의 연구결과는 미국에서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본 가설을 강하게 지지해 주었다. 즉, 젊은 걸음걸이를 가진 사람은 힘있고 행복하게 지각됨으로서 걸음걸이가 인상에 미치는 영향은 동, 서양의 문화권에 관계없이 보편적임을 나타내었고, 지배성 차원의 지각에서 예측한 문화적 차이는 젊은 걸음걸이의 성인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Abstract
Three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identify the impact of age-related gait features upon the perception of personality attributes, which was based on McArthur & Baron(1983)'s ecological theory of social perception. Study 1, 2, 3 were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age-related gait qualities on trait impressions, and to compare the results of the study 1, 2, 3 with the studies by Montepare & Zebrowitz-McArthur(1988)'s to see the cross-cultural generality in trait attribution for young gaits. It was predicted that age-related gait qualities will result in cross-culturally consistent trait attribution, but unlike the U.S. subjects, Korean subjects will perceive younger walkers to be more dominant than older walkers. In study 1, subjects observed from 6- to 72-year-old walkers depicted in point-light displays, and rated the walkers' traits, gaits, and ages. Younger walkers were perceived to be more powerful and happier than older walkers. In study 2, subjects observed young adult walkers depicted in point-light displays, than rated their trait, gaits, and ages. Consistent with the effects of real age found in study 1, young adults with youthful gaits were perceived to be more powerful and happier than peers wit older gaits. Study 3 replicated study 2 using displays showing walkers' full bodies and faces. A youthful gait predicted trait impresions even when subjects could identify the walkers' age and sex. The findings showed cross-cultural similarities in trait attribution for age-related gait qualities, hence, supported the hypothetical prediction.
초록
과제수행의 지속 시간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어머니에 대한 배려의 효과를 보여준 정영숙(1994)의 결과를 종속변인을 달리하여 반복검증하고자 두 개의 실험을 실시하였다. 오른손잡이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자기선물이 추가되는 집단, 어머니선물이 추가되는 집단, 그리고 선물에 대한 언급이 없는 통제집단에서 일정한 시간 안에 신체적으로 힘들고 고된 과제를 어느 정도 열심히 수행하는지(과제수행의 열심도)를 측정하였다. 3분짜리 연습시행을 2회 시킨 후 15분간의 본 시행에서의 수행량을 측정하였던 실험1에서는 남, 여에 따라 수행 양상이 달랐다. 남자 아동의 경우, 어머니선물이 추가되는 조건의 아동들은 자기선물이 추가되는 조건의 아동들이나 통제집단의 아동들보다 힘든 과제인 왼손으로 글자쓰기를 더 열심히 하였으나, 자기선물이 추가되는 조건의 아동들과 통제집단의 아동들 간에는 수행에 차이가 없었다. 여자 아동의 경우에는 세 조건 간의 수행에서 차이가 없었다. 성차의 효과를 줄이는 방안으로 연습시행의 시간을 7분 30초로 늘여 2회의 연습을 시킨 실험2에서는 실험1에서 나타났던 남, 여 간의 수행 양상의 차이가 사라졌고, 실험1에 참여한 남자아동들에게서 나타난 양상과 동일한 결과를 얻어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기에게 득이 생기는 경우보다 어머니에게 득이 생기는 경우에 아동들이 힘든 과제를 더 오래 수행하였던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자기에게 생기는 득으로 인한 자기통제의 한계성과 개인이 좋아하는 타인에게 생기는 득으로 인한 자기통제의 우월성을 반복적으로 입증해주었다.
Abstract
Two experiments using industriousness as dependent variable were conducted to confirm the powerful effect of concern for mother on self-control in working hard setting. Fifth grade right-handed children who were treated with one of three experimental conditions copied mirror-image letters with their left hand. This task was very laborious and tedious to children. Industriousness in performing task was measured based on individual performance in exercise session. Children participating in experiment 1 showed different patterns of performance according to their sex. Male children in the condition of reward for mother performed more ardently than those both in reward for self condition and in control condition. But there were no difference in performance among conditions in female children. In experiment 2 making exercise time longer, there disappeared the sex difference found in experiment 1. The result of experiment 2 was identical with the result of obtained in male subjects in experiment 1. The result of this study was consistent with previous findings(Chong, 1994). This result supported Chong's proposal for sources of self-control(1994): The effect of self-control to get one's own benefit is limited but the effect of self-control to give benefit to significant other is powerful.
초록
본 연구는 성도식의 사용과 권위주의적 사고에 따른 편견이 수행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문화에서 경험적으로 재검증해 보고자 실시한 것이다. 평가대상자(글의 저자)의 성별에 따라 전반적인 수행평가가 달라지는지를 검증하고 동시에 평가자의 도식 사용 유형이 수행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는데, 도식적 사고를 하는 유형과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역할 검사(KSRI)'와 '권위주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논술문과 수필형식의 글을 남녀저자의 이름으로 제시하고, 글의 우수성에 대한 전반적 평가, 권위주의적 사고, 성역할 특성 등을 포함한 설문지를 남녀 대학생 147명에게 실시하였다. 응답자들이 글의 저자의 성별에 따라 전반적인 평가를 다르게 하였는지를 검증한 결과,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응답자들을 도식 사용 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남성적 특성이 강한 수필에 대한 평가에서 저자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도식 사용 유형이 양성적인 사람들은 남녀 저자의 글에 대한 평가에 차이가 없었던 반면, 남성적인 유형의 사람들은 글의 저자가 남자였을 때 그 글이 매우 잘 쓴 글이라고 평가하여 성별에 따라 큰 차별성을 보였다. 권위주의적 사고 정도에 따라 남녀의 수행에 대한 평가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에서는 권위주의적 사고가 심한 유형이 저자의 성별에 따라 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더 큰 차이를 두었고, 글의 저자가 남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 더 잘 쓴 글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요하는 사회적 판단이나 평가에 집단 차별적인 도식의 사용은 평가 자체의 공정성을 잃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되므로 이러한 현상의 이해에는 성도식이나 권위주의적 사고와 같은 도식 사용 유형에서의 개인차 변인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였다.
Abstract
Since Goldberg's influential study demonstrated an evaluative bias against women by showing that evaluation of the same article came out lower when attributed to a woman author compared to a man, many studies have adopted the experimental paradigm. The accumulated results are inconsistent, however, and a recent study using meta-analysis concluded that there is little evidence of gender-biased evaluations. The present study has two major purposes. The first is to examine if the western results in gender bias in evaluation is replicated in the Korean culture, and the second is to test the effects of gender schema and authoritarianism in evaluations. One hundred and forty-seven subjects answered a questionaire which included 4 articles attributed to male or female authors, the Korean Sex Role Inventory, and the authoritarianism scale. Overall, the results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gender-bias in evaluations, replicating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When the results were analyzed by groups differing in schema use, however, it was found that some people are indeed biased against women in their evaluations. For one of the four articles which deals with ambitions of the youths(masculine connotations), masculine sex-typed subjects and highly authoritarian subjects evaluated the article more highly when it was attributed to a man than a woman. Androgynous subjects and non-authoritarian subjects did not show any gender bias. These results suggest that it is yet premature to conclude that gender bias in evaluation does not exist any more. On the whole, it may be fading away gradually, but it is still alive and exerting its influence in a significant part of the population, namely those who use stereotyped schem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