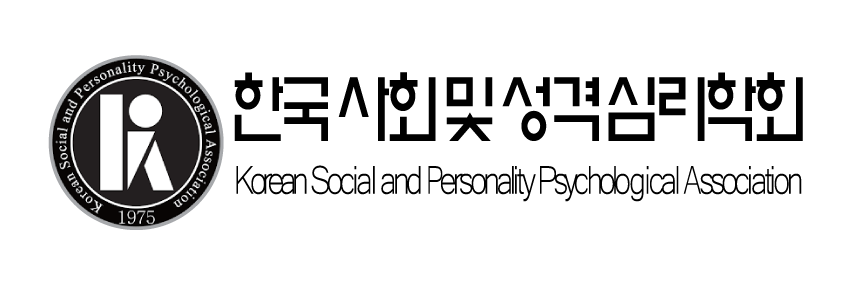ISSN : 1229-0653
ISSN : 1229-0653
권호 목록
- 2025 (39권)
- 2024 (38권)
- 2023 (37권)
- 2022 (36권)
- 2021 (35권)
- 2020 (34권)
- 2019 (33권)
- 2018 (32권)
- 2017 (31권)
- 2016 (30권)
- 2015 (29권)
- 2014 (28권)
- 2013 (27권)
- 2012 (26권)
- 2011 (25권)
- 2010 (24권)
- 2009 (23권)
- 2008 (22권)
- 2007 (21권)
- 2006 (20권)
- 2005 (19권)
- 2004 (18권)
- 2003 (17권)
- 2002 (16권)
- 2001 (15권)
- 2000 (14권)
- 1999 (13권)
- 1998 (12권)
- 1997 (11권)
- 1996 (10권)
- 1995 (9권)
- 1994 (8권)
- 1993 (7권)
- 1992 (6권)
- 1991 (6권)
- 1990 (5권)
- 1989 (4권)
- 1988 (4권)
- 1987 (3권)
- 1986 (3권)
- 1985 (2권)
- 1984 (2권)
- 1983 (1권)
- 1982 (1권)
11권 2호
초록
천인관계론(조긍호, 1994)과 인성론(조공호, 1995)을 통해 순자 사상의 심리학적 함의를 찾아 보려 한 앞선 글에 이어, 본고에서는 순자의 禮論을 중심으로 그 심리학적 함의를 도출해 보려 하였다. 순자는 人道의 표준으로서의 禮의 필요성을 인간 존재의 사회적 특성과 자원 부족이라는 상황적 특성에서 찾고 있으며, 그 기능은 分ㆍ節ㆍ中ㆍ文飾에 있다고 본다. 이러한 순자의 예론으로부터 群居和一하는 것이 사회관계 형성의 목표이며, 사회관계의 유지는 각 관계 속에 내재된 역할에 대한 인식(明分) 및 이의 상호의존적인 실천(守分)에 있다는 독특한 사회관계론과 형평분배가 가장 공정한 분배의 원칙이라는 분배정의론의 문제를 도출해 내고, 그 심리학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Abstract
Continued from the previous paper(Cho, 1995) regarding Hsun Tzu's theory of human nature, this article aimed at extracting some psychological lessons from Hsun Tzu's theory of the proper conduct(Li, 禮). Hsun Tzu proposed that because human beings are social and gregarious in nature and gregarious living inevitably bring about conflict and struggle among members, the system of prevention of these struggle (Li) is needed. The first and foremost function of Li is division of human classes and roles. Hsun Tzu viewed that human beings live together peacefully through these division, because it brings each of them contentment with his/her lot. From Hsun Tzu's theory of the proper conduct like this, the author derived two research issues and discussed their psychological implications: the study on the theory of social relation-ships(which is different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exchange theory) and the study on the distributive justice.
초록
본 논문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사회적 요인들을 밝히고 그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하기 위한 방법상의 문제들을 조명하는 문헌 연구이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개념의 애매함으로 인한 측정 방법의 다양성 때문에 여러 연구들을 동등하게 비교할 수 없는 단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범죄의 피해를 입을 실질적인 위험, 범죄 피해 경험, 역할 사회화 과정, 대중 매체의 내용, 공식적 방어기제의 효율성 지각, 지역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반문명성(incivility), 사희적 통제의 약화, 심리적 취약성 등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드러났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지역사회 내부/외부에서 일어나는 요인 및 개인의 심리적 내부에서 일어나는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하여 발생하는 듯하다. 시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한 제안도 논의되었다.
Abstract
This paper is a review of the studies on the fear of crime. It focuses on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factors that influence the fear of crime and some methodological issues for future empirical studies. Due to the ambiguity of the concept, there are difficulties to draw a conclusion from various studies with different perspectives. The fear of crime is a complex construct in which the factors inside and outside of the community as well as personal variables interact with one another. The actual risk of victimization, victimization history, socialization process, mass media, perceived efficiency of official control, structural changes of community and incivility factors, and perceived vulnerability seem to be related to the fear of crime.
초록
실험 1의 목적은 두 사람이 상대방과 이득과 손실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상호성 규범이 지켜지고 있는 지를 실험적으로 입증하고, 아울러 부적 상호성과 정적 상호성 규범 중 어느 것이 더 잘 지켜지는 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상호성 규범이 정확하게 지켜지는 지 혹은 대략적(과소부합과 과대부합)으로 지켜지는 지를 알아보려 하였다. 그 결과 상대방으로부터 이득을 받은 피험자들은 자신이 받은 이득만큼 그에게 이득을 줌으로써 상호성 규범이 비교적 정확하게 준수됨을 볼 수 있었으나,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험자들은 그에게 자신이 입은 피해보다는 약간 더 작은 피해를 되돌려 줌으로써 과소부합 상호성 규범을 따르고 있었다. 실험 2의 목적은 갈등이 상호성 규범의 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려는 것이었다. 실험 2의 결과, 피험자들은 무갈등 상황에서보다는 갈등 상황(즉 zero-sum 상황)에서 상호성 규범을 더 잘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보다는 이득을 얻은 사람이 상대방에게 자신이 받은 것보다 작은 보상을 줌으로써 자신의 이득을 최대화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결과들로 볼 때, 일반적으로 교환관계에서 사람들은 상호성 규범은 잘 준수하는 듯 하나, 자신이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득실과 상황요인 (예: 갈등)에 따라 그에게 되갚는 형태가 달라짐을 엿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결과들을 이론적 및 실용적 맥락에서 논의하였다.
Abstract
The present study composing of two related experiments concerns to search the patterns of using of two reciprocity nonrms in the outcome exchange situation. In experiment 1 subjects overpaid or underpaid credits from their partner(confederate) than they expected, then in the next session of experiment they were told to repay credits to their partner at will. Subjects overpaid did compensate to him exactly same to their profit received before, but subjects underpaid did repay to him more credits than they received. These results suggest that subjects follow the positive reciprocity norm exactly and follow the negative reciprocity norm roughly. In experiment 2 dealing with effect of conflict(manipulated with zero-sum situation) on the pattern of exchange, the conflict of two persons in exchange relationships made the reciprocity norm salient. When subjects perceive there are conflict between two person, they more followed the norm exactly than do not perceive conflict. The conflict may trigger a matching response in the size of the repayment between two persons exchanging their profits. Generally speaking, they opted for rough reciprocity norm in no conflict condition and opted for relatively exact reciprocity norm in conflict condition. Above results were discussed in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contexts.
초록
본 연구는 한국 성역할 검사(KSRI)가 개발된 이후 사용상 제기되었던 문제, 즉 남성 응답자들이 대거 양성성으로 분류 되고, 여성 응답자들이 대거 미분화 집단으로 분류되는 점과 중앙치가 표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능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KSR1에 대한 최근 연구(김남숙, 1997)에서 심리측정적 분석의 결과, 문항들의 신뢰도, 난이도, 변별도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서 문항편파의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연구 1에서는 반응편파의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KSR1를 약간 수정하여 네 종류의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남성들이 대거 양성성으로, 여성들이 대거 미분화로 나타나는 원인이 동성비교 즉 남성 응답자들은 남성 타인들과 자신을 비교해서 응답하고, 여성 응답자들은 여성 타인들과 자신을 비교해서 응답한 것에 있음을 밝혔다. 연구 2에서는 기존의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위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계적인 점수변환을 하였고, 이를 검증하였다. 연구 3에서는 중앙치가 표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응답자간의 비교가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IRT 분석을 이용하여 응답자의 모집단에 의해 달라지지 않고, 분류오류를 최소화하는 분류기준점을 산출하였다. 이상 세개의 연구를 토대로 산출된 조절계수와 분류기준점을 사용하여 응답자들을 분류하면 기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될 것이다. 논의에서는 본 연구에서 산출한 수정점수와 분류기준점의 사용상 유의해야할 점과 본 연구의 한계점 그리고 후속연구에서 보완하여야 할 점 등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addressed two problems that have been repeatedly observed in the previous studies using Korean Sex Role Inventory(KSRI). The first problem was that far too many male respondents had been classified as the androgynous type, and disproportionately large number of female respondents as the undifferentiated type by the KSRI. The second problem was that the same respondent could be classified into different sex role categories because sample medians were used as the cut-off points for classification. A previous study which examined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KSRI items failed to discover any psychometric defects among the items. Thus, study 1 was designed to test the hypothesis that the unexpected distribution of sex role categories is due to resoonse bias. That is, males respond to the items by comparing themselves with other males in general, and females respond by comparing themselves with other females in general. Four versions of KSRI were constructed by changing the instruction requesting the respondents to rate the items by comparing themselves with other males, females, both or each. The hypothesis was clearly confirmed. It was concluded that the disproportionate numbers of male respondents in the androgynous category and female respondents in the undifferentiated category were the result of response bias with the respondents rating themselves by applying stereotypical standards with respect to their own biological gender. Study 2 based on the data collected in study 1, attempted to derive adjustment coefficients that can be added ito the raw scores of KSRI in order to estimate the scores that would be obtained if the respondents have had applied gender-free judgmental standards. When the adjusted scores were used to classify the respondents into the sex role categories, the unexpected distribution of sex role categories no longer occurred. Finally, study 3 determined permanent cut-off scores that should be used irrespective of particular samples. For this determination, all previous data on KSRI were combined(n= 1675) and subjected to Item Response Theory analysis. Cut-off points of the femininity and masculinity subscales were determined at the scores that pro vide the highest test information. Since the higest test information implies the strongest discriminating power, these cut-off scores are theoretically considered to guarantee the lowest rates of misclassification. With the adjustment coefficients and the sample-free cut-off points the previous problems associated with KSRI will no longer occur. Follow-up studies need to examine the validities of the coefficients and the cut-off points. Implications for Bern's original Sex Role Inventory were discussed.
초록
이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한국 대학생들의 애착 유형 분포 형태를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수행된 많은 연구들에서 미국의 성인들과 대학생들의 전형적인 분포 형태는 안심〉회피>양가형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일관된 분포 형태에도 불구하고 애착 유형간의 심리적 특성의 차이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본 연구자들은 이러한 불일치를 문화적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특히 미국의 성인들과 대학생들에게서 양가형에 비해 회피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은 자기의 개별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는 미국 문화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았다. 반면에 집단주의적 이며 관계지향적인 한국 문화에서는 회피형보다 양가형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 1과 2의 결과 한국 대학생들에게서는 회피형보다 양가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한국 대학생들의 애착 유형별 특성은 미국 대학생들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본 연구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문화적인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Abstract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Korean college students' distributional pattern of attachment style. The typical distributional pattern of American adults and college students appeared in order of secure>avoidant>ambivalent in many studies. In spite of this consistent distributional pattern, the differences in many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between attachment types are unstable. We are to understand this disparity in cultural perspective. Particularly, we conjectured that the higher ratio of avoidant in comparison with ambivalent is a reflection of American culture emphasizes individuality and independence of self. Korea is classified into collectivistic and relational oriented culture. Therefore we anticipated that there are more ambivalent than avoidant in Korean culture. As anticipated, the ratio of ambivalent was higher than that of avoidant in Korean college students. And the characteristics between attachment types were different in two cultures. We discussed it with cultural view.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1)역고정관념(counter-stereotype)의 암묵적 활성화가 고정관념 불일치 인물(예: 남자같은 여자, 여자같은 남자)에 대한 인상을 실제로 좋게 만들 수 있는지를 실험적으로 검증하고, (2)이와 같은 역고정관념 또는 고정관념의 활성화가 인상형성에 체계적인 영향을 줌에도 불구하고 판단자들 자신은 이런 과정을 거의 의식하지 못함을 보임으로써 암묵적(implicit) 인지과정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하였다. 사전조사를 거쳐 점화행동 활성화 질문지와 인상판단 질문지를 만든 다음, 이 두 가지가 별개의 실험인 것처럼 하여 112명의 피험자들이 이 두 질문지 간의 관련성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실험의 독립변인은 (1)점화행동의 긍정성ㆍ부정성, (2)점화행동의 고정관념 일치 여부(역고정관념 활성화ㆍ고정관념 활성화) - 중성적 행동의 활성화 집단은 통제집단,(3)판단인물의 고정관념 일치ㆍ불일치 여부, 그리고 (4)판단인물의 성별로서 2×2×2×2 요인설계였다. 종속변인은 자기주장적 인물 또는 수줍은 인물로 묘사된 영호와 영희에 대한 (1)호감, (2)평소 좋아함, (3)공격성 지각 정도(일종의 조작 확인), 및 (4)사회적 거리감이었다. 연구 결과, 대체로 긍정적 역고정관념 활성화와 부정적 고정관념 활성화가 고정관념 불일치인물에 대한 호감을 상대적으로 증가시켰다. 반대로, 부정적 역고정관념 활성화와 긍정적 고정관념 활성화는 고정관념 일치인물(예: 남자다운 남자, 여자다운 여자)을 불일치인물보다 더 좋게 보는 종래의 관점을 유지 또는 강화시켰다. 피험자들은 고정관념 또는 역고정관념 활성화 조건에 따라 남녀 인물에 대해 현저히 다른 인상을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활성화 자극들의 내용에 대한 명시적인 기억 정도와 인상형성 평균치 간에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성적으로 의식하지 못하는 과정에 의해 인상형성과 같은 우리의 판단과정이 체계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끝으로, 강한 태도의 자동적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고정관념 연구들을 이론적으로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l)to show whether the implicit activation of counter-stereotypes may enhance relative favorableness of impressions for stereotype-inconsistent persons, and (2)to prove the existence of implicit cognition by showing that subjects were unaware of the process through which they were systematically influenced by the priming behaviors in forming impressions. After constructing priming and impression questionnaires based on pretests, the experimenter made the 112 subjects each believe that the two questionnaires were made for separate experiments. While subjects being unaware of the connected ness between the questionnaires, they were first primed by (l)positive or negative (2)stereotype or counterstereotype behavioral statements, and then asked to form the impressions of (3)one male and one female described as (4)either assertive or shy. Impressions were measured by (l)favorableness, (2)likability in daily lives, (3)perceived aggressiveness(a manipulation check), and (4)social distance. Results showed that positive counter-stereotype and negative stereotype activation increased the favorableness of impressions for stereotype-inconsistent persons, while negative counter-stereotype and positive stereotype priming maintained or strengthened the favorableness of stereotype-consistent persons. There was almost no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subjects' explicit memory for prime behaviors and impression scores. Thus, it was concluded that unconscious or implicit processes may systematically influence individuals' judgmental processes such as impression formation. Finally, it was suggested that stereotype research should be theoretically reformulated in terms of automatic acrivation of strong attitudes.
초록
본 연구에서는 대다수의 구성원이 낮은 시험 점수를 받은 집단에 시험 점수가 매우 높은 비전형적인 구성원이 포함되었을 때, 그를 포함한 집단 전체와 비전형적인 구성원 외의 다른 개인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는 가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비전형적인 구성원의 효과는 사회적 비교 유형에 따라 달라졌다. 집단내 비교 시에는, 시험 점수가 낮은, 다수를 집단대표정보로 지각하였다. 그 결과, 시험 점수가 높은 구성원이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에 대한 평가는 시험 점수가 높은 구성원이 포함되지 않았을 때와 동일하였다. 그러나 집단간 비교 시에는, 두 집단의 차이를 가장 잘 변별시켜 주는, 시험 점수가 높은, 비전형적인 구성원을 집단대표정보로 지각하였다. 그 결과, 시험 점수가 높은 구성원이 포함된 집단을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개인에 대한 평가 시에는, 집단내 비교 조건 과 집단간 비교 조건 모두에서 시험 점수가 높은 구성원과 다른 개인들 간에 대비효과가 나타났다. 즉, 시험 점수가 높은 구성원이 포함되지 않은 조건보다 포함된 조건에서 시험 점수가 동일한 개인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시험 점수가 매우 낮은 구성원들에 대한 평가는 시험 점수가 높은 구성원의 유무와 상관없이 동일했다. 즉 비전형적인 사례와 점수의 차이가 매우 컸던 개인들에게는 대비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논의에서는 본 연구가 고정관념의 변화와 행복감에 대한 연구들에 시사하는 바를 알아보았다.
Abstract
The present study examined subjects' evaluations of groups and individual members of that groups composed of a majority of persons with low test scores and atypical persons with high test scores. As a result, the effect of atypical persons on the impression ratings depended on the type of social comparison. First with regard to the ratings of groups, when subjects made within-group comparisons, they perceived the majority (low scorers) as the representative information of groups. As a result, ratings of the groups did not differ whether or not there was atypical high-scoring members. However, when subjects made between-group comparisons, the atypical high-scorers(who accentuated the difference in between-group comparisons) were perceived as the representative information of groups. That is, subjects rated the group with the high-scorers more positively than the group without them. With regard to the ratings of individual members, there were contrast effects between the high-scorers and the rests of the group members in both the within-comparison and between-comparison conditions. Ratings of the test scores of individuals were more negative when there were atypical high-scoring members in the group than there was none. However ratings of individuals with extremely low scores did not differ whether there were high-scoring members or not. That is, no contrast effects appeared in the ratings of individual members whose scores were extremely different from high-scoring members. Implications of the result to the study of stereotypes and subjective well-being were discussed.
초록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정된 일부 공간에서 어떠한 형태의 좌석선호를 보이는 지를 보기 위하여 강의실 160명, 도서관 240명, 지하철 140명, 버스 287명, 교내식당 140명, 교내매점 120명, 그리고 영화관에서 304명을 관찰하였다. 이들 공간에서 앉을 수 있는 전체 좌석 중 10%의 좌석이 찰 때까지를 선호되는 공간으로 보았을때 강의실에서는 문쪽으로부터 먼 곳에 그리고 뒷쪽에 위치한 좌석에, 도서관에서는 출입구로부터 먼 곳과 벽쪽에, 지하철에서는 문이 열리는 곳이나 그 반대쪽의 가운데 보다는 가장자리에 버스에서는 통로를 중심으로 창가에 그리고 뒤쪽보다는 앞쪽과 가운데에, 교내 식당과 매점에서는 배식구나 판매대로부터 가까운 곳에, 그리고 영화관에서는 출입구로부터 반대쪽과 스크린으로부터 뒷부분에 대한 선호가 뚜렷하였다. 이들 선호되는 개인공간이 갖는 함축적인 의미에 대하여도 논의하였다.
Abstract
Patterns in the use of personal space were observed in selected settings: the classroom, library, subway, bus, snacksar, cafeteria, and theater. Seats far from the door and the lectem were preferred in the classroom. In the library, seats far from the door and near from the walls were preferred. The outer rather than middle seats on the subway filled first, with no observable differences between the opposite and the same-side seats from the sliding doors. Passengers on the bus chose window seats in the front and middle over the aisle and the rear section. Students settled at table near the serving line in the cafeteria and closet to the counter in the snack bar, indicating perhaps of a choice of convenience, while their preference for inside seats away from the corridor possibly denote a desire for privacy. For theater goers, the seats of choice were opposite the entrance and in the upper-middle s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