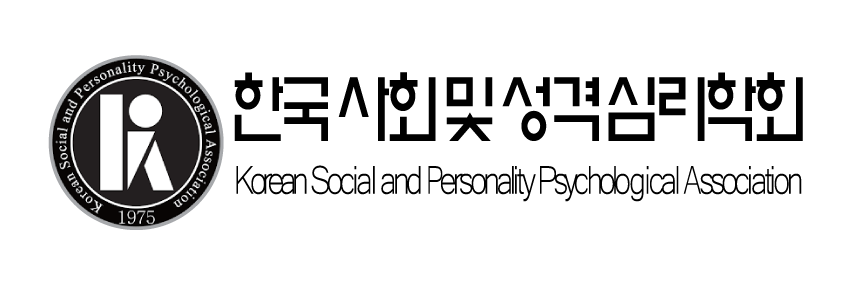ISSN : 1229-0653
ISSN : 1229-0653
권호 목록
- 2025 (39권)
- 2024 (38권)
- 2023 (37권)
- 2022 (36권)
- 2021 (35권)
- 2020 (34권)
- 2019 (33권)
- 2018 (32권)
- 2017 (31권)
- 2016 (30권)
- 2015 (29권)
- 2014 (28권)
- 2013 (27권)
- 2012 (26권)
- 2011 (25권)
- 2010 (24권)
- 2009 (23권)
- 2008 (22권)
- 2007 (21권)
- 2006 (20권)
- 2005 (19권)
- 2004 (18권)
- 2003 (17권)
- 2002 (16권)
- 2001 (15권)
- 2000 (14권)
- 1999 (13권)
- 1998 (12권)
- 1997 (11권)
- 1996 (10권)
- 1995 (9권)
- 1994 (8권)
- 1993 (7권)
- 1992 (6권)
- 1991 (6권)
- 1990 (5권)
- 1989 (4권)
- 1988 (4권)
- 1987 (3권)
- 1986 (3권)
- 1985 (2권)
- 1984 (2권)
- 1983 (1권)
- 1982 (1권)
28권 3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의 하위 이론인 Ryan과 Deci(2002)의 기본 심리적 욕구 이론(Basic Needs Theory)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30대 대졸 기혼 직장 여성들이 지각한 다중역할에 대한 회사의 지지, 남편의 지지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기본 심리적 욕구 충족이 매개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를 위해 30대 대졸 기혼 직장 여성 172명의 자료를 수집하고, 가설모형의 적합도와 변인들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회사의 지지와 남편의 지지가 기본 심리적 욕구 충족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모형은 자료를 양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삶의 만족도 변량의 약 57%를 설명하였다. 구체적인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회사의 지지와 남편의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여성들의 기본 심리적 욕구 충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사의 지지와 남편의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회사의 지지가 기본 심리적 욕구 충족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와 남편의 지지가 기본 심리적 욕구 충족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상담실제에 대한 시사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possible mediating effects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on the relation between perceived company and husband supports among highly educated married working women in their 30s. First, the measurement model yielded evidence of good fit. In addition, analyses of the structural model supported the indirect pathways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Company and husband supports was positively related with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Also, husband supports and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was positively relation with life satisfaction. Finally, company and husband supports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which in turn was related to life satisfaction. About 57% of variance in life satisfaction was explained by evaluative company and husband supports and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Implications for counseling practice and further research are discussed.
초록
본 연구는 수형자의 성인애착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소재 구치소에 수감된 130명의 수형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성인애착(ECR-R), 사회적 유대감(SCS), 우울(CES-D) 수준을 각각 측정하였다. 각 변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변인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모형에 따라 순차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성인애착 차원과 우울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회피애착 차원, 불안애착 차원과 우울 수준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사회적 유대감은 회피애착 차원, 불안애착 차원, 우울 수준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그리고 사회적 유대감은 회피애착 차원과 우울 수준 사이에서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며, 불안애착 차원과 우울 수준 사이에서는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수형자의 우울과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갖는 사회적 유대감을 높이는 것의 중요성과 성인애착 하위 차원에 따라 차별화된 개입의 필요성을 조명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형시설 차원에서 수형자 관련 제도개선 및 상담적 개입에 대한 함의와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기술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verified the role of social connectedness as a mediator to better understand the link between adult attachment dimension and depression among inmates. Adult attachment dimension, social connectedness, and depression of 130 inmates in a detention center in Seoul were measured. The researchers conducted correlational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recommended by Baron & Kenny(1986) to analyze the mediation effect. Avoidant adult attachment, anxious adult attachment, and depression were positively correlated while social connectedness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other three variables. Social connectedness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voidant adult attachment and depression. In contrast, social connectedness partially mediated the link between anxious adult attachment and depression. The main results emphasize social connectedness to deal with depression and call for differential intervention according to one’s attachment dimension. Implication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counseling practice regarding inmates are discussed as well as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148 words).
초록
공동체의식은 개인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로서, 오늘날 발생하는 개인적 또는 사회적 문제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특히 대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공동체는 자신이 속한 대학이므로, 대학생들의 대학 공동체의식이 개인 및 사회의 안녕과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의 한국사회를 위해서도 의미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 공동체의식이 개인의 안녕과 사회적 관심의 예측 변인의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고, 또한 대학 공동체의식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들도 알아보았다.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은 총 451명으로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었다. 개인의 안녕을 측정하는 척도는 주관적 행복감, 지각된 스트레스, 우울, 학업만족도 및 학교생활 만족도이었고, 사회적 관심을 측정하는 척도는 봉사활동 여부와 소외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었다. 대학 공동체의식을 예측하는 변인으로는 대학의 인지도와 대학의 서비스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대학 공동체의식은 개인의 안녕과 사회적 관심의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고, 대학 인지도와 서비스 만족도는 대학 공동체의식의 유의미한 설명변인의 역할을 하였다. 또한, 매개분석 결과 대학 인지도와 서비스 만족도는 대학 공동체의식을 매개로 개인의 안녕과 사회적 관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공동체의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본 연구의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Abstract
Sense of community(SOC) is the indicator that shows how person thinks of his/her community. The deficiency of SOC is tightly correlated with social problems in today Especially, SOC may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undergraduate student experience by individual’s wellbeing and social involvement. Current study examine the effect of sense of community on individual’s wellbeing (subjective happiness, perceived stress, depression, academic satisfaction, and school life satisfaction) and social involvement(volunteer’s experience and social distance toward minor groups). The total 541 respondents participated in this survey. The results showed that SOC predicted individual’s wellbeing as well as social involvements. Also, SOC was predicted by awareness of the university and satisfaction of service provided by the university. Further, SOC mediated between awareness of the university/satisfaction of service provided by the university and individual’s wellbeing/social involvement. The implication for this study were discussed.
초록
시행수는 P300 숨긴정보검사(P300 CIT)에 두 가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 가지는 시행수가 많아질수록 자극에 습관화되어 P300 진폭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P300 진폭이 감소하면 P300 CIT의 정확판단율은 감소할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시행수가 많아질수록 통계적 검증력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통계적 검증력이 증가하면, P300 CIT의 정확판단율은 증가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P300 CIT에서 시행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P300 진폭이 감소하는지, 또는 시행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P300 CIT의 정확판단율이 증가하는지 검증하였다. 24명의 실험참가자들이 모의범죄를 수행한 후에, P300 CIT를 사용한 거짓말 탐지 검사를 받았다. 실험참가자의 반은 사진 자극을 제시받았으며, 나머지 반은 문자자극을 제시받았다. 목표자극 1개와 관련자극 1개, 무관련자극 4개를 각각 30번씩 제시하는 것을 한 블록으로 하여, 총 네 블록에 걸쳐서 검사를 받았다. 실험결과, 예상과는 달리 목표자극에 대한 P300 진폭은 첫 번째 블록에서 가장 작은 값을 보였고, 네 번째 블록에서 가장 큰 값을 보였다. 관련자극에 대한 P300 진폭과 무관련자극에 대한 P300 진폭은 검사 후반부로 갈수록 약간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부트스트랩 크기차이분석 결과에서, 분석에 사용된 블록 수가 증가하여도 정확판단율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트스트랩 상관차이분석 결과에서, 첫 번째 블록만 사용한 경우의 정확판단율이 여러 개의 블록을 누적시켜 사용한 경우의 정확판단율보다 낮은 경향이 있었다. 사진자극과 문자자극 간에는 정확판단율에 큰 차이가 없었다. 시행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목표자극의 P300 진폭이 증가한 이유와 부트스트랩 상관차이분석 결과가 시행 수에 영향을 받았던 이유를 논의하였다.
Abstract
The number of trials can influence P300-based concealed information test (P300-based CIT) in two ways. First, as the number of trial increases, the P300 amplitude is likely to reduce due to habituation. If P300 amplitude decreases, accuracy rate of P300 CIT would be declined. Second, as the number of trial increases, the power of test increases and then the accuracy rate would also be increased. This study is to verify whether the accuracy rate of P300 CIT declines or improves as the number of trials increases. After twenty-four participants performed a mock crime, lie detection test was administered to them by using the P300 CIT. Half of the participants was exposed to photo stimuli, and the other half was presented with letter stimuli. A target stimulus, a probe stimulus, and four irrelevant stimuli were presented 30 times in one block, and four blocks were presented to each participant. Contrary to our expectation, P300 amplitude to the target stimulus was smallest in the first block and was largest in the fourth block. P300 amplitude to the relevant stimulus and to the irrelevant stimuli tended to decrease slightly at the second half of the experiment. In bootstrapped amplitude difference test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ccuracy rate as the number of blocks increase. In bootstrapped correlation difference tests, the accuracy rate tended to be lower when only the first block was used, compared to that when several blocks were include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photo stimuli and the letter stimuli in both bootstrapped tests. Reasons why P300 amplitude by a target stimulus was increased and the bootstrapped correlation difference tests were impacted by the number of trials were discussed.
초록
본 연구는 가해사건에 대한 비정의, 보복적 정의 및 회복적 정의 조건에 따라서 가해사건의 피해자가 느끼는 정의 회복의 정도인 불공평함의 지각, 부정적 정서, 반추 정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를 위해 대학생 55명이 참가하였으며 참가자들이 피해자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실험을 설계하여 가상적인 경제적 피해상황을 구성하였다. 정의 조건에 따른 불공평함의 지각, 부정적 정서, 반추 정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복적 정의 조건은 다른 정의 조건보다 부정적 정서와 반추를 더 적게 지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을 통해 각 정의 조건을 구분하여 보복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다 경험적으로 탐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injustice, negative emotion, and situational specific rumination between justice conditions of no justice, retributive justice and restorative justice. Participants(N=55) experienced a supposed economical injustice as victims in the experimental situation. This study concerned how victims respond differently according to justice conditions. Results indicat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y justice condition. Negative emotion and rumination were less responded in restorative condition than other justice conditions. The results showed that restorative justice had positive influence on victim in terms of recovering their negative responses through a communication between victim and offender. The results also suggested that communication including offender’s apology played a essential role in victim’s restoration in the restorative justice context. Future directions concerning the meaning and possible implication of restorative justice are discussed. In addition,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are followed.
초록
두 편의 연구를 통해서 집단에서 구성원들 간의 공감 구조(공감균형/공감불균형/비공감균형)에 따른 집단과제 몰입, 집단 실체성 지각 및 응집성을 알아보았다. 연구 1에서는 시나리오를 통해 세 명의 집단 구성원들 간에 공감균형, 공감불균형, 비공감균형이 존재하는 상황을 제시하여 집단 내 공감 구조를 조작했다. 연구 결과, 집단 실체성 지각과 응집성은 공감균형 조건에서 가장 높고 공감불균형 조건과 비공감균형 조건 순으로 낮았다. 구성원들의 집단과제 몰입 수준에서는 연구 가설과 일관된 결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연구 2에서는 대학생들로 구성된 현장집단을 대상으로 다양한 집단 상호공감 구조를 확인했으며, 집단 실체성 지각과 응집성 경험에서 연구 1의 결과가 반복검증 되었다. 또한 집단과제 몰입은 비공감균형 조건이 가장 높고 공감불균형과 공감균형 조건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집단의 핵심 기능에 대해 집단 상호공감 구조가 미치는 영향과 공감의 사회적 역동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장래 연구 방향을 논의했다.
Abstract
The present research investigated how empathy structures in task groups affect group members' task-focus, perceived entitativity and cohesion. Empathy structures in task groups were defined at the dyadic level, and three forms of empathy structures were investigated: empathy-balanced, empathy-imbalanced, non-empathy-balanced. It was hypothesized that in the two balanced structures, groups would experience higher levels of task-focus than in the imbalanced structure. In addition, empathy-balanced groups were expected to perceive higher levels of group entitativity and experience higher cohesion than other groups. In Study 1, we used a scenario method and manipulated three types of empathy structure. Results showed that the perceived entitativity was high in the empathy-balance condition, empathy-imbalance condition, and non-empathy-balance condition, in order. We found the same pattern of result on cohesion. We conducted Study 2 using bona-fide groups consists of Korean college students and replicated the findings of Study 2. In addition, groups with a structure of non-empathy-balance reported higher levels of task-focus than did groups with other types of empathy structures.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초록
최근의 인터넷과 SNS와 같은 온라인 공간의 발전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많은 시간을 온라인 공간에서 보내고 있으며, 온라인 대인관계의 영역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대인관계의 친밀감의 형성을 오프라인과 비교하여 파악하기 위해 Reis와 Shaver의 친밀감의 대인관계모형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 경기지역의 청소년 65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에는 SNS 이용빈도, 온, 오프라인 자기개방, 반응성, 친밀감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포함하였다. 온라인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에 대해서 각각 자기개방과 반응성, 친밀감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온라인 공간에서는 자기개방이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반응성이 조절변수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오프라인에서는 자기개방이 반응성을 매개로 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온라인 공간에서는 오프라인과 다르게 자기개방이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을 반응성이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을 밝혀내어, 온라인 관계에 대한 상반된 두 가지 가설인 감소가설과 촉진가설의 통합적 이해에 기여하였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소통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Abstract
Many new and important developmental issues are encountered during adolescence, which is also a time when Internet use becomes increasingly popular. Studies have shown that adolescents are using these online spaces to address developmental issues, especially needs for intimacy and connection to others. Reis and P. Shaver's (1988) interpersonal process model of intimacy suggested both online and offline spaces. Six hundred and fifty-six high school students completed an questionnaire about the activities on social networking sites, online/offline self disclosure, responsiveness and intimacy. The result indicat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 disclosure and intimacy was moderated by responsiveness in online space. On the other hand, responsiveness mediated the relation between the self disclosure and intimacy on offline space. Finally,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nd directions for future study were discussed.
초록
본 연구는 평균 이상 효과(자신을 평균보다 더 낫다고 간주하는 경향)에서 문화적 차이의 발생 조건을 탐구하고, 그 기제를 확인해 보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동아시아 문화권을 대표하여 한국인을, 그리고 서양 문화권을 대표하여 한국 거주 서구인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연구 1에서 연구자는 평균 이상 효과의 크기에서 한국인과 서구인 사이에 문화적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전반적으로 한국인들이 서구인들에 비하여 더 낮은 수준의 평균 이상 효과를 보였으나, 긍정적 특성에서는 한국인들도 서구인들처럼 상당한 크기의 평균 이상 효과를 보였다. 부정적 특성에서는 2010년 자료에서 한국인들이 평균 이상 효과를 보이지 않았던 반면에, 2014년 자료에서 약간의 평균 이상 효과를 보였다. 이것은 4년이 지나면서 한국인들이 더욱 서구화되고 있다는 지표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부정적 특성에서 한국인들이 평균 이상 효과를 보이지 않거나 적게 보이는 근거의 하나로 겸손 규범을 고려해 보았다. 연구 2에서 직접적으로 겸손 동기를 부각시키면 평균 이상 효과가 낮아지는지를 실험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자신보다 상대방을 더 높이는 겸손 동기를 조작하면, 특히 부정적 특성에서 평균 이상 효과가 사라진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것은 서구인들도 마찬가지였다. 이 발견사실은 한국과 같은 동양문화권에서는 자신의 단점을 찾아서 개선함으로써 자신을 향상시키려는 동기가 작용했기 때문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 결과의 의의 및 제한점이 논의되었다.
Abstract
The present study examined when cultural differences in the better-than-average effect (the tendency to view oneself as better than average) would vary with trait desirability and why the differences would occurred. The researcher used Koreans and Westerners in Korea as representatives of East Asian and Western cultures, respectively. In Study 1, the author found that the magnitude of cultural difference in the better-than-average effect varied between Westerners and Koreans. While Korean participants failed to exhibit the better-than- average effect for any negative trait in 2010 year data, they showed the effect for negative traits in 2014 year data. In contrast, Westerners tended to display the better-than-average effect more than Koreans, and cultural difference was greater for negative traits than for positive traits. In Study 2 to pin down the underlying mechanism that gives rise to cultural differences, it was found that the other-enhancing orientation of the modesty norm influenced the cross-cultural difference. Westerners as well as Koreans did not show the better-than-average effect under the enhancement of the modesty norm. The findings indicate that Koreans of East Asian culture motivate to correct their own defects and improve themselves. Implications of the results and suggestions of the future studies were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