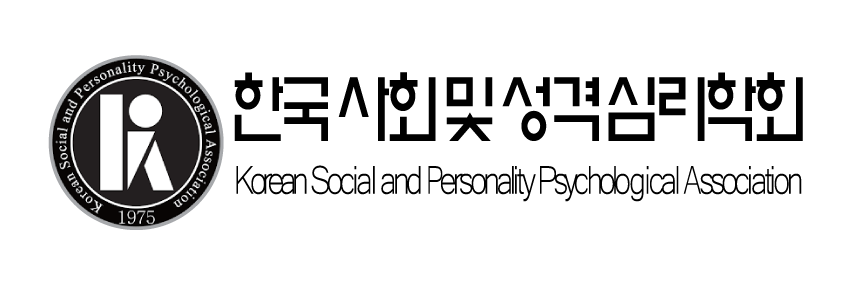ISSN : 1229-0653
ISSN : 1229-0653
권호 목록
- 2025 (39권)
- 2024 (38권)
- 2023 (37권)
- 2022 (36권)
- 2021 (35권)
- 2020 (34권)
- 2019 (33권)
- 2018 (32권)
- 2017 (31권)
- 2016 (30권)
- 2015 (29권)
- 2014 (28권)
- 2013 (27권)
- 2012 (26권)
- 2011 (25권)
- 2010 (24권)
- 2009 (23권)
- 2008 (22권)
- 2007 (21권)
- 2006 (20권)
- 2005 (19권)
- 2004 (18권)
- 2003 (17권)
- 2002 (16권)
- 2001 (15권)
- 2000 (14권)
- 1999 (13권)
- 1998 (12권)
- 1997 (11권)
- 1996 (10권)
- 1995 (9권)
- 1994 (8권)
- 1993 (7권)
- 1992 (6권)
- 1991 (6권)
- 1990 (5권)
- 1989 (4권)
- 1988 (4권)
- 1987 (3권)
- 1986 (3권)
- 1985 (2권)
- 1984 (2권)
- 1983 (1권)
- 1982 (1권)
31권 2호
초록
본 연구는 낭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외도 의도를 예측하는 성격적 특성과 상황적 특성을 확인하고, 둘 사이의 상호작용을 살펴보았다. 연구 1에서는 외도 의도에 대해 나르시시즘과 성별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기혼 남녀 116명을 대상으로 나르시시즘을 측정하고, 결혼 생활 중 우연하게 발생한 외도 기회를 묘사한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외도 의도를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더 높은 외도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나르시시즘이 높을수록 더 많은 외도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두 변인 간의 상호작용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즉, 나르시시즘은 성별의 효과와는 독립적으로 외도 의도에 영향을 미쳤다. 연구 2에서는 외도 의도에 대한 상황적 특성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외도 의도에 대해 나르시시즘과 상황적 특성 간의 상호작용적 측면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낭만적 관계 중에 있지 않은 남자 대학생 143명을 대상으로 나르시시즘을 측정한 뒤, 투자 모델 내 요인(투자 정도, 대안의 질)에 의거하여 조작된 시나리오를 통해 외도 의도를 측정하였다. 먼저 외도 의도는 조작된 상황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투자 정도가 낮거나 대안의 질의 수준이 높은 경우에 외도 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나르시시즘은 현재 낭만적 관계에 대한 투자 정도와 대안으로 다가온 외도 대상의 가치가 모두 높거나 모두 낮은 경우에만 외도 의도와 정적 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는 나르시시즘이라는 성격적 특성과 투자 정도와 대안의 질의 높고 낮음이라는 상황적 특성이 외도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각각 확인하였으며, 나아가 성격적 특성과 상황적 특성이 상호작용하여 외도 의도를 예측함을 밝혔다. 이를 통해 인간의 행동에 대한 설명과 예측이라는 심리학의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인 성격적 특성과 상황적 특성의 영향력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제언하였다.
Abstract
We investigated the interactive effect of person and situation on infidelity intention in romantic relationship. In study 1, married individuals (N = 116) completed an online survey including a measure of narcissism and were asked to respond to infidelity intention questions after imagining themselves as a protagonist in a hypothetical vignette. The protagonist in the vignette has made a big investment into marriage and encounters an attractive opposite-sex person who showed romantic interests in him/her. Results showed that narcissism was positively related to infidelity intentions, and that men had higher infidelity intentions than women. However, the interaction between sex and narcissism was not significant, indicating that narcissism’s effect on infidelity intention was independent of participant sex. In Study 2, w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both person and situation on infidelity intention, as well as the interaction between them. Male students (N = 143) who were not involved in a romantic relationship completed a measure of narcissism and responded to infidelity intention questions after reading a similar vignette to study 1. We manipulated the investment size of the protagonist (high vs. low) and quality of the alternative partner (high vs. low) in the vignettes. Participants showed higher infidelity intentions when the investment size was low or when the quality of the alternative was high. Narcissistic individuals showed high infidelity intentions when both investment size and quality of the alternative were high or both of them were low. These results suggest that it is important to take both person and situation into account when understanding social behavior.
초록
사람들은 타인의 행복이 자신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을 제대로 인지하는가? 본 연구는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는 대학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룸메이트의 행복이 자신의 기숙사 만족도에 얼마나 중요할 것인지 예측하도록 한 뒤, 이를 현재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재학생들의 자료와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신입생들은 대체로 룸메이트의 행복보다 다른 요인들(예, 기숙사의 생활시설 상태, 룸메이트와의 생활 습관의 일치성)이 만족스러운 기숙사 생활에 더 중요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연구 1). 게다가 이러한 경향성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재학생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연구 2). 하지만 학생들의 ‘생각’과 달리 실제 이들의 기숙사 만족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룸메이트의 행복뿐인 것으로 나타났다(연구 3). 이상의 결과는 사람들이 가까운 타인의 행복이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행복의 사회적 기능과 가치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Abstract
Do people fully recognize the impact of other people’s happiness on their own? We asked college freshmen, newly assigned to dormitories, to predict how much impact their roommates’ happiness would have on their satisfaction with dormitory life. Their predictions were compared with the reports of students who have actually lived in the same dormitories. Freshmen students expected that roommates’ happiness, compared to other factors (e.g, dormitory facilities and roommates’ habits), would play a less central role in their dormitory satisfaction (Study 1). Similar tendency was observed even among students currently residing in dormitories (Study 2). Contrary to their intuitions, however, roommates’ level of happiness was most predictive of their satisfaction with dormitory life (Study 3). These results illustrate people’s tendency to underestimate the importance of other people’s happiness on their own. Discussions on the possible societal consequences of happiness are offered.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공감, 공정성, 도움행동의도 및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사이버 괴롭힘 상황에서 주변인의 도움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으로써 주변인의 도움행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참가자는 94명의 여대생으로 토론을 위한 온라인 채팅(사이버 괴롭힘 실험)을 실시한 후 일련의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완료하였다. 사이버 괴롭힘 상황에서 참가자들의 언어적 반응은 10개의 범주로 분류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일반적인 어려움 상황에서는 정서적 공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도움행동의도를 유의하게 설명하였고, 괴롭힘 상황에서는 인지적 공감이 도움행동의도를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둘째,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인지적 공감이 사이버 괴롭힘 상황에서 실제 도움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감과 공정성은 도움행동의도를 매개로 하여 도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도움행동의도가 도움행동으로 이어지는데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이버 괴롭힘 상황에서 인지적 공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실제 도움행동과 사이버 괴롭힘의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이 논의되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empathy, fairness, intention in helping behavior and social self-efficacy affect bystanders' helping behavior in a cyber bullying situation. The participants were 94 female college students. After an online chatting for discussion(cyber bullying experiment), each participant completed some self-report questionnaires. Participants’ responses in a cyber bullying situation were classified into one of 10 categories.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emotional empathy and social self-efficacy significantly influenced on bystanders' intention to help someone who experience an everyday difficulty, and cognitive empathy significantly explained bystanders' intention to help bullying victim. Second, social self-efficacy and cognitive empathy showed significant effects on actual helping behavior of participants as bystanders in cyberbullying situation. Third, empathy and fairness had mediation effects between intention in helping behavior and actual helping behavior of bystanders, respectively. Fourth, social self-efficacy didn't moderate intention in helping behavior on actual helping behavior of bystanders. These results suggest that activation of cognitive empathy and improving social self-efficacy can contribute to actual helping behavior and the prevention of cyberbullying. Finally,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long with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초록
본 연구에서는 도시 점화가 공정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협력적인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1에서는 도시 또는 시골에 대해 떠올리도록 한 후, 공정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참여자들은 시골이 점화되었을 때보다 도시가 점화되었을 때 세상을 보다 공정한 곳으로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2에서는 도시 또는 시골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점화한 후, 죄수의 딜레마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시골 관련 개념보다 도시 관련 개념이 활성화되었을 때 보다 협력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협력적인 의사결정에 시사하는 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Abstract
Two studies examined the possibility that information relevant to the concepts of city and rural areas can influence belief in just world(BJW) and cooperative behavior. In study 1, participants were asked to imagine city(vs. rural) areas. In an ostensibly unrelated second task, participants responded to BJW scale. The results showed that participants perceived the world as a more fair place when the concepts of city(vs. rural) area were primed. In study 2, we used a scrambled sentence task(SST) for implicitly priming the concepts of city or rural areas. After completion of the priming procedure, participants were invited to a second, ostensibly separate experiment in which they were asked to make a decision in a prisoner’s dilemma game. The results showed that participants primed with the city concepts made more cooperative decisions than those who were primed with rural area concepts. The implications of present study for cooperative decision-making are discussed.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진입기 북한이탈 청년의 문화적응 유형을 분류하고 그에 따른 심리사회적 특성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다차원 문화적응 모델을 기반으로 원문화 및 주류문화에 대한 문화지향성을 문화적 행동과 가치라는 두 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문화적응 하위유형을 분류하였다. 이를 위해 20대 북한이탈 청년 94명(남: 38명, 여: 56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군집분석과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북한이탈 청년의 문화적응은 세 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남한문화 행동이 적은) 부분 통합’, ‘(북한문화 행동․가치가 보통인) 부분 분리’, ‘(남한문화 행동이 우세한) 동화.’ 한편, ‘(남한문화 행동이 우세한) 동화’는 가장 낮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문화충격/이질감, 차별, 주변화)를 보고한 반면, ‘(남한문화 행동이 적은) 부분 통합’은 가장 높은 일상적 차별감(불공정 대우, 개인적 거절감)을 보고하였다. 또한 ‘(남한문화 행동이 우세한) 동화’는 ‘(북한문화 행동․가치가 보통인) 부분 분리’ 보다 남한 공동체 지지 수준이 높았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이탈 청년의 남한사회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먼저 남한사회의 차별적 분위기를 감소시키고 두문화주의가 가능한 사회문화 맥락을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논의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classify the acculturation strategies based on the multidimensional acculturation model and to examine the differences of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among North Korean refugee youth. For this reason, after we respectively divided heritage/receiving cultural orientations into two domains(cultural behaviors and values). Participants were 94 North Korean refugee youths aged 18 to 28 (male: 38, female: 56). Self-report data was analyzed using the cluster analysis and analysis of variance. The acculturation strategies were categorized 3 types as follows: ‘the partial integration (with small cultural behaviors of South Korea)’, ‘the partial separation (with average cultural behaviors․values of North Korea)’, ‘the assimilation (with superior cultural behaviors of South Korea).’ The assimilation was the lowest on acculturation stress, while the partial integration was the highest on everyday discrimination. The support from South Korean also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assimilation than in the partial separation. Based on results, we discuss the importance of creating sociocultural context of biculturalism to improve their adaptation.
초록
집단 실체성이란 집단이 단순한 개개인의 모임이 아닌 한 덩어리의 개체처럼 지각되는 특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전의 집단 실체성 연구들에서 사용한 실체성의 측정 문항들을 바탕으로 집단 실체성 척도를 만들고 그 하위 요인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참가자들은 다양한 범주의 집단(친밀한 집단, 업무 집단, 사회적 범주, 느슨한 관계)에 대하여 지각되는 특성들을 예비 척도에 답하였다. 분석 결과, 집단 실체성은 ‘주체성’과 ‘본질성’으로 구성되고 주체성은 다시 ‘공동의 목표’와 ‘공통 운명’, 본질성은 ‘친밀성’과 ‘비침습성’, ‘집단성’의 하위 요인을 갖는 두 수준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집단 간에 실체성의 두 상위 요인 점수를 비교한 결과 친밀한 집단과 업무 집단은 주체성, 본질성 점수가 다른 집단들의 점수에 비해 높았다. 업무 집단은 사회적 범주에 비해 주체성 점수는 높았지만 본질성 점수에서는 두 집단이 다르지 않았다. 느슨한 관계는 주체성, 본질성 점수 모두에서 다른 집단들에 비해 낮았다. 본 연구는 집단 실체성의 요인 구조를 밝힘으로써 집단 실체성의 이론적인 개념을 구체화하고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Abstract
Group entitativity is a group trait to be perceived as a whole, singular entity, and not as a crowd of individuals. In this study, a Group Entitativity Scale was developed based on items from previous studies and its subfactors were examined. Participants reported perceived characteristics of four different group types (an intimacy group, a task group, a social category, a loose association) on a preliminary Group Entitativity Scale. The results show that a two-level model of group entitativity has a good fit. In the model, group entitativity consists of two distinct factors: Agency and Essence. Agency factor comprises common goal and common fate; Essence factor is composed of closeness, impermeability, and groupness. Meanwhile, when the four types of groups were compared on the two factors, Agency and Essence factor scores of the intimacy group and the task group were higher than the scores of the other two groups. Agency score of the task group was higher than that of the social category; however,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n Essenc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oth Agency and Essence scores of the loose association were lower than those of the other groups. This study reveals the factor structure of group entitativity, and thereby further reifies the concept and provides a method to measure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