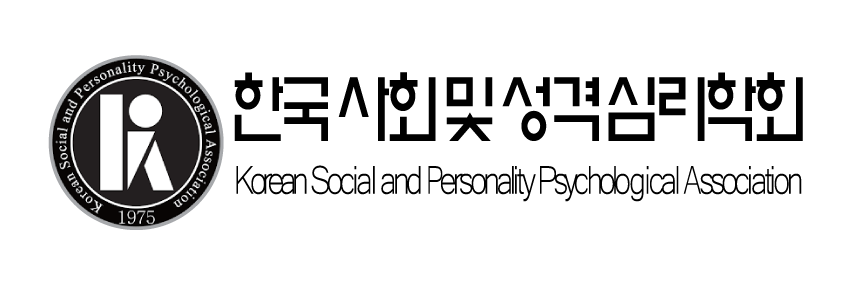ISSN : 1229-0653
ISSN : 1229-0653
권호 목록
- 2025 (39권)
- 2024 (38권)
- 2023 (37권)
- 2022 (36권)
- 2021 (35권)
- 2020 (34권)
- 2019 (33권)
- 2018 (32권)
- 2017 (31권)
- 2016 (30권)
- 2015 (29권)
- 2014 (28권)
- 2013 (27권)
- 2012 (26권)
- 2011 (25권)
- 2010 (24권)
- 2009 (23권)
- 2008 (22권)
- 2007 (21권)
- 2006 (20권)
- 2005 (19권)
- 2004 (18권)
- 2003 (17권)
- 2002 (16권)
- 2001 (15권)
- 2000 (14권)
- 1999 (13권)
- 1998 (12권)
- 1997 (11권)
- 1996 (10권)
- 1995 (9권)
- 1994 (8권)
- 1993 (7권)
- 1992 (6권)
- 1991 (6권)
- 1990 (5권)
- 1989 (4권)
- 1988 (4권)
- 1987 (3권)
- 1986 (3권)
- 1985 (2권)
- 1984 (2권)
- 1983 (1권)
- 1982 (1권)
37권 1호
초록
대통령 선거는 국가의 경제, 문화, 복지 등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개인의 행복 경험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회정치적 사건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직 국내에서 경험적으로 탐구되지 않은 선거와 행복의 관계를 탐구하기 위해 대규모 행복 횡단 자료(연구 1; N = 22,939)와 네 시점에 걸쳐 행복을 반복 측정한 종단 자료(연구 2; N = 833)를 사용하여 20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른 행복의 변화를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통령 선거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지지하는 후보자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선거 결과를 긍정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연구 1: 윤석열 득표율이 높은 지역 거주자, 연구 2: 윤석열 지지자)의 주관적 안녕감은 선거 전후로 차이가 없었던 반면, 선거 결과를 부정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연구 1: 이재명 득표율이 높은 지역 거주자, 연구 2:이재명 지지자)의 주관적 안녕감은 선거 직후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이는 한 달 가까이 지속되는 양상을 보였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거와 행복의 관계를 탐색했다는 의의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 결과는 선거를 긍정적으로 경험하는 것보다 부정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A presidential election is a sociopolitical event that not only influences the entire society, including the economy, culture, and politics, but also the happiness of individuals in the society. In this study, we aimed to empirically explore the association of a presidential election with happiness. To do so, we analyzed Subjective Well-Being (SWB) trajectories around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held on 9th March 2022 by materializing large-scale cross-sectional data (Study 1; N = 22,939) and a repeated measure longitudinal data across four time points (Study 2; N = 833).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impact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on SWB differed according to which presidential candidate one supported. The changes in SWB follow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were not significant for those who experienced the election results positively (i.e., regions with a higher number of Yoon supporters & Yoon supporter). However, those who experienced the election results negatively (i.e., regions with a higher number of Lee supporters & Lee supporter) showed a significant dip in their SWB compared to before the election, and this decrease in SWB was maintained over a month. This study has implications in that it is the first study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elections and happiness in South Korea. Interpretations and discussions of the results are further discussed in the General Discussion section.
초록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운전자의 위반 행동에 대한 지각과 처벌판단의 차이를 살펴보고 기대-불일치가 이러한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80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교통 장면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고 vs. 저)와 성별(남 vs. 여)을 조작하여 2 ✕ 2 참가자 간 설계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참가자는 네 개 조건 중 하나에 무선으로 할당되었으며 각 조건에 해당하는 자극 사진과 설명을 제시받고 조작 점검 문항, 인상 평가 문항, 기대-불일치 문항, 위반 행동에 대한 잘못함 지각 및 처벌판단 문항 등에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반 행동을 범칙금형(주차 위반, 신호 위반, 속도 위반)과 벌금형(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사고 후 도주)으로 구분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범칙금형 위반 행동에 대한 잘못함 지각 및 처벌판단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칙금형 위반 행동에 대해 참가자들은 차량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vs. 낮은) 운전자를 더욱 잘못한 것으로 지각하고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벌금형 위반 행동의 경우는 차량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와 위반 행동에 대한 잘못함 지각 및 처벌판단의 관계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지각된 운전자에 대한 기대-불일치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vs. 낮은)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 기대-불일치의 정도가 더 큰(vs. 작은) 것으로 나타났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불일치가 위반 행동에 대해 더(vs. 덜) 잘못한 것으로 지각하고 더(vs. 덜) 엄격한 처벌을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교통 장면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교통 법규 위반 행동에 대한 사회적 판단 및 처벌에 편향을 일으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socioeconomic status (SES) on perception and punishment for targets’ violation of traffic laws, and to examine the mediation effects of expectancy disconfirmation. For this purpose, a 2 ✕ 2 between subject experiment was conducted for 280 participants by manipulating SES (high vs. low) and gender (male vs. female) in the traffic scene. Participants were randomly assigned one of four conditions, and presented with stimulus pictures and explanation corresponding each condition, and then answered a survey including manipulation check, impression evaluation, expectancy disconfirmation, wrongness perception and punishment for violation of traffic laws. In this study, offenses were divided into fine type (parking violation, signal violation, and speed violation) and penalty type (drunken driving, driving without a license, hit-and-run). We foun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wrongness perception of the violation of the fine and the judgment of punishment according to target’s SES. In the violations of fine type, people with higher socioeconomic status were perceived as more wrong and punished more severely for the same violation. For the case of penalty type, there was no difference depending on target’s SES. The relationships between SES and perception/punishment were mediated by the expectations-disconfirmation. Specifically, it was found that the degree of expectation-disconfirmation was greater (vs. small) for drivers with higher (vs. lower) SES, and ultimately, these inconsistencies made perception/ judgments for violations more wrong/harsh.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meaningful in that socioeconomic status in the traffic scene can bias social judgment and punishment for traffic violation behavior.
초록
사회적 지위란 조직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부여하는 사회적 가치에서의 위상으로 정의되며, 사람들은 이러한 사회적 지위를 추구하려는 기본적 욕구를 지니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사람들이 사회적 지위를 추구할 때, 경제적 여건 같은 외적 조건과 품위 같은 내적 조건 중에서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사회 계층 간 차이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소득이나 경제적 여건 같은 사회적 지위의 외적 조건은 상대적으로 하위 계층의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반면, 품위와 교양 같은 사회적 지위의 내적 조건은 상위 계층의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연구 1(N = 204)에서 외적 조건의 중요성은 사회 계층과 부적 관계를 보였으나 내적 조건에 대한 상대적 선호는 사회 계층이 올라갈수록 증가하였다. 연구 2(N = 160)에서 하위 계층의 참여자들은 내적 조건이 점화되었을 때보다 외적 조건이 점화되었을 때 본인의 사회적 지위를 더 높게 평가하였다. 또한 이런 결과들은 사회 계층에 관한 객관적 지표보다는 주관적 지표를 분석에 사용했을 때 더욱 명확히 관찰되었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결과는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이 사회 계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Abstract
An emerging literature suggests that people have basic needs for social status which is defined as one’s comparative social ranking in terms of social esteem an respect. Building on the literature, the present research examined social class differences in the relative importance of internal vs. external attributes of social status. The results from two studies showed that external attributes such as income and economic conditions are relatively more important for lower-class individuals, whereas internal attributes such as attitudes and elegance are relatively more important for higher-class individuals. Specifically, in Study 1, social class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perceived importance of external attributes in determining social status and yet, positively associated with relative importance of internal attributes over external attributes. In Study 2, lower-class participants reported that their social status was higher when they believed that external criteria of social status were met than when they believed that internal criteria of social status were met. In both studies, subjective social class showed stronger effects than objective social class. Taken together, these findings demonstrate that one’s perception of social status systematically varies as a function of social class.
초록
“그때 만약 ...했다면, ...했을텐데.”와 같이 과거 행동 및 사건에 대한 대안을 상상하는 대안현실사고(counterfactual thinking)는 인간의 고등 정신활동으로, 사람들이 일상에서 흔히 경험하는 심리적 시간 여행이다. 지난 40여 년간 대안현실사고 현상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인간의 인지-정서-행동 간 연결에 대한 이해를 높여 왔다. 본 논문에서는 정서, 동기, 판단, 의사결정, 자기개념, 그리고 인간관계 등 사람들의 다양한 심리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대안현실사고의 기능적 측면을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대안현실사고의 내용과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그리고 대안현실사고의 결과적 측면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봄으로써 대안현실사고의 다양한 기능을 살펴보았다. 또한, 기존 연구들에서 드러난 제한점을 분석하고 향후 대안현실사고 연구의 방향과 연구 결과의 응용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Abstract
Counterfactual thinking (i.e., thoughts of what might have been) is a mental time travel to past and its alternatives. The phenomenon of counterfactual thinking has been actively studied over the decades in the field of Social Psychology, yielding important insights into how human cognition, affect, and behavior are interconnected. From a functional perspective, the present study reviews literature on how counterfactuals are related to diverse experiences such as affect, motivation, judgment, decision making, self-concept,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Furthermore, the present study proposes new direction for future research in counterfactual thinking. Implications for application of counterfactuals and interdisciplinary research are discussed.
초록
한민족 정체성과 국가 정체성의 상호작용이 남북 관계에서 경험되는 집합적 죄책감을 매개로 통합지향 행동의도를 예측하는 모형을 검증하였다. 인구비례할당표집을 통해 대한민국 거주 일반인 1,3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설과 일관되게 응답자들의 한민족 정체성이 높고 국가 정체성이 낮을수록 남북 관계에서 집합적 죄책감을 강하게 느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회 정체성의 상호작용은 집합적 죄책감을 매개로 북한에 대한 이해의도와 핵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적 희생의도를 각각 예측했다. 남북통일 및 통합에 관한 심리학 연구와 관련하여 본 연구가 지니는 시사점 및 장래연구 과제를 논의하였다.
Abstract
The present study tested a moderated mediation model that stipulates an interaction of ethnic identity and national identity in predicting South Koreans’ feelings of collective guilt about the current situations involving the two Koreas, which in turn predicting their intentions to engage in reconciliaroty behaviors. A total of 1,300 South Korean adults participated in a survey via a stratified sampling method. Results indicated, as expected, that the stronger the ethnic identity, the more likely the participants reported collective guilt, and this relationship was stronger for individuals who are low in national identity compared to those who have strong national identity. We also found support for the predicted moderated mediation effect in predicting the participants’ intention to learn about the positions and perspectives of the outgroup (i.e., North Korea) on the current North-South situations and their willingness to sacrifice the current economic advantages of South Korea as a means to resolve the nuclear crisis on the peninsula.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for research on issues related to the two Korea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