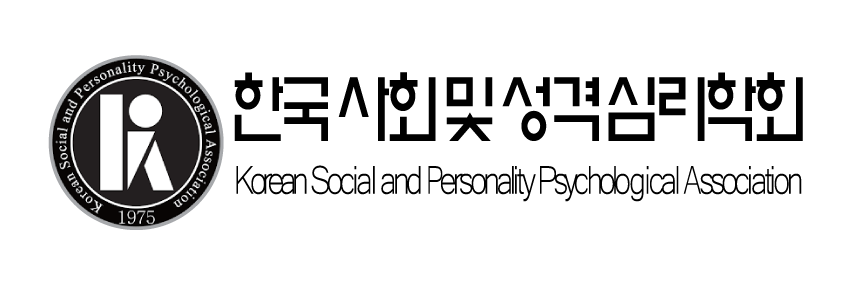ISSN : 1229-0653
ISSN : 1229-0653
권호 목록
- 2025 (39권)
- 2024 (38권)
- 2023 (37권)
- 2022 (36권)
- 2021 (35권)
- 2020 (34권)
- 2019 (33권)
- 2018 (32권)
- 2017 (31권)
- 2016 (30권)
- 2015 (29권)
- 2014 (28권)
- 2013 (27권)
- 2012 (26권)
- 2011 (25권)
- 2010 (24권)
- 2009 (23권)
- 2008 (22권)
- 2007 (21권)
- 2006 (20권)
- 2005 (19권)
- 2004 (18권)
- 2003 (17권)
- 2002 (16권)
- 2001 (15권)
- 2000 (14권)
- 1999 (13권)
- 1998 (12권)
- 1997 (11권)
- 1996 (10권)
- 1995 (9권)
- 1994 (8권)
- 1993 (7권)
- 1992 (6권)
- 1991 (6권)
- 1990 (5권)
- 1989 (4권)
- 1988 (4권)
- 1987 (3권)
- 1986 (3권)
- 1985 (2권)
- 1984 (2권)
- 1983 (1권)
- 1982 (1권)
30권 3호
초록
본 연구에서는 DSM-5 Section Ⅲ 성격장애의 핵심 준거인 ‘병리적 성격 특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DSM-5 성격검사(The Personality Inventory for DSM-5; PID-5)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 검사는 부정적 정서성, 애착상실, 적대성, 탈억제, 정신병적 경향성이라는 5개의 ‘영역(domains)’으로, 각 영역은 다시 25개의 세부적인 ‘양상(facets)’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20개(한국판은 219문항)의 문항으로 되어있다. 만 18세 이상의 성인 607명에게 한국어판 PID-5와 함께 성격장애 진단검사, 정신병리 5 요인 척도(PSY-5)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로 기술통계 분석, 신뢰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첫째, 한국판 PID-5의 내적 일관성과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적절한 수준이었다. 둘째, 요인구조를 살펴본 결과 부정적 정서성 영역(domain), 애착상실 영역, 정신병적 경향성 영역의 양상(facets)은 원판의 요인구조와 동일했다. 그러나 적대성 영역과 탈억제 영역의 양상은 원판의 요인구조와 다르게 나타났다. 셋째, 한국판 PID-5 양상은 각 성격장애의 핵심 성격 특질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넷째, 한국판 PID-5 양상은 PSY-5의 관련 척도와 대체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는 외국의 여러 선행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기는 했으나 PID-5가 국내에서도 다양한 성격장애의 중요한 특징들을 대체로 잘 측정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DSM-5 Section Ⅲ 성격장애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서 가능성을 보여준다.
Abstract
This research tested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Personality Inventory for DSM-5 (PID-5) - which is based on ‘Pathological personality traits’, the core criterion of DSM-5 Section Ⅲ personality disorder - after translating it into Korean language. The test comprises of 5 domains - negative affect, attachment, antagonism, disinhibition, psychoticism - and each domain comprises of 25 detailed facets, and there are total 220 questions (219 in the Korean version).To 607 adults over the age of 18, along with the Korean version of PID-5, the Korean Personality Disorders Test and PSY-5 were conducted. Descriptive statistic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were conducted with collected data. As the result of analyses, first, the Korean PID-5 showed appropriate levels of internal consistency and test-retest reliability. Secondly, reviewing the factor structure, the facets of negative affect domains, attachment domains and psychoticism domains were identical to the factor structure of the original. However, the facets of antagonism domains and disinhibition domains were difference to the factor structure of the original. Thirdly, the Korean version’s PID-5 facet showed positive correlation to each personality disorder’s core personality traits. Fourth, the Korean version’s PID-5 facet showed relatively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PSY-5’s related scales. The results above show that, although there are partial differences to the results of preceding overseas research, the PID-5 is measuring the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various personality disorders in this country relatively well, and shows the possibility of becoming a tool for evaluating DSM-5 Section Ⅲ personality disorders.
초록
실패나 역경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목표를 추구하게 만드는 투지의 특성은 무엇일까? 본 연구는 투지에 따라 부정적 피드백에 대한 정서 반응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투지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투지 수준에 따라 부정적 피드백을 받았을 때의 정서반응이 달라질 것이고, 특히 시간이 흐른 후 투지에 따른 반응의 차이가 커질 것이라 예상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피드백 제공 직후(Time 1)와 회상 시점(Time 2), 두 시점에 걸쳐 정서반응을 측정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이전 시점의 정서와 오염변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하였을 때, 투지가 회상 시점(T2)의 정서 수준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지가 높을수록 회상 시점의 부정정서가 줄어들었으며, 긍정정서가 늘어났다. 이는 똑같은 부정적 피드백일지라도 투지에 따라 이에 반응하는 양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투지가 높은 사람들은 부정적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투지가 부정적 피드백의 완충제로써 작용한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Abstract
What characteristics of grit allow people to pursue long-term goals even in the face of failures and setbacks? This study, by examining changes of negative feedback response on grit, explored the characteristics of grit. We hypothesized that emotional responses to negative feedback would be different as a function of grit and this difference would be greater as time elapses. In order to explore changes of feedback response over time, we measured emotional responses to negative feedback in two different time frames, one immediately after providing the feedback (Time 1) and the other when recalling the feedback (Time 2). When previous emotion level and confounding variables were controlled for, the results of hierarchical analysis showed that grit predicted emotion level at Time 2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The results showed that people high in grit effectively reduced their negative emotion level and increased positive emotion level when they recalled the negative feedback (T2). Even when given the same negative feedback, people high in grit tend to react more positively to negative feedback than people low in grit as time elapses. This implies that people reacted to negative events differently according to their grit level.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grit acts as a buffer against negative feedback.
초록
Haidt와 Joseph(2004)이 제시한 도덕적 기반 이론(Moral Foundations Theory)에 근거하여 개발된 도덕적 기반 질문지는 서구권에서는 그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도덕적 기반 이론을 적용한 연구들에서는 부분적 혹은 단편적으로는 그 타당성이 지지되었으나 도덕적 기반 질문지의 타당성은 아직까지 검증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는 대학생 집단 뿐 아니라 20대∼50대 한국인을 대상으로 도덕적 기반 질문지가 한국사회에도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성인 327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결과, 하위 척도 중 하나인 도덕적 판단 척도는 유의미한 요인구조를 전혀 도출하지 못하였다. 도덕적 관련성 척도는 원저자들의 5요인 모델이 아닌 3요인 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요인은 집단규범존중, 공정성, 위해라고 명명되었다. 도덕적 관련성 척도와 정치성 성향과의 관계에서는 집단규범존중과 공정성만이 정치성성향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 연구 결과에 대한 함의점과 제한점이 논의되었다.
Abstract
The moral foundations questionnaire developed based on the moral foundations theory (Haidt & Joseph, 2004) was validated in the western culture. However, it is equivocal wether the foundations are applicable in Korean culture since the moral foundations vary across cultures. Therefore, this study, undertaken with Korean adults (N = 327, Mage = 35.83), validated the moral foundations questionnaire using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The results of factor analyses yielded a 11-item questionnaire with three factors (respecting group norms, harm/care, and fairness/reciprocity) compared to five factors (harm/care, fairness/reciprocity, authority/respect, in-group/loyalty, and purity/sanctity) of original version. The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es, with measures of value orientations and political inclination, partially supported both the convergent and criterion-related validities of the Korean moral foundations questionnaire. Based on this result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were discussed.
초록
범죄사건 수사에서 목격자의 진술은 가장 중요한 정보 중 하나이다. 목격자들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사건 발생 후 빠른 시간 내에 면담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경찰 인력과 시간이 요구되므로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렵다. 이로써 시간지연으로 인한 망각이나 왜곡 등이 개입되어 목격자의 기억을 훼손시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건 목격과 보고 사이의 시간 간격을 좁히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최소한의 경찰 인력으로 다수의 목격자 진술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목적으로 개발된 SAI(Self-Administered Interview)가 목격자 진술 회상에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강원도 소재 K대학교 재학생 235명을 대상으로 폭행 영상을 보여준 직후 SAI와 수기용 경찰면담질문지를 실시하였고, 1주일 후 정보의 양과 질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사건 목격 직후 SAI를 실시하는 것이 1주일 후에도 사건 정보의 양과 정확성을 유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 결과의 시사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Abstract
Witnesses’ statemen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sources of information in the investigation of crimes. In order to obtain the most informative and correct statement, witnesses should be interviewed as soon as possible after the incident. However, all too often this is not achieved, largely due to demands on police resources and times. Therefore, the memory of the witness may not be perfectly preserved due to its forgetting or distortions by time delay.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narrow down the time between the event and the actual interview. Thus, it is better to develop a tool to collect the accurate information from witnesses speedily with the less police resource. By this reason, SAI(Self-Administered Interview) has been developed and now in use. The present study is to look into SAI and to find out if it is effective on the witness to recall the event accurately. In order to explore the changes of the information quality and quantity, SAI or Standard Police Questionnaire was conducted to 235 university freshmen in Kangwon province right after watching a violent video clip and conducted again one week later. The result showed that the group who was conducted SAI maintained the accurate information even one week after the event than the group who was conducted Standard Police Questionnaire. We further discussed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present findings.
초록
"일관성 기반 논증(coherence-based reasoning)" 이론에 의하면 배심원들은 판단 초기에 사건에 대하여 잠정적인 가설 혹은 정신적 표상을 구성하고 이 가설 혹은 표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증거들을 해석하고 판단하여 유무죄 판단에 반영을 하는데, 표상에 반대되는 증거는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인간의 의사결정에 관한 심리학적, 신경생물학적 이론들을 토대로 반박증거(incoherent evidence)가 판단이 이루어진 후에 제시되면, 아직 판단이 형성되고 있는 과정에 제시되는 경우에 비하여 배심원의 판단에 더 많은 영향을 끼쳐 소위 마음 바꾸기(change-of-mind)가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 가정하고, 이를 확인하고자 실시되었다. 배심원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지는 300명의 성인 남녀가 4 가지 실험 조건 - 2(반박증거 제시시점: 초반 v. 후반) x 2(반박증거 종류: 유죄탄핵증거 v. 무죄지지증거) 중 하나에 무작위로 할당되어, 유죄심증이 강한 한 형사사건의 공판내용과 9개의 유무죄 증거들을 읽은 후 피고인에 대하여유무죄 판단을 내리도록 지시를 받았다. 참가자들은 모두 과제의 초반부에 잠정적인 유무죄 판단(1차 판단)을 내렸는데 조건에 따라 강력한 무죄증거(반박증거)를 1차 판단 직후, 혹은 최종 유무죄 판단 직전에 읽었다. 또한 반박증거는 조건에 따라 유죄를 탄핵하는 증거 혹은 무죄를 지지하는 증거로 나뉘어서 제시되었다. 반박증거가 앞에 제시되는 조건의 참가자들이 뒤에 제시되는 조건의 참가자들에 비해서 최종판단에서 유죄에서 무죄로 마음을 더 바꾸는 경향이 있었으며, 반박증거가 유죄증거를 직접적으로 탄핵하는 경우에 참가자들의 마음이 더 많이 바뀌는 경향이 있었다.
Abstract
The present study aims to test whether the coherence of a juror’s mental model of a case is a function of the decisional phase (pre- or post-decision) in which inconsistent evidence is presented. Based on psychological and neurological theories of decision-making, it was hypothesized that inconsistent information could cause a shift in juror's verdict preference more often when the information is presented after the decision is almost shaped than when it is presented while the decision is still shaping. With an actual criminal case in which the evidence was generally skewed toward the guilty verdict, three hundred collage students established an initial verdict preference and rated the likelihood of guilt of the defendant after reading a description of the facts and the first two pieces of strongly incriminating evidence. Participants then read the rest of the evidence, and decided on a final verdict and re-rated the likelihood of guilt. One of the two types of inconsistent evidence, one weakening the prosecution's case and the other supporting the defense's case, was presented either soon after the initial verdict preference was made or just before the final verdict was made. The initial guilty preference shifted in the final verdict more often, and the rated likelihood of guilt decreased more with the late presentation than with the early presentation of the inconsistent evidence. Implications for juror's decision-making in court are discussed.
초록
개인의 고유한 특질로서의 낙관성은 기존의 연구들에서 일관되게 행복 관련 변인들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낙관성을 행복의 원인 변인으로 간주해왔지만, 행복의 긍정성이 다양한 삶의 영역들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할 때, 행복이 낙관성의 원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낙관성과 행복의 인과 방향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종단 자료를 이용하여 낙관성과 행복 간의 쌍방향적 관계를 탐색하였다. 대학생들(N=270)을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1년마다 특질 수준에서의 낙관성과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여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통해 검증한 결과, 이전 시점의 낙관성은 이후 시점의 행복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이전 시점의 행복은 이후 시점의 낙관성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낙관성이 행복의 선행 변인임이 실증적으로 검증되었다. 논의에서는 연구결과가 갖는 함의와 제한점을 검토하였다.
Abstract
The trait optimism has been studied extensively and found to be linked to a host of positive life outcomes. Across previous studies, optimism has been found to be positively correlated with subjective well-being. Based on these correlational data, researchers have suggested that optimism increases subjective well-being, without empirically ruling out the possibility that subjective well-being predicts optimism. This possibility needs to be empirically tested considering the recent study findings that psychological well-being has a positive influence in various life domains such as achievement and relationship. Therefore, the present study aimed to clarify the bidirectional causal relationship between optimism and subjective well-being at trait level by analyzing the yearly longitudinal data set of Korean undergraduate students (N = 270) across three time points. The results from the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showed that previous optimism predicted subsequent subjective well-being positively, whereas previous subjective well-being did not predict subsequent optimism.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present results are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