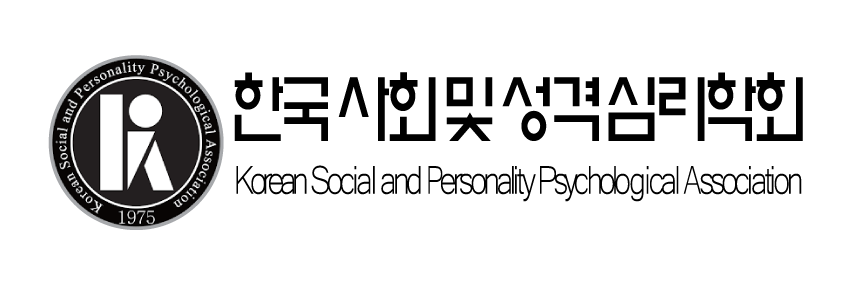ISSN : 1229-0653
ISSN : 1229-0653
권호 목록
- 2025 (39권)
- 2024 (38권)
- 2023 (37권)
- 2022 (36권)
- 2021 (35권)
- 2020 (34권)
- 2019 (33권)
- 2018 (32권)
- 2017 (31권)
- 2016 (30권)
- 2015 (29권)
- 2014 (28권)
- 2013 (27권)
- 2012 (26권)
- 2011 (25권)
- 2010 (24권)
- 2009 (23권)
- 2008 (22권)
- 2007 (21권)
- 2006 (20권)
- 2005 (19권)
- 2004 (18권)
- 2003 (17권)
- 2002 (16권)
- 2001 (15권)
- 2000 (14권)
- 1999 (13권)
- 1998 (12권)
- 1997 (11권)
- 1996 (10권)
- 1995 (9권)
- 1994 (8권)
- 1993 (7권)
- 1992 (6권)
- 1991 (6권)
- 1990 (5권)
- 1989 (4권)
- 1988 (4권)
- 1987 (3권)
- 1986 (3권)
- 1985 (2권)
- 1984 (2권)
- 1983 (1권)
- 1982 (1권)
21권 2호
초록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 이론(이누미야, 2004)은 한국인과 일본인의 심리적 차이와 같은 동일 문화권(동아시아 집단주의문화)내의 상이한 심리적 양상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기관 모델로 제시되었으나 이러한 자기관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아직 없다(이누미야, 김윤주,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 개념을 측정하는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의 개발을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 척도의 양호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지지하는 증거를 얻었다. 주체성 자기, 대상성 자기 및 자율성 자기를 측정하는 각각 6문항의 척도에 대한 신뢰도 분석의 결과는 양호한 내적 일관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주성분분석의 결과는 각 척도의 1요인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아울러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 척도, 자기존중감 척도, 및 대인관계 형용사척도(KIAS-40)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른 변인과의 관계에 기초한 타당도의 충분한 근거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논의하였다.
Abstract
Following concepts introduced by Inumiya and Kim(2006), this study describes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development of a scale to measure the strength of an individual's subjective, objective and autonomous self-construals. These three representations of self are conceptualized as reflecting the emphasis on the relational position that displays social influence often found in Korean culture - subjective, the emphasis on the relational position that accommodates social influence often found in Japanese culture - objective, and the separateness and uniqueness of the individual - autonomous - stressed in the West. An 18-item Subjective/Objective/Autonomous Self-construal(SOAS) scale measuring three dimensions of self-image is presented. The SOAS scale was found to have satisfactory internal reliability. And it showed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with measures of independent and interdependent self-construal(Takata independent/interdependent self-construal scale; Takata, Ohmoto, & Seike, 1996) and interpersonal circumplex (Korean version of the Interpersonal Adjective Scale; Chung, 2004). Its implications for self-related processes and potential applications are discussed.
초록
초점주의(focalism)란 미래의 행복 예측시 초점이 되는 요소나 사건에 과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으로서, 과장된 정서예측 오류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어 왔다. 그렇다면 초점주의는 개인의 미래 사건 경험에 대한 예측 뿐 아니라 타인의 행복을 예측할 때에도 나타나는가(Shkcade & Kahneman, 1998)? 본 연구는 타인의 행복 예측시 나타나는 초점주의가 한국문화 내에서 발생하는지 살펴보고자, 총 1,429 명의 서울과 춘천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춘천시민은 서울시민의 쇼핑/문화생활, 직업 영역에 대한 삶의 만족을 실제보다 높다고 예상한 반면, 서울시민은 삶의여유 영역에 대한 춘천시민의 삶의 만족을 실제보다 높게 예상하였다.
Abstract
Focalism is a tendency to neglect relevant but less salient factors in theprediction of happiness. To explore whether focalism occurs in the context of predicting other people’s happiness in Korea, the actual and predicted levels of happiness of Seoul and Choonchun residents were analyzed (N=1,429). As expected, predictions of other’s happiness were based disproportionately heavily on aspects of life that might be highly salient from the standpoint of a non-resident. For instance, Choonchun residents overestimated the amount of satisfaction residents of Seoul might derive from domains of shopping and job opportunities. Conversely, people living in Seoul overestimated how happy Choonchun residents might feel in their leisurely pace of life style. The current findingssuggest that focalistic judgmental tendencies emerge among Koreans in happiness predictions, despite holding holistic worldviews that may potentially attenuate such biases (Lam et al., 2005).
초록
Abstract
Juvenile diversion at police has been attempted with expert intervention since 2003. However, legislation for this system has not been made in Korea. A preliminary risk assessment procedure for juvenile offenders has been performed from 2003 to early 2004 at two police stations. This risk evaluation system is very important for determining the level of expert intervention for juvenile diversion. From late 2004 to early 2005, three more police stations have been involved. Now, fifty police stations are applied this juvenile risk evaluation and aftercare system nation-widely. This study explored the effectiveness of the risk evaluation system to predict juvenile recidivism. Data collected from 2003 to 2005 at five police stations were analyzed for this study. The recidivism data were searched at the end of 2006. The results showed criminal records of juveniles significantly predicted the number of committing crime. When the time to the first recidivism was controlled family brokenness was a facilitating factor pushing juveniles into crime. ROC analysis presented that predictive power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weak.
초록
범인식별절차에서 논란이 되어온 순차적 제시방법과 동시적 제시방법의 식별 정확성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대학생 299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비편향된 지시의 유무와 라인업상의 표적대상 유무에 따라 순차적 제시방법과 동시적 제시방법의 식별 정확성이 달라질 것으로 가정하여, 실험 진행자의 비편향된 지시유무(편향된 지시/비편향된 지시), 라인업 방법(동시적/순차적), 표적대상의 유무의 세 가지 차원을 조합한 요인 설계(2×2×2)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비편향 지시문의 유무와 라인업 방법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표적대상의 유무와 제시 방법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표적 대상이 있는 조건에서는 두 가지 제시방법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표적 대상이 없는 조건에서는 순차적 제시방법이 동시적 제시방법보다 지목 오류율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나, 현장에서 순차적 제시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The present study were to examine that a sequential lineup procedure yield greater diagnosticity ratios than does the common simultaneous lineup procedure. Participants were 299 university students. The result of the examination showed that the effect of interaction in the lineup formation has an important implication, according to the likelihood of the suspect's presence or not. In detail, in the case of the suspect's presence among the participants in the lineup formation, there are difference between the simultaneous procedure and the sequential one. In other words, this result that identification's accuracy of the sequential procedure was more high the simultaneous one. Meanwhile, the unbiased instructions appear to create no moderating effects between the lineup formation and the identification rates. Instead there appears to have a significant ramification in the interaction between the unbiased instructions and the fact that whether or not the suspect is included. This result demonstrates the possibility of the suspect's absence or presence in the lineup formation. Consequently, the unbiased instructions are essential to the identification procedure for the sake of the innocent protection from being pointed as the suspect. This study has implicit ramifications on the current investigation scene as follows:firstly, the sequential procedure has accuracy in the suspect identification as well as it contributes to reduction in misidentification. Accordingly, when the identification procedure takes place, the sequential procedure should have a priority to be considered prior to the simultaneous one. Secondly, the unbiased instruction of the processor helps to prevent the witness' mistakes in the identification procedure.
초록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바람직성이 자기보고식 성격검사의 구인타당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사회적 바람직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서 성격구인이 동등한지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5요인 성격검사(중앙고용정보원, 2001)를 대학생 2,7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외향성, 호감성, 성실성, 정서적 불안정성, 개방성의 각 주요인에 해당하는 5문항을 선정하여, 총 25문항으로 척도를 축소하여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사회적 바람직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서 성격구인이 동등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사회적 바람직성 하위척도인 자기기만적 고양 및 인상관리 점수에 근거하여 상, 하위 집단을 구성한 뒤, 두 집단 간 다집단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 간 형태불변성과 측정불변성이 확인되어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력이 있음에도 성격구인이 어느 정도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나 척도불변성이 확보되지 않아 측정된 점수를 두 집단에서 직접 비교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함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결과를 자기보고식 성격검사 활용과 관련하여 해석 시 고려사항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nstruct equivalence of a personality inventory in a low and high socially desirable responding (SDR) groups. In the pursuit of achieving the purposes, a multi-group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to test the configural, metric, and scalar invariance in the two groups' data. Total of 2,799 undergraduate students responded to the reduced personality inventory which was based on the Personality Inventory developed by the Central Employment Information Office (2001) and Korean version of Paulus' (2002) BIDR-7 that consists of two sub-scales, namely the self-deceptive enhancement scale and the impression management scale. The results of the construct equivalence tests provided evidence that supported the configural and metric invariance in the two groups. The results also showed that (1) between the low and high self-deceptive enhancement groups, substantial effect sizes were observed in the conscientiousness and emotional stability items; (2) between the low and high impression management groups, substantial effect sizes were observed in the agreeableness and conscientiousness items. It was worth noting that social desirability did not alter the factor structures that characterized the personality inventory used in this study. The results implied that the personal inventory could be used commonly in the low and high SDR groups. However, since it failed to ensure scalar invariance, the personality inventory scores from each group were to be compared cautiously.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ollowing studies were discussed.
초록
본 연구에서는 부부간 성격과 결혼가치관의 유사성과 상대방에 대한 이해 크기가 결혼만족과 관련되는지를 알아보았다. 또한 부부간 유사성과 이해 크기가 결혼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지, 성격과 결혼가치관 영역별로 그것들이 차이가 있는지, 남편과 부인의 경우 다른지 등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부부 155쌍의 대상으로 각각에게 자신과 배우자의 성격과 결혼가치관에 대한 지각을 알아보았다. 성격 지각의 경우는 5요인 성격이론에 근거하여, 결혼가치관 지각의 경우는 Acitelli 등(2001)의 연구를 참조한 4 영역에서 부부의 자기지각과 배우자 지각을 측정하였다. 부부간 상호지각의 일치도는 실제유사성(남편-부인 자기지각의 일치도), 가정된 유사성(자기지각과 상대방지각의 일치도), 이해(상대방에 대한 지각과 상대방의 자기지각의 일치도)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주요 결과는 첫째, 성격 영역에서는 실제 및 가정된 유사성보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크기가 더 컸으며, 결혼가치관 영역에서는 가정된 유사성의 크기가 다른 일치도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둘째, 기간은 모든 부부간 상호지각의 일치도 크기와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셋째, 성격의 경우 남편의 가정된 유사성이 높을수록, 부인의 남편에 대한 이해가 클수록, 부부 모두의 결혼만족이 높았다. 그러나 결혼가치관의 경우 남편은 실제유사성과 부인에 대한 가정된 유사성이 높을수록, 결혼만족이 높은 반면, 부인은 남편에 대한 가정된 유사성이 높을수록, 결혼만족이 높았다.
Abstract
The present study purport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several indices of perception congruence and marital satisfaction in married couples. Specifically it was carried out to find whether indices of perception congruence depend on marriage periods, domains, husbands and wives' beliefs and finally whether they are related to martial satisfaction. Data was collected from 155 married couples in Masan and Changwon. They did respond on prepared questionnaire to find out perceptions of the self and his(her) spouse on personalities and beliefs of marriage. Perception about personalities was measured in five domains based on Big 5 personality traits and perception about beliefs of marriage in four domains. The major results are followed: First, there was no meaningful relations between couple's marriage periods and all indices of their perception congruence. Second, in personalities couple's understanding of his(her) spouse was greater than actual and assumed similarity. In beliefs of marriage, assumed similarity that a spouse has the same beliefs of marriage was greater than other measures of perception congruence. Last, the effect on measures of perception congruence on marital satisfaction was different in personalities and beliefs of marriage. In personalities, the greater husband's assumed similarity and wife's understanding were, the greater their marital satisfaction was. In beliefs of marriage, However, the greater actual and assumed similarity of husband was, the greater the his marital satisfaction was. While the greater the wife's assumed similarity was, the greater her marital satisfaction was.
초록
집단에서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부적으로 고정관념화된 표적 구성원의 수행은 집단원 구성과 개인 기여의 도구성에 따라서 달리 나타나리라고 가정하고 이를 실험 연구를 통해서 검증했다. 여성에게 부적 고정관념이 연합된 근력 과제를 이용하여 실험한 결과, 가설과 일관되게 혼성 집단보다 동성 집단에서 고정관념 표적인 여성 구성원의 수행이 우수했다. 또한 가설과 일관되게 개인 기여의 도구성이 낮은 조건보다 높은 조건에서 여성 구성원의 수행이 우수했다. 그러나 두 변인 간의 상호작용은 가설과 달리 개인 기여의 도구성이 높은 조건에서만 집단원 구성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었다. 2차 과제로 실시한 인지과제에서도 근력 과제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을 집단원 구성, 고정관념 위협 및 집단에서의 동기 이득과 관련지어 논의하고 장래 연구의 방향을 제시했다.
Abstract
The present study examined how group composition and instrumentality of individual contribution to a group task affect the performance of stereotype targets in groups. The composition of groups was manipulated by assigning female participants to either a same-sex group (with one female confederate) or a mixed-sex group (with one male confederate). Instrumentality of individual contribution was manipulated by leading the female participants to believe that their own performance would determine either 70% or 30% of group performance. Drawing on previous research on stereotype threat, the present study hypothesized that female participants would perform better in the same-sex condition than in the mixed-sex condition. In addition, it was hypothesized that female participants would perform better in the high instrumentality condition than in the low instrumentality condition. Using a handgrip task, the present study found supportive evidence for the two predicted main effect hypotheses. However, unlike the predicted interaction effect, female participants performed better in the same-sex condition than in the mixed-sex condition when the perceived instrumentality of individual contribution was high. In contrast, group composition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when the perceived instrumentality was low. These findings were interpreted in terms of motivation gain and social loafing among females in a stereotype threat situation. Implications of the study and future directions are discussed.
초록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활동과 정서 경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일상재구성법을 이용하여 직장인 남녀와 전업 주부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일상재구성법은 사람들이 하루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장면에서 얼마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정서를 경험하는지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회상편향을 줄이기 위하여 시간대별 일기쓰기와 경험표집법을 결합한 방법으로, 연구 참가자들로 하여금 전날 자신의 활동과 경험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 결과, 세 집단은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각기 경험하는 활동과 정서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일하기’, ‘먹기’, ‘대화하기’였으며 전체적으로 부적 정서보다는 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강한 행복을 경험하는 경우는 '배우자와 함께 할 때'와 ‘먹을 때’ 라는 응답이 나왔으며, 시간에 따른 정서 경험을 살펴본 결과, 직장인 남성과 여성은 점심시간과 퇴근 후에 가장 행복했으며, 업무시간에 가장 피곤하고 긴장과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한정된 자료만을 수집할 수밖에 없었던 기존의 연구 방법에서 벗어나 실용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하였으며, 각 집단 별 경험하는 사회적 활동과 정서의 특성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집단 간 차이를 이해하고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된 연구의 의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investigate the quality of life in terms of how individuals experience various activities and emotions in daily life using the Day Reconstruction Method (DRM). The DRM, which combines features of the time-diary method and the Experience Sampling Method, assesses how people spend their time and how they experience the various activities in different settings of their lives. The participants were composed of three groups: working men, working women, and housewives. In order to minimize recall biases, participants were asked to systematically reconstruct their activities and experiences of the preceding day. In general, the three groups showed no differences in the levels of life satisfaction. The participants reported the most happiness when they spent time with their spouse/partner and when they did eating. Eating, working, and talking were the most frequent daily activities and participants overall experienced positive emotions more than negative emotions. As for the daily emotion experiences by time periods, working men and women groups experienced most happiness during the lunch time and after work; on the contrary, the working time was reported as the most tiring and stressful time of the day. Implications of measuring life satisfaction using the DRM were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