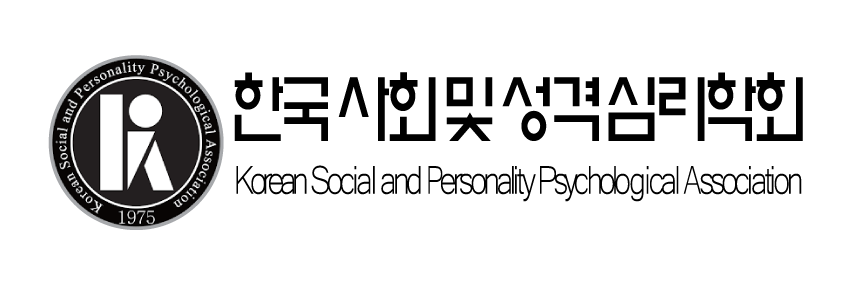ISSN : 1229-0653
ISSN : 1229-0653
권호 목록
- 2025 (39권)
- 2024 (38권)
- 2023 (37권)
- 2022 (36권)
- 2021 (35권)
- 2020 (34권)
- 2019 (33권)
- 2018 (32권)
- 2017 (31권)
- 2016 (30권)
- 2015 (29권)
- 2014 (28권)
- 2013 (27권)
- 2012 (26권)
- 2011 (25권)
- 2010 (24권)
- 2009 (23권)
- 2008 (22권)
- 2007 (21권)
- 2006 (20권)
- 2005 (19권)
- 2004 (18권)
- 2003 (17권)
- 2002 (16권)
- 2001 (15권)
- 2000 (14권)
- 1999 (13권)
- 1998 (12권)
- 1997 (11권)
- 1996 (10권)
- 1995 (9권)
- 1994 (8권)
- 1993 (7권)
- 1992 (6권)
- 1991 (6권)
- 1990 (5권)
- 1989 (4권)
- 1988 (4권)
- 1987 (3권)
- 1986 (3권)
- 1985 (2권)
- 1984 (2권)
- 1983 (1권)
- 1982 (1권)
29권 1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기분조절을 위해 음악을 감상하는 여러 가지 방략을 측정하기 위해 Saarikallio(2008)가 개발한 Music in Mood Regulation Scale(MMR)을 한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대학생 252명으로 구성된 표본 A를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대학생 197명으로 구성된 표본 B를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및 구성타당도 확인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스크리 도표, 해석 가능성, 각 요인에 속하는 문항 수를 고려하였을 때 음악 사용 기분조절 척도는 최종적으로 회복, 분출, 강렬한 느낌, 오락, 주의전환, 위로의 6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본 B를 대상으로 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발견한 6요인 18문항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렴 및 변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변인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음악 사용 기분조절 척도는 음악의 기능, 부적 기분조절 기대, 재해석, 주의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억제와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한국어로 번안된 음악 사용 기분조절 척도가 신뢰롭고 타당한 도구임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의 의의와 한계점 및 추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validate the Korean Music in Mood Regulation Scale developed by Saarikallio(2012), which measures the differential use of mood regulatory strategies while listening to music. A survey was conducted in two separate groups of undergraduate students(N=252 and N=197) to validate the instrument.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ith sample A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ith sample B were conducted. The result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n sample A found evidence regarding six factor structure: revival, discharge, strong sensation, entertainment, diversion and solace. In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e measurement model on sample B provided a 18 item scale for the Korean Music in Mood Regulation, showing adequate internal consistency and reliability. In addition, the correlation with other scales measuring general affect regulation was as expected. Specifically, Korean MMR showed positive correlation with functions of music, negative mood regulation, reappraisal and attention, indicating convergent validity, while the correlation with suppression was insignificant.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Korean Music in Mood Regulation scale is a reliable and valid instrument for measuring the use of different strategies related to music listening and mood regulation. The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rther studies are discussed.
초록
본 연구는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 간에 행복을 경험하는 맥락, 정서 그리고 행복 관련 가치의 차이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 121명을 대상으로 2주 동안 행복 에피소드 일기를 쓰도록 하였다. 그 내용을 분석한 결과, 행복맥락은 대인관계, 여가활동, 자기계발, 친사회적 행동, 종교 총 5개의 상위범주로 범주화되었다. 대인관계 맥락에서 외향적인 사람일수록 유쾌, 황홀, 애정, 자부심을 높게 경험한 반면, 내향적인 사람일수록 안락정서를 높게 경험하였다. 여가활동과 자기계발 맥락에서 외향적인 사람일수록 전반적으로 긍정 정서 및 가치를 높게 경험하였다. 에피소드 빈도의 경우, 외향적 집단이 내향적 집단보다 대인관계를 빈번하게 경험했고, 내향적 집단이 외향적 집단보다 여가활동 중 정적활동과 신체․심리적 평안과 즐거움 활동을 더 빈번하게 경험하였다. 자기계발범주에서 외향적 집단은 수행맥락을 내향적 집단보다 빈번하게 경험한 반면, 내향적 집단은 자기탐색과 자기성장 맥락을 더 빈번하게 경험하였다. 이를 토대로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논의하였다.
Abstract
The present study aimed to identify the differences in emotions, contexts, and values relevant to happiness between extroverts and introverts. A total of 121 undergraduates were asked to keep a diary for their happiness episodes for two weeks. Content analysis of happiness episodic contexts led to five upper categories: interpersonal relationship, leisure activities, self-improvement, pro-social behaviors, religion. For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category, extroverts had experienced emotions more such as pleasure, ecstasy, affection, and confidence, whereas introverts had experienced ones more such as tranquility. For the leisure activities and self-improvement categories, extroverts experienced positive emotions and values more than introverts did. And contexts in which extroverts experienced happiness were more related to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ntexts, those for introverts were more related to passive activities, physical/psychological well-being and pleasure. Finally, for the self-development category, the performance contexts were more closely connected with extroverts, while self-reflection and self growth were more important for the introverts.
초록
본 연구는 대학생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자아정체감 및 진로결정몰입의 관계를 살펴보고,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진로결정몰입의 관계를 자아정체감이 매개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강원, 제주 지역의 대학생 3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자아정체감, 진로결정몰입을 측정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18.0을 이용하여 상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자아정체감 및 진로결정몰입이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둘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결정몰입의 수준이 높았고,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결정몰입의 수준이 높았다. 셋째, 자아정체감은 대학생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진로결정몰입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을 논의하였다.
Abstract
In this study, I have sought to explore the linkages among college students’ communication with their parents, ego identity, and commitment to their career choices. In particular, I have investigated whether college students’ ego identity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llege students’ communication with their parents and commitment to their career choices. To test my arguments, I have conducted a survey of college students from Seoul, and Gangwon and Jeju provinces. A final sample includes 308 students from the above regions. For my analysis, I have employed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using SPSS 18.0. Additionally, I have conducted the Sobel test to test a mediation effect. I have found the positive and significant correlations among parent-student communication, college students’ commitment to their career choices, and college students’ ego identity. Second, I have found the positive and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parent-student communication and college students’ commitment to their career choices, between college students’ ego identity and commitment to their career choices. Finally, I have found that college students’ ego identity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tudent communication and college students' commitment to their career choices. I have discussed finding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in the final section.
초록
본 연구는 다양한 나이대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성별과 나이가 성폭력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참여자는 전국 260명(여성 = 133명)의 성인들로 구성되었으며, 나이의 분포는 20세에서 69세(M = 41.39, SD = 11.20) 사이였다. 연구 참여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성관계 발생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구성된 가상적 성폭력 시나리오 중 하나를 읽고, 성폭력 인식과 관련된 5개의 문항(여성 거절의 진심, 여성의 불쾌감, 여성의 성적 만족, 남성 행동의 폭력성, 남성 행동의 남성성)에 답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경우에서 성별과 성관계 여부 간, 그리고 나이와 성관계 여부 간의 이원 상호작용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이, 나이가 적은 사람에 비해 많은 사람이 성폭력에 대해 더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강간통념, 성역할 고정관념 등의 성폭력 인식 관련 척도 간의 관계성을 검토하거나 사법적 관점에서 책임 혹은 양형 판단을 측정하였던 기존 연구와 달리 연구 참여자들에게 성폭력 시나리오를 직접적으로 제시하여 일반적인 성폭력 인식을 측정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점을 갖는다.
Abstract
We investigated how gender and age affect the perception of sexual violence. Participants whose age ranged from 20 to 69 read one of two scenarios about a dating couple. In one scenario, the man had sex with the woman against the woman's will at the end of the story. In the other scenario, the man did not attempt to have sex once realizing that the woman did not want to have sex. Participants then answered the following five items regarding the two characters in the scenario: sincerity of woman’s refusal, woman’s unpleasantness, woman’s sexual satisfaction, man’s violence, and man’s masculinity. There were several significant two-way interactions between participant gender and condition, and between participant age and condition. It was found that male and old participants were more likely than their counterparts to score low on sincerity of woman’s refusal, woman’s unpleasantness, and man’s violence, and score high on woman’s sexual satisfaction and man’s masculinity in the sex condition. No meaningful pattern was found in the no sex condition.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초․중등학생들의 인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타당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선행연구 고찰, 2차에 걸친 델파이조사, 교사서면면담조사, 전문가 협의회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예비검사 문항을 개발하였다. 또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예비검사 문항의 내용타당도를 검토 받았다. 예비검사는 전국 초․중․고 약 2,0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예비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110개의 본검사 문항을 선정하였다. 본검사는 전국 1,184개교 약 40,000명의 초(5학년)․중(2학년)․고(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본검사 결과에 기초하여 10개의 하위요인을 포함하는 총 70개 문항으로 구성된 ‘KEDI 인성검사’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최종적으로 개발된 ‘KDEI 인성검사’는 자기존중, 성실, 배려․소통, 책임, 예의, 자기조절, 정직․용기, 지혜, 정의, 시민성의 10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KEDI 인성검사’는 적절한 수준의 신뢰도(내적 합치도, 검사-재검사 신뢰도)와 타당도(구인타당도, 공인타당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개발된 ‘KEDI 인성검사’가 갖는 의의와 제한점 및 추후연구에 대해 논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character scale for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and to evaluate its reliability and validity. To this end, this study made the best use of various methods, such as literature review, delphi survey, experts meeting, e-mail interview to teachers and developed preliminary test items. Also, to verify the content validity character experts rated those items. On the basis of the preliminary test results, 110 items of KEDI character test were selected. The KEDI character test was administered to sample of 40,000 students in elementary(fifth grade), middle(second grade) and high(first grade) school. Ten factors were extracted from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the results of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upported a ten-factor structure. KEDI character test is composed of 10 constructs, namely self-respect, integrity, emotional & social intelligence, responsibility, self-regulation, honesty & courage, wisdom, justice, and citizenship. KEDI character test shows strong levels of reliability(internal, test-retest) and clear patterns of concurrent validity. Finally, the implication of results and future direction of the present study were discussed.
초록
스마트폰의 보급과 모바일 기술의 발달로 온라인을 통한 정보 교류 및 의사소통이 현대인의 일상이 되었다. 그동안 온라인을 통한 관계유지행동이 사회자본의 축적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점차 기존에 형성된 사회자본이 온라인 관계유지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다소 상반된 의견도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온라인에서의 대인관계와 사회자본과의 관련성을 살핀 대부분의 연구가 상관연구이거나 경험적 증거 없이 인과적 가정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졌으며, 특히 교량적 유형의 사회자본에 치중했다는 제한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6개월 간격으로 3차 시점에 걸쳐 수집된 1039명의 종단자료를 바탕으로 온라인 관계유지행동 및 오프라인 관계유지행동과 교량적 및 결속적 유형의 사회자본간의 인과관계를 통합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분석 결과, 기존에 형성된 교량적 유형의 사회자본 수준이 오프라인 및 온라인 관계유지행동을 부분적으로 설명하였으며, 결속적 유형의 사회자본은 오프라인 관계유지행동을 통해 온라인 관계유지행동으로 이어지는 완전매개모형을 보였다. 오프라인 관계유지행동 역시 온라인 관계유지행동의 부분적인 원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온라인의 관계유지행동이 오프라인의 관계유지행동으로 확장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관계유지행동 모두 사회자본의 축적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연구결과의 함의와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Abstract
Nowadays online communication is an essential part of a daily life. Some people argued that online activity was beneficial for the accumulation of social capital, but there is quite opposite evidence supporting that the social capital may promote online activity. As most of the research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 capital and online activity was conducted using a cross-sectional design, it was hard to establish causal relationship.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causality between online/offline relationship-maintaining behaviors and social capital. For this purpose,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was analyzed based on three wave panel data of 1039 participants. Results showed that pre-existing bridging social capital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offline and online relationship-maintaining behaviors, and offline relationship-maintaining behaviors also partly contributed to the increase of online relationship-maaintaining behaviors. However, both offline and online relationship-maintaining behaviors did not contribute to the accumulation of bridging social capital. Futhermore, the positive effect of pre-existing bonding social capital on online relationship was completely mediated through offline relationship.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